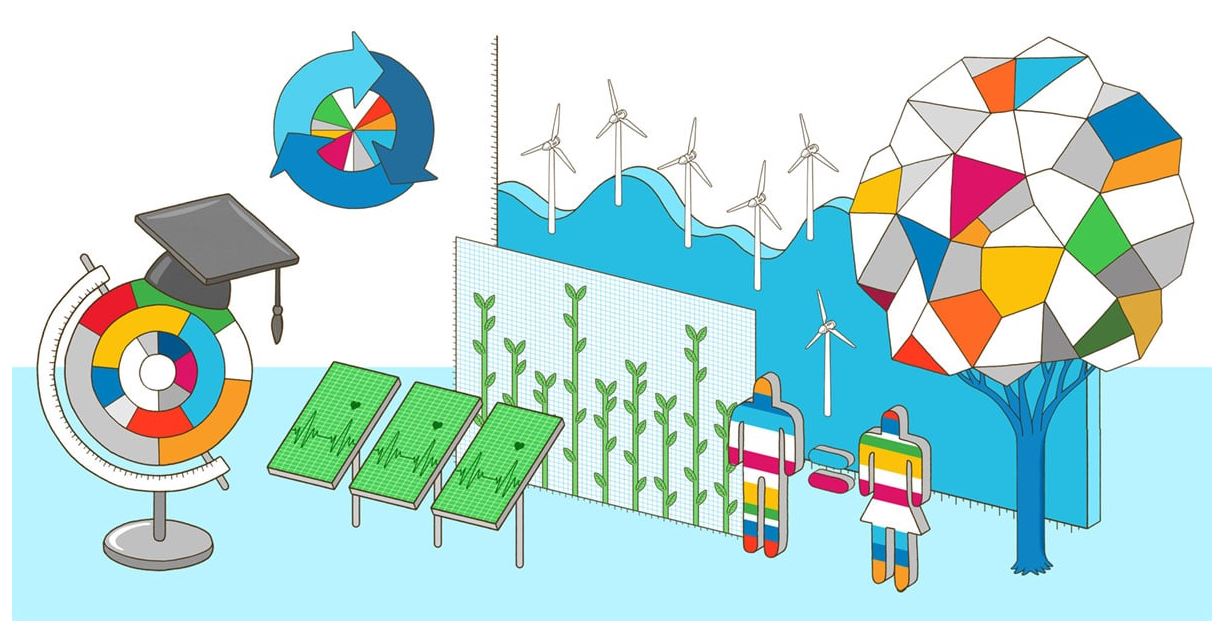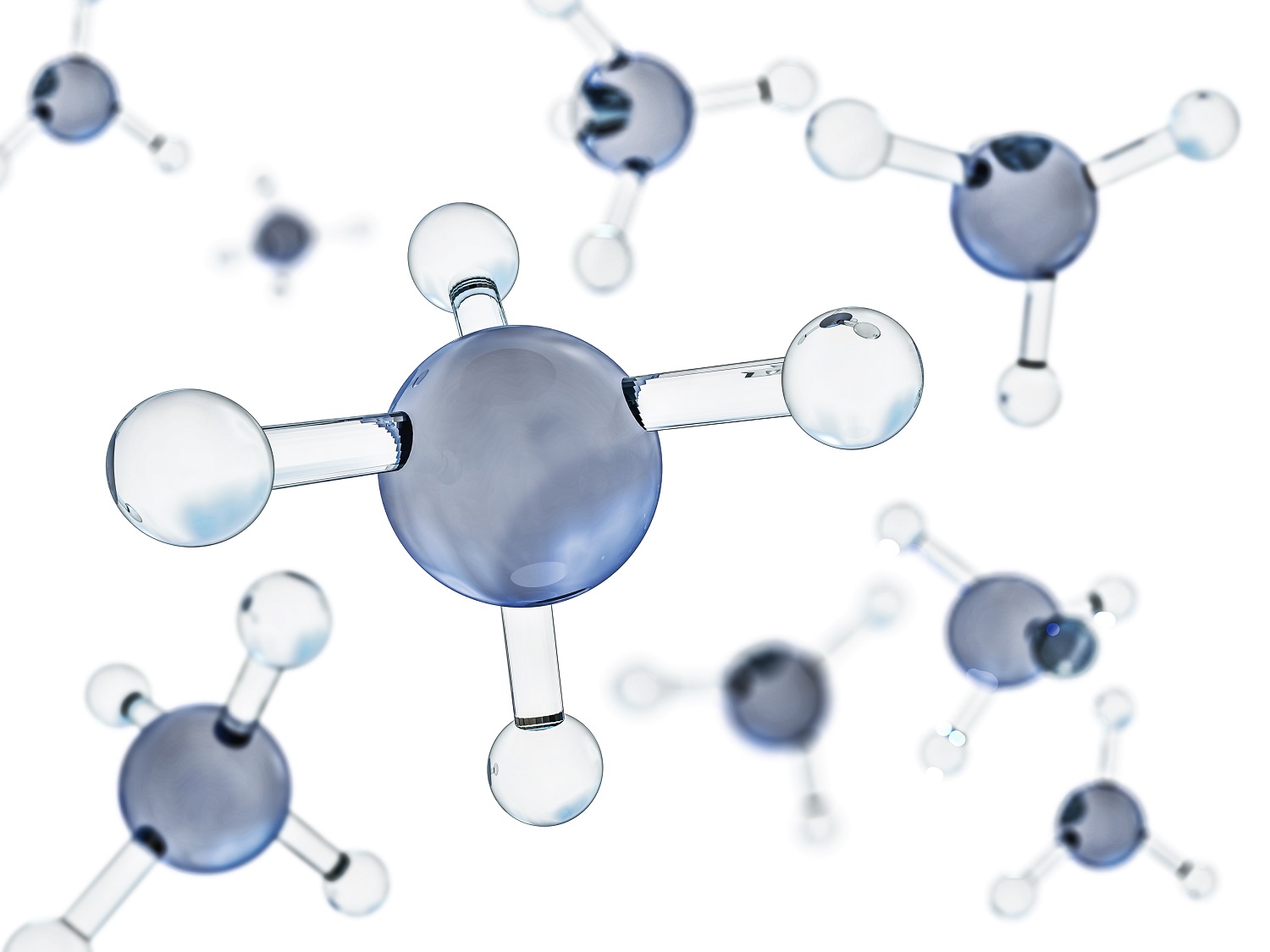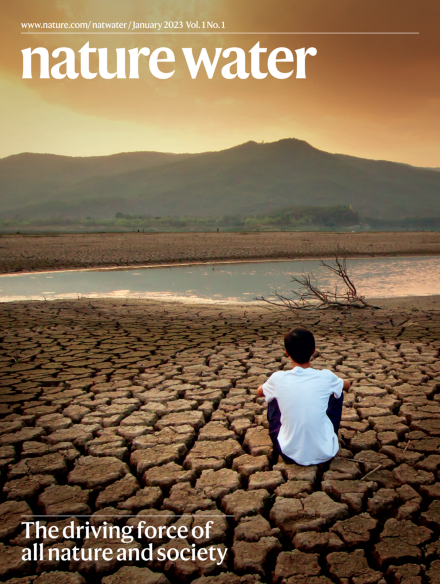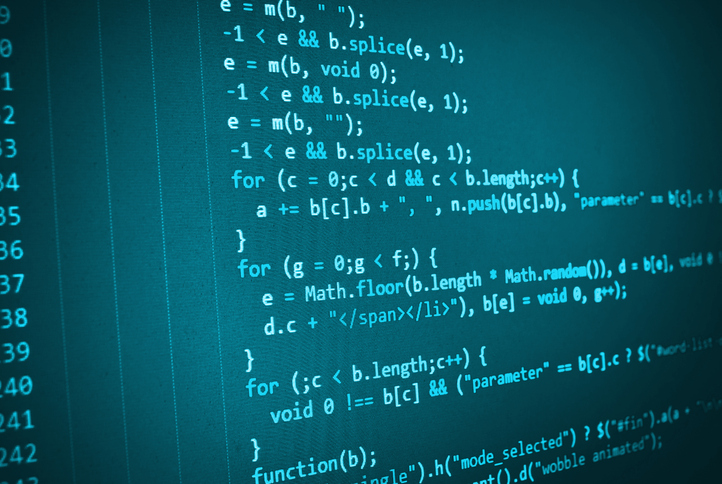지난 2015년 12월 15일, UN 총회는 매년 2월 11일을 ‘세계 여성 과학자의 날(International Day of Women and Girls in Science)’로 제정했다. 그리고 일요일인 11일 세 번째 기념일을 맞아 UN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António Guterres) 사무총장은 “지난 15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여성들이 과학현장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여성들이 과학 연구자로서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제 사회는 지난 15년 간 과학 현장에서 여서 소외 현상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도 과학계 곳곳에서 여성 소외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이 박사 될 수 있는 확률, 2%에 불과
UN이 1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으로 태어나 대학에서 과학을 전공할 수 있는 확률은 18%,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확률은 8%,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확률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로 태어나 대학에서 과학을 전공할 수 있는 확률은 37%,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확률은 18%,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확률은 6%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교육 분야에서 성적 소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핀란드 오울루 대학의 대기과학자인 뇐네 프리슬(Nønne Prisle) 조교수는 ‘여성 과학자의 날’을 앞둔 지난 9일 ‘사이언스’ 지를 통해 “그동안 여성 과학자로서 수차례 성차별적인 도전환경과 소외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뛰어난 여성 선배 과학자로서 롤 모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남성들이 주도하는 연구 풍토에 적응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 그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 초기 경력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신들이 겪었던 경험을 되살려 후배들을 지원하고 멘토링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후배들이 모범적인 과학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자신들이 직면했던 경험들을 공개하고, 또한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의생명과학 박사학위 과정을 앞두고 있는 사만타 존스( Samantha Jones) 씨는 “학생들을 위한 거의 모든 실습 과정이 남성 위주로 짜여져 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교육 과정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학공학자인 시애틀 워싱톤 대학의 엘리자베스 낸스(Elizabeth Nance) 조교수는 “과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 많은 여성들이 여성이 아닌 선배 남성으로부터 조언을 듣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했다.
여성 과학자들 ‘가면현상’으로 고통 겪어
“연구 과정에서 여성들은 남성과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성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여성들은 손쉽게 풀어갈 수 있다.”는 것. “특히 여성 과학자로서 여성적인 직감에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직감과 같은 여성만이 지니고 있는 강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감과 같은 여성적인 강점들을 살려나갈 경우 뛰어난 연구 실적을 쌓아나갈 수 있다.”며 후배들에게 여성 과학자로서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가져줄 것으로 주문했다.
터키 앙카라 대학의 여성 고에너지물리학자인 빌게 데미르코츠(Bilge Demirkoz) 교수는 그동안 많은 후배 여성들을 위해 멘토링을 해온 인물이다. 그녀는 “여성들에게 있어 가장 큰 고민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성공 여부를 진단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많은 여성들이 어린 시절부터 과학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과학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런 현상을 가면현상(impostor syndrome)이라고 설명했다.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체성 상실현상을 말한다.
‘imposter’는 ‘사기꾼’, ‘타인을 사칭하는 자’를 뜻하는 데 그동안 자신의 노력을 통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와 신분에 이르렀으면서도 끊임없이 ‘이것은 나의 참모습이 아니다’, ‘언제 가면이 벗겨질지 모른다’ 등의 망상에 시달리는 현상을 말한다.
교수는 자신도 이런 ‘가면현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후배 과학자들 역시 이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며, “어린 학생들이 이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난 즐겁게 과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끊임없이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불어넣어주었다.”는 영국 울버햄튼 대학의 약리학자인 사라 존스(Sarah Jones) 교수는 “그동안 과학만 생각했지 성적 소외감에 직면할지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과학계 내부에 여성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 과학자들의 연구 능력에 대해 남성 다음으로 평가하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다.“며 남성과 여성 과학자들의 능력을 동등하게 봐줄 것을 요구했다.
옥스퍼드 대학의 컴퓨터공학자 마리나 지토르카(Marina Jirotka) 교수는 “여성 컴퓨터 전문가로서 그동안 수시로 소수집단으로서의 박탈감을 느껴왔다.”고 말했다. “남성 중심으로 미팅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과학의 미래를 위해 성적인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여성 과학자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많은 국가들이 여성 과학자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쏟아져 나오는 여성 과학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강봉 객원기자
- aacc409@naver.com
- 저작권자 2018-02-12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