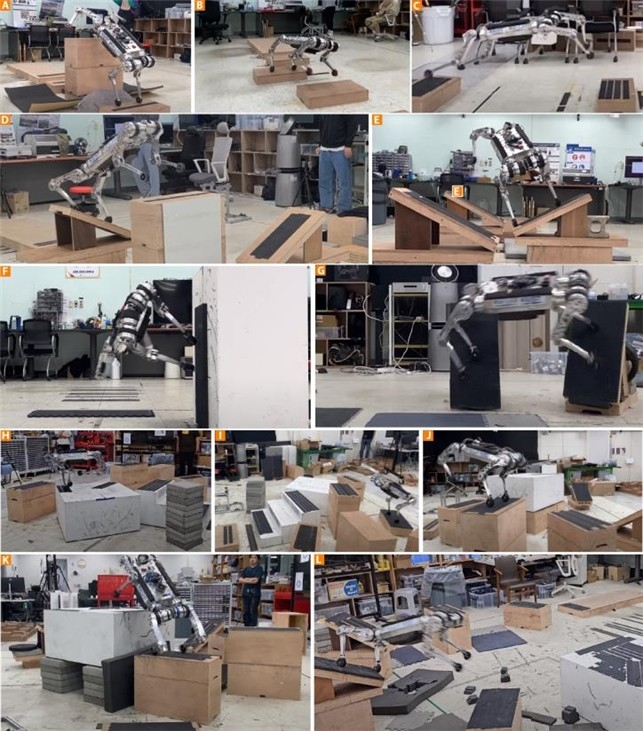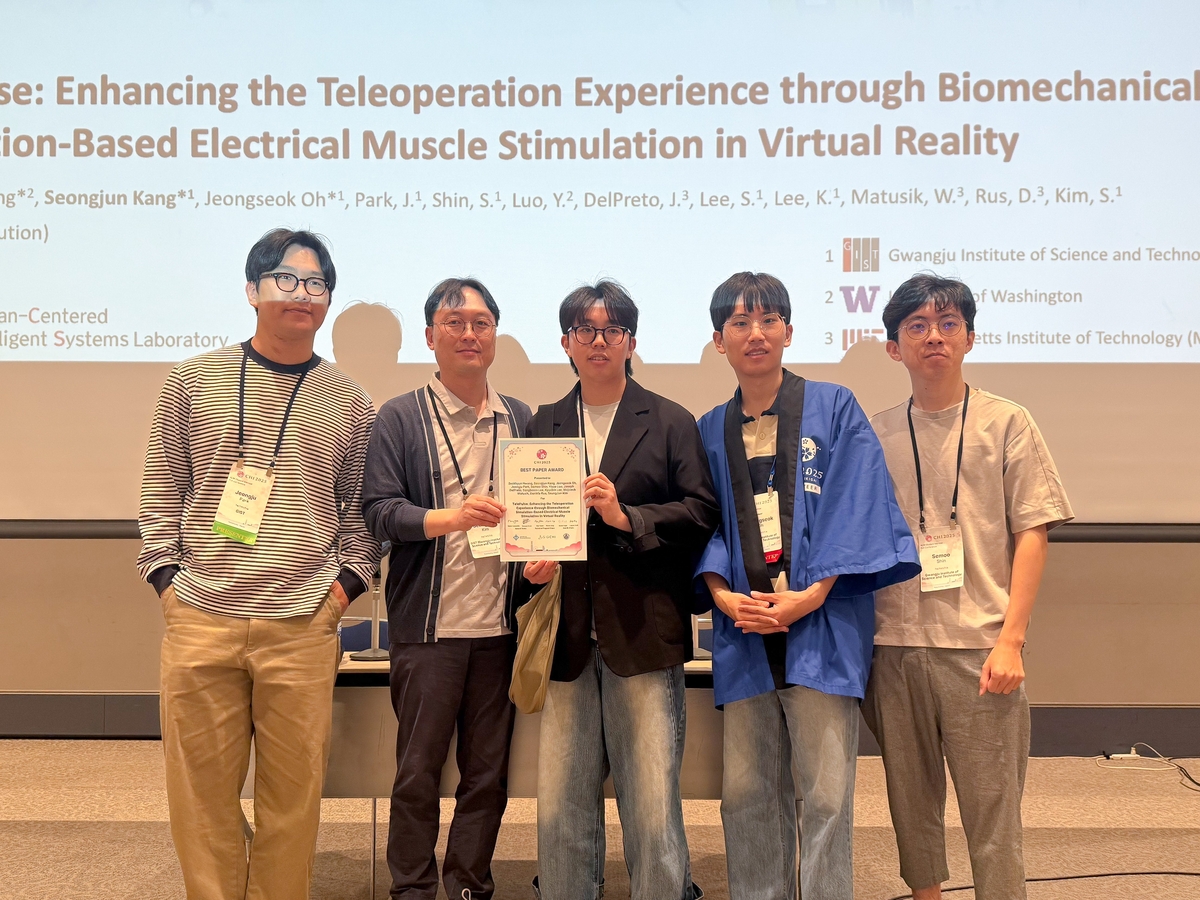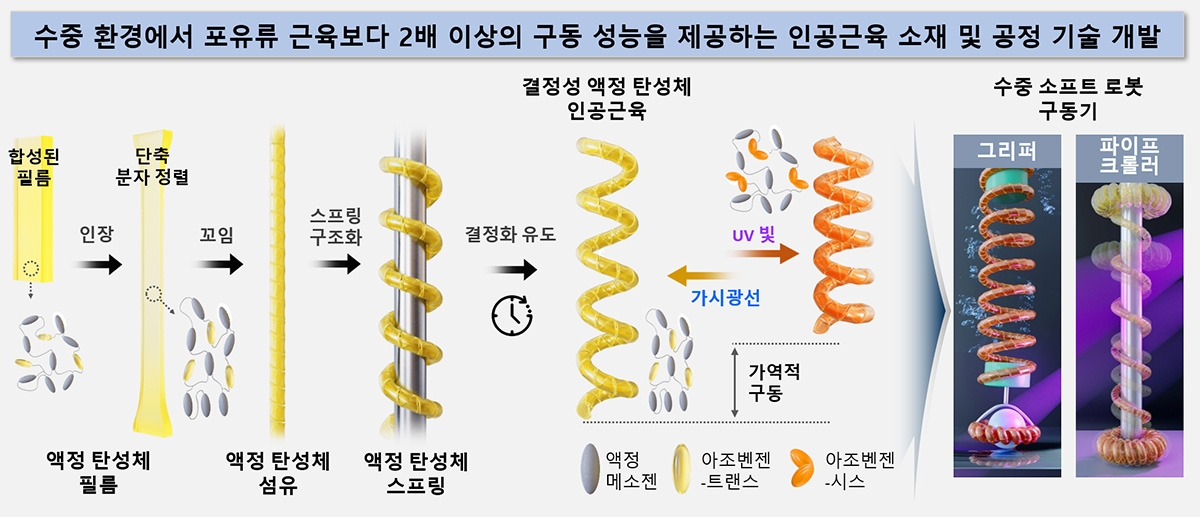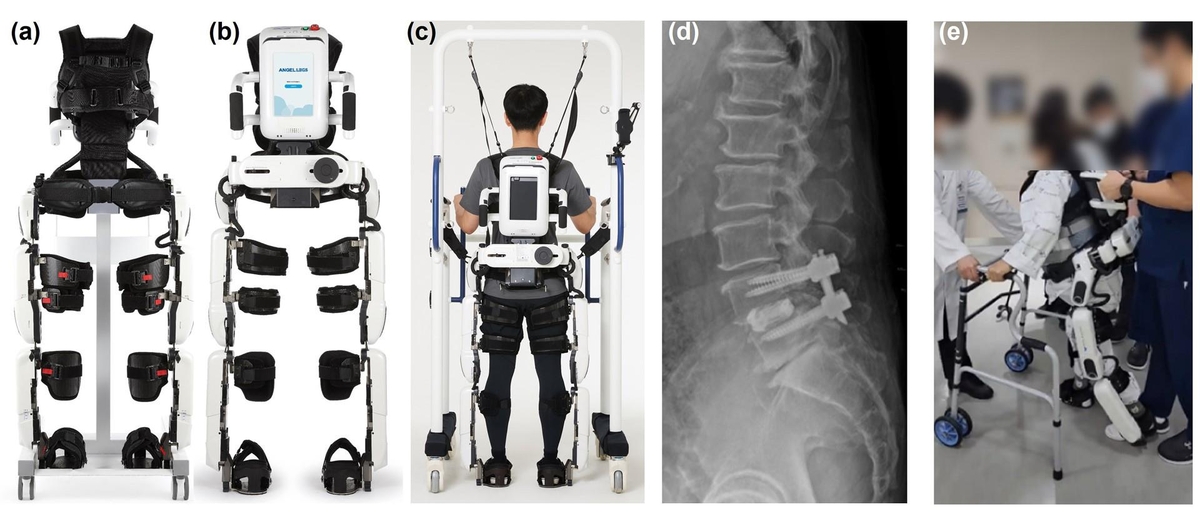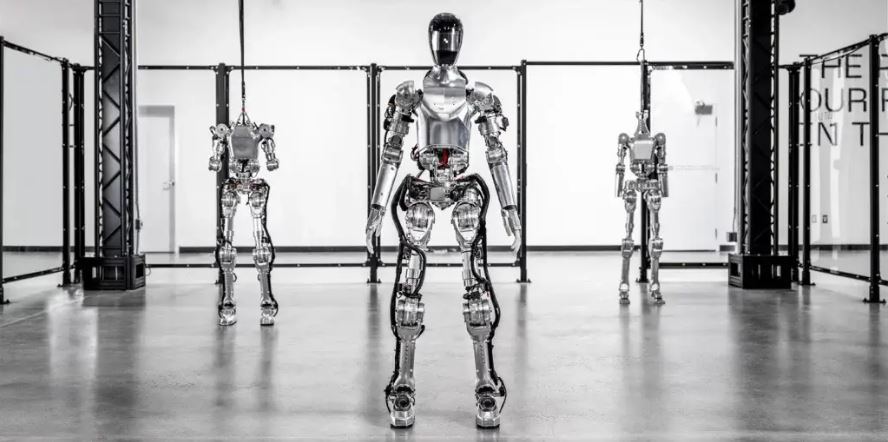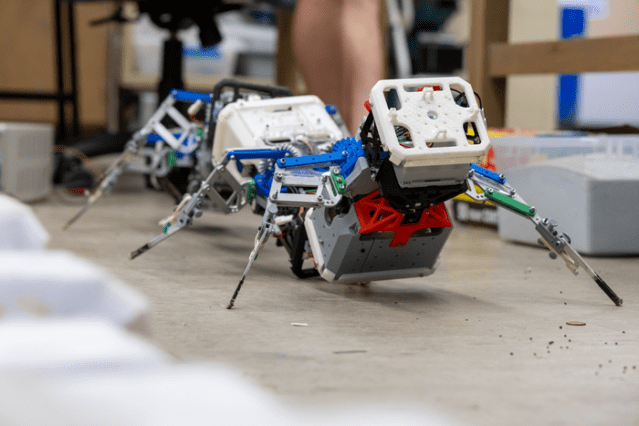오늘날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각종 휴머노이드 로봇 역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로봇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체코의 극작가 카렐 차페크(Karel Capek)로, 1921년에 발표한 ‘로섬의 만능로봇’(Rossum's Universal Robots)이라는 연극의 대본이 시초였다. 로봇(Robot)은 ‘힘든 일’, 혹은 ‘강제노동’이라는 의미의 체코어 ‘로보타(Robota)'에서 따온 말이다.

희곡의 줄거리는 어느 과학자가 인간의 힘든 일을 대신시키기 위하여 로봇을 만들었는데,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리라 기대했던 로봇이 도리어 어려운 일을 싫어하고 인간에게 반항하다가, 결국은 인간을 죽이고 세계를 지배한다는 이야기이다. 미래에 인간보다 나은 로봇이 출현할 수 있느냐, 혹은 로봇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등등, 터미네이터 시리즈를 비롯한 오늘날 숱한 SF영화에서 자주 등장하고 우려하는 것들이 로봇이라는 말이 생길 때부터 시작되었던 듯하다.
‘로봇 소설의 아버지’라 불리는 저명한 SF작가이자 과학자인 아이작 아시모프(Isaac Asimov)는 1950년에 펴낸 책 ‘아이, 로봇(I, Robot)’에서 이른바 ‘로봇 헌장 3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원작으로 한 동명의 영화도 나온 적이 있는데, 첫째 로봇은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에 해를 끼쳐서는 안되고, 둘째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셋째 이 두 가지 조건을 지킬 경우에는 스스로를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의 로봇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SF소설과 영화 등에서 로봇은 인간에게 제법 익숙한 존재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세계 최초의 로봇은 무엇이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로봇의 원조를 어느 정도까지 보느냐에 따라 견해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청동 거인 탈로스(Talos)를 사상 최초의 로봇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탈로스는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어 크레타섬을 지키는 파수병 역할을 한 일종의 인조인간으로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여 섬에 침입하는 적군이나 해적선 등을 뜨겁게 달아오른 몸으로 껴안아 죽이거나 파괴했다고 전해진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이므로 실존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탈로스는 오늘날 최신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미국이 개발하는 군사용 로봇의 명칭 등으로 자주 쓰인다.

비행기, 낙하산, 잠수함 등 시대를 뛰어넘는 선구적인 연구와 설계도를 남긴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의 노트에는 갑옷을 입은 기계 기사도 그려져 있는데, 이를 로봇의 설계라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다빈치의 로봇은 현대에 복원되기도 하였는데, 최근 각종 외과수술 등에 활용되는 의료용 로봇시스템 ‘다빈치’는 여기에서 따온 것이다.
앞선 글에서 언급했던, 1840년대에 다나카 히사시게(田中久重) 등이 제작하여 선보였던 일본식 오토마톤인 가라쿠리(からくり) 인형, 즉 문자쓰기 인형이나 차 나르는 인형 등도 로봇의 태동 역사에서 나름의 위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늘날 일본이 이족보행 로봇 아시모(ASIMO) 등 혁신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세계적인 로봇 강국이 된 것도 이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듯싶다.
산업현장 등에서 실용적으로 쓰인 로봇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을 끌었던 최초의 로봇으로는, 1927년과 1928년에 각각 선보인 텔레복스(Televox)와 에릭(Eric)이 있다. 1927년 10월에 뉴욕에서 선보인 텔레복스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전기회사의 기사였던 웬슬리(R. J. Wensley)가 철판 등을 잘라서 인간의 모습에 가깝게 만든 로봇으로서, 전화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초보적인 음성인식 제어의 기능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음성인식 수준과는 큰 차이가 있어서, 실제로 인간이 하는 말의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세 가지 정도의 음성 톤에 각각 다르게 대응하도록 전기회로적으로 설계된 것이었다. 웨스팅하우스사는 텔레복스 형태의 로봇을 발전시켜서, 1939년에 뉴욕 세계박람회에서 선보인 로봇 엘렉트로(Elektro)는 수백 개 정도의 단어를 말할 수도 있었고, 인간의 명령에 대응하여 춤을 추거나 음악을 지휘하는 등 다양한 행위를 할 수 있어서 대중들의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1928년 9월 영국 런던의 한 전시회에 등장한 로봇 에릭은 리처드(William Richards) 등이 제작한 것인데, 마치 만화영화에 나오는 깡통 로봇 또는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양철나무꾼과 흡사해 보이는 외관을 지니고 있었다. 에릭은 무선 신호를 수신하여 말도 할 수 있었고 일어나거나 앉을 수는 있었지만 다리를 움직이거나 걸을 수는 없었고, 가슴에는 ‘로섬의 만능로봇(Rossum's Universal Robots)’의 약자인 RUR이 쓰여있었다고 한다.

텔레복스나 에릭, 엘렉트로 등은 실제로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로봇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다기보다는 전시용이나 박람회의 관객 유치를 돕는 용도 등으로 쓰였다. 로봇이 산업현장에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이다.
1954년에 미국의 데벌(George Devol) 등이 발명한 유니메이트(Unimate)는 세계 최초의 산업용 로봇으로 꼽힌다. 유니메이트의 개발자들은 이를 개선하여 1961년에 로봇에 대한 최초의 특허도 받았고,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는 1962년부터 이 산업용 로봇을 자동차 부품의 이동이나 용접 등에 활용함으로써 로봇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이르렀다.
- 최성우 과학평론가
- 저작권자 2021-07-23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