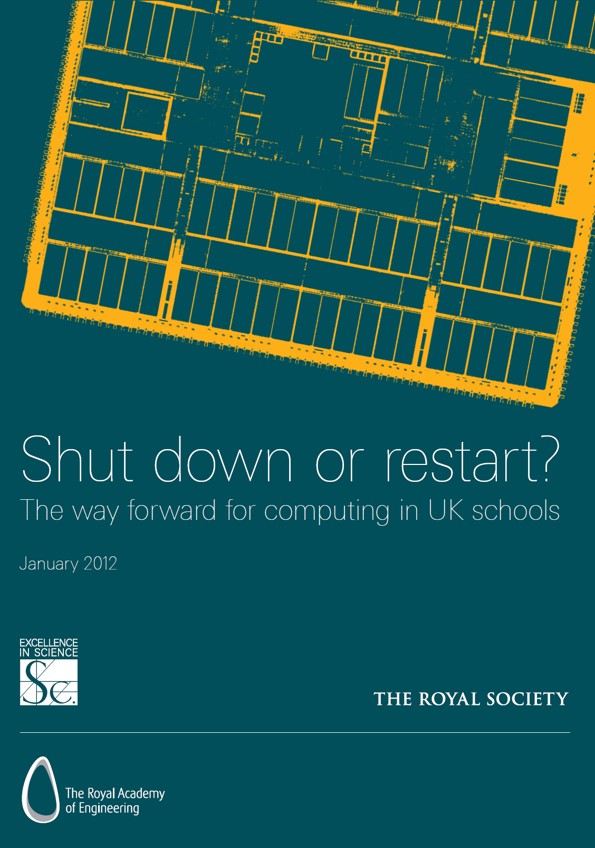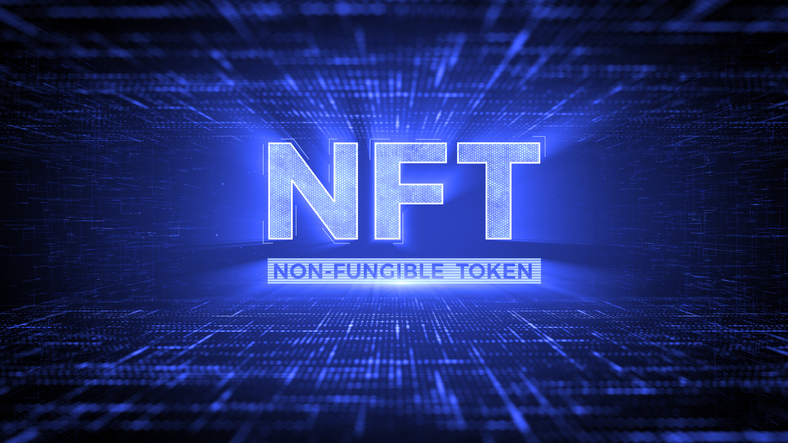시험에나 존재하던 ‘과학’이 ‘놀이 산업’을 통해 시민 생활 속으로 들어올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즐기고, 소통하고, 성장하는 과학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 5년간 1조 4500억 원을 투자, 민간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중 과학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축제인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은 세계적인 명품 과학축제로 집중 육성되고, 상징성을 가진 지역들은 ‘과학 랜드마크’로 조성된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과학문화도시를 구축하고, 동네 과학문화 공간을 세분화하여 시민들의 일상에서 놀이가 이어진다.
주목할 만한 것은 과학을 재미·놀이 요소가 융합된 ‘싸이테인먼트 산업’으로 육성, 아이에서부터 노인층까지 전 계층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로 개발한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 30일 서울 종로구 국립어린이과학관에서 ‘과학문화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전 국민, 과학으로 ‘즐기고 소통하고 놀자’
과학은 이제 우리 생활과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다. 선진국들은 이미 국민 생활 속에 과학을 녹여 ‘시민과학’을 실천 중이다.
선진국에서는 과학을 ‘소풍’으로, ‘축제’로, ‘클럽 과학’으로, ‘해커톤’으로, ‘청년의회’로 다양하고 재미있게 생활 속에서 접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혁신적인 과학문화 정책을 통해 전 국민이 과학을 생활 속에서 향유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병주 과학기술문화과장은 지난 11월 26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호텔(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에서 열린 ‘2018 과학창의 연례컨퍼런스’에서 올해 발표한 ‘과학문화산업 혁신성장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밝혔다.
가장 먼저 기존 과학관 기능을 재정비하는 작업이 수행된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전국 과학문화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의 중심 기관이 된다.
전국 국립과학관들 역시 과학문화 거점기관으로 자리잡는다. 지역 공립 및 사립 과학관과 무한상상실로 연결된다.
권역별 과학관의 놀이터 공간은 최신 과학교구와 놀이기구를 보유한 모델형 과학놀이터로 조성된다.
특히 지역과 연계한 ‘과학문화 즐길거리’가 확대된다. 지역특화산업을 연계하고 지역대표 과학체험 콘텐츠가 개발된다. 대표 지역의 축제와 연계한 과학체험 공연 콘텐츠를 개발하고 마을단위 작은 과학축제도 활성화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스토리를 중심으로 지역과 캐릭터를 연계한 과학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관광, 여행 상품 등 다양한 부가산업으로 확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최신 첨단 기술의 발달로 어느 때보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콘텐츠 확대와 구축이 중요하다. 온라인은 과학포털 ‘사이언스올(scienceall)’을 중심으로 과학문화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된다.
유튜브, 팟캐스트 등 1인 창작 미디어 등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AR·VR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유통채널도 확대될 전망이다.
생활 속의 과학 실천 위해 정책적인 대안 마련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재미있게 체험했던 과학 활동은 중학교를 가면 멈추기 시작한다. 직접 실험실에서 했던 흥미로운 실험도, 천문관이나 과학관에서 보던 환상적인 별자리 관측도 기억에서 사라진다.
생명과학, 지구과학, 물리, 화학이라는 과목으로 공식과 기호를 달달 암기하며 시험 대비를 위해서만 ‘과학’이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과학은 학교 시험과정에만 필요한 학문이 아니다. 미세먼지, 방사능,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 먹고, 입고, 자고, 인간이 생활하는데 있어 필요한 모든 곳에 과학이 있다.
선진국에서는 과학을 시민과학으로 결부시켜 시민과 기업, 과학자들이 함께 과학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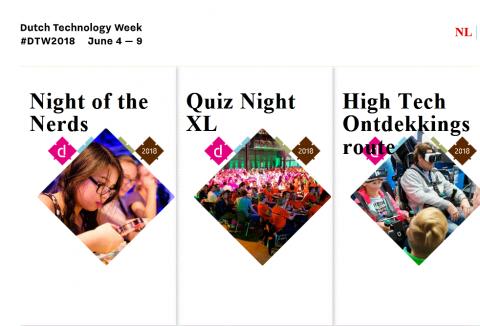
독일은 일찌감치 지역 주민들이 회사에서 퇴근한 뒤 과학자들과 함께 동네의 사회문제를 함께 의논하며 해결하는 ‘사회과학모임’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토론을 진행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어항같다는 의미에서 ‘피쉬볼 토론회’라고도 불린다.
네덜란드의 젊은 과학자들은 금요일 밤에 과학관을 ‘불금의 과학파티’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 자신의 인생이야기를 과학에 녹여 신나는 클럽 음악과 함께 공유한다.
유럽연합(EU)은 보다 적극적인 시민과학을 실행하고 있다. 젊은 과학자들이 직접 사회 속의 과학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청년의회’를 만든 것이다. 이들이 마련한 정책들은 실제 의회에 정책안으로 제출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5G 통신 등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첨단기술 또한 우리 실생활과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다.
기술변화는 산업에도 거대한 변화를 몰고온다. 이러한 변화는 직업에서도 관측된다. 이미 미국 및 유럽국가에서는 과학커뮤니케이터, 과학저널리스트, 과학관 코디네이터 등이 새롭게 각광받는 고소득 직업으로 떠올랐다.
장병주 과장은 “이번 정책을 통해 국민들이 과학을 일상에서 재미있게 누릴 수 있도록 대중화, 지역화, 특성화, 연령층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과학문화산업의 역량을 키우겠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새로운 미래 직업군을 양성하는 데에도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은영 객원기자
- teashotcool@gmail.com
- 저작권자 2018-12-03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