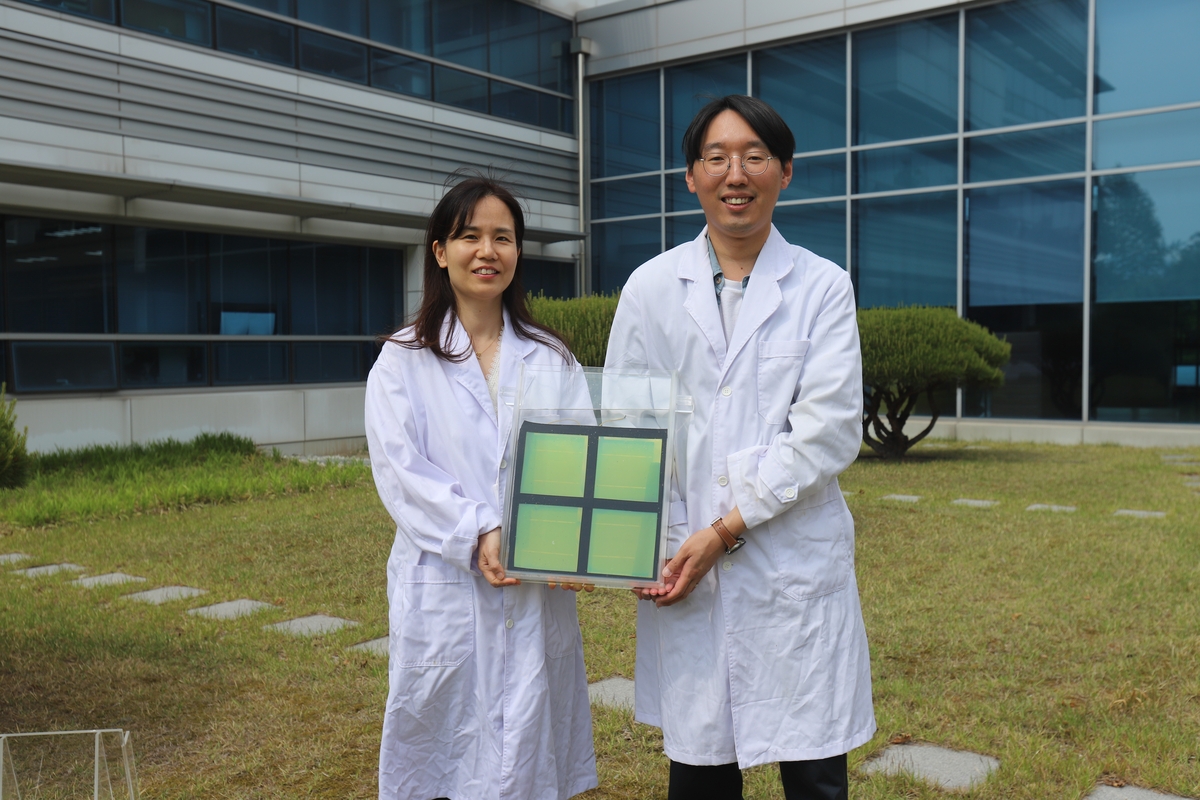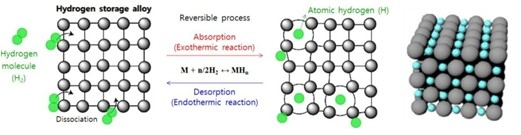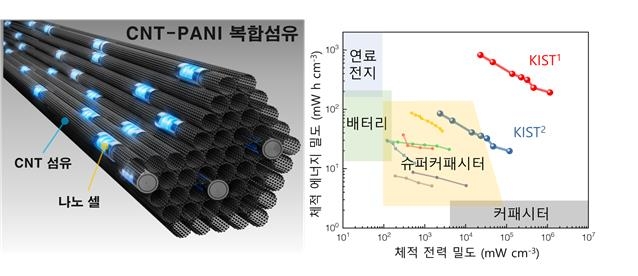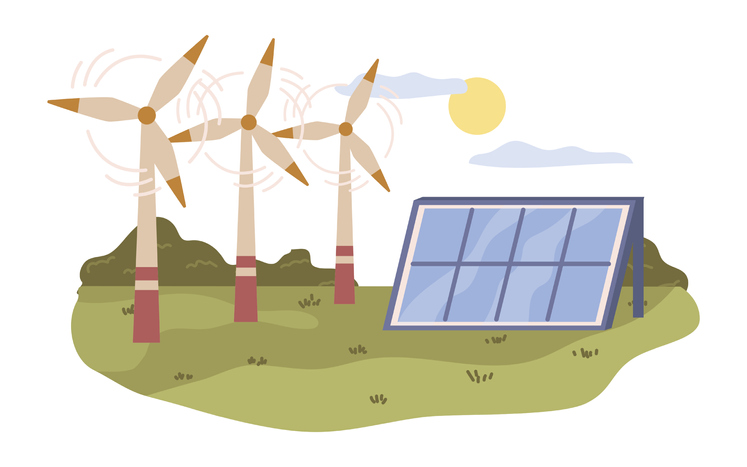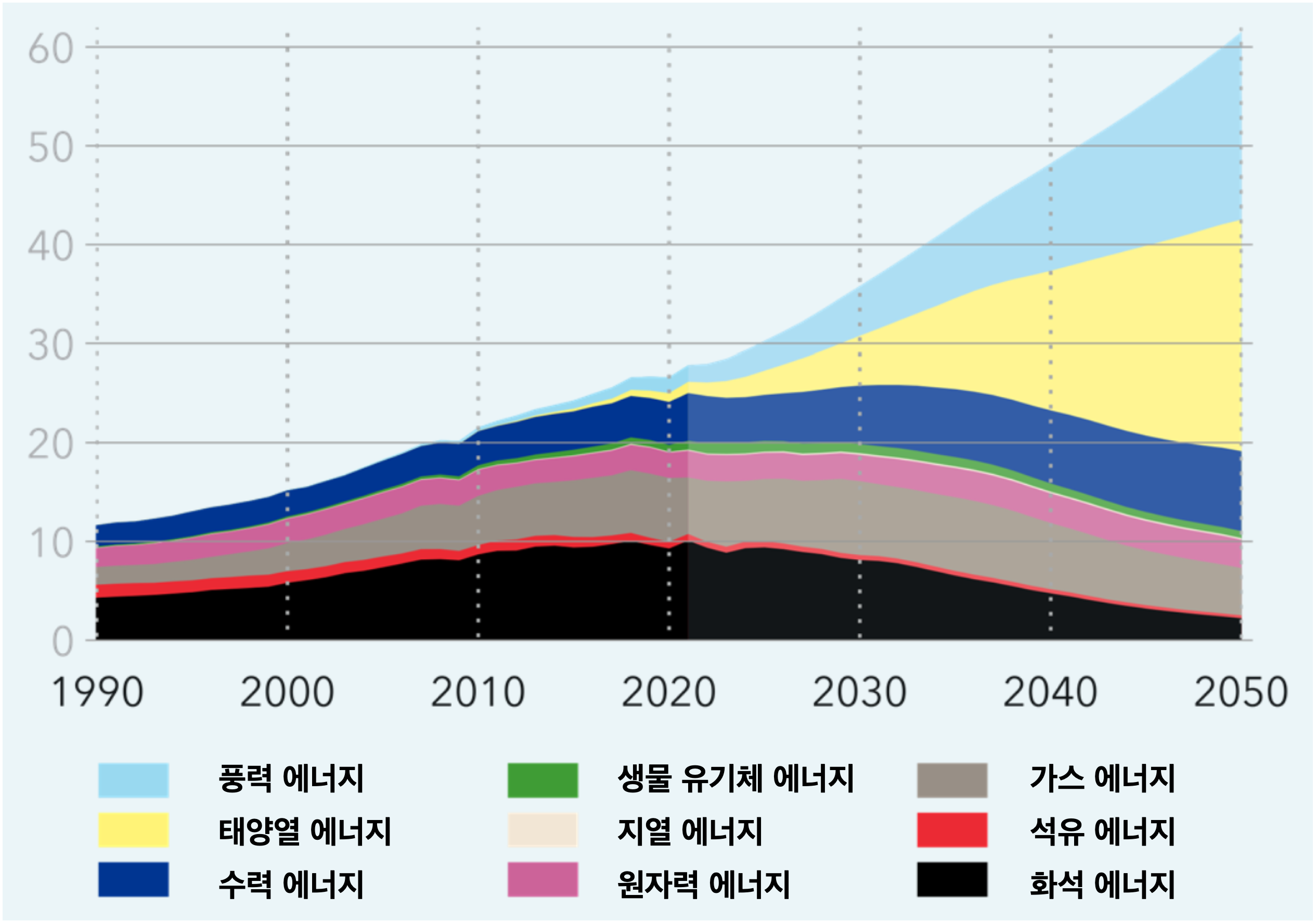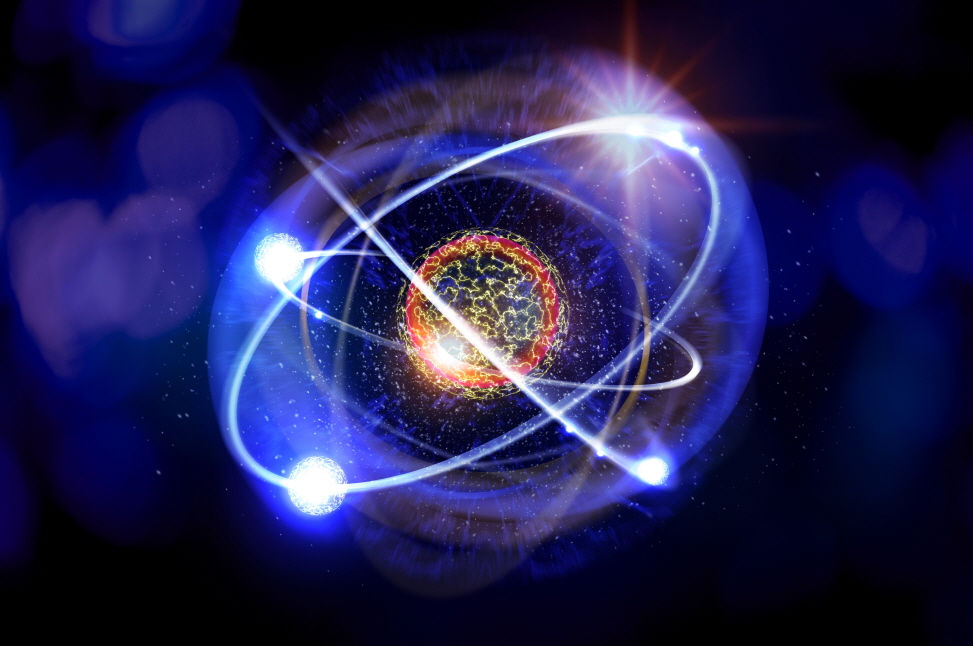건물에서 사용하는 각종 에너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이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1년 발생한 9.15 정전 사태를 계기로 갑작스런 정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들은 각 사옥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앞당기고 있고, 올 겨울 한파로 인한 정전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효율성을 주목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에너지관리공단도 ‘2012년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시범 보급사업’을 실시하는 등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저변 확대에 나섰다.
SK텔레콤의 경우,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벰스(Cloud BEMS)’를 개발해 사옥 3개 동에 시범 운영한 결과, 평균 5~15%의 에너지를 절감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소 등 부대효과가 발생해 건물 관리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미국의 파이크 리서치(Pike Research)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시장이 매년 14%씩 성장해 2020년에는 규모가 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 소비의 주범은 ‘조명’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중 가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조명이다. 조명에 소비하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비상계단, 화장실 등 사람의 왕래가 드문 공간에 온·오프를 조절하는 센서를 설치한 것이 가장 상용화된 방법이다. 실내·외 빛의 밝기를 확인해 조명과 블라인드를 바꿔 쾌적한 실내 환경을 구현하기도 한다.
또한 온도를 측정해 냉·난방 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다양한 에너지 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스마트폰만 몇 번 두드리면 간단히 조작할 수 있도록 원격 통신환경이 구축됐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적외선 원격 제어가 가능하고 전화와 IP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등 게이트웨이가 다양해졌다.
이처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이 잘 구축된 건물은 국토해양부과 환경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건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를 실시하는 등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과 시설 개선에 적극적이다. 지난 9월에는 에너지를 절감한 기록이 높은 대형건물 19곳을 선정해 총 1억4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20여년 전부터 친환경 건물에 관한 법규를 강화하고 자연친화적 빌딩·건축물에는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 Design)라는 인증을 부여했다. 국내 건물로는 코엑스, 강남파이낸스센터, 인천 송도 컨벤시아 등 28개가 LEED 인증을 받았다. 유사한 인증제도로는 영국의 BREEAM, 프랑스 HQE, 일본 CASBEE가 있다.
건물간 에너지 정보 공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빌딩자동화시스템(BAS) 등이 갖춰진 건물을 통상 인텔리전트빌딩(Intelligent Building) 혹은 스마트빌딩(Smart Building)이라고 일컫는다. 건물의 자동제어, 근거리 통신망 구현 등을 갖추고 최첨단 시설로 관리·운영하는 빌딩이라는 뜻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빌딩들에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추세다. 외부 침입 및 화재, 지진 등의 감시를 강화한 것. 누수, 연기, 가스 등에 대한 경보 장치들을 통합해 관제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한다.
중앙 감시시스템은 해당 건물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건물을 동시에 제어하는 수준으로 진보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빌딩 에너지 통합 관리 EMM 플랫폼 기술’이 눈여겨볼 만하다.
원격자의 건물 에너지 관제센터에서 다수 개의 건물로부터 다양한 설비 및 환경센서 정보를 통합 수집 관리해, 에너지 사용정보를 분석하고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는 기술이다.
여기서 핵심은 각 건물이 데이터를 전송할 때 하나의 공통 언어로 통신해야 한다는 점이다. 표준규격 없이 건물마다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면 상호 연동이 안 되고, 국내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기도 어렵기 때문. 서익환 KNX한국협회장 “인체를 예로 들면 차가운 물에 손을 넣었는데 뜨겁다고 인식해버리면 문제인 것처럼, 데이터 호환이 필수면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 회장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탑재한 스마트빌딩이 생겨남으로써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정전대란 위험으로 인해 국민의 정서가 불안해지는 일이 머지않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1년 발생한 9.15 정전 사태를 계기로 갑작스런 정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들은 각 사옥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앞당기고 있고, 올 겨울 한파로 인한 정전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효율성을 주목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에너지관리공단도 ‘2012년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시범 보급사업’을 실시하는 등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저변 확대에 나섰다.
SK텔레콤의 경우,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벰스(Cloud BEMS)’를 개발해 사옥 3개 동에 시범 운영한 결과, 평균 5~15%의 에너지를 절감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소 등 부대효과가 발생해 건물 관리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미국의 파이크 리서치(Pike Research)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시장이 매년 14%씩 성장해 2020년에는 규모가 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 소비의 주범은 ‘조명’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중 가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조명이다. 조명에 소비하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비상계단, 화장실 등 사람의 왕래가 드문 공간에 온·오프를 조절하는 센서를 설치한 것이 가장 상용화된 방법이다. 실내·외 빛의 밝기를 확인해 조명과 블라인드를 바꿔 쾌적한 실내 환경을 구현하기도 한다.
또한 온도를 측정해 냉·난방 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다양한 에너지 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스마트폰만 몇 번 두드리면 간단히 조작할 수 있도록 원격 통신환경이 구축됐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적외선 원격 제어가 가능하고 전화와 IP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등 게이트웨이가 다양해졌다.
이처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이 잘 구축된 건물은 국토해양부과 환경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건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를 실시하는 등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과 시설 개선에 적극적이다. 지난 9월에는 에너지를 절감한 기록이 높은 대형건물 19곳을 선정해 총 1억4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20여년 전부터 친환경 건물에 관한 법규를 강화하고 자연친화적 빌딩·건축물에는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 Design)라는 인증을 부여했다. 국내 건물로는 코엑스, 강남파이낸스센터, 인천 송도 컨벤시아 등 28개가 LEED 인증을 받았다. 유사한 인증제도로는 영국의 BREEAM, 프랑스 HQE, 일본 CASBEE가 있다.
건물간 에너지 정보 공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빌딩자동화시스템(BAS) 등이 갖춰진 건물을 통상 인텔리전트빌딩(Intelligent Building) 혹은 스마트빌딩(Smart Building)이라고 일컫는다. 건물의 자동제어, 근거리 통신망 구현 등을 갖추고 최첨단 시설로 관리·운영하는 빌딩이라는 뜻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빌딩들에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추세다. 외부 침입 및 화재, 지진 등의 감시를 강화한 것. 누수, 연기, 가스 등에 대한 경보 장치들을 통합해 관제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한다.
중앙 감시시스템은 해당 건물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건물을 동시에 제어하는 수준으로 진보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빌딩 에너지 통합 관리 EMM 플랫폼 기술’이 눈여겨볼 만하다.
원격자의 건물 에너지 관제센터에서 다수 개의 건물로부터 다양한 설비 및 환경센서 정보를 통합 수집 관리해, 에너지 사용정보를 분석하고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는 기술이다.
여기서 핵심은 각 건물이 데이터를 전송할 때 하나의 공통 언어로 통신해야 한다는 점이다. 표준규격 없이 건물마다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면 상호 연동이 안 되고, 국내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기도 어렵기 때문. 서익환 KNX한국협회장 “인체를 예로 들면 차가운 물에 손을 넣었는데 뜨겁다고 인식해버리면 문제인 것처럼, 데이터 호환이 필수면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 회장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탑재한 스마트빌딩이 생겨남으로써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정전대란 위험으로 인해 국민의 정서가 불안해지는 일이 머지않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권시연 객원기자
- navirara@naver.com
- 저작권자 2012-11-29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