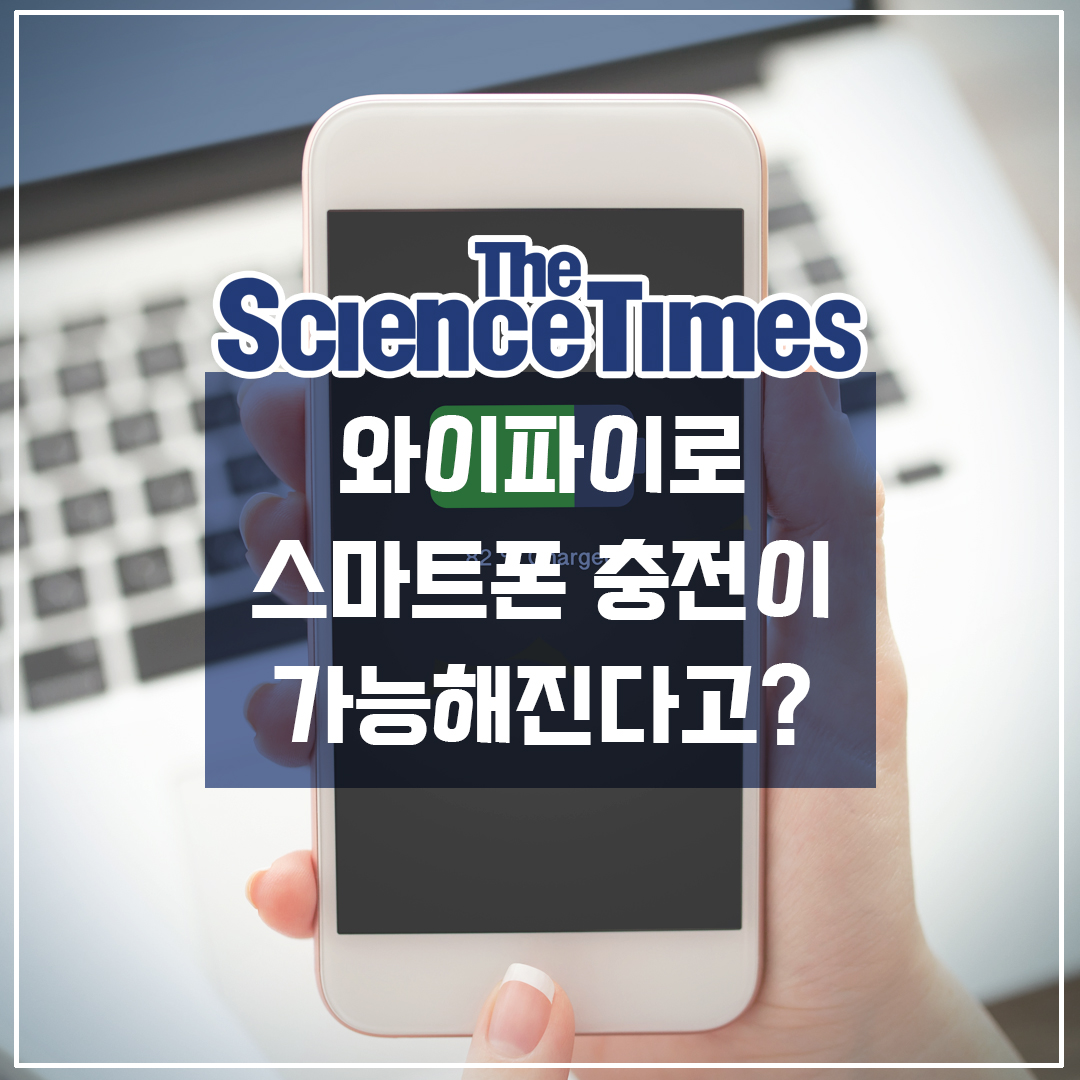‘주머니 속의 컴퓨터’라 불리며 전화, 인터넷, 게임, 일정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스마트폰. 그러나 최근 애플과 구글을 비롯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저장하고 전송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프랑스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폴 쿠르비(Paul Courbis)가 애플의 아이폰(iPhone) 내에서 수상한 데이터 파일을 발견했다. 이 파일에는 시간, 위도, 경도 등 사용자가 아이폰을 언제 어디서 사용했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최근에는 영국의 공학도 피트 워든(Pete Warden)과 알러스데어 앨런(Alasdair Allan)이 아이폰 내의 ‘consolidated.db’ 파일에서 위치정보를 추출해내는 아이폰 트래커(iPhone Tracker) 프로그램을 공개해 충격을 더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거대회사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던 사용자들은 국내외에서 사생활 침해로 소송을 걸고 있다. 스마트폰이 위치정보를 몰래 빼내간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원치 않는데도 쫓아다니는 스토킹과 다름없다. 애플과 구글 등은 답변을 내놓았지만 몇몇 의문점은 풀리지 않고 있다.
외신들은 이 문제를 올해 IT분야의 최대 이슈로 보고 관련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CNN이 보도한 ‘애플과 구글이 스토킹을 하는 이유(Why Apply and Google need to stalk you)’, 르피가로(LeFigaro)의 ‘아이폰이 스토킹을 하는 방식과 이유(Comment et pourquoi votre iPhone vous piste)’, 뉴욕타임즈(NYT)의 ‘애플 기기에 사용자 위치정보가 저장된다(3G Apple iOS Devices Are Storing Users’ Location Data)’ 등의 기사를 종합해 문제점을 짚어본다.
GPS 빨리 잡으려 위치정보 기록한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위치정보를 저장한다는 것이 사실인가’ 하는 질문이다. 대답은 당연히 ‘그렇다’이다. 문제는 애플의 아이폰, 구글의 안드로이드폰, 리서치인모션(RIM)의 블랙베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폰, 노키아의 심비안폰 등 거의 모든 스마트폰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위치정보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여기가 어디인지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다. 스마트폰에는 위성을 이용해 위치를 확인하는 GPS 기능을 내장하고 있다. 하늘에 떠 있는 여러 개의 위성을 잡아내 그 거리와 각도를 이용해 현재의 위치를 자동으로 계산해내는 방식이다. 기기를 처음 켜면 몇분 정도가 지나야 제대로 작동한다.
문제는 사용자들이 이 시간을 못 참는다는 점이다. 언제든 현재 위치를 물어보면 스마트폰이 즉각 대답해주기를 원한다. 작동시간을 단축시키려면 주변의 무선기지국이나 무선공유기의 위치를 수집해 저장했다가 삼각측량법의 기준점으로 써먹으면 된다. 이것이 위치정보를 저장하는 핵심적인 이유다. 포레스터 리서치(Forrester Research)의 프로그래머 찰스 골빈(Charles Golvin)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주변에 공유기가 8개고 기지국이 3군데니까 현재 위치는 여기쯤일 것이라 추측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위치기록 파일을 암호화하지도 않고 전송해예전에는 무선랜을 제공하는 통신회사와 제휴해서 위치정보를 알아냈다. 애플이나 노키아는 스카이후크(Skyhook)라는 통신회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무선공유기의 위치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비용 절감을 위해 사용자의 스마트폰에서 위치정보를 직접 전송받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이렇듯 편리함을 위해 시작된 위치정보 활용이 이제는 사생활 침해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 개인정보를 너무 오래 저장해두거나 본사의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해 공유하기 때문이다. 아이폰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위치정보를 파일로 저장한다. 구글은 최근 접속한 무선기지국 50개와 무선랜 공유기 200개의 위치정보를 저장한다고 알려져 있다.
위치정보가 기록된 파일은 본사의 서버에 저장돼 전체 지도를 그리는 데 쓰인다. 거의 모든 스마트폰 회사들이 사용자들의 위치정보 파일을 수집하고 있다. 익명으로 보관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는 없다지만 사용자가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저장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은 문제다. 안드로이드폰, 윈도폰, 심비안폰 등은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로 들어가 위치정보 서비스를 끄면 파일전송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아이폰은 서비스를 거부해도 위치기록이 계속 전송된다. 스티브 잡스는 이에 대해 “프로그램 상의 버그”라고 변명했지만 애플사가 얼마전 위치정보 추적시스템으로 특허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파일을 암호화하지도 않아서 누구나 쉽게 정보를 빼갈 수 있게 한 점도 지적받고 있다. 게다가 위치정보 수집은 지난해 6월 아이폰4에 맞춘 운영체제가 나왔을 때 이미 시작됐지만 사용자들은 어떠한 공지도 받은 바 없다. “다음번 업데이트 때 암호화 기술을 넣겠다”는 답변이 성의 없어 보이는 이유다.
개인정보 없다면 불법이라 하기 어려워
인터넷을 통한 무차별적 파일 공유와 해킹이 가능해지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별다른 메시지도 없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위치를 추적당하는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작년부터 이미 아이폰의 위치기록을 이용해 개인의 행적을 수사하는 방식이 쓰이고 있다. 게다가 최근 독일에서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체인 톰톰(TomTom)이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저장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Guardian)은 사설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는 사생활 침해가 당연한 것처럼 인식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명백한 불법이라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프랑스의 정보자유 국가위원회(Cnil) 소속 엔지니어 베르트랑 파예스(Pailhès)는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사용자의 위치를 기록한 파일이 애플사나 제3자에게 전송되지만 않는다면 불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만일 본사로 데이터가 전송된다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는 아닌지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프랑스, 독일, 한국 등 각국의 정부들이 애플과 구글 등에 질의서를 보내놓은 상태이지만 아직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했다. 애플은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한 바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고 구글은 “더 나은 모바일 환경 구축을 위해 위치정보를 수집한다고 공지해왔다”고 짤막하게 답했을 뿐이다.
- 임동욱 기자
- im.dong.uk@gmail.com
- 저작권자 2011-05-03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