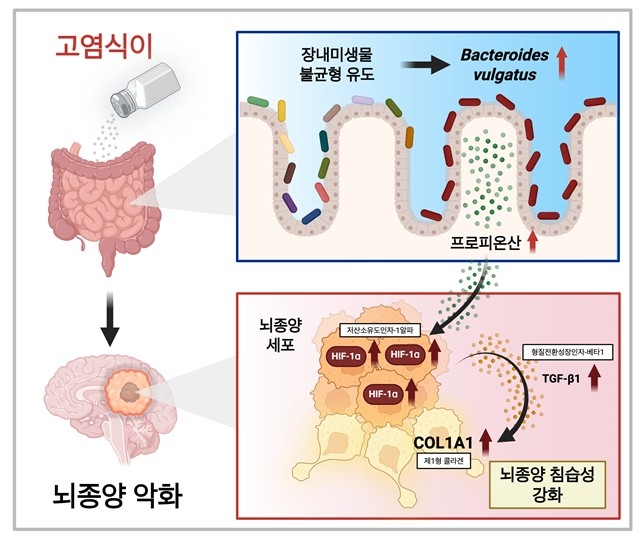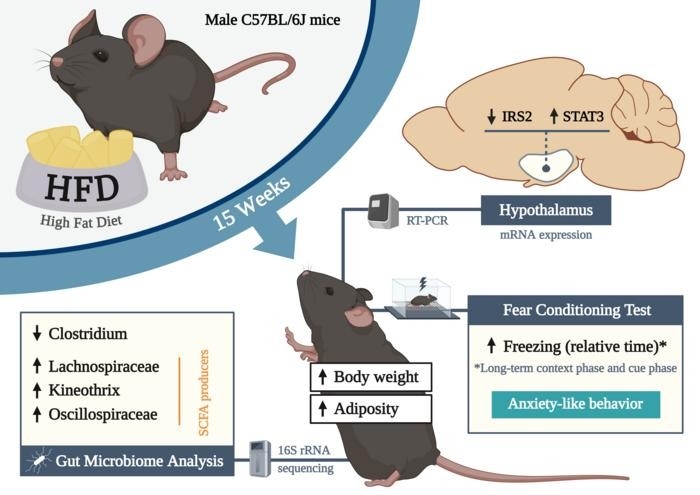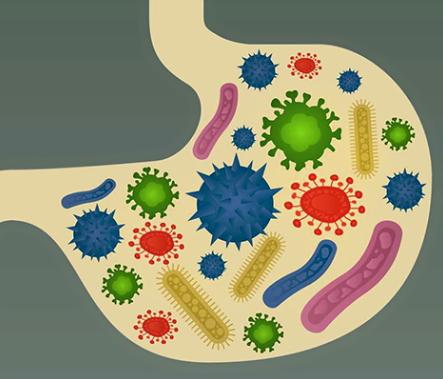미국의 보존생물학자인 ‘소어 핸슨(Thor Hanson)’ 박사의 저서 ‘벌의 사생활’을 보면 벌이 원래는 육식 곤충이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 증거로 박사는 각종 곤충들을 먹이로 삼는 말벌의 습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랬던 벌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백악기에 접어들면서 다른 곤충을 잡아먹는 습성을 포기하고 꽃가루를 수집하고 운반하며 채식을 하기 시작한다. 그야말로 현재에도 볼 수 있는 진정한 벌로 진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말벌만이 육식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도 말벌처럼 곤충을 먹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콘도르(condor)같이 짐승의 사체만을 찾아다니는 독특한 습성의 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바로 콘도르 벌이라는 별명을 가진 ‘벌처벌(vulture bee)’이다.
벌처벌과 콘도르의 장내 미생물 형태 유사
독수리과에 속하는 콘도르는 커다란 날개를 가진 맹금류다. 외모만 보면 독수리과 중에서도 가장 살벌하게 생겼지만, 사실 콘도르는 직접 사냥할 능력이 없어서 죽은 동물의 사체를 찾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독수리과에 속하는 맹금류라고 하더라도 영어에서는 단어가 다르다. 살아있는 동물을 사냥하는 수리들을 이글(eagle)이라고 부르지만, 죽은 사체만을 먹는 수리들을 통틀어서 벌처(vulture)라고 칭한다.
벌처로 불리는 수리들은 소화 기능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들은 주로 사자나 하이에나가 먹고 남긴 동물 사체의 썩은 고기를 먹고 살아가는데, 알려졌다시피 썩은 고기에는 식중독이나 콜레라 같은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균들이 우글대는 것으로 유명하다.

다른 동물의 경우 이러한 유해균이 체내에 들어가면 병이 들거나 죽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벌처 수리들은 완전히 썩은 고기를 먹더라도 끄떡없을 정도로 튼튼한 위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미국과 덴마크의 공동연구진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이들 연구진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한 벌처 수리들의 소화 기관은 섭취한 유해균 대부분을 죽일 수 있고, 유해균에 대한 내성과 증식억제 능력도 상당히 발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수리들과 같은 이름을 가진 벌처 벌 역시 소화 기관의 기능이나 그곳에서 생육하는 미생물들의 종류가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연구진은 벌처라는 이름을 가진 수리들과 벌들의 장내 조직을 연구한 끝에 최근 비슷한 미생물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다른 벌들과의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존재
벌처벌은 남미 열대지역에 서식하는 부봉침벌(stingless bee)의 한 종이다. 부봉침벌이란 침을 쏘지 않는 벌이라는 의미로서, 침이 없는 대신에 고기를 물어뜯을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미 리버사이드캘리포니아대(UCR)의 연구진은 이처럼 독특한 습성을 가진 벌처벌에 흥미를 느껴 이들의 장내 구조와 장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연구진은 벌처벌이 대거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미의 숲 속을 탐사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닭고기를 나무에 올려놓은 다음, 벌처벌을 유인하여 채집했다.
그 결과 꽃가루를 먹고 사는 다른 벌들과는 상당히 다른 종류의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대표적으로는 발효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lactobacillus)’와 육류를 소화할 때 많이 활동하는 ‘카르노박테리움(carnobacterium)’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미생물은 썩은 고기를 주로 먹는 맹금류인 콘도르의 장내에서 주로 발견되는 박테리아들인데, 연구진은 이들 박테리아가 썩은 고기에 들어있는 유해균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남미 현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UCR의 ‘제시카 마카로(Jessica Maccaro)’ 연구원은 “짐승의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 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번 조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라고 밝히며 “사람이나 대부분의 동물이 이런 썩은 고기를 섭취한다면 유해균으로 인해 병을 앓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 것은 다른 벌들과 완전히 차별화된 점이지만, 공통점도 있다. 바로 꿀을 모으는 능력이다. 단순히 꿀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식용이 가능한 꿀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벌처벌이 다른 벌들과 비교하여 공통된 점과 상반된 점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마카로 연구원은 “꿀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벌처벌은 자신의 습성을 바꾸는 것보다 육식을 하는 습성을 남기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에 진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말했다.
- 김준래 객원기자
- stimes@naver.com
- 저작권자 2021-12-06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