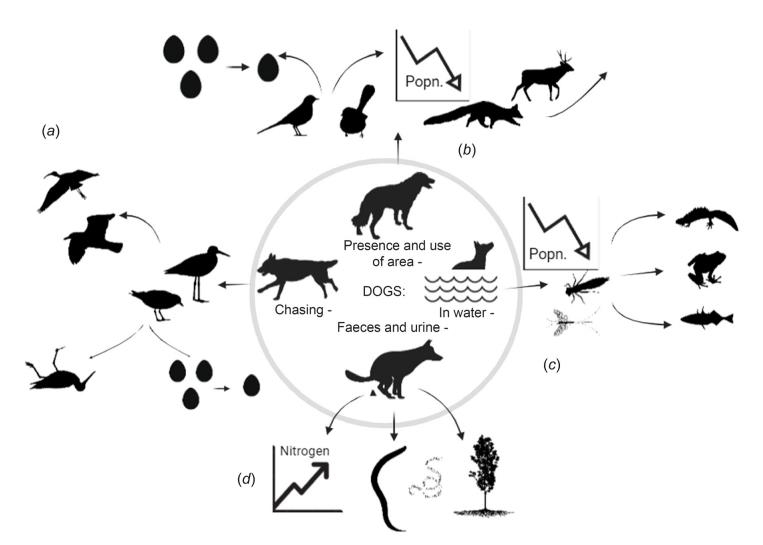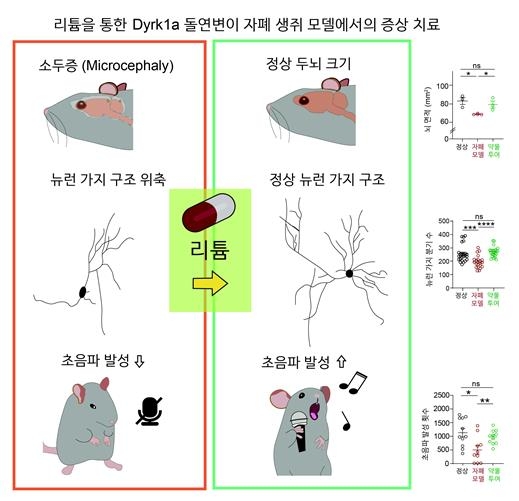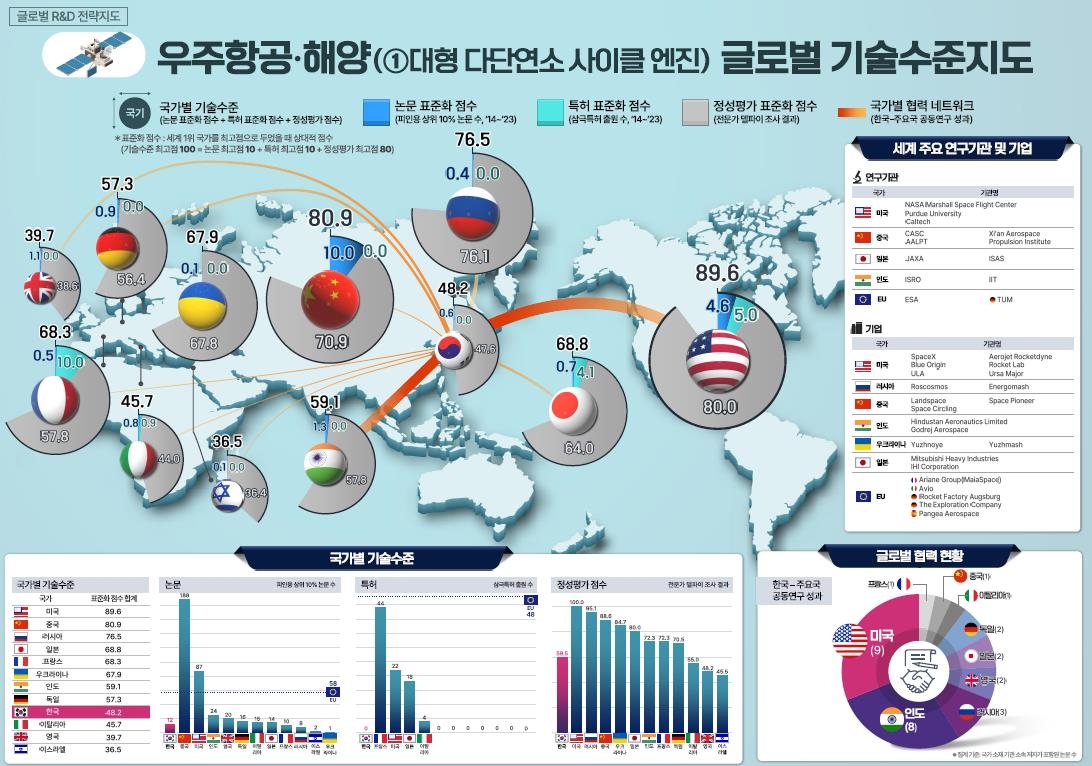폴스텐 연구부터 최신 발견까지: 자폐증 쌍둥이 연구의 진화
자폐 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ASD)는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능력, 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신경 발달 장애이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ASD 유병률과 함께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과학적 연구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최전선에 있는 것이 바로 쌍둥이 연구다.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의 비교는 ASD의 유전적 기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기사를 통해 ASD의 유전적 요인을 밝히기 위한 쌍둥이 연구들과 그 의미, 그리고 이러한 발견이 진단과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977년 영국의 아동 정신과 의사 마이클 러터(Michael Rutter)와 수잔 폴스텐(Susan Folstein)에 의해 자폐증의 유전적 기반을 탐구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유아기 자폐증: 21쌍의 쌍둥이에 대한 유전 연구(Infantile autism: a genetic study of 21 twin pairs)"란 제목의 이 연구는 자폐증이 있는 쌍둥이 21쌍(일란성 11쌍, 이란성 10쌍)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일란성 쌍둥이의 일치율(한 쌍둥이가 자폐증이 있을 때 다른 쌍둥이도 자폐증을 가질 확률)은 36%로, 이란성 쌍둥이의 일치율 0%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자폐증이 상당한 유전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초기 연구 자료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더 큰 규모로 쌍둥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2011년, 요아힘 할마이어(Joachim Hallmayer)를 주 저자로 하고 다니엘 게슈윈드(Daniel Geschwind)가 공동 저자로 참여한 “자폐증을 가진 쌍둥이들 간 유전적 요인과 공유된 환경적 요인(Genetic Heritability and Shared Environmental Factors Among Twin Pairs With Autism)"이라는 연구는 무려 192쌍의 쌍둥이(54쌍의 일란성 쌍둥이, 138쌍의 이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나타난 일란성 쌍둥이의 ASD 일치율은 70%로, 이란성 쌍둥이의 일치율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ASD의 유전율(heritability)이 약 80%에 달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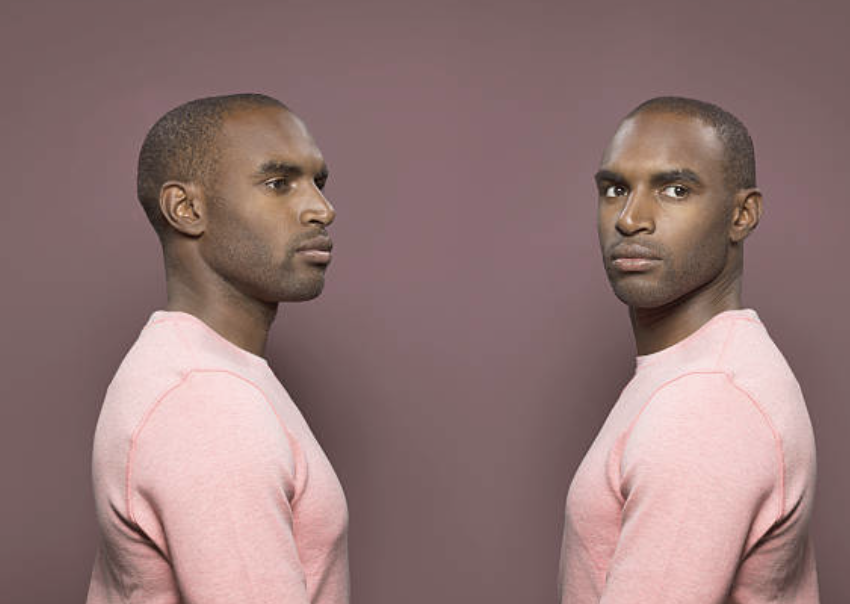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 쌍둥이 연구로 2017년 스벤 산딘(Sven Sandin)와 폴 리크텐슈타인(Paul Lichtenstein)이 발표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유전율(The Heritability of Autism Spectrum Disorder)"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스웨덴 쌍둥이 레지스트리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1982년부터 2008년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분석 결과 ASD의 유전율이 약 83%라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2020년, 프란체스카 하페(Francesca Happé)와 우타 프리스(Uta Frith)가 발표한 "연간 연구 리뷰: 미래를 보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다 – 자폐증 개념의 변화와 미래 연구에의 함의(Annual Research Review: Looking back to look forward – changes in the concept of autism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에서는 자폐증 개념의 변화와 미래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쌍둥이 연구를 통한 유전적 기여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분자 유전학과의 융합: 유전적 복잡성 이해하기
쌍둥이 연구를 통해 ASD의 강한 유전적 기반이 확립되었지만 그 유전적 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2020년, 카일 새터스트롬(F. Kyle Satterstrom)과 마크 데일리(Mark Daly)가 이끄는 연구팀이 발표한 "자폐증의 신경생물학에서 발달적 및 기능적 변화를 포함하는 대규모 엑솜 시퀀싱 연구(Large-Scale Exome Sequencing Study Implicates Both Developmental and Functional Changes in the Neurobiology of Autism)"에서는 ASD와 관련된 102개의 유전자를 확인했다. 이 연구는 기존 쌍둥이 연구 결과와 분자 유전학을 결합하여 ASD의 유전적 기반에 대한 이해를 크게 발전시켰다.

최근 연구에서는 ASD가 다양한 유전적 경로를 통해 발생할 수 있다는 '다중 요인 모델'이 제안되고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서로 다른 유전적 변이들이 유사한 임상적 표현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ASD의 유전적 이질성을 설명한다. 또 유전적 이질성으로 인해 자폐증 치료에는 개인에게 맞춘 접근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임상 적용과 미래 전망
쌍둥이 연구는 ASD의 유전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러한 지식은 진단, 조기 개입, 맞춤형 치료 접근법 개발 등 여러 방면에서 임상 실무를 변화시키고 있다.
쌍둥이 연구의 발견은 ASD에 대한 임상 접근과 사회적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ASD가 주로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인식은 과거에 부모, 특히 어머니에게 죄책감을 부과했던 오래된 이론들(예: '냉장고 어머니' 이론)을 반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는 ASD가 있는 가족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안도감을 제공했다.

앞으로 ASD에 대한 연구에서는 유전적 위험이 높은 영아(예: ASD가 있는 형제자매를 가진 영아)에 대한 조기 개입과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조기 진단과 중재가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증거가 축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쌍둥이 연구를 통해 ASD의 유전적 기반에 대한 이해가 크게 진전된 덕분이다.
미래 연구 방향으로는 더 큰 규모의 쌍둥이 코호트 연구와 더 정교한 분자 유전학 방법을 결합하는 접근법이 유망하다. 2016년부터 시작된 "자폐증 연구를 위한 사이먼스 재단 역량 강화(Simons Foundation Powering Autism Research, SPARK)"라는 프로젝트는 자폐증 개인과 그 가족(쌍둥이 포함)의 유전 정보를 수집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ASD의 유전적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민재 리포터
- minjae.gaspar.kim@gmail.com
- 저작권자 2025-05-01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