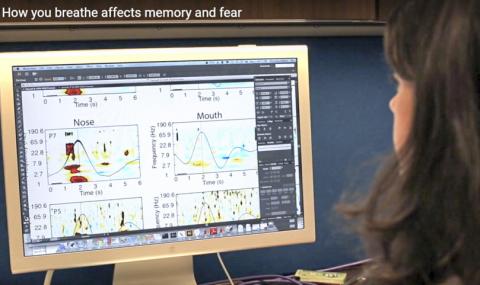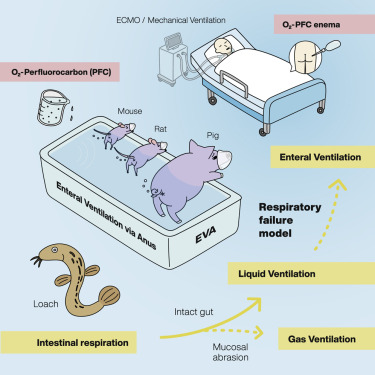호흡의 리듬이 뇌에서 전기적 신호를 일으켜 정서적 판단과 기억 회상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가 나왔다. 호흡에 따른 이 같은 효과는 숨을 내쉬는가 들이쉬는가, 또 코로 숨을 쉬는가 입으로 숨을 쉬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노스웨스턴의대 연구팀이 처음 수행한 이번 연구에 따르면 각 개인들은 숨을 내쉴 때에 비해 들이쉴 때 상대방이 공포스런 얼굴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더 빨리 식별할 수 있고, 날숨 때보다 들숨 때 마주하는 대상을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입으로 숨을 쉬면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뇌에 심은 전극신호로 호흡과 뇌활동 관계 연구
논문 제1저자인 크리스티나 젤라노(Christina Zelano) 신경과 조교수는 “이번 연구의 주된 발견은 숨을 내쉴 때에 비해 들이쉴 때 소뇌의 편도체와 대뇌 측두엽 해마에서의 뇌 활동에 극적인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라며, “숨을 들이쉴 때 후각 피질과 편도체, 해마 등 모든 변연계(대뇌에서 감정과 욕구 등을 관장하는 신경계)에 걸쳐 뇌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신경과학 저널’(Journal of Neuroscience) 지난 6일자에 발표됐다.
논문의 시니어 저자인 신경과 제이 고트프리드(Jay Gottfried)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은 뇌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간질환자 7명을 조사하다 이 같은 차이점을 발견했다. 뇌 수술 일주일 전 외과팀은 환자들의 발작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이들의 뇌에 전극을 삽입했다.
연구팀은 이를 이용해 환자들의 뇌에서 직접 전기생리학적 데이터를 얻어냈다. 데이터에 기록된 전기신호는 환자의 호흡에 따라 뇌 활동에 등락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뇌 활동은 감정과 기억, 냄새 정보를 처리하는 부위에서 나타났다.
입으로 숨 쉬면 기억 효과 등 사라져
연구팀은 이 사실을 보고 전형적으로 이들 뇌 부위와 관련된 인지기능 특히 공포감 처리와 기억이 호흡의 영향을 받는지 의문을 갖게 됐다.
소뇌의 편도체는 감정 특히 공포와 관련된 감정 처리에 매우 밀접하게 관계돼 있다. 연구팀은 조사대상자 60명을 골라 실험 환경 하에서 주어지는 감정 표현에 대해 신속하게 의사 표시를 하도록 하고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의 호흡을 기록했다.
공포나 놀람을 표현하는 그림들을 보여주면 연구참여자들은 최대한 빨리 그림의 얼굴들이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지를 답하도록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숨을 내쉴 때보다 들이쉴 때 접한 공포스런 얼굴들을 보고 더 빨리 공포감을 인지했다. 그러나 놀람을 표현하는 얼굴들에 대해서는 그런 차이가 없었다. 이 같은 효과는 연구참여자들이 입으로 숨을 쉴 때는 사라져 버렸다. 따라서 이 효과는 코로 숨쉬는 동안의 공포 자극에만 특화된 것이었다.
숨 들이쉴 때 뇌 진동 동기화돼
젤라노 교수는 이번 연구가 위험에 처했을 때 빠른 호흡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극심한 공포 상태에 있다면 호흡 리듬이 빨라지게 된다”며, “그 결과 평온할 때보다 더 많이 숨을 들이쉬게 되고, 우리 몸의 공포에 대한 반응은 빠른 호흡과 함께 뇌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주변환경의 위험한 자극에 더욱 빨리 반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명상 혹은 집중 호흡의 기본 메커니즘에 대한 통찰을 얻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젤라노 교수는 “숨을 들이쉴 때 뇌의 변연계 네트워크를 통해 뇌 진동이 동기화되는 느낌에 이른다”고 말했다.
- 김병희 객원기자
- kna@live.co.kr
- 저작권자 2016-12-12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