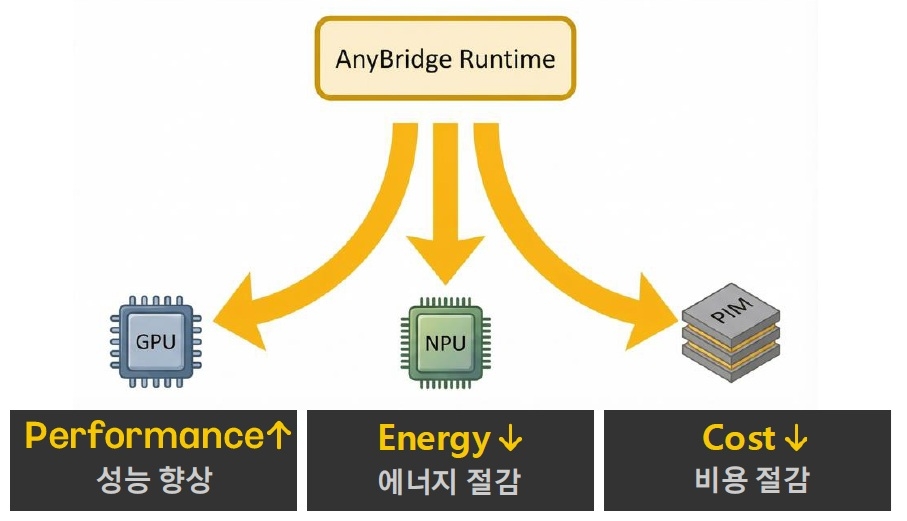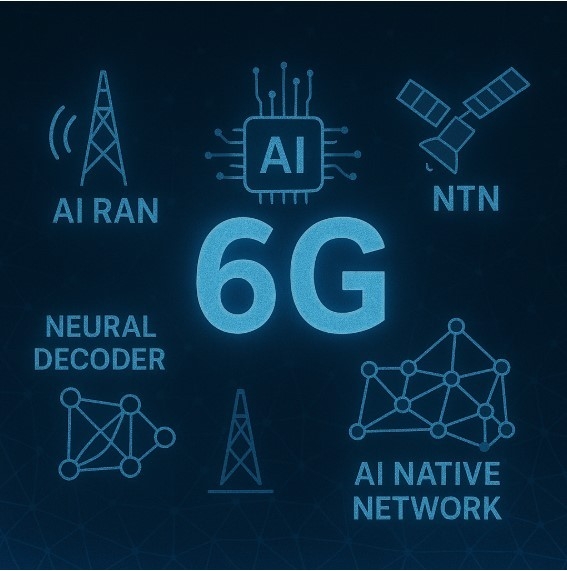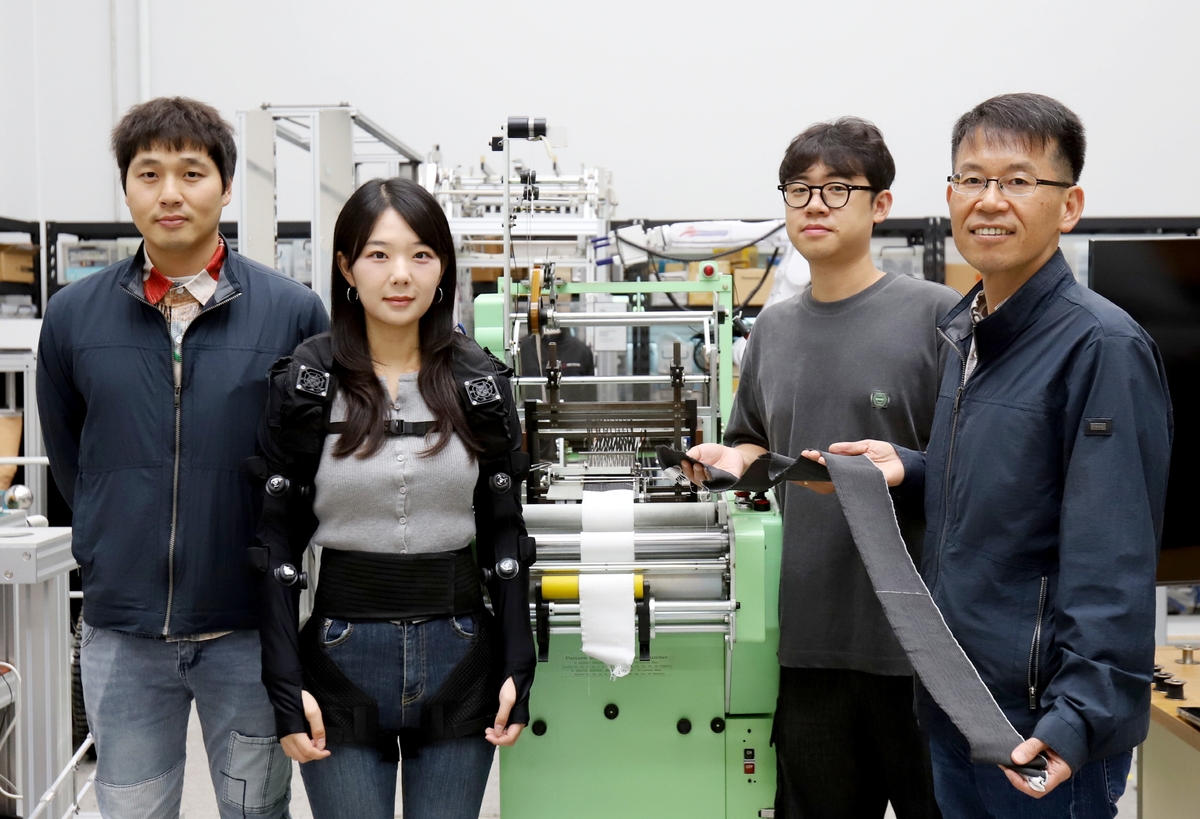그동안 과학자들은 로봇에 적용할 수 있는 ‘미니 뇌(mini-brains)’를 개발해왔다.
17일 ‘사이언스 데일리’에 따르면 싱가포르 난양이공대(NTU)에서 고통을 감지할 수 있으며, 부상을 입었을 때 스스로 처치가 가능한 '미니 뇌'와 유사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이다.
이 인공지능은 외부로부터의 감지 기능을 지니고 있는데 로봇에 주입해 ‘미니 뇌’와 같은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사람처럼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반응하면서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은 채 평소 지니고 있는 소재를 사용해 손상된 부위를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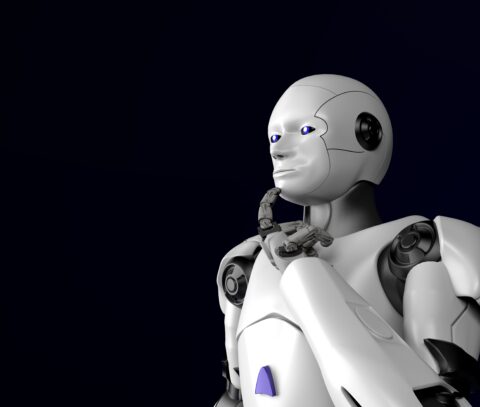
정보처리 최소화 ‘미니 뇌’와 같은 역할
NTU 연구팀은 이 인공지능이 사람의 뇌세포처럼 다수의 미세한 센서 노드(sensor nodes)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또 로봇 피부를 통해 어떤 힘이 가해졌는지 세분화해 인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충격이 가해졌을 때 다른 로봇들과 비교해 5~10배 더 빠르게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
또 신축성이 뛰어난 이온젤(ion gel) 등의 소재를 항상 지니고 있어 피부와 또 다른 기계적인 기능에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스스로 처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논문 작성에 참여한 NTU의 애린담 바수(Arindam Basu) 교수는 ‘사이언스 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거친 환경에서 사람처럼 일할 수 있는 로봇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수 교수는 “사람처럼 감촉이 가능한 로봇을 개발해왔는데, 이번 연구 결과로 외부 충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스스로 치료가 가능한 감지 기능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컴퓨팅 칩인 뉴로모픽(Neuromorphic) 전문가인 바수 교수는 로봇에 적용할 수 있는 ‘미니 뇌’를 개발하기 위해 전자 부품의 수를 줄이면서 필요한 배선장치와 회로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연구 논문은 최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됐다. 제목은 ‘Self healable neuromorphic memtransistor elements for decentralized sensory signal processing in robotics’이다.
연구팀은 논문을 통해 그동안 과학자들이 로봇 피부의 감각 정보 처리 과정(Sensory information processing)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람처럼 피부감각 정보를 전달해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앙처리장치(CPU)서부터 주변부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정보처리 장치가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게 되고 개발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사람과 닮은 로봇으로 진화할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 NTU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다.
사람의 뇌세포처럼 가능한 정보처리 장치를 최소화해 ‘미니 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연구팀은 이 과정에서 신경 구조와 유사한 센서와 회로, 텍타일(tactile) 장치를 적용해 다양한 유형의 충격을 세분화해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강한 충격이 일어났을 때 로봇 팔 등을 사용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연구에서 특히 관심을 기울인 것은 스스로 처치가 가능한 기능이다. 연구팀은 사람의 신경조직을 닮은 통증 수용기(nociceptors)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 개발한 멤트랜지스터 (memtransistor)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강한 충격으로 피부, 혹은 내부 기계장치가 손상됐을 때 지능형 반도체인 멤트랜지스터가 상황 판단을 하게 되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면서 평소 보유하고 있는 이온젤 소재 등을 활용해 손상된 부위를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로봇의 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제작된 멤트랜지스터가 로봇의 지능을 향상시키고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충격 정도를 감지해 판단하고, 손상된 부위에 대한 스스로의 처치가 가능하며, 또한 메모리 기능을 통해 폴트 톨러런스(ault tolerance)와 유연적응성(robustness)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폴트 톨러런스란 시스템 일부가 고장(fault)나더라도 그 부분을 스스로 교정하면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해나갈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논문 수석 저자인 로히트 아브라함 존(Rohit Abraham John) 교수는 향후 추가 실험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충격을 받은 로봇이 어떻게 대처해나갈 수 있는지 다양한 매뉴얼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존 교수는 “자기회복(self-healing) 기능과 관련된 노하우가 축적될 경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로봇이 스스로 치료하면서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사람과의 협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NTU의 이번 연구 결과는 기존 프로그램화된 로봇 기능에 사람처럼 유연한 움직임을 추가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연구를 통해 사람과 얼마나 닮은 로봇을 개발할 수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강봉 객원기자
- aacc409@hanmail.net
- 저작권자 2020-10-20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