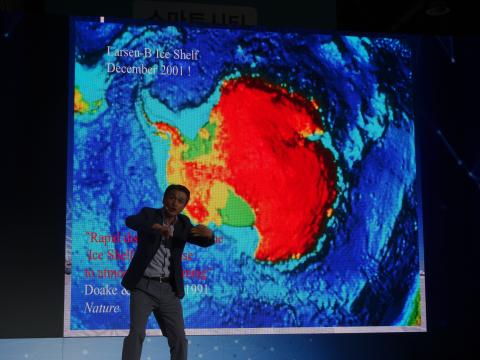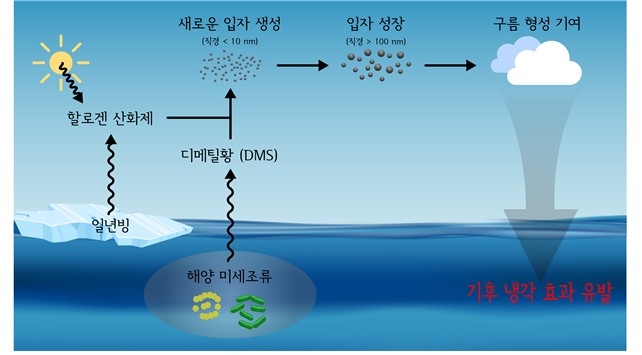지구에서 가장 최남단에 위치한 대륙, 남극.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이기도 하다.
서울에서 남극을 가려면 뉴욕으로 12시간, 칠레로 12시간, 칠레에서 4시간, 다시 공군 수송기로 12시간을 타고 날아가야 한다. 남극에서 서울의 거리는 무려 17,240km. 기착지 대기를 포함 총 5일이 걸리는 대장정을 해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다.
20여 년간 이 먼 거리의 남극을 오가며 생명을 걸고 극지탐사를 벌여온 윤호일 극지연구소 소장(세종기지 탐험대장)은 남극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인 동시에 생존의 위협이 있는 곳’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지난 9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과학창의대전’ 인스파이어 콘서트에서 남극탐험 속에서 생겼던 죽음이 오가는 절체절명의 순간들과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나갔던 이야기들을 펼쳐나갔다.
서울에서 17,240km 떨어진 곳, 남극에서의 20년
일반 사람들에게 남극은 여전히 생소한 ‘미지의 세계’이다. 이 미지의 세계를 알아보기 위해 설립한 것이 ‘남극세종기지’이다. 윤호일 소장은 1988년도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과학기지인 세종기지를 20여 년간 오가며 남극탐사에 인생을 바쳐왔다.
수십 년 동안 오간 남극기지이지만 매번 들어갈 때마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곳이 남극이다. 윤호일 소장은 탐험대장으로서 매번 수많은 대원들을 이끌어온 베테랑이지만 그 또한 매번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두려움에 떨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슬기롭게 이겨냈다. 윤호일 탐험대장은 남극탐사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위기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 상세히 공유했다.
그가 말하는 위기와 공포,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본질’을 파악하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었다. 위기가 주는 공포의 ‘밑바닥’을 확인하고 바닥을 직시해야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윤 대장은 시종일관 진지하면서 역동적인 자세로 극한 상황에서의 삶의 자세에 대해 강연했다. 청중들 또한 그의 뜨거운 에너지와 삶의 순간의 대한 이야기에 빠져 들어갔다.
윤 대장에게 지난 2004년도는 잊을 수 없는 해였다. 남극기지는 특성상 한번 들어가면 통상 1년을 꼬박 기지에 있어야 한다. 기상변화가 심해 비행기가 원하는 시간에 뜰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기지에 들어가기 전 대원들은 철저하게 자기 체력관리를 하는 것은 물론 전원 맹장수술을 하고 들어가야 한다.
“대원들은 맹장수술 안하려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한 의사가 남극기지에 맹장수술을 안하고 들어갔다가 맹장이 터져서 본인이 거울을 보면서 맹장을 수술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교본인데 그 교본을 보면 다들 수술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눈폭풍 속에서 고립된 대원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전원 맹장수술까지 강행해서 들어온 대원 15명 중 절반 이상을 잃을 위기가 바로 2004년도에 생겼다. 13년 경력의 부대장이 대원을 데리고 남극바다 탐사를 나갔다가 귀항 도중 폭풍을 만나 조난을 당하게 된 것. 설상가상으로 이들을 찾으러 간 수색대원들까지 조난을 당했다.
24시간동안 불러도, 36시간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남극의 혹한은 신체의 감각을 금세 마비시킨다. 48시간이 지나면 발가락 감각이 없다. 5명의 구조대로 떠난 대원들의 마지막 무전은 ‘살려 주세요’라는 외마디 비명이었다. 15명의 대원 중 8명의 대원이 조난을 당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극한의 상황을 극복하고 기지로 복귀했다. 무전기 배터리는 닳아 교신이 안되고 가지고 있던 비상식량은 전부 다 떨어진 상태였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는 죽는구나’ 하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이들은 평소 윤 대장의 당부를 잊지 않았다. 그는 평소 어떤 극한상황에서도 멀리 보고 도전하기를 주문해왔다.
13년 경력 부대장과 7년 경력의 구조대 팀장은 용기를 잃지 않았다. 이들은 스스로 대원들을 다독였고 이들을 진정성 있게 움직이게 만들었다. 윤 대장은 “모든 조직의 생명은 리더의 능력이 아니라 중간 간부의 능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위기의 순간에 실패하는 조직의 특성을 보면 조직원들이 건성으로 행동하고 진정성이 안 보인다. 안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윤 대장은 ‘그것이 바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조직이 사라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그에게도 실패가 많았다. 하지만 실패를 극복하며 경험할 수 있었다. 개인은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지만 조직이 힘을 합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움직이는 조직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극대원들에게 ‘크레바스’는 가장 큰 위험 요소이다. 크레바스(crevasse)란 빙하가 갈라져서 생긴 좁고 깊은 틈을 말한다. 크레바스는 탐사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곤 한다. 작게는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에 달하는 크레바스에 빠지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윤 대장은 크레바스에 빠졌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크레바스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생을 살다보면 누구나 ‘크레바스’와 같은 위기의 순간이 온다. 중요한 것은 그 절망과 위기의 상황을 빠져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크레바스에서 대원에게 위기를 전가하는 대장은 다시 그 위기가 자신에게 온다. 윤 대장은 “자신을 괴롭히는 괴로움과 공포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눈 똑바로 뜨고 위기를 그대로 받아 드려야한다”고 강조했다.
크레바스에 떨어질 때의 자세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그는 바닥을 볼 수 있는 리더가 되라고 주문했다. 밑바닥을 확인하고 상황을 직시할 때 ‘구조대가 올 때까지 9시간만 견뎌보자’하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윤 대장은 남극에서의 극한상황을 우리 인생에 비유했다. 남극에서만이 아니다. 인생에서 가정의 위기, 개인의 위기, 조직의 위기 등 위기는 도처에 깔려있다. 그래서 누구나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점이다. 윤 대장은 솟아날 구멍을 볼 수 있는 자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줬다.
- 김은영 객원기자
- teashotcool@gmail.com
- 저작권자 2018-08-13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