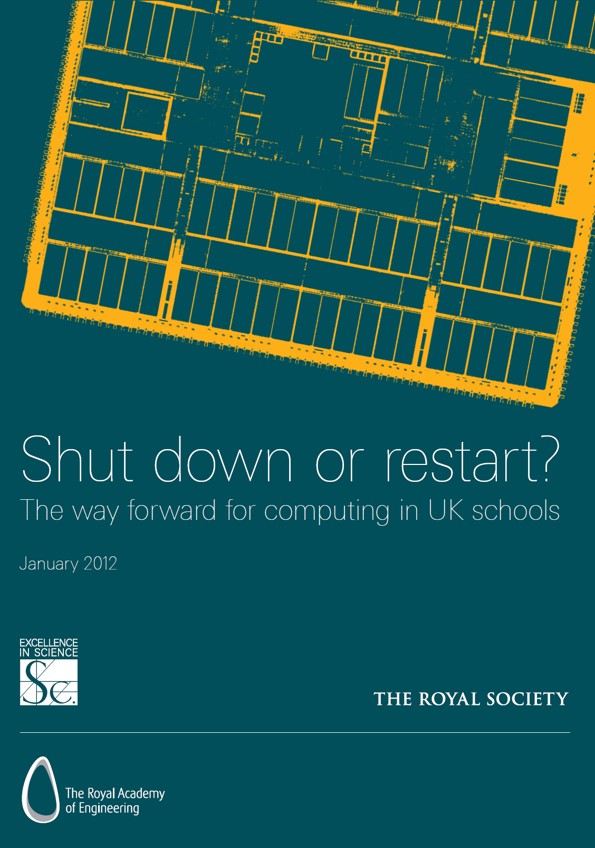우리나라 국가 R&D 혁신방안을 실행하는데 있어 ‘연구기획단계에서의 연구자들의 소외감 해소’와 ‘평가단계에서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이 가장 중대한 혁신 과제로 꼽혔다.
2일(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가 주최한 ‘국가 R&D 혁신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한 결과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큰 과제로 제기됐다.
국가 R&D 양적 성장은 충분, 질적 성장 높여야
우리나라가 세계를 이끌어 나갈 과학정보통신기술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떤 혁신이 필요할까. 사실 우리나라의 R&D 규모 수준은 세계적인 면모를 갖췄다. GDP 대비 국가 R&D 규모는 세계 2위라는 위엄을 자랑한다. 투자규모도 583억불로 세계 6위이다. 총 연구원 수는 345,463명으로 세계 4위 수준이다. 양적 성장 측면만 봤을 때는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
전문가들은 ‘양적 성장에 대비되는 초라한 질적 수준’을 지적했다. 이승복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교수는 “2012년에서 2016년간 5년 주기 기초연구 분야의 논문 1편 당 피인용 횟수는 5.6회로 세계 33위 수준에 불과하다. 개발연구 분야의 기술무역수지는 OECD 최고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산업화 시대의 추격형 시스템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비효율적인 관리체계 등 전략성이 신속성이 부족했다고 돌아봤다. 국민과 시장이 연결되지 않는 ‘나 홀로 기술개발’과 폐쇄적인 R&D 구조로 인해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연계, 사업화 및 기술혁신 또한 저조했다고 반성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돌아보는 것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국가 R&D의 방향을 연구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삶의 질 제고, 일자리 만들기 등 국민들이 원하는 성과창출을 강화하는 동시에 파괴적 혁신을 이끌어낼 ‘고위험 혁신형(High Risk-High Return) R&D’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로는 연구자 중심으로 R&D 제도를 혁신해 개방형 기획을 확대하고 평가위원 이력제를 통해 심화 평가를 실시하는 안이 제시됐다.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 제정을 통해 범부처 R&D 통합 법률을 제정하는 안도 거론됐다.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1부처1기관’이라는 통합원칙 하에 기능을 재정비하고 부처별 산재되어 있는 연구비, 과제관리시스템도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고위험 혁신연구 관련해서는 미래시장 선점 또는 사회문제 해결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하되 신기술 및 신제품이 적기에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는 것을 큰 골자로 잡았다.
연구 발제자보다 전문성 갖춘 평가위원 부재
국가 R&D 프로세스 혁신 관련, 현업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기획단계에서의 연구자 소외 현상과 평가단계에서 공정성·전문성 시비 요소였다.
최영진 세종대학교 교수는 연구자 중심의 R&D 프로세스가 혁신안을 연구하면서 현업 연구자들이 기획 단계, 연구과제 선정단계에서 소외감을 느꼈다는 답변과 연구과제 선정단계에서의 공정성 여부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기획단계에서의 개방성 여부와 소외감 문제는 개선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모든 과제를 채택할 수 없다는 문제의 특성상 과제가 채택되지 않은 연구자들의 소외감 현상은 어쩔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연구 선정 평가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R&D 자금은 많이 투여하지만 평가, 선정 과정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봤다.
이어 “평가위원들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평가를 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평가단도 연구 제안자들보다 더 전문적일 수 없다. 그래서 전문성·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온다. 선정평가에 대해 더 많은 재원을 들여야 서로 승복하는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준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기획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투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젊은 연구자들이 여러 단계를 거쳐 효과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워크숍 등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평가단의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했다. 이 교수는 “평가 문제는 늘 공정성 시비가 있어왔다. 그래서 공정성을 강화하다보니 지금은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다. 과제를 낸 연구자보다 더 전문적인 평가단이 부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유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현장에서 공정성 문제 대두로 인해 전문가들이 배제되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알렸다. 공정성과 전문성은 어느 한 쪽도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축이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 과장도 “그동안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이제는 전문성이라는 또 다른 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 이 두 가지 요소를 어떻게 균형감 있게 가져가야할 것인지를 연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과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평가위원 선정 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선정위원회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고, 평가단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방향성도 재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호 서울대 교수는 ‘파괴적 혁신’이라는 틀에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평가위원회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다”며 “연구과제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 또한 2~3년 동안 한시적으로 받겠다고 하면 훨씬 책임감 연구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선안을 제안했다.
- 김은영 객원기자
- teashotcool@gmail.com
- 저작권자 2018-05-03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