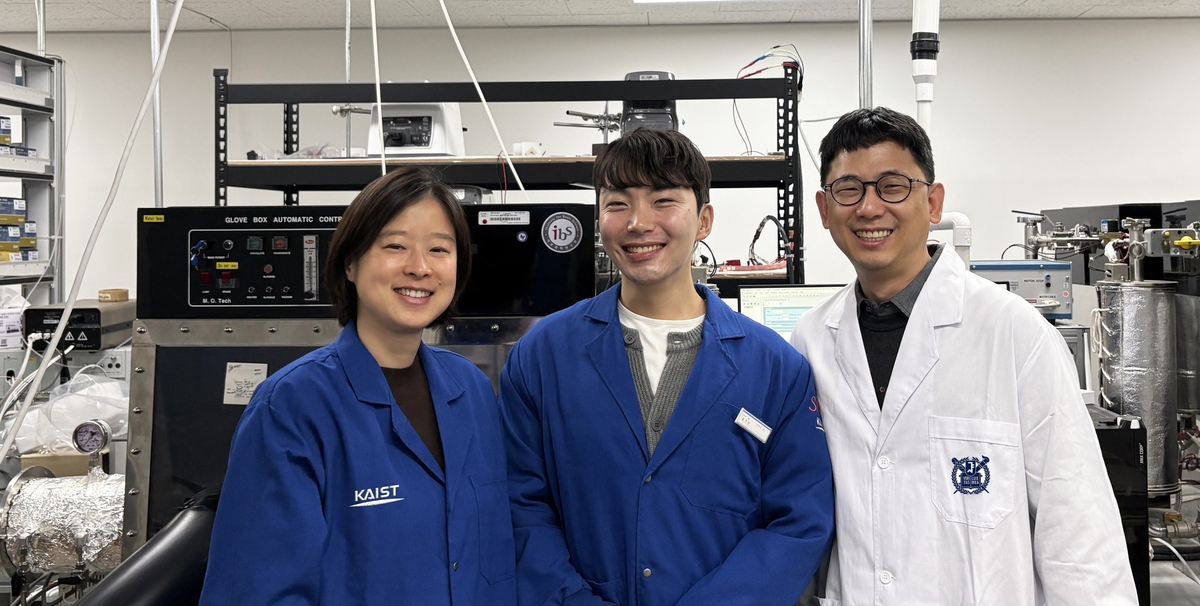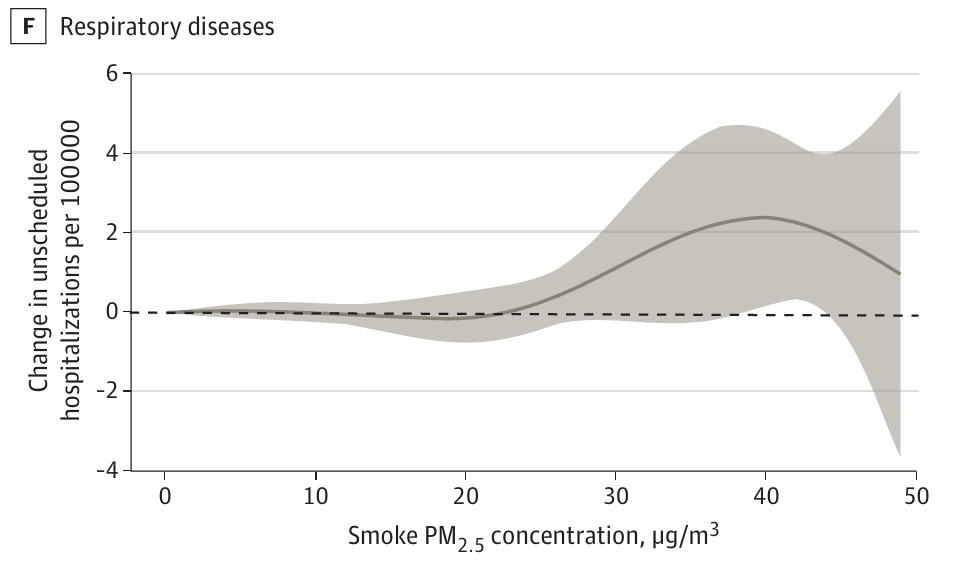산불은 서식지 파괴라는 어두운 면이 있으나 생태와 진화의 관점에서 생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강력한 힘도 있다.
최근 들어 이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올 초 호주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불 탓에 산림과 생물 서식지 파괴로 이어져 산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생태학과 진화의 경향(Trends in Ecology & Evolution)’ 저널에는 산불을 진압하는 동물의 행동에 대한 호주 연구팀의 논문 리뷰가 게재됐다.
이 연구는 사바나 산림지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산불이 발생하는 데 재료가 되는 연료의 양, 구조, 상태 등 세 가지 특성을 동물이 어떤 행동방식을 통해 변형시켜 화재 예방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관찰했다.

초식동물 존재가 산불 발생 최소화
연구진은 초식동물의 존재 여부에 따라 산불 발생의 피해 정도가 다른 사실을 알아냈다.
호주 국립대학 보전생물학자이면서 연구교수인 클레어 포스터(Claire Foster) 박사는 “사바나 산림지대를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소나 염소, 코뿔소 등 대형 초식동물이 서식하지 않는 곳에 발생한 화재는 불 온도가 높고, 피해 면적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초식동물의 유무가 화재진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화재 진압에 대한 대형 초식동물의 영향력이 주로 건조한 기후와 강변에서는 증가하지만, 기후와 지리적 특성도 고려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연료 재배치로 화재 확산 줄여
연구진은 서식지 내 살아있거나 죽은 식물의 위치, 연료 밀도 등 연료의 구조를 미세하게 바꾸는 동물의 행동도 화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연료가 재배치되면 연료 층 내 열과 공기 흐름이 제어되고, 불꽃 높이와 열 확산이 변화하는 등 동물이 연료 구조를 바꾸는 의미 있는 행동에 과학자들은 주목했다.
포스터 박사는 “풀숲 무덤새(닭목 무덤새과)는 주변에 떨어진 식물 재료로 흙무더기 형태의 둥지를 만드는 행동으로 화재가 일어날 만한 식물 즉, 연료의 위치를 바꿔 화재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초스터 박사는 "코끼리가 식물을 짓밟아 압축하거나 폭이 넓은 이동통로를 만드는 행동이나 그 외 동물이 숲 내부에 숲길을 만드는 행동은 산불 발생 시 화염의 높이를 낮추고 화재 확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곤충, 식물 가해로 연료 가연성 높여
또한 식물의 수분 함유와 화학 조성에 따라 연료가 연소하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곤충의 행동방식이 이런 식물의 상태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딱정벌레가 소나무와 가문비나무를 가해하면 나무는 보유한 습기를 낮추고, 가연성이 증가하는 상태를 관찰했다. 곤충의 공격으로 인해 식물이 보유한 수분을 감소하게 하고, 수분이 감소할수록 가연성이 높아져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번 리뷰에서 연구진은 식물의 종 다양화에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하는 산불은 동물의 서식지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산불을 대하는 동물의 처지에서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행동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다.
포스터와 공동연구자이면서 호주 서부대학교 레오니 발렌타인(Leonie Valentine) 야생생물학자는 "가축 동물의 방목과 야생동물의 개체 수 변화가 화재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미세할지라고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연구팀은 화재진압을 위해 동물의 개체군이 변화하는 과정을 추가로 연구할 계획이다.
- 정승환 객원기자
- biology_sh@daum.net
- 저작권자 2020-10-21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