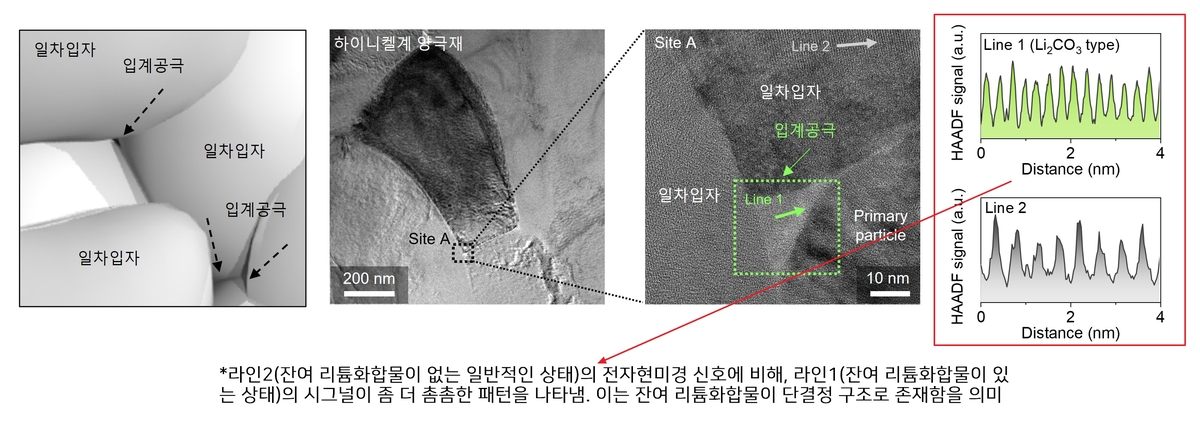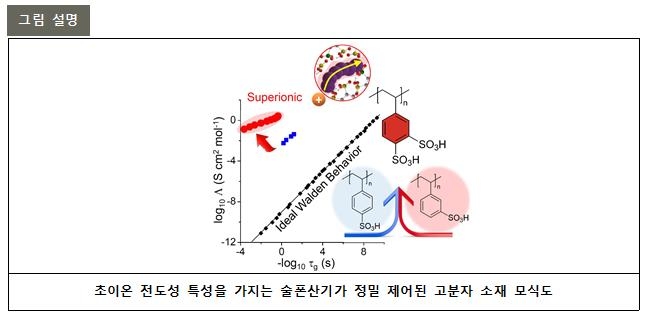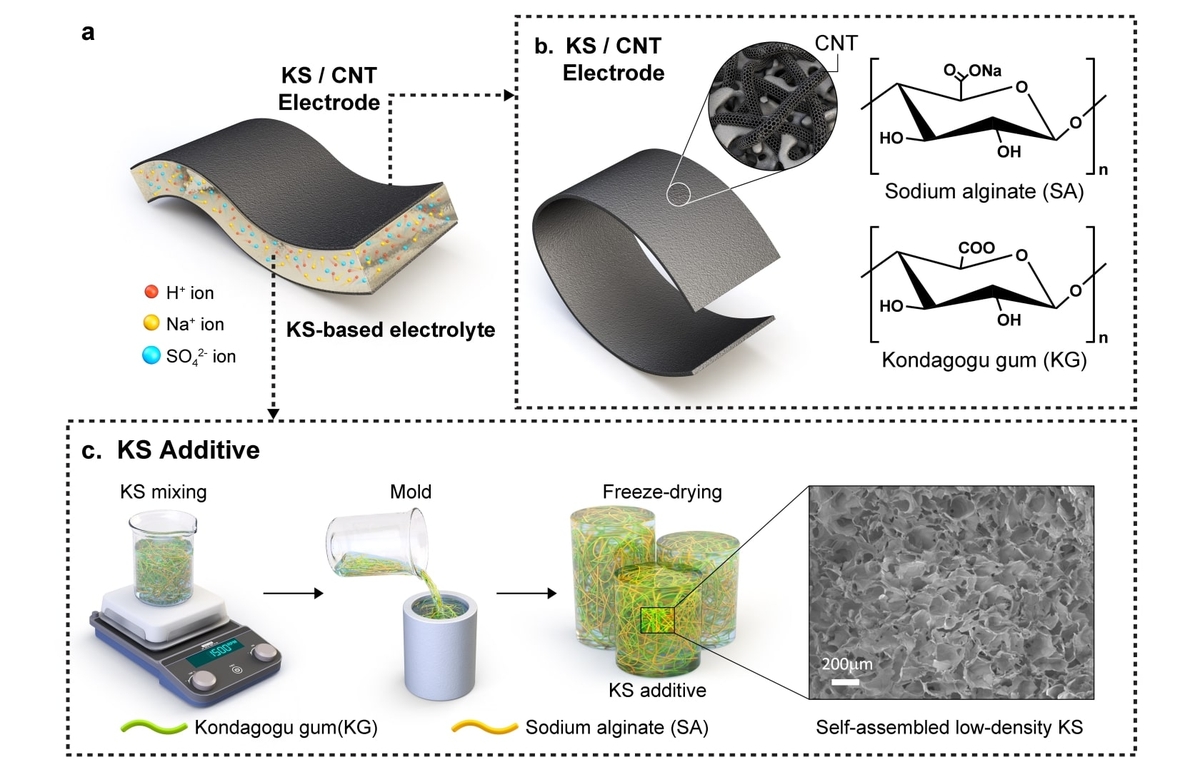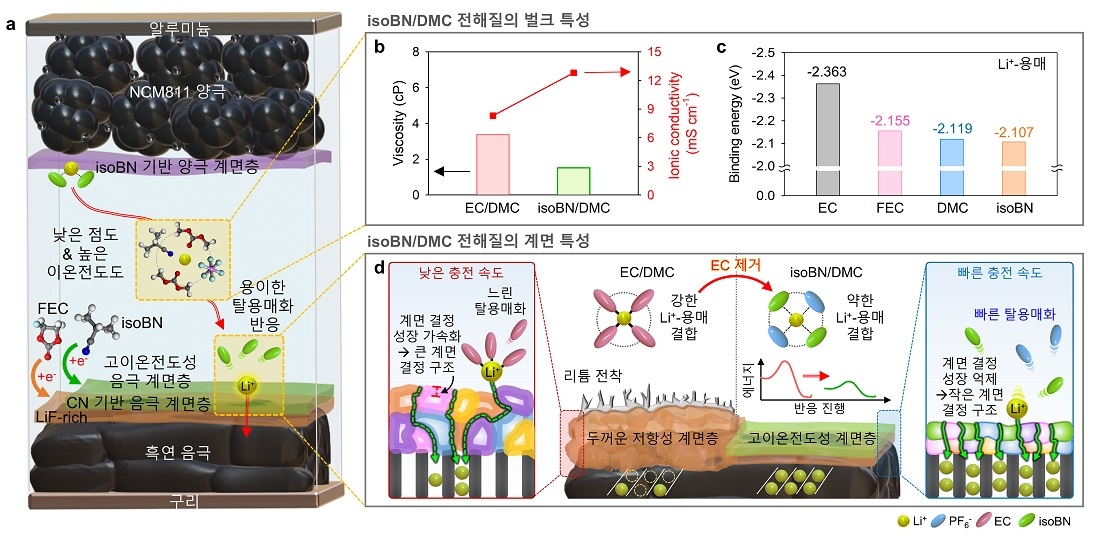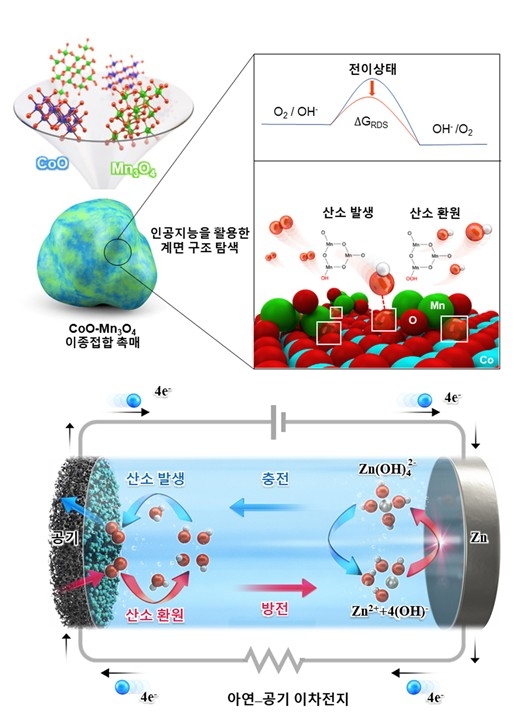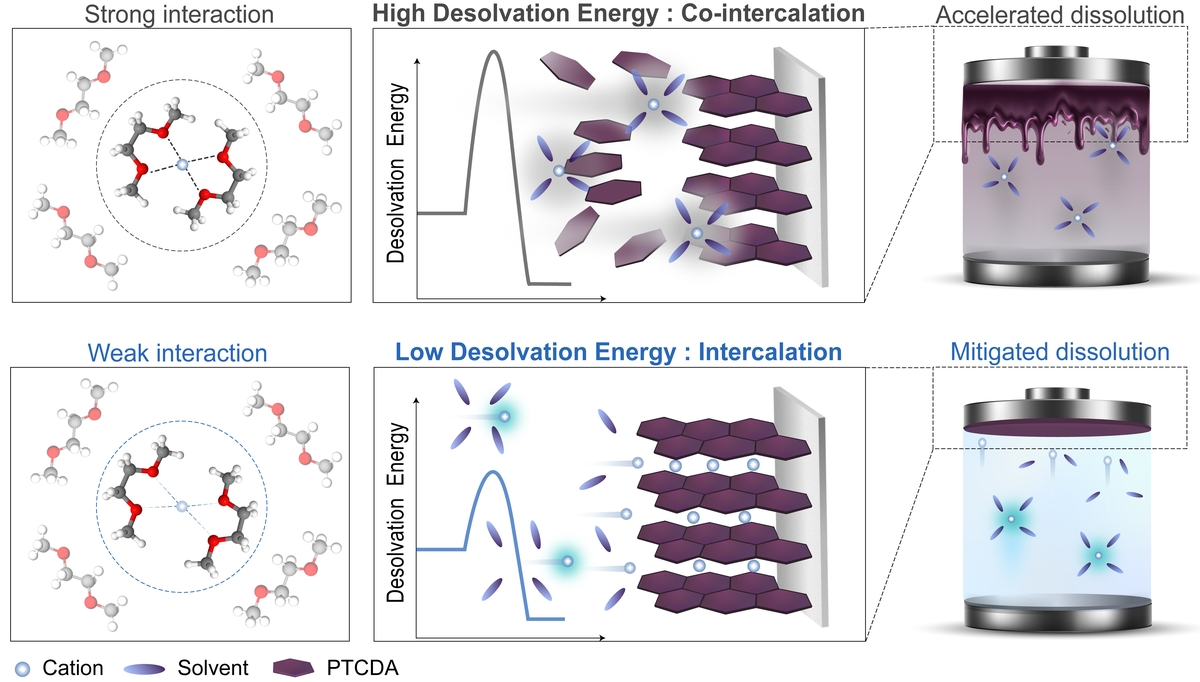지난 7월 한국체육대학교 기숙사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킥보드에서 불이 나 학생 수백 명이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킥보드에 장착된 리튬이온 배터리가 과열되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리튬이온 배터리와 관련된 화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39건이 발생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23건이나 발생한 상황이다.
리튬이온 배터리로 대표되는 이차전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문제는 안정성이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화재 위험성이 늘 상존하고 있어서, 산업계는 오래 전부터 리튬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소재를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나듐 배터리
리튬(Lithium)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소재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물질은 ‘바나듐(Vanadium)’이다. 리튬처럼 희소금속의 하나인 바나듐은 원자번호 23번의 원소로서, 다른 희소금속들처럼 다양한 색을 띄고 있다.
바나듐의 특징 중 하나로는 높은 강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강철에 소량만 첨가해도 강도를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고속 절삭공구나 크랭크축처럼 높은 강도를 요구하는 장비의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연성과 전성 능력이 좋아서 가공이 수월하고, 황산이나 염산, 또는 강알칼리 등을 만나도 부식하지 않는 뛰어난 내부식성까지 갖고 있다.
이처럼 뛰어난 물성을 갖고 있어서 사용처가 많다보니, 바나듐의 가격은 해가 갈수록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3년 새 10배 이상 가격이 폭등하면서, 바나듐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던 철강업계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다.
이 같은 가격 상승세는 전체 광물 중 바나듐이 가장 가파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광물자원공사의 관계자는 바나듐 가격이 폭등하는 주요 원인에 대해 “공급 부족”이라고 진단하면서, “전 세계의 연간 바나듐 수요량은 8만 3000톤에 달하는 반면, 공급량은 7만9000톤 가량에 그쳐 4000톤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추세가 점점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바나듐이 철강 강도를 높이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더해 배터리의 소재로도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인 블룸버그도 “현재 채굴되고 있는 바나듐의 90% 가량을 철강 산업에서 소화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수요처는 철강보다 배터리 분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오랜 수명과 폭발 위험성이 없는 것이 바나듐 배터리의 장점
바나듐이 리튬보다 어떤 점이 우수해서 차세대 배터리의 소재로 주목을 받는 것일까? 이 같은 의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랜 수명’과 ‘폭발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꼽는다.
바나듐 기반의 배터리는 레독스플로(Redox Flow) 방식의 이차전지다. 전해액에 용해된 바나듐 이온이 전자를 주고받아 충·방전되는 방식의 배터리인 것.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수명이 10배 이상 길며, 값도 같은 용량에 대비하여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휘발성 전해액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폭발 위험성이 없다는 것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하는 가장 큰 동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바나듐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KAIST의 관계자는 “이차전지 소재 중에서도 바나듐은 20년 이상의 수명을 보장하기 때문에 가장 오래간다고 할 수 있다”라고 전하며 “전해액 양을 늘리기만 해도 저장 용량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제조에 용이하다는 점도 배터리 소재로서 매력적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바나듐은 높은 출력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설치 공간에도 제약이 없는 대용량 태양광 발전소나 풍력 발전소의 배터리 소재로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전력을 일정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주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저장장치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저장 용량이 작다보니 폭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저장장치의 대표적 사례로는 벤처기업인 에이치투(H2)가 세종시에 설치한 ESS가 있다. 이 저장장치는 태양광이 낮동안에 만든 전력을 받아 세종시 내의 일부 LED 가로등에 공급하고 있다. 현재는 1MWh급 ESS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의 바나듐 기반 ESS를 보유한 나라는 독일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에너지공단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바나듐 배터리가 오는 2028년까지 신재생에너지와 연계된 ESS 시장에서 최대 25% 수준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모양새다. 이미 다롄 지역에 풍력발전과 연계한 200㎿급 규모의 바나듐 배터리 ESS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있고, 오는 2020년까지는 100메가와트(㎿) 이상 규모를 갖춘 바나듐 배터리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바나듐 배터리에게도 단점은 존재한다.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2~3배 이상의 공간을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나 스마트폰용 배터리로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유럽에서는 바나듐을 독성 물질로 규정하여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 김준래 객원기자
- stimes@naver.com
- 저작권자 2018-12-03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