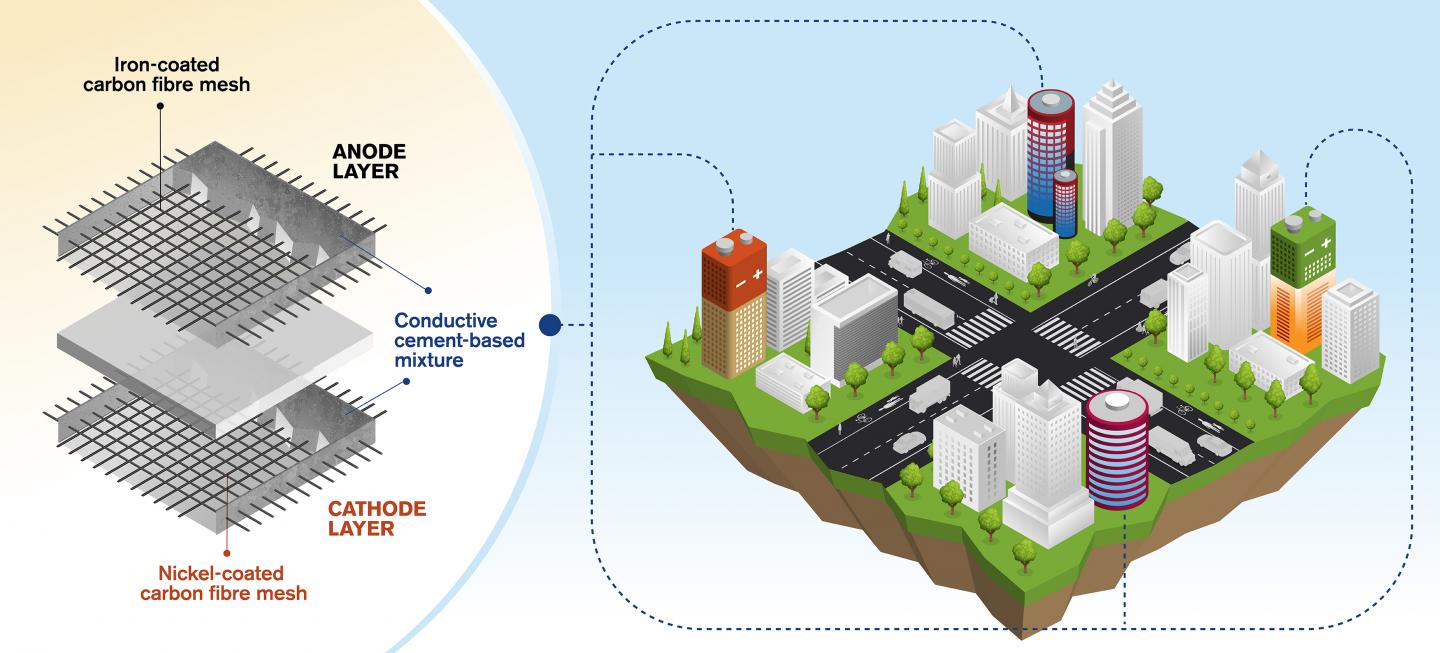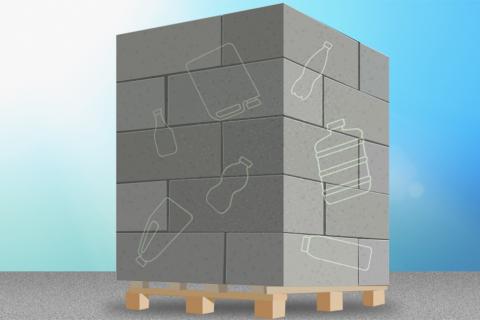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방사성 폐기물의 노출이 환경과 인간, 야생동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잘 보여준 사건이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회수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잇달아 개발되고 있어 주목을 끈다.
러시아 극동연방대학 연구진은 쓰나미에도 무너지지 않고 안전하게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새로운 콘크리트를 개발했다. 석회암 분쇄 폐기물, 규산질 모래, 쌀겨 등을 시멘트에 섞은 이 새로운 콘크리트는 기존 제품보다 6~9배 더 높은 충격 내구성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격을 흡수하는 비결은 마치 고무처럼 수축하고 탄성을 가지는 슬래브 덕분이다. 이 같은 구조는 동적 점성에 따라 충격을 흡수해 잘 부서지지 않는다. 거기에다 금속 섬유 등을 추가하면 향상된 충격 내구성을 가진 콘크리트가 된다.

이렇게 개발된 콘크리트는 쓰나미 같은 강한 외부 충격은 물론 높은 내진 안정성을 지닌다. 또한 이 콘크리트는 자체 밀폐가 되므로 복잡한 지하 구조물을 만드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이 콘크리트로 원자력발전소를 만들었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재앙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
9.11 테러 이후 전 세계는 비행기 충돌로부터 구조물을 방어할 수 있는 테러 방지용 구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번에 개발된 콘크리트는 이런 용도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된 콘크리트가 시멘트의 약 40%를 모래나 쌀겨, 석회암 폐기물 등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기존 콘크리트에 비해 비용 효율적인 면에서도 뛰어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콘크리트는 0.5%의 정확도로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을 맞추어 마치 자연석처럼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콘크리트에 관한 논문은 학술지 ‘Inorganic Materials: Aplieded Research’ 최신호에 실렸다.
이 연구를 추진한 극동연방대학 연구진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균열된 후 발생하는 콘크리트 열화는 시간문제이므로 콘크리트가 최초로 균열되기까지 최대한 오래 버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의 목표는 방사능에 강한 콘크리트를 만드는 것이다”고 말했다.
방사성 우라늄 제거하는 마이크로봇
체코와 대만의 과학자들은 방사성 폐기물에 함유된 우라늄을 제거할 수 있는 마이크로봇을 개발했다. 아주 작은 자가-추진 프로펠러가 달린 이 로봇은 폐수에서 방사성 우라늄을 포획해 분리 제거할 수 있다.
연구진이 제작한 것은 ZIF-8이라고 불리는 막대기형의 금속-유기 프레임워크(MOFs)이다. MOFs는 다공성 구조를 하고 있어 방사성 우라늄 같은 특정 물질을 포획할 수 있는데, 이 로봇은 막대기 끝에 소형 모터를 장착해 우라늄을 빠르게 담을 수 있다.
ZIF-8은 사람 머리카락의 1/15에 불과한 직경을 지닌다. 하지만 거기에 철 원자와 철산화 나노입자를 첨부해 구조를 안정화시켰으며, 자성을 띄도록 해 로봇을 제어할 수 있다.
즉, 막대기 모양의 나노입자 끝에 촉매성 백금 나노입자를 장착해 과산화수소 연료로 물에서 산소 방울이 만들어지게 한 것. 이렇게 생성되는 산소는 마이크로봇이 몸길이의 60배 되는 거리를 1초 만에 주파할 수 있도록 만든다.
연구진은 모의실험을 실시한 결과 이 마이크로봇이 방사성 폐기물에서 한 시간 만에 96%의 우라늄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우라늄을 수거한 마이크로봇은 자석으로 제어해 수집한 다음 재활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는 재료분야 국제학술지인 ‘ACS Nano’ 최신호에 게재됐다.
고준위폐기물 해결 위한 새 원자로
한편, 러시아 국영 원자력 회사인 로사톰(Rosatom)은 젤레즈노고르스크에 있는 광업화학단지에 용융염 연구 원자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준공하기까지 최소 10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되는 이 원자로를 건설하는 이유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용융염 원자로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최초로 개발되었는데, 당시 이 원자로의 주요 임무는 무기급 플루토늄의 생산이었다. 그러나 그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아 프로그램이 취소되었다.
러시아에서는 1970년대 후반에 이 원자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후 용융염 원자로의 효율성이 확인됐지만, 체르노빌 사건으로 인한 원자력 발전 산업의 정체로 작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용융염 원자로의 안전성과 아메리슘, 퀴륨, 넵투늄 등 미량의 악티늄족 원소를 연소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관심을 받아 왔다. 넵누늄과 아메리슘의 반감기는 수백 년이지만, 이 원자로가 성공적으로 건설될 경우 지난 반세기 동안 축적된 것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
이 원자로가 건설되는 장소는 이전에 원전이 있던 곳으로서 송전 시스템이 존재하므로 젤레즈노고르스크 시의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이 될 수도 있다.
- 이성규 객원기자
- yess01@hanmail.net
- 저작권자 2019-12-13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