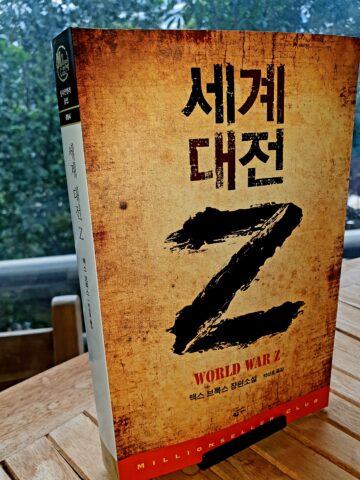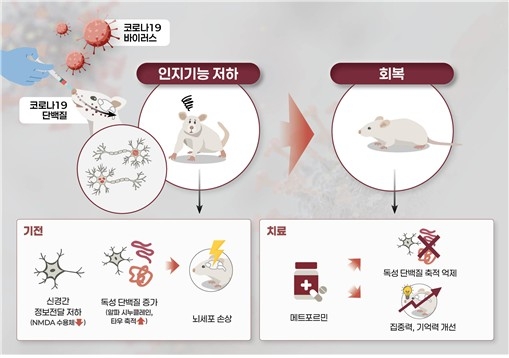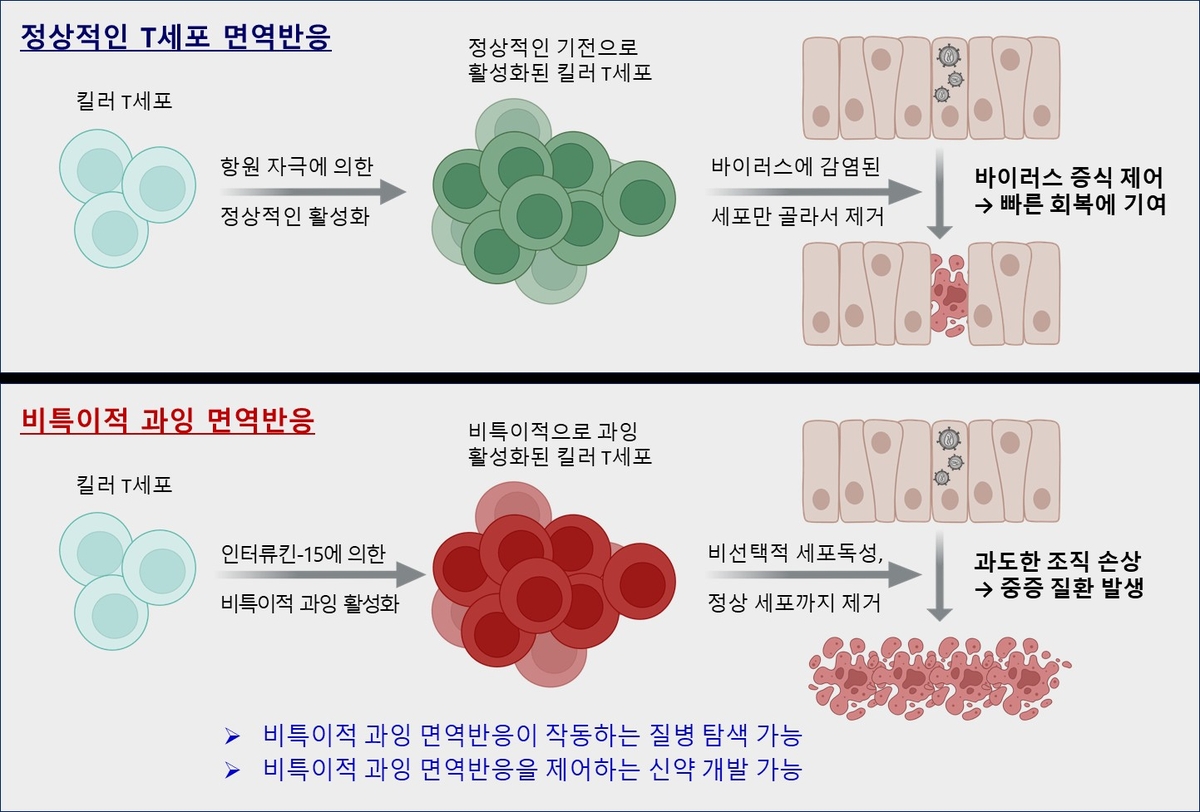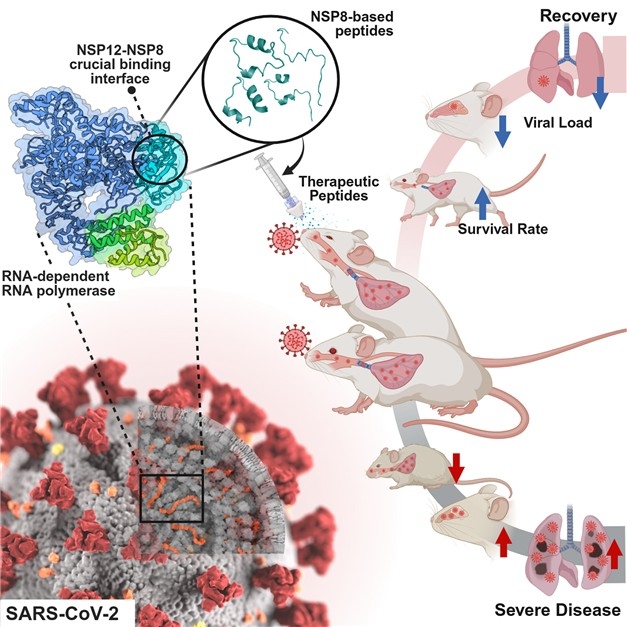세상은 갑자기 생겨난 정체불명의 존재들로 초토화된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들이 죽어도 죽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 전투는 세계로 번졌다. 세계대전 ‘Z’가 되는 시점이다.
과거 세계대전은 핵전쟁으로 전망됐다. 핵전쟁에서는 그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 ‘인류 멸종’이다. 최근 인류 멸종에 대한 불안은 전염병으로 옮겨왔다.
전 세계 팬데믹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와 같이 인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종 바이러스 앞에서 무기력하기만 하다.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 세계대전으로 번지다
맥스 브룩스(Max Brooks) 소설 ‘세계대전 Z’(World War Z, 황금가지 펴냄)은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대전이 벌어진 이후 살아남은 생존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첨단 문명을 이룩한 인류가 어떻게 바이러스에 함락되는지를 보여준다.
소설은 바이러스 발발을 중국 연방, 대충징으로 정했다. 이 지역은 한때 인구가 3500만 명이 넘었다. 하지만 지금은 5만 명만이 살고 있다. 이곳은 중앙전력망도, 수돗물도 공급되지 않는다.
중국인 의사 광진슈는 이곳으로 왕진을 왔다가 정체불명의 병에 걸려 신음하는 7명의 환자를 돌보게 된다. 이들은 40도가 넘는 고열에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고 있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최초의 ‘발생자’ 때문이다. 그는 12살의 소년이었다. 아이는 짐승처럼 몸부림을 치고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의사 광진슈는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소년을 진찰한다. 아이는 심장 박동도 맥박도 잡히지 않았다. 혈액을 채취했지만 나온 건 붉은 피가 아닌 찐득찐득한 갈색 액체였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가 아버지와 값나갈 만한 물건을 건지기 위해 저수지 물속에 들어갔다가 뭔가에 물린 이후로 저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년을 시작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병이 퍼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 중 나이가 지긋이 든 노파는 방역대원들과 의료진을 향해 주먹을 들이대며 “염라대왕의 벌을 받고 있다”고 소리 질렀다.
비이성적인 사회가 되면 사람들은 광기에 휩싸인다. 가짜 뉴스에 휘말린다. 신을 갈구하며 현 상황을 벗어나고자 한다. 죽음이라는 실재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것이다.
바이러스가 물리적인 실체를 가진 존재로 거듭날 때
사람들은 감염자를 상대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 어떤 비극의 순간에도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 존재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려움을 자극하면 ‘팔린다’. 악덕 무역상들에게 ‘두려움’은 다시 말해 ‘무엇이든 팔아먹을 수 있다’는 논리와 통했다.

감염자들과 싸워야 하는 군인들도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싸워야 했다. 감염자들은 오로지 뇌를 정조준해서 총을 쏴야만 활동을 멈췄다. 그 외에는 아무 타격이 없었다. 산탄총을 쏘고 폭탄을 터뜨려도 다시 일어나서 공격했다.
한 군인이 뇌를 조준해서 쐈지만 감염자는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뇌를 쏴도 소용이 없다는 소문이 군인들 사이에 공포심을 가져왔다. 공포는 좀비 바이러스보다 더 전염성이 강했고 군인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어떠했을까. 감염병으로 인한 세계대전은 대한민국에도 커다란 상흔을 남겼다. 서울, 포항, 대구에 이미 질병이 발발한 상태였다. 목포 시민들은 대피를 시켰고 강릉은 격리됐다. 인천에서는 전투가 벌어졌다.
전염병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국가 전체가 붕괴되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인터뷰에 응한 최형철 국가정보원 부원장은 이를 북한 덕분이라고 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현재 분단 상태인 남북관계와 북한의 특수한 체제 때문이었다.
바이러스가 발발하자 북한은 전쟁을 위해 파놓은 지하공간으로 전 국민을 대피시켰다. 그리고 그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모든 소통을 끊었다. 폐쇄적인 국가답게 그야말로 바이러스를 원천봉쇄한 것이다. 북한이라는 체제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북한은 지하에 모든 사람들을 가두고 나오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북한으로 내려오는 감염자들을 막을 필요 없이 자체적인 감염자들만 상대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군사력 손실이 적다는 의미였다.
역병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에만 있지 않다. 알 수 없는 죽음의 공포는 실체적인 죽음보다 더 위협적이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독일의 사회학자인 엘리아스(Norbert Elias, 1897~1990)가 지적한 대로 실제로 죽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인간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류는 이번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도 길을 찾을 것이다. 소설 속 ‘세계대전 Z’을 이겨낸 생존자들이 평화로운 저녁 시간에 과거를 회상하며 인터뷰를 했던 것처럼.
- 김은영 객원기자
- teashotcool@gmail.com
- 저작권자 2020-08-31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