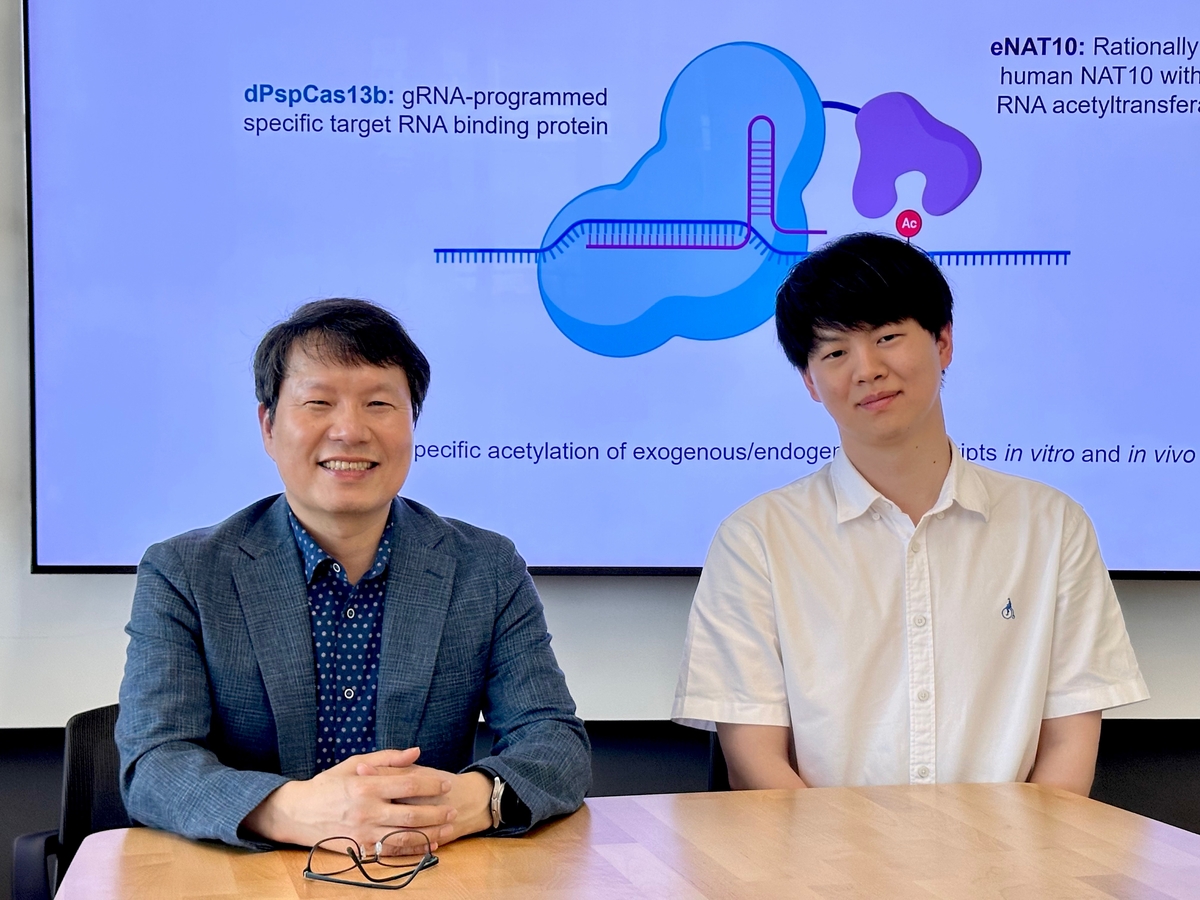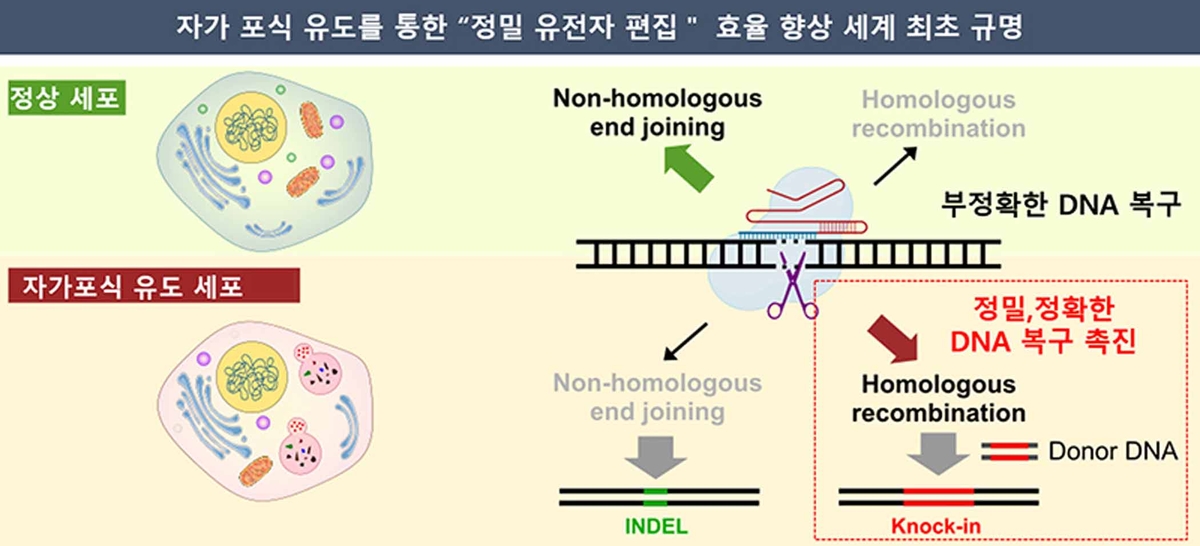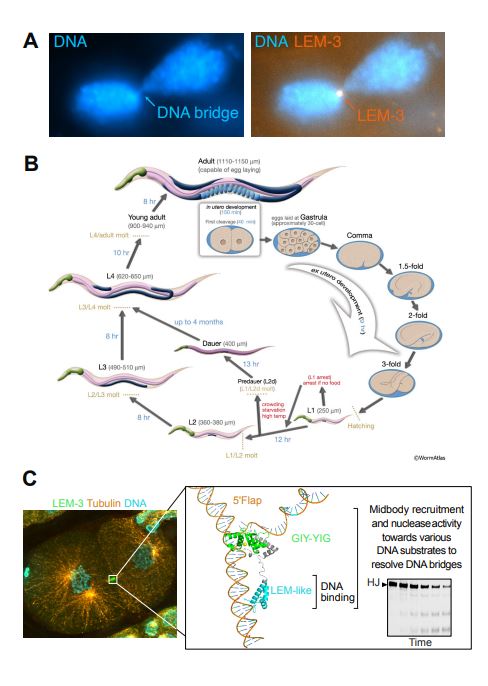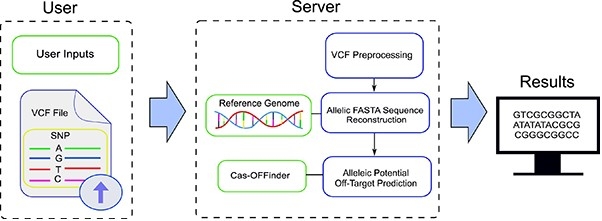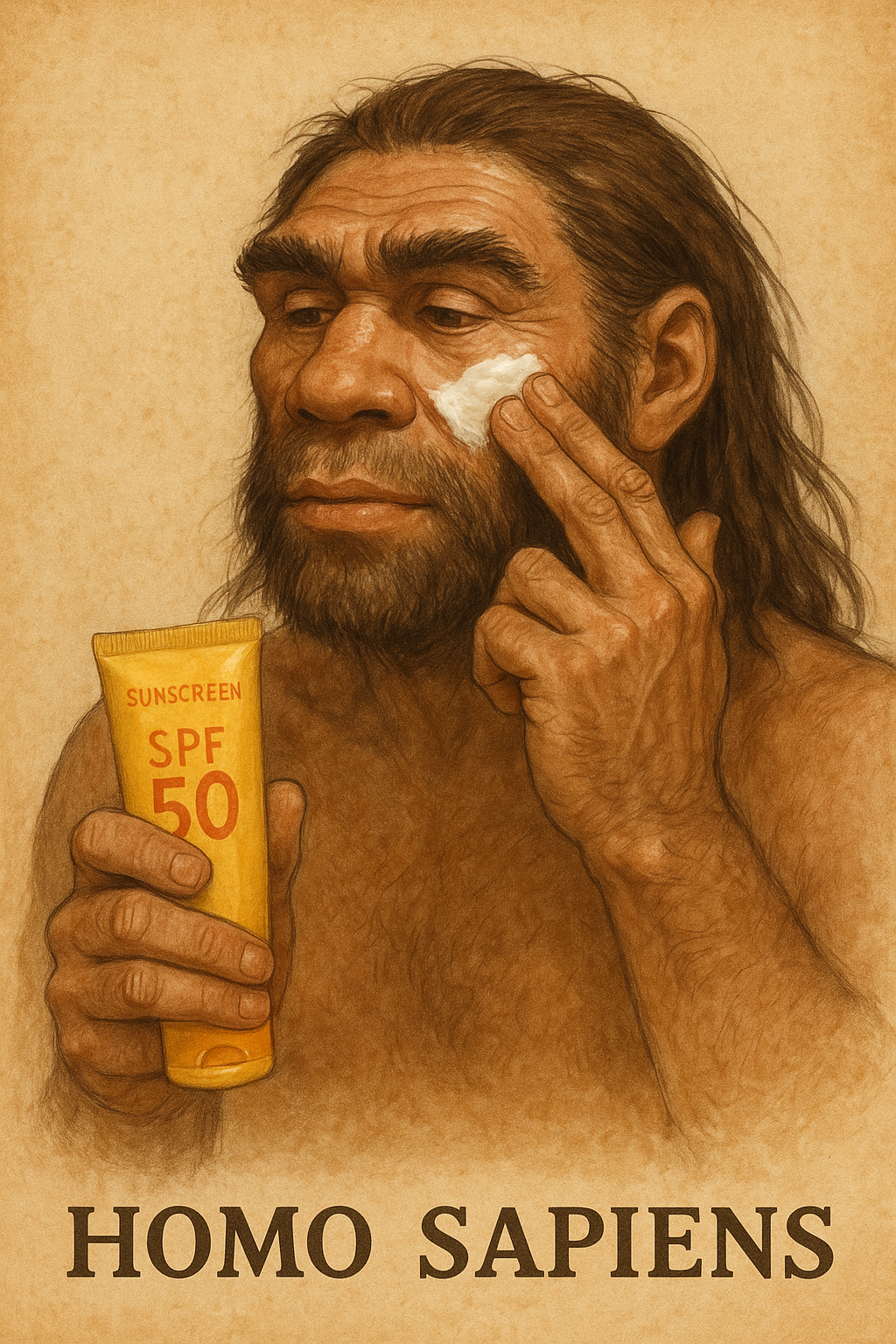우리가 몸을 구성하고 기능하는 것은 우리 세포마다 존재하는 DNA의 설계대로 필요한 단백질과 여러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조절되기 때문이다. 이 DNA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 불과 60여 년 전의 일인데, 그간 DNA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했다.

사람의 몸에 있는 DNA의 총체인 ‘게놈’을 모두 분석해 낸 것이 2003년의 일이고, 이후 게놈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유럽인, 아시아인, 혹은 각 국가 단위에서 까지 집단 특유의 유전변이는 무엇인지가 밝혀지기 시작했다. 유전자는 모든 생명체들의 구조와 기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구체적인 실체이지만 그 기작은 매우 복잡해서 그 기능을 이해하는 일은 끝이 없다.
유전변이와 질병
예를 들어, 폐암이나 유방암, 심혈관 질환과 같은 특정 질병과 관련되어 있는 유전변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는, 질환이 있는 환자군과 질환이 없는 대조군의 게놈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시작한 것이 점차 인류 집단 별로 같은 질환에 대해 관련된 유전변이가 서로 다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몸에서 유전자들은 다른 유전자들과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유전변이에 대한 이해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민족적, 가족적 유전적 특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최근의 시각이다.
시간이 지나면 물건들이 낡고 바래는 것처럼 DNA도 시간이 지나면 부서지고 망가진다. 이를 테면, 박물관에 박제가 되어 있는 동물들의 몸에 남아 있는 DNA도 점차 부식이 생기고, 동굴에 수천 년 수만 년 남아있던 사체의 DNA는 흙 속에 있는 벌레와 세균들의 작용까지 더해져 더 빠르게 조각 조각나고 화학적 변이가 일어나며, 벌레와 세균들의 DNA까지 섞여 오염도 일어나게 된다.
고대 DNA 연구들
이렇게 오래되고 부식한 DNA는 특히 고대 DNA(ancient DNA)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점차 발전해 온 DNA 분석 방식 덕에 우리는 수 만년 전에 살다 간 우리 조상들과 네안데르탈인, 심지어는 데니소바인들의 DNA까지 분석해 내어 이들이 언제 인류와 분기했고 어느 지역에 살았으며, 인류와 교류를 했는지 등 다양한 사실들을 알아낼 수 있었다.

‘심지어’ 데니소바인이라고 표현한 까닭은, 이들은 DNA를 추출했기 때문에 알게 된 인류의 한 줄기이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인류 고고학적 증거들은 유골과 화석, 유물 등의 거시적 증거를 토대로 이해되어 왔다. 이를 테면, 우리들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의 차이는 어디까지나 형태학적 차이와 남아있는 유물들을 토대로 재구성한 문화적 차이 등을 토대로 논의할 수 있었는데, 데니소바인은 남아 있는 화석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접근 방식으로는 그 존재 자체를 알아차릴 수 없었던 셈이다. 그런데 우연히 시베리아에 있는 데니소바 동굴에서 찾은 뼛조각에서 추출한 DNA를 토대로 이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 모두와 구별되는 다른 집단에서 왔고, 이 집단은 인류보다는 네안데르탈인과 더 가깝다는 것 등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 분석에 사용된 시료는 동굴에서 나온 셀 수 없이 많은 뼛조각들이었다는 것이 특히 흥미롭다. 뼛조각에 있는 콜라겐 일부를 확인해 인류의 것인지 아닌지 저렴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류의 뼛조각을 골라내고 DNA를 추출하는 방법이 쓰인 것이다. 보존이 잘 되어 있어 가치가 높은 화석이 아니더라도 뼛조각들을 이용해 흥미로운 발견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요즘은 동굴이나 특정 지질학적 토양층에서 DNA를 추출해 시기별로 살았던 생물종들을 확인하고 그 진화적 궤적을 이해하는 일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말 그대로 흙에 섞여 있는 DNA 조각들을 낚아내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또는, 목걸이나 토기 등 발굴된 유물들에 남아 있는 DNA를 추출해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이나 그 재료가 된 동물을 연구하는 방식도 계속 시도되고 있다.
야생의 동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진 최근에는 야생 동물 연구에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되는 예도 많다. 야생동물에게 접근해 피나 털 등을 뽑는 식의 방법은 동물들과 사람 사이에 감염병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 옳은가의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배설물이나 둥지 등에 남아있는 털 등을 채집해 DNA를 추출해 분석하는 방식 등이 쓰이고 있다.
계속 발전하는 DNA 분석법은 우리 이해의 지평을 끝도 없이 넓히고 있다.
- 한소정 객원기자
- 저작권자 2023-12-19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