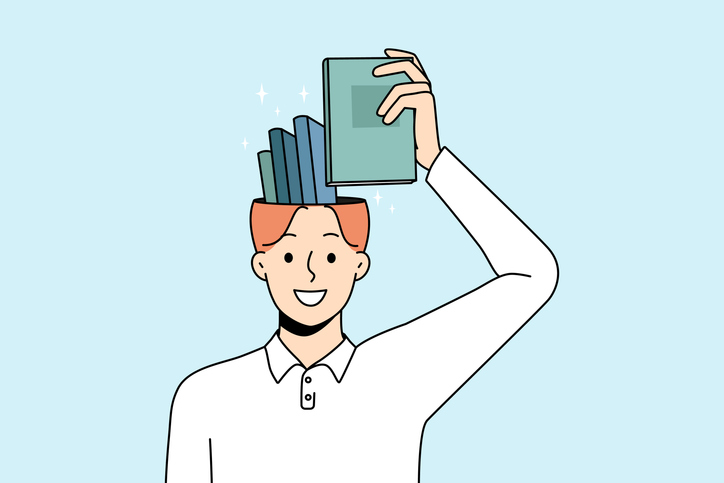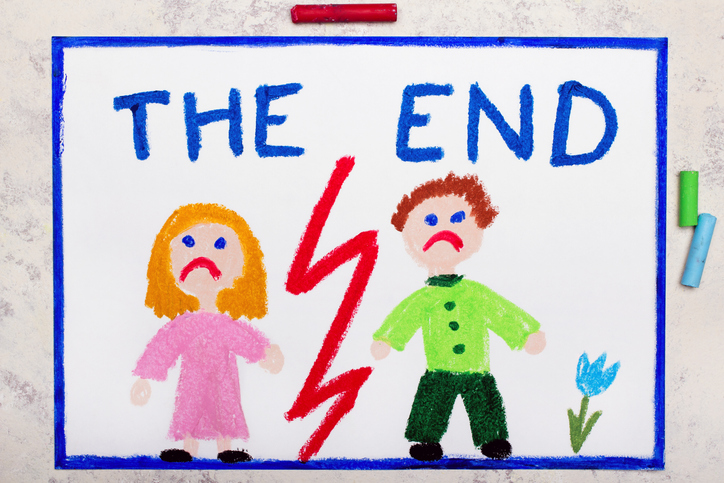흔히 ‘가십’이나 ‘뒷말’이라 부르는, 여럿이 모여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학교나, 직장, 다양한 사회적 단위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자 소통의 형태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대개 우리는 하루 16,000개가량의 단어를 말하는데, 이 중 65%가 이 같은 ‘사회적 주제’를 다룬다.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나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는 문화를 막론하고 관찰할 수 있는 행동으로, 그 기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함께 뒷말을 나누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즐거움을 나눈다는 등의 가설들이 존재한다.
가십은 험담이라는 시선
실제로, 그간 보고된 여러 실험에서는 가십이 이기적인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고 이들을 배제해 집단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이익을 높인다거나, 누구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어 미래의 협력자를 얻기 위해 노력하도록 장려한다거나 하는 등의 측면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는, 다른 이들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이라는 ‘가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도 연관이 있다.
최근 ‘커런트 바이올로지’에 실린 실험 연구는 가십의 다른 성격에 대해 관찰했다. 가십이 사회적 정보를 얻는 학습의 장일뿐 아니라, 함께 뒷말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했다.
실험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었다. 연구진은 2,300여 명의 참여자를 모아 이들에게 실험의 개요를 설명하고, 이를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간단한 퀴즈를 풀게 한 뒤에 10분간 '대기실'에서 기다리도록 했다. 이후, 각 참여자는 다섯 명의 다른 참가자들과 그룹을 이루어 10개의 라운드에 걸친 과제를 함께 수행했고, 이를 모두 마친 뒤에는 함께 한 다른 다섯 명의 구성원들에 대해 이들과 ‘다시 게임을 할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 평가하도록 했다.
과제를 마치기까지는 평균 12분이 걸렸고 각 참여자는 과제를 마치는 데에 대해 기본 1.5달러를 받았으며, 이후 같은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 평균 2.65달러, 최대 4.5달러까지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최종적으로는 954명의 참가자가 과제를 모두 완수해 분석에 사용되었다.
실제 관계망을 재현한 실험 디자인
이렇게 총 여섯 명의 참여자들이 함께 수행한 각 라운드의 과제는 일종의 ‘공공재 게임 (public goods game)’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각 참여자들은 100개의 포인트를 지급받았고, 이중 얼마만큼을 그룹을 위해 쓰고 얼마를 자기가 취할지 결정해야 했다. 각 라운드에서 참여자에게는 정해진 관계망이 있었는데, 어떻게 결정했는지가 바로 보이는 두 명의 ‘가까운 이웃’과 정보의 흐름에 따라 결정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두 명의 ‘먼(distant) 이웃’, 그리고 먼 이웃이지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또 한 명의 ‘먼(remote) 이웃’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이 구조 속에서 허락된 일부 정보만을 아는 상태에서 ‘먼(remote) 이웃’과 대화를 통해 다른 정보를 얻어야 했다. 이 관계망은 각 라운드에서 새로 설정되었는데, 이를 통해 각 참여자는 그룹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상과 정보를 형성해가는 한편, 이를 ‘먼(remote) 이웃’과 제한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회 관계망에 더 가까운 사람들과 먼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 대한 정보가 불균형한 동시에 이 같은 정보가 가십을 통해 흘러 다니는 것을 실험 속에서 최대한 재현하기 위한 고안이었다.

가십은 정보를 나누는 기능을 해
실험을 분석한 결과, 먼저 연구진은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을 때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대화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의 결정에 대한 정보가 충분할 때, 대화의 주제는 더 다양해졌다. 연구진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수록 사람들은 이들을 파악하기 위한 대화를 하고, 정보가 충분할수록 신변잡기나 다른 일상의 대화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흥미로운 것은,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실험 환경에서도 참여자들 간의 가십은 그룹 내에서 자신들이 직접 관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참여자들이 그룹의 다른 사람들을 평가한 내용은 이들이 가십을 통해 주고받은 내용과 연관성을 보였는데, 특히 이들이 함께 가십을 나눈 사람들과의 유대감이 클수록 그 영향은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가십은 사회적 유대를 높이는 기능을 해
또한, 대화를 나누는 행위 자체가 이들의 사회적 유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서로 대화를 나눈 참여자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과 비교해 서로 더 큰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이들이 게임에서 더 협조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이었는가 보다 더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가십이 가진 사회적, 생물학적 기능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 여러 측면을 한 꺼풀씩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실험 고안이 필요한데, 이번 실험에 그 혁신성이 있다고 연구진은 강조한다. 앞으로도 다른 흥미로운 실험들이 가십의 다른 측면들을 탐구해가기를 기대한다.
- 한소정 객원기자
- sojungapril8@gmail.com
- 저작권자 2021-06-29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