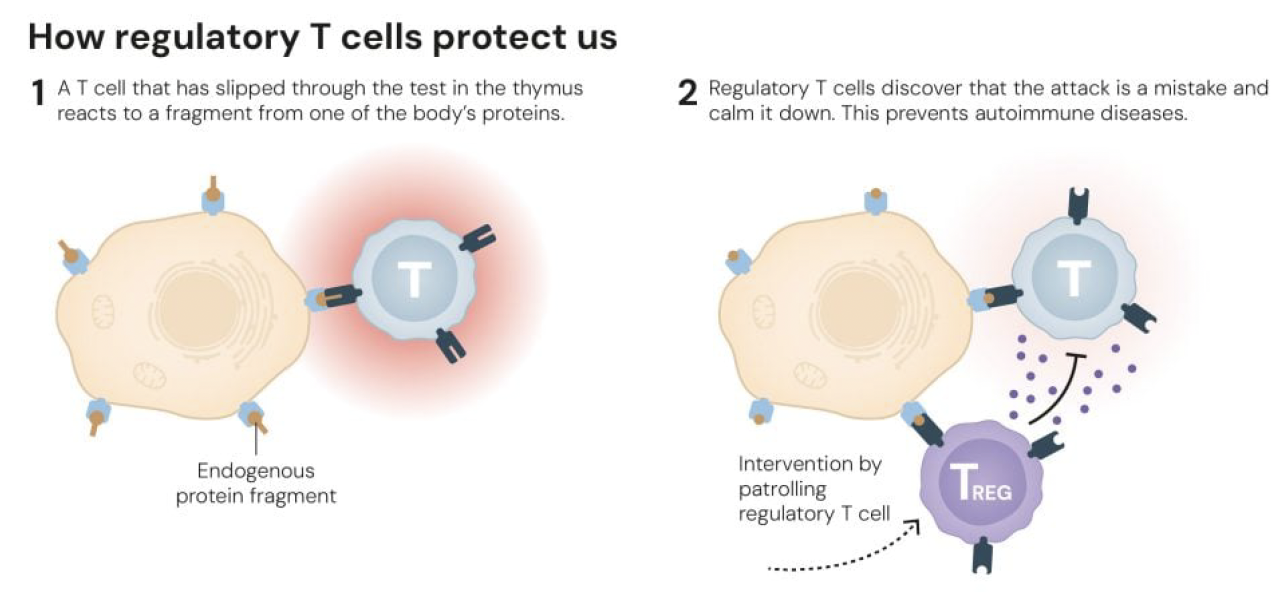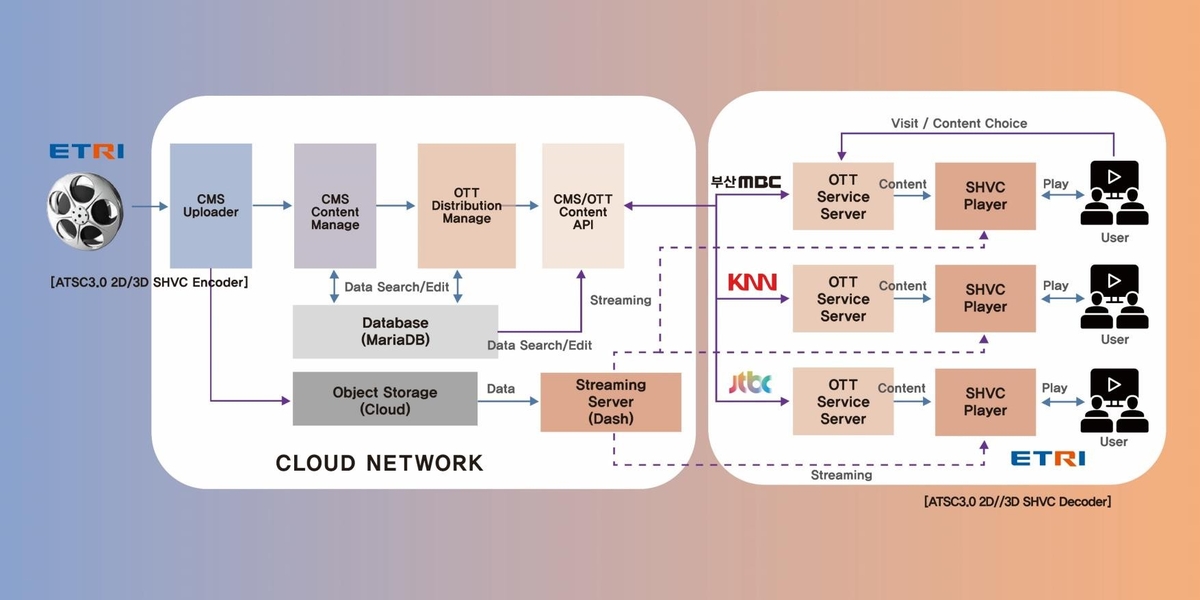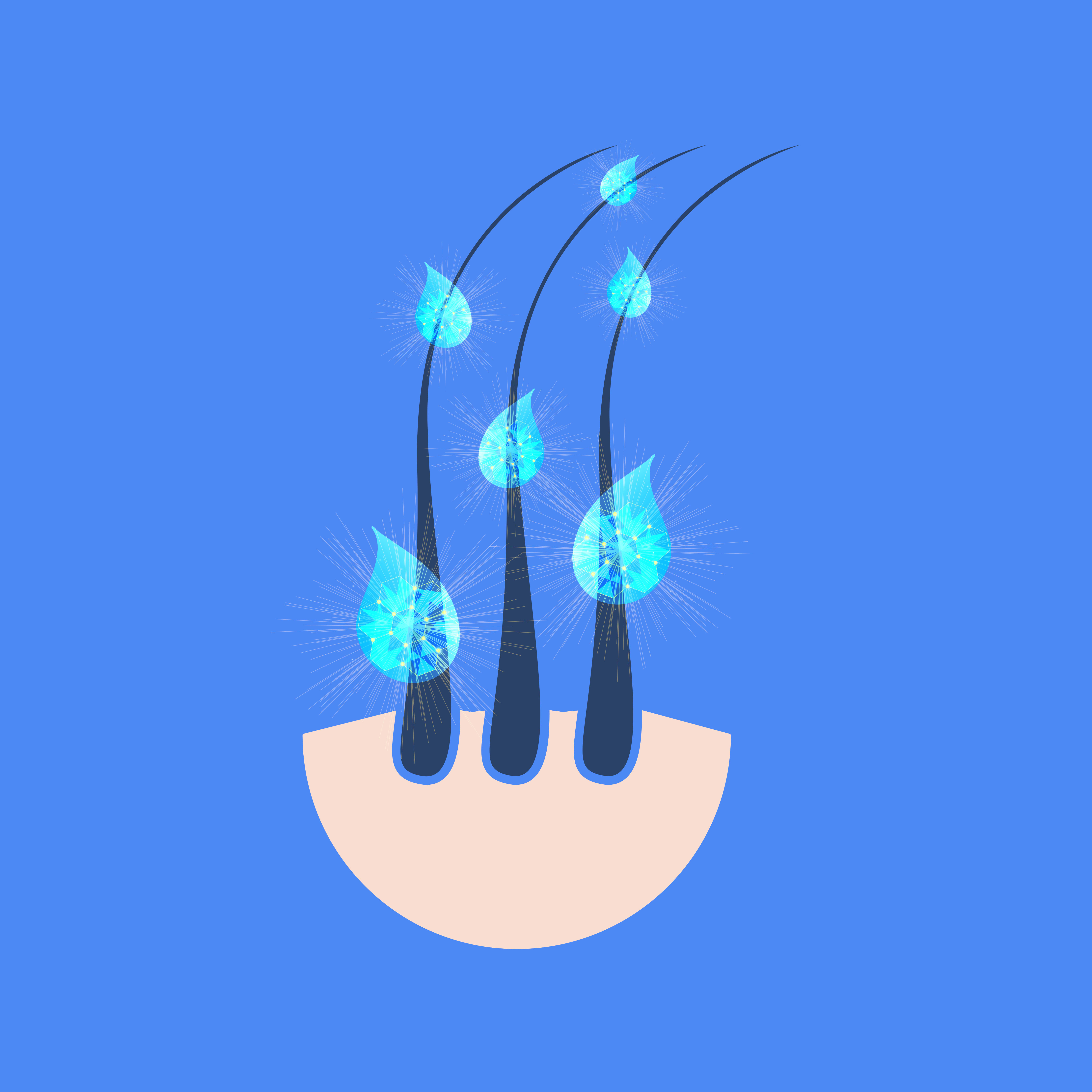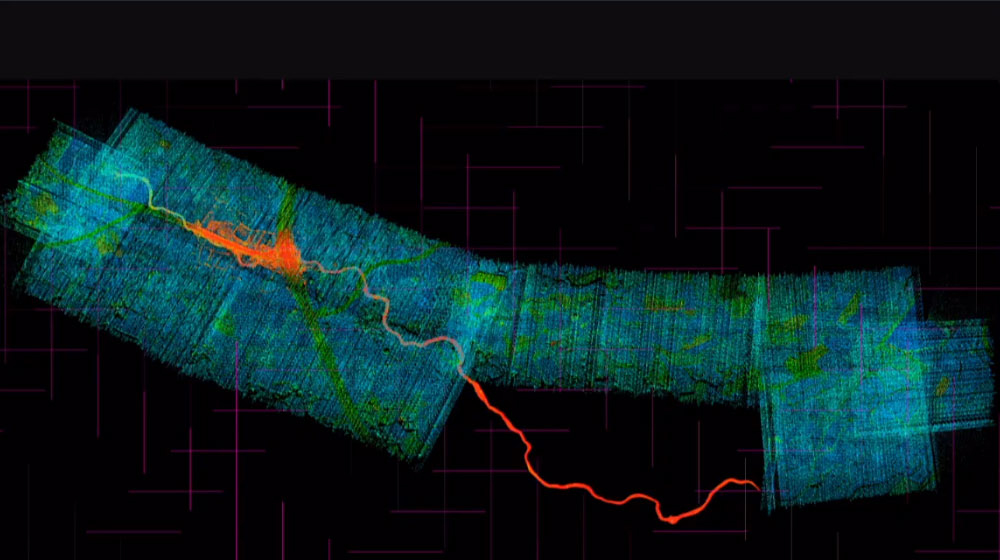사람 같은 로봇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소프트 로보틱스(Soft Robotics)’ 기술이다. 최근 과학자들은 강한 금속 대신 실리콘, 직물, 겔, 엘라스토머 같은 부드러운 소재로 사람처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기술 수준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15일 캐나다 ‘CBC 뉴스’에 따르면 미국 코넬대학의 제임스 피쿨(James Pikul) 교수 연구팀은 문어·갑오징어의 피부를 변화시키는 셰이프시프팅(shape-shifting) 방식을 모방해 변형이 가능한 인공피부를 개발 중이다.
이 피부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입체(3D) 피부다. 군사용, 첩보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위장피부는 물론 미용 분야 등에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피부 변형이 가능하다. 관련 논문은 지난 주말 과학저널 ‘사이언스’ 지에 게재됐다.
문어·갑오징어 피부 돌기현상 모방
이번 연구는 두 팀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한 팀은 생물연구팀이다. MIT 해양생물학연구소의 생물학자 로저 핸론(Roger Hanlon) 박사 연구팀은 특히 빠른 속도로 색깔을 변형시킬 수 있는 문어·갑오징어 피부 연조직에 주목했다.
피부 속의 세밀한 조직들을 정밀 관찰했는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부 조직이 수천분의 1초 단위로 미세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피부색깔 변화는 돌기(papillae)라 불리는 돌출부에서 일어났다.
이 돌기들은 매우 작은 근육들의 조합들로 상황에 따라 튀어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하면서 주변 환경과 결합해 색깔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헨론 박사는 “문어·갑오징어를 비롯 많은 연체동물들이 두터운 외피 없이 이 같은 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쿨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연구 결과에 착안, 문어·갑오징어 피부 시스템을 모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 변형이 가능한 2차원의 피부 세포조직을 합성했으며, 이렇게 제작된 피부조직으로 3차원으로 발전시켜나갔다.
이 합성 피부조직은 탄성중합체의 멤브레인(elastomeric membranes)으로 제작했다. 탄성중합체란 외부에 힘을 가해서 잡아당기면 몇 배나 늘어나고, 힘을 제거하면 원래의 길이로 돌아가는 성질을 가지는 고분자 화합물을 말한다.
이 화합물로 구멍이 0.5~1.2㎜ 정도에 불과한 매우 얇은 막, 멤브레인을 만들었다. 그리고 멤브레인의 미세한 구멍 안에 특정 물질이 접근하면 형태가 늘어나는 미세 물질인 섬유조직을 삽입했다. 문어·갑오징어의 돌기를 모방한 것이다.
최근 자연을 대상으로 최근 실험을 실시했다. 그리고 이 특수 멤브레인이 주변의 돌들 모습이나 식물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람의 기술을 통해 위장이 가능한 문어·갑오징어 피부를 재현한 것이다.
위장무기, 디스플레이 산업에 활용 가능
피쿨 교수는 “이 합성 피부조직을 제작하는데 열기구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실리콘 소재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빵 만들 때 깔개로 쓰는 실팻(silpat)의 원료와 유사한 것이다. 자수 모양의 섬유조직으로 구성돼 있어 매우 강한 탄력을 지니고 있다.
연구팀은 컴퓨터 알고리즘을 활용해 이 합성 소재의 탄력 정도를 미세한 수준에서 계산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교수는 “이 알고리즘을 활용해 문어·갑오징어 피부처럼 주변 환경에 따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피부 제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생물 등 자연을 흉내 낸 기술을 ‘생체모방 기술(Biomimetics)’이라고 한다. 연잎의 물방울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방수복’을 만들었으며, 도꼬마리 가시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벨크로(접착포)를 만들어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다.
그러나 문어·갑오징어와 같은 연체동물을 활용해 변형이 가능한 피부를 만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피쿨 교수는 “이 새로운 기술이 상용화돼 삶의 현장에 적용될 경우 그 활용가치가 매우 다양해 산업 측면에서 놀라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배니싱 인터페이스(vanishing interfaces)’ 기능이다. 웹에 화면에서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능인 대시보드(dashboard) 기능을 말한다.
연구팀은 “이 기능을 의류나 가죽, 기타 다양한 물질 표면에 적용할 경우 놀라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면서 “디스플레이는 물론 빌딩 및 도시 설계,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각종 공산품 디자인 등에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날씨에 따라 디스플레이가 변화하는 다양한 제품들을 상상할 수 있다. 피쿨 교수는 “그러나 사용자가 원치 않으면 어떤 디스플레이라도 즉시에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디스플레이 변형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이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 기관은 미국 육군 연구소(U.S. Army Research Office)다. 연구소에서는 이 기술을 통해 위장능력과 함께 미래 로봇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프트 로보틱스 기술을 확보하기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영화 ‘엑스맨’에 등장하는 돌연변이 여인 ‘미스틱’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습을 변형시킬 수 있다. 과학자들을 통해 이 ‘미스틱’과 같은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일들이 생체모방 기술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지난 13일 ‘사이언스’ 지에 게재된 피쿨 교수 연구팀의 논문 제목은 ‘Stretchable surfaces with programmable 3D texture morphing for synthetic camouflaging skins’이다.
- 이강봉 객원기자
- aacc409@naver.com
- 저작권자 2017-10-16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