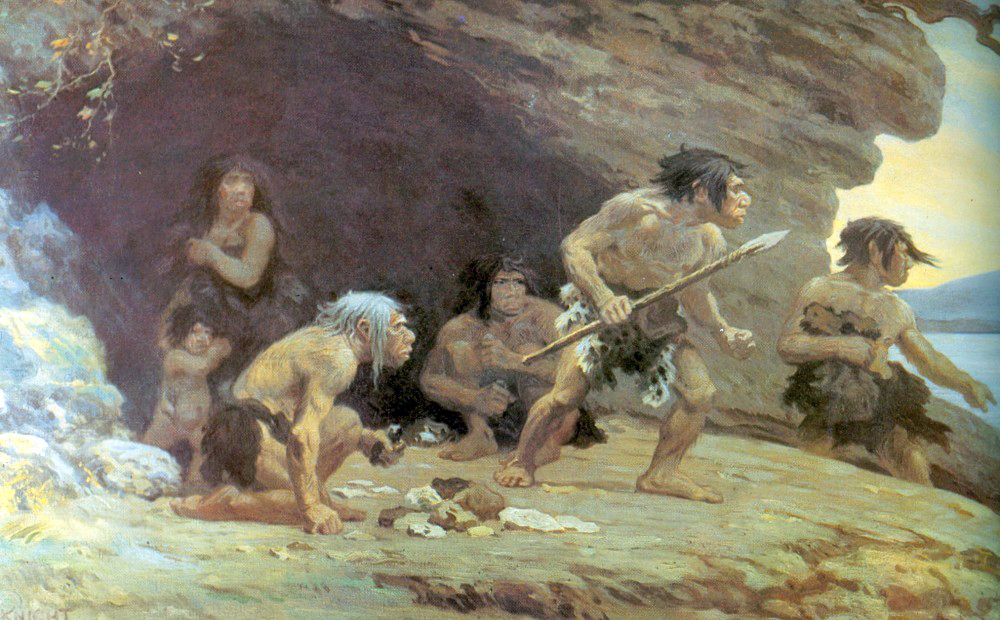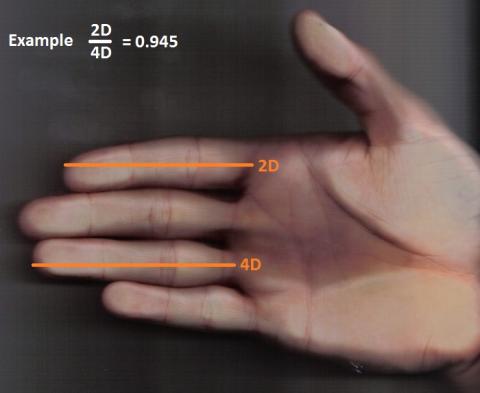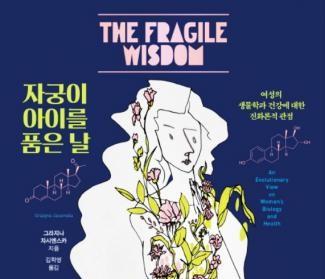UC 리버사이드(UC Riverside) 대학 연구팀은 동물의 가계도에서 가장 먼저 출현한 좌우대칭동물(bilaterian)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지질학자들은 동물의 초기 형태는 앞과 뒤, 혹은 좌우가 대칭을 이룬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가장 오래된 좌우대칭동물을 찾고 있었다.
호주에서 발견한 ‘이카리아 와리오티아’(Ikaria wariootia)라는 이름의 이 작고 지렁이 같은 생물은 좌우가 대칭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양쪽 끝에 내장으로 연결된 개구부를 가진 유기체라고 UC리버사이드 대학 연구팀은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PNAS) 저널에 발표했다.

해면이나 해조류 같은 초기의 다세포 유기체는 다양한 모양을 가진다. 총체적으로 에디아카라 생물군(Ediacaran Biota)이라고 하는 이 집단은 복잡한 다세포 유기체의 가장 오래된 화석을 남겼다.
그러나 이들은 입이나 내장같이 대부분의 동물들이 가진 기본적 특징이 없다. 흔히 선캄브리아대 최후에 살았던 벌레인 디킨소니아(Dickinsonia)에 속하는 것으로, 과학자들은 이들이 오늘날의 동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물의 발달에서 쌍방향 대칭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유기체가 대칭을 이뤄야 유기체는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신체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벌레부터 곤충, 공룡, 인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동물이 이와 같이 기본적인 좌우대칭 형태를 갖는다.
현대 동물의 유전학을 연구하는 진화생물학자들은 모든 좌우대칭동물 중 가장 오래된 조상은 초보적인 감각기관을 가지면서 동시에 아주 단순하고 작았을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그러한 동물의 화석을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지만 어렵다고 생각해왔다.
3차원 레이저 스캔으로 형태 복원
그런데 이번에 UC리버사이드 대학 연구팀이 이 좌우대칭동물의 모습을 복원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지난 15년 동안, 과학자들은 남호주 닐페나(Nilpena)에 있는 5억 5500만 년 된 에디아카라 시대(Ediacaran Period)의 퇴적물에서 발견된 아주 작은 동굴의 화석이 좌우대칭동물의 흔적이라는 사실에 동의했다. 그렇지만 굴을 만든 생물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아 과학자들은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UC 리버사이드에서 최근 박사학위를 마친 스콧 에반스(Scott Evans)와 메리 드로저(Mary Droser) 지질학 교수는 이 굴 중 일부에서 작은 타원형의 흔적을 복원했다. NASA의 도움을 받은 이들은 3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사용해서 동물의 공통 조상이라고 생각되는 벌레의 형태를 복원했다,

이들이 발견한 벌레는 머리와 꼬리가 뚜렷하고 희미하게 홈이 패인 원통형의 규칙적이고 일관된 모양을 지녔다. 길이는 2~7㎜에 너비는 1~2.5 ㎜로, 쌀알 크기와 모양은 굴을 만들기에 적합했다.
벌레같이 근육수축 운동으로 이동
UC 샌디에이고의 이안 휴즈(Ian Hughes)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박물관의 제임스 겔링(James Gehling)을 포함한 연구팀은 이 동물의 이름에 원주민의 언어를 사용했다. 이들이 지은 속명인 이카라아는 아드냐마탄하(Adnyamathanha) 언어로 ‘만나는 장소’를 뜻한다.
이카리아의 굴은 다른 어떤 것보다 낮은 곳에 존재한다. 드로저 교수는 “이것이 이런 종류의 복잡성으로 가진 화석 중 가장 오래된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비교적 단순한 모양에도 불구하고 이카리아는 이 시기의 다른 화석에 비해 복잡했다. 그것은 이카리아가 잘 발달된 해저 모래의 얇은 층을 파고들면서 산소를 찾아가는 초보적인 감각 능력을 가졌음을 나타낸다.
굴은 또한 V자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는 이카리아가 벌레처럼 몸 전체 근육을 수축시키면서 움직였음을 시사한다. 아키리아의 이동흔적은 이카리아가 아마도 입, 항문, 내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 심재율 객원기자
- kosinova@hanmail.net
- 저작권자 2020-03-26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