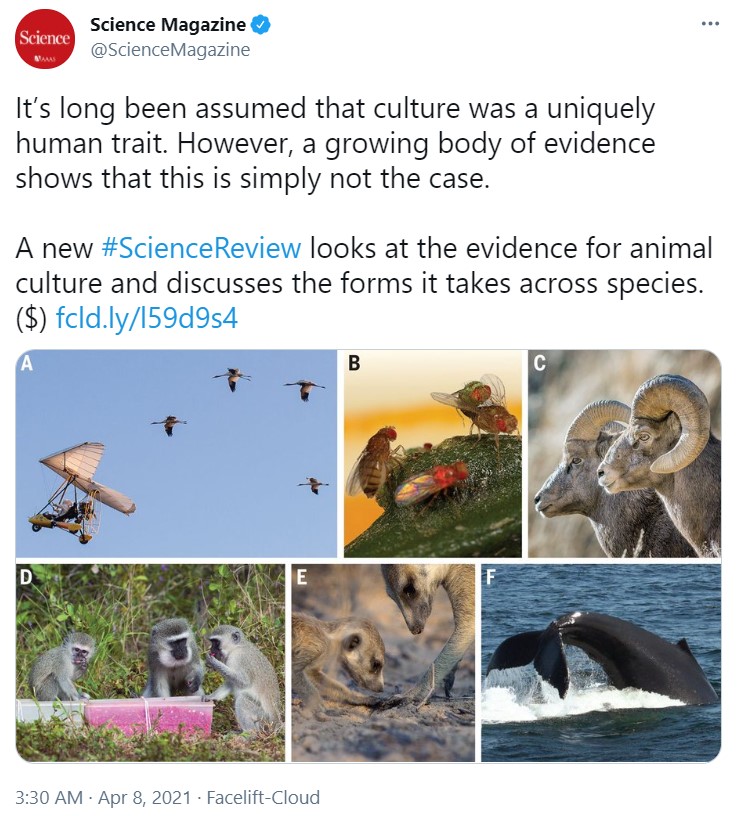‘문화’를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행동 생태학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정의는 ‘각 사회에서 학습이나 흉내내기를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전통’을 말한다. 일본 고시마 섬에 사는 원숭이는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는 행동이나 코트디부아르의 타이 국립공원에 사는 침팬지들이 딱딱한 견과류를 윗돌과 아랫돌을 가져다 사이에 놓고 깨먹는 행동, 향유고래나 혹등고래가 집단에 따라 조금씩 다른 발성법을 사용하는 것 등이 모두 문화 현상으로 간주된다.
특히, 사람의 언어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새나 여러 포유류의 발성 문화는 아주 어렸을 때 배울 수 있는 시기가 있다. 이 시기에 어린 개체들이 언어나 발성을 배우지 못하면 집단 고유의 언어와 발성 문화는 위기를 맞게 된다. 사람에게서는 외래어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고유의 언어문화를 잃게 되는 것, 지역의 방언이 사라지는 것이 이와 같은 현상이다. 최근 ‘로열 소사이어티’지에 실린 논문은 멸종 위기에 처한 호주의 ‘꿀빨이새(regent honeyeaters)’들에게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었다고 보고했다.
꿀빨이새들은 수백 마리씩 떼를 지어 호주의 남동부를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인간의 영향으로 서식지를 잃으면서 최근에는 2-400마리 수준으로 개체수가 많이 감소했다. 꿀빨이새 수컷들은 짝짓기를 하거나 영역 보호를 위해 더 성숙한 개체들로부터 노래를 배우는데, 대개 태어나 1년 이후 즈음까지 발성을 배우는 것을 마친다. 짝짓기와 영역 확보는 생존과 번식에 직결되는 문제로, 이를 위해 종 고유의 정확한 발성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빠 새는 새끼 새들이 다 자라도록 둥지 근처에서 노래하지 않고, 다 자란 새들은 둥지를 떠나 날아가야 하므로 새끼 새들은 아빠 새가 아닌 다른 수컷 새들로부터 발성을 배우게 된다. 따라서, 개체수의 감소에 따라 다른 수컷 새들을 접하기 어려운 환경은 어린 새들이 발성을 배우는데 불리한 환경이 된다.
개체수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이들의 발성 문화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진은 2015년 7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서식지 내 1,367개 장소에서 수집한 정규 모니터 자료와 호주 최대의 독립 비영리 조류보호단체에 시민 과학자들이 참여해 모은 데이터, 그리고 1986년과 2011년 사이 녹음한 자료들을 토대로 비교 분석을 했다.
꿀빨이새 수컷이 내는 발성은 고양이 같은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 울음과 꽥꽥거리는 소리의 경보 울음, 그리고 뚜렷이 구별되는, 머리를 흔들면서 목이 쉰 듯한 소리를 점점 크게 내는 울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진은 각 소리가 종 고유의 소리인지 다른 종들과 섞인 소리인지를 구분하고 이것이 수컷들의 밀집도와 연관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 소리를 녹음한 각 수컷들 근방에 관찰되는 다른 수컷들의 수를 세었다. 또한, 각 새소리의 복잡성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산했다. 마지막으로 수컷 새들이 부르는 노래와 번식 성공률과의 관계를 알기 위해 각각 이 수컷들이 암컷과 짝을 이루고 있는지와 둥지에 알이 생겼는지 그 알에서 부화한 새끼가 잘 성장했는지와 비교했다.
분석 결과 가까이에 사는 수컷들은 130km 이상 멀리 살고 있는 수컷보다 서로 더 비슷한 소리를 냈다. 새들이 근방에 사는 다른 새의 소리를 듣고 배운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전체적으로는 대략 27%의 수컷 새는 자기 종 고유의 소리와 다른 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 새들은 근방에 동종의 새들의 밀집도가 현저히 낮은 새들이었다. 이렇게 종 고유의 소리를 잃은 수컷들은 암컷과 짝을 이루는 확률도 더 낮았고, 짝을 이루더라도 둥지에 알을 낳는 확률이 더 낮았다. 다만, 새끼가 성체가 되는 것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변에 다른 수컷들이 없는 새들에게 종 고유의 소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어 다른 종의 소리를 배운 뒤에 번식에 불리한 부적응(maladaptation)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연구진은 해석했다.
새소리의 복합성에 대한 분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들의 소리가 복합성이 낮아지고 단순해지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단순화 현상은 현재 새들의 밀도가 높은 지역보다 낮은 지역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사람의 언어와 마찬가지로, 개체의 수와 밀도가 낮아지면 고유의 새소리가 점점 쇠퇴해간다는 것을 보이고, 꿀빨이새들의 번식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인 흥미로운 연구다. 또한, 연구진은 생물다양성 감소와 맞물려 다양한 새 종이 개체수 감소를 보이는 상황에서 새소리라는 문화 현상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여러 보존 프로그램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다.
- 한소정 객원기자
- sojungapril8@gmail.com
- 저작권자 2021-04-06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