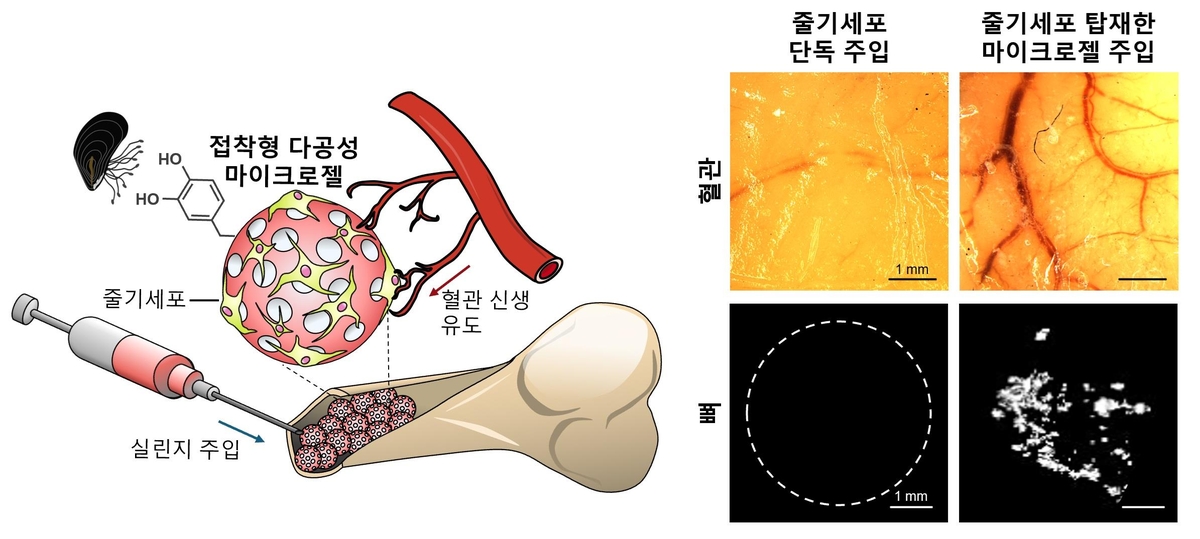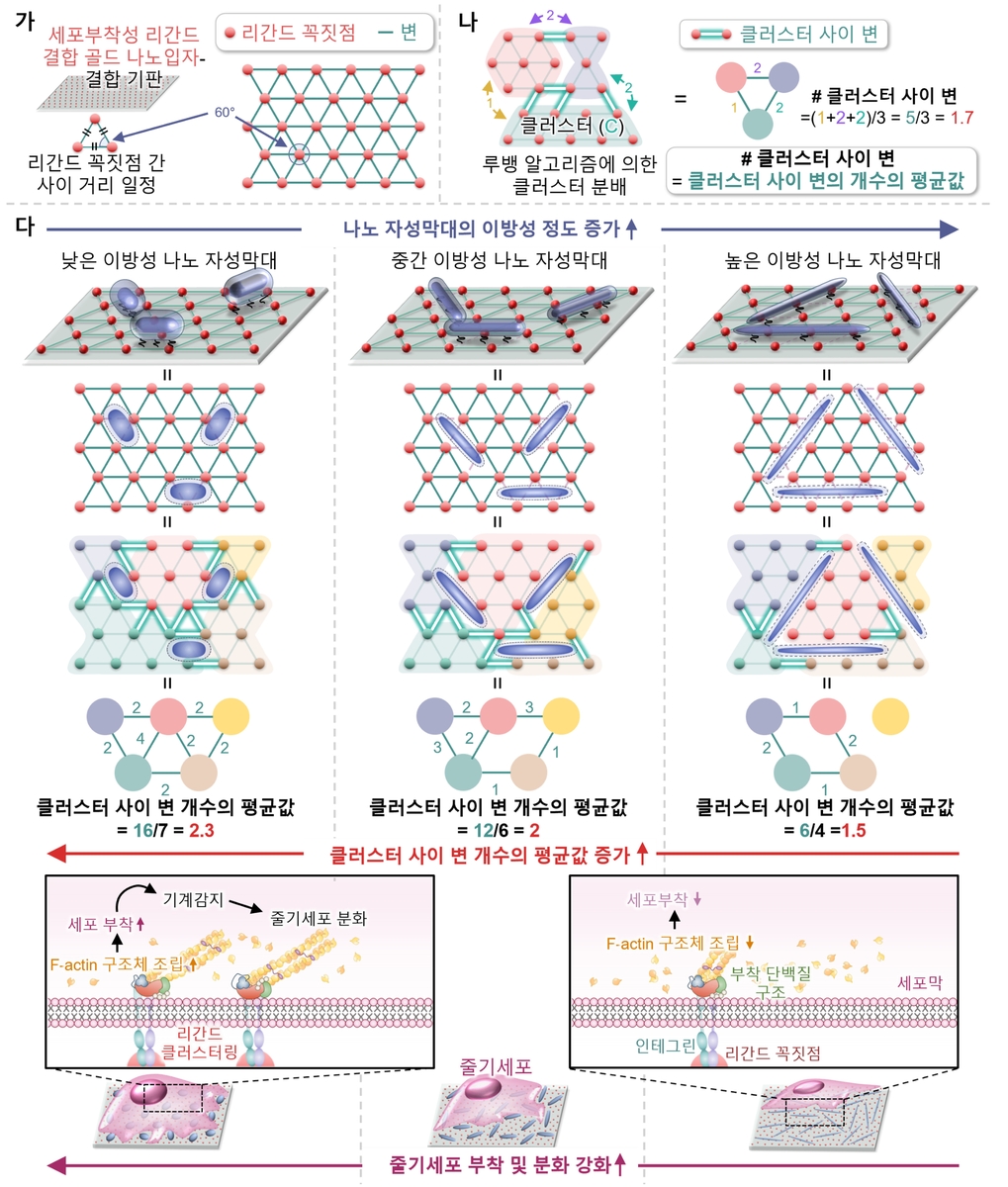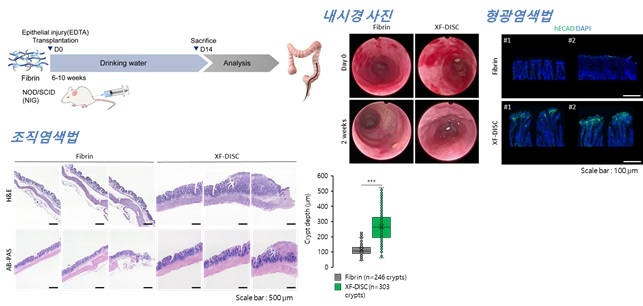세계 최초로 살아있는 로봇(living robot)이 탄생했다.
이 로봇은 남아프리카산 개구리인 제노푸스(Xenopus laevis)의 배아줄기세포를 증식시켜 만든 세계 최초의 기계‧동물의 혼합체다.
연구진은 ‘제노봇(Xenobots)’라고 명명한 이 작은 로봇이 ‘생명이 있는 로봇’으로 세포가 손상되더라도 스스로 회복이 가능해 어려운 상황에서 생명을 지속해나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개구리 줄기세포로 3D 로봇 제작에 성공
이번 연구는 미국 터프츠 대학, 버몬트 대학 등의 공동 연구진이 진행했다.
14일 ‘가디언’, ‘텔레그라프’, ‘와이어’ 지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제노봇’을 활용해 동맥경화를 치료하고, 독성이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연구에 참여한 버몬트 대학의 컴퓨터과학자이면서 로봇공학자인 조수아 봉가드(Joshua Bongard) 박사는 “이전의 로봇도 아니고, 어떤 종(種)의 생명체도 아닌 새롭게 프로그램 된, 살아있는 유기조직체가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유전자코드를 복제해 살아있는 유기조직체를 재생시키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다. 형광 해파리와 돼지의 유전자를 합성해서 만든 유전자 조작 생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형광돼지’가 대표적인 경우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작업을 통해 살아있는 생물학적 기계(biological machines)인 로봇 생명체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진은 이 스스로 살아있는 로봇 ‘제노봇’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 버몬트 대학에 있는 슈퍼컴퓨터 ‘슈퍼 그린(Super Green)’과 함께 컴퓨터 전문가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터프츠 대학 연구진은 버몬트 대학에서 설계한 알고리즘을 통해 특정 목적을 위한 가상의 심장, 피부 등을 3D 영상으로 설계한 후 개구리 배아줄기세포를 조작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로봇 생명체의 모습을 구현해나갔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제작한 초소형 전기 칼(electric knife), 전기 가위(electric forceps) 등을 통해 줄기세포를 형상화해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한 설계도를 완성시켜나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미 국립과학원회보(PNAS) 13일 자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A scalable pipeline for designing reconfigurable organisms’이다.
생체실험, 미세 플라스틱 등 오염물 제거
연구진은 논문을 통해 전통적인 개념의 로봇은 강철, 화학물질, 플라스틱 등의 소재로 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생태적으로 독성이 있는 소재들 때문에 유기체를 다루는 생물학, 의료계 등에서는 생명체와 연관된 실험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많은 과학자들이 독성이 없는 줄기세포를 통해 로봇처럼 움직일 수 있는 로봇 생명체를 제작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의한 살아있는 로봇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로봇 생명체 구현이 가능했던 것은 줄기세포의 특이한 속성 때문이다.
연구에 참여한 터프츠 대학의 마이클 레빈(Michael Levin) 박사는 “‘제노봇’ 제작에 사용한 줄기세포는 100% 제조푸스 개구리로부터 채취한 것이지만 이 세포로 로봇을 만들었을 때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레빈 박사는 “개구리 줄기세포가 주변 환경에 따라 이전과 전혀 다른 형태로 변모했으며, 이를 속성을 살려 특정한 목적에 맞는 로봇 생명체 제작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논문을 통해 제노봇은 생체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완벽할 정도로 생체에 적합한 로봇이라고 말했다.
또한 프로그래밍에 따라 다양한 줄기세포로 필요한 모습의 장기들을 설계해나갈 수 있으며, 생명체와 연관된 실험은 물론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지속적인 로봇 작업에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조수아 봉가드 박사는 “사람의 상상력에 따라 이전에 기계에 의한 로봇이 수행하지 못했던 기능을 무한대로 확대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대하고 있는 것은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한 생체 실험과 의약품 개발, 산업현장에서 독성제거 작업, 바다와 강 등의 오염된 환경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생태계 구조를 다시 정상화하는 일 등이다.
- 이강봉 객원기자
- aacc409@naver.com
- 저작권자 2020-01-15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