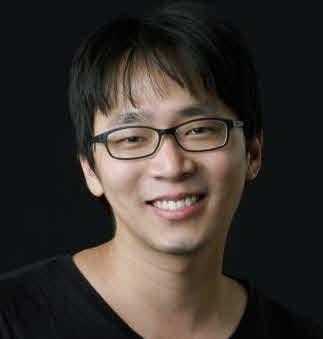아르코미술관에서 ‘2012 아르코미술관 미디어 프로젝트: 언바운드 아카이브 Unbound Archive' 전을 개최한다. 다음달 2일까지 진행될 전시회에서는 현재 미디어아트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다.
이번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관람객들이 직접 해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이다. 작품해석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 노트, 다이어리, 스케치, 인터뷰 영상 등을 함께 배치해 둔 것도 이 때문이다.
영화가 새로운 미디어아트로 탄생
‘언바운드 아카이브’에는 15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그 중 3명은 ‘아르코미디어 비평 총서 시리즈’에 동참한 작가다. 정은영 작가는 전시회 1층에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다. ‘마스터클래스, 뜻밖의 응답, 무영탑, 오프/스테이지: 조영숙 Off/Stage, 오프/스테이지: 이소자 Off/Stage ’ 총 5개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정 작가는 한국 패미니즘 아티스트 중 한 명이다. 이번 미디어아트 작품은 80년대 직접 무대에서 했던 국극을 영상에 담은 것. 특징이라면 배우가 모두 여성이라는 점이다. 이 영상을 통해 젠더가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노재운 작가는 엄청난 영화광이다. 올드무비에서 현재 영화까지 거의 모든 영화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업은 영화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이 많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 ‘ 신세계, 여성이 정체, 캐롤 앤을 찾아서, 오 솔레미오, 얼음여왕’도 영화에서 이미지를 따와서 교묘하게 편집돼 있다. 하지만 본인의 말소리와 음악이 새롭게 덧입혀져 있어 오리지널 영상과는 다른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
안정주 작가는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했다. 예를 들어 ‘립싱크 프로젝트’ 작품에서는 아카이브 자료 위에 있던 말하는 사람을 다 뜯어내버렸다. 그래서 관람객이 ‘왜 이 자리가 비었지?’라는 궁금증이 생기도록 만들어졌다. 이 외에도 이번 전시회에서는 ‘ Their War 2, The Bottles, Troll’를 선보이고 있다.
인간에 대한 다양한 시선 작품화
12명의 작가들은 ‘2012년 아르코미디어 작품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그들의 작품을 굳이 분류해보자면 사회와 개인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이라는 분류에는 6명의 작가가 인간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작품화했다.
김도희 작가의 ‘회상몽’ 중첩되고 분열된 자아의 모습을 보여준다. 화면에 한 여자가 천천히 세 가지 꿈을 동시에 늘어놓지만, 3개 층으로 오버랩돼 들려지는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다. 이는 중첩되고 분열된 자아의 모습을 보여준다.
리금홍 작가는 ‘치네리 힌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는 몽골에서 몽골인들에게 이름과 희망을 묻는 모습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영상에 담았다. 누구에게나 한 가지씩 소망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영상을 통해 우리 모두가 희망이라는 성분을 갖고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3형제가 한 팀을 이룬 무진브라더스는 ‘적막의 시대’라는 작품을 내놓고 있다. 이 영상에서는 빛도 들어오지 않는 축축한 옥탑 창고 같은 곳에서 하루 종일 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며 시간을 보내는 한 여자가 보인다. 그들은 작품을 통해 소외되고 외로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박민한 작가는 오랜 시간 외국 생활로 인해 집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 그는 이케아(IKEA) 가구 홍보 영상을 편집한 ‘익명의 날들의 꿈’이란 작품을 통해 집이라는 소재로 불안정한 삶에 대한 고찰을 그려내고 있다.
‘어느 여름 저녁’의 박성연 작가는 대화를 하는 사람들의 손짓에 주목해 영상을 만들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주의 깊게 보지 못한 손의 움직임에 주목한 작품이다. 이는 보편적인 것에 대해 특별한 가치를 부여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장규정 작가의 ‘더 마운틴’은 작가적 상상이 돋보인 작품이다. 나쁜 기억이나 감정이 생기면 몸속에 어두운 덩어리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작가. 그럴 때마다 몸과 집안을 청소하고 정돈하면 안정을 되찾고 하는데, 이를 모티브로 몸속을 청소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사회 문제를 제기한 작품들 선 보여
나머지 6개는 사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작품이다. ‘판문점 양수리 세트장-공동감시구역’은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를 함께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 상황이 영화적 상상력과 편집기술에 의해 변조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가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김혜지 작가는 인천의 3D 홍보영상들을 편집한 작품이다. '어디선가 누군가에게‘라는 작품은 많은 개발로 행복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이 영상이 과연 우리에게 유토피아인지 디스토피아인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노기훈 작가의 ‘거즈 드레싱, Gauze Dressing’ 은 5·18 민주화 운동에 희생된 인물 사진 위에서 성형하는 행위를 보여준다. 작가는 이미지를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 ‘보기 싫은 과거’가 ‘보기 좋은 과거’로 날조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작품 ‘보편적 이야기’는 군 복무 시절을 찾아가는 여정을 영상에 담았다. 신정균 작가의 기억에 의존하면서 만들어진 이 작품은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통과의례처럼 경험하는 군생활이 보편적인 것인지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임선희 작가는 원래 페인팅 작가였다. 내 방안의 풍경’에서도 예전의 작업 방식과 버무려져 있어 색다른 영상미가 느껴진다. 드라마의 한 씬을 페인팅으로 그려 영상의 배경으로 만들고 작가 본인이 그 영상의 주인으로 등장해 그 공간을 자기 공간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는 공적인 것과 사적으로 것이 불분명해진 사회에 대한 생각이 담긴 작품이다.
장종한 작가의 ‘이상한 돌’은 쇼핑몰로 인해 화려하고 윤택한 것처럼 보이는 작가의 동네에 대한 고찰을 확장한 작품이다. ‘이상한 돌’은 쇼핑몰처럼 현대도시의 외관을 빗대 표현됐다. 하지만 정작 작가는 겉모습만큼 현대인들의 정신도 풍요로운지를 묻고 있다.
이번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관람객들이 직접 해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이다. 작품해석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 노트, 다이어리, 스케치, 인터뷰 영상 등을 함께 배치해 둔 것도 이 때문이다.
영화가 새로운 미디어아트로 탄생
‘언바운드 아카이브’에는 15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그 중 3명은 ‘아르코미디어 비평 총서 시리즈’에 동참한 작가다. 정은영 작가는 전시회 1층에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다. ‘마스터클래스, 뜻밖의 응답, 무영탑, 오프/스테이지: 조영숙 Off/Stage, 오프/스테이지: 이소자 Off/Stage ’ 총 5개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정 작가는 한국 패미니즘 아티스트 중 한 명이다. 이번 미디어아트 작품은 80년대 직접 무대에서 했던 국극을 영상에 담은 것. 특징이라면 배우가 모두 여성이라는 점이다. 이 영상을 통해 젠더가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노재운 작가는 엄청난 영화광이다. 올드무비에서 현재 영화까지 거의 모든 영화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업은 영화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이 많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 ‘ 신세계, 여성이 정체, 캐롤 앤을 찾아서, 오 솔레미오, 얼음여왕’도 영화에서 이미지를 따와서 교묘하게 편집돼 있다. 하지만 본인의 말소리와 음악이 새롭게 덧입혀져 있어 오리지널 영상과는 다른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
안정주 작가는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했다. 예를 들어 ‘립싱크 프로젝트’ 작품에서는 아카이브 자료 위에 있던 말하는 사람을 다 뜯어내버렸다. 그래서 관람객이 ‘왜 이 자리가 비었지?’라는 궁금증이 생기도록 만들어졌다. 이 외에도 이번 전시회에서는 ‘ Their War 2, The Bottles, Troll’를 선보이고 있다.
인간에 대한 다양한 시선 작품화
12명의 작가들은 ‘2012년 아르코미디어 작품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그들의 작품을 굳이 분류해보자면 사회와 개인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이라는 분류에는 6명의 작가가 인간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작품화했다.
김도희 작가의 ‘회상몽’ 중첩되고 분열된 자아의 모습을 보여준다. 화면에 한 여자가 천천히 세 가지 꿈을 동시에 늘어놓지만, 3개 층으로 오버랩돼 들려지는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다. 이는 중첩되고 분열된 자아의 모습을 보여준다.
리금홍 작가는 ‘치네리 힌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는 몽골에서 몽골인들에게 이름과 희망을 묻는 모습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영상에 담았다. 누구에게나 한 가지씩 소망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영상을 통해 우리 모두가 희망이라는 성분을 갖고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3형제가 한 팀을 이룬 무진브라더스는 ‘적막의 시대’라는 작품을 내놓고 있다. 이 영상에서는 빛도 들어오지 않는 축축한 옥탑 창고 같은 곳에서 하루 종일 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며 시간을 보내는 한 여자가 보인다. 그들은 작품을 통해 소외되고 외로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박민한 작가는 오랜 시간 외국 생활로 인해 집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 그는 이케아(IKEA) 가구 홍보 영상을 편집한 ‘익명의 날들의 꿈’이란 작품을 통해 집이라는 소재로 불안정한 삶에 대한 고찰을 그려내고 있다.
‘어느 여름 저녁’의 박성연 작가는 대화를 하는 사람들의 손짓에 주목해 영상을 만들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주의 깊게 보지 못한 손의 움직임에 주목한 작품이다. 이는 보편적인 것에 대해 특별한 가치를 부여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장규정 작가의 ‘더 마운틴’은 작가적 상상이 돋보인 작품이다. 나쁜 기억이나 감정이 생기면 몸속에 어두운 덩어리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작가. 그럴 때마다 몸과 집안을 청소하고 정돈하면 안정을 되찾고 하는데, 이를 모티브로 몸속을 청소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사회 문제를 제기한 작품들 선 보여
나머지 6개는 사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작품이다. ‘판문점 양수리 세트장-공동감시구역’은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를 함께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 상황이 영화적 상상력과 편집기술에 의해 변조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가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김혜지 작가는 인천의 3D 홍보영상들을 편집한 작품이다. '어디선가 누군가에게‘라는 작품은 많은 개발로 행복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이 영상이 과연 우리에게 유토피아인지 디스토피아인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노기훈 작가의 ‘거즈 드레싱, Gauze Dressing’ 은 5·18 민주화 운동에 희생된 인물 사진 위에서 성형하는 행위를 보여준다. 작가는 이미지를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 ‘보기 싫은 과거’가 ‘보기 좋은 과거’로 날조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작품 ‘보편적 이야기’는 군 복무 시절을 찾아가는 여정을 영상에 담았다. 신정균 작가의 기억에 의존하면서 만들어진 이 작품은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통과의례처럼 경험하는 군생활이 보편적인 것인지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임선희 작가는 원래 페인팅 작가였다. 내 방안의 풍경’에서도 예전의 작업 방식과 버무려져 있어 색다른 영상미가 느껴진다. 드라마의 한 씬을 페인팅으로 그려 영상의 배경으로 만들고 작가 본인이 그 영상의 주인으로 등장해 그 공간을 자기 공간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는 공적인 것과 사적으로 것이 불분명해진 사회에 대한 생각이 담긴 작품이다.
장종한 작가의 ‘이상한 돌’은 쇼핑몰로 인해 화려하고 윤택한 것처럼 보이는 작가의 동네에 대한 고찰을 확장한 작품이다. ‘이상한 돌’은 쇼핑몰처럼 현대도시의 외관을 빗대 표현됐다. 하지만 정작 작가는 겉모습만큼 현대인들의 정신도 풍요로운지를 묻고 있다.
- 김연희 객원기자
- iini0318@hanmail.net
- 저작권자 2012-10-29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