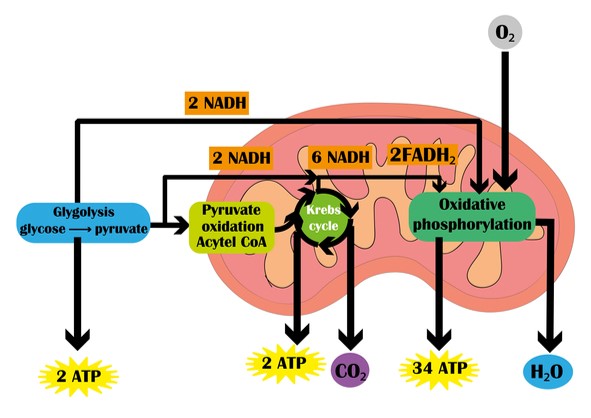당뇨병은 대사증후군 즉 만성 성인병의 대표적 질환으로 꼽힌다. 우리 나라 사람 10명 중 1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고, 당뇨병 전단계까지 포함하면 10명 중 3명이 당뇨병 환자이거나 잠재적 당뇨병 환자다. 2030년쯤이면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는 5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당뇨병은 우리 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다. 비만 증가와 함께 급속히 늘어나 2035년에는 6억명 가까이가 당뇨를 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음식 조절과 운동이 필수적이다. 음식 조절에 대해서는 인술린 저항성을 줄이기 위해 설탕을 제한하라는 등 세부사항이 많이 알려져 있으나 운동은 개인별 신체능력이나 선호도가 달라 방법도 다를 수 있다.
운동 많이 하면 할수록 도움돼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진은 최근 일주일에 150분 동안 빨리 걷거나 사이클링을 하면 2형 당뇨병을 26%나 줄일 수 있다는 연구를 내놨다. 또 매일 중간 강도와 고강도 운동을 한 시간씩 하는 사람은 당뇨 위험을 40%나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을 얼마 만큼 하건 양에 관계 없이 당뇨 발병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당뇨병 학술지인 ‘다이베톨로지아’(Diabetologia) 최근호에 게재됐다.
영국 보건부는 중간강도에서 고강도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빨리 걷기나 가벼운 사이클링 혹은 테니스 복식경기 같은 스포츠가 포함된다. 2012년도에 실시한 영국 국민건강조사에 따르면 영국 성인의 3분의 1 정도는 이런 운동 목표에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명 이상으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분석한 이번 연구는 운동을 조금이라도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통상적인 권장량을 넘어서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00만명 이상 대상 23개 연구 분석
이번 연구는 미국과 아시아, 호주와 유럽에서 수행한 23개 연구로부터 얻은 자료를 분석했다. 이들 연구에서 관찰된 결과들을 취합 분석한 결과 연구진은 여러 행동요인들로부터 휴식시간의 신체활동 효과를 분리하고, 서로 다른 각 신체활동 단계들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었다. 이전의 연구들은 식이와 신체활동 변화를 모두 포함하기도 해 순수하게 운동 효과만을 분리해 내기가 어려웠다.
연구를 수행한 안드레아 스미스 연구원(케임브리지대 UCL 건강행동연구 및 공중보건연구소)은 “이번 연구는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2형 당뇨병을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해 운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정부의 보건정책에도 유용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논문의 공저자인 소런 브라지(Soren Brage) 박사(케임브리지대 의학연구협의회 역학분과)는 “연구 결과 운동을 하는 것은 유익하지만, 많이 할수록 더 좋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정책적으로 사람들이 매일 운동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 잘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짧은 시간에 효과 높은 인터벌 운동
한편 지난 9월 미국생리학회 저널 ‘심장과 순환생리학’에는 저강도와 고강도 운동을 번갈아 가며 하는 인터벌 운동이 특히 당뇨환자들에게 혈관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연구가 발표돼 이번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본지 9월28일자 ‘혈관 건강에 좋은 인터벌 운동’).
인터벌 운동은 고강도 운동 사이에 하는 저강도 운동 혹은 짧은 휴식시간에 산소를 흡입하는 양이 많아 운동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 트레이닝법은 체코의 육상선수인 에밀 자토펙을 통해 알려졌다. 자토펙은 이 이 방법으로 훈련해 1952년 제15회 헬싱키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비롯, 1만m와 5000m 경주에서 세 개의 금메달을 따냈다. 이후 많은 프로선수들이 인터벌 트레이닝으로 훈련을 하고 있고, 짧은 시간에 운동효과가 높아 체중을 줄이거나 체력을 키우려는 일반인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위 연구에서는 인터벌 운동을 20분으로 정하고 앞뒤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2~3분 한 후 1분간 7회씩 각각 고강도 운동과 저강도 운동을 번갈아 하도록 했다. 연구팀은 잡아당기거나 미는 저항성 인터벌 운동으로 실험을 했으나, 걷기나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 여러 운동에 적용해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김병희 객원기자
- kna@live.co.kr
- 저작권자 2016-10-21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