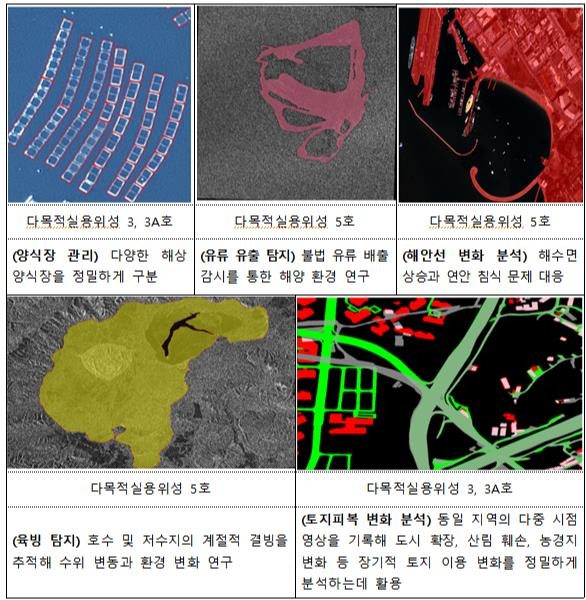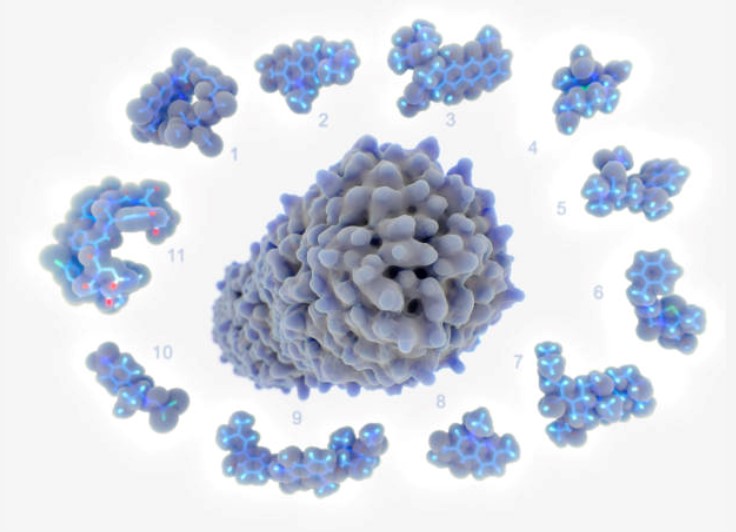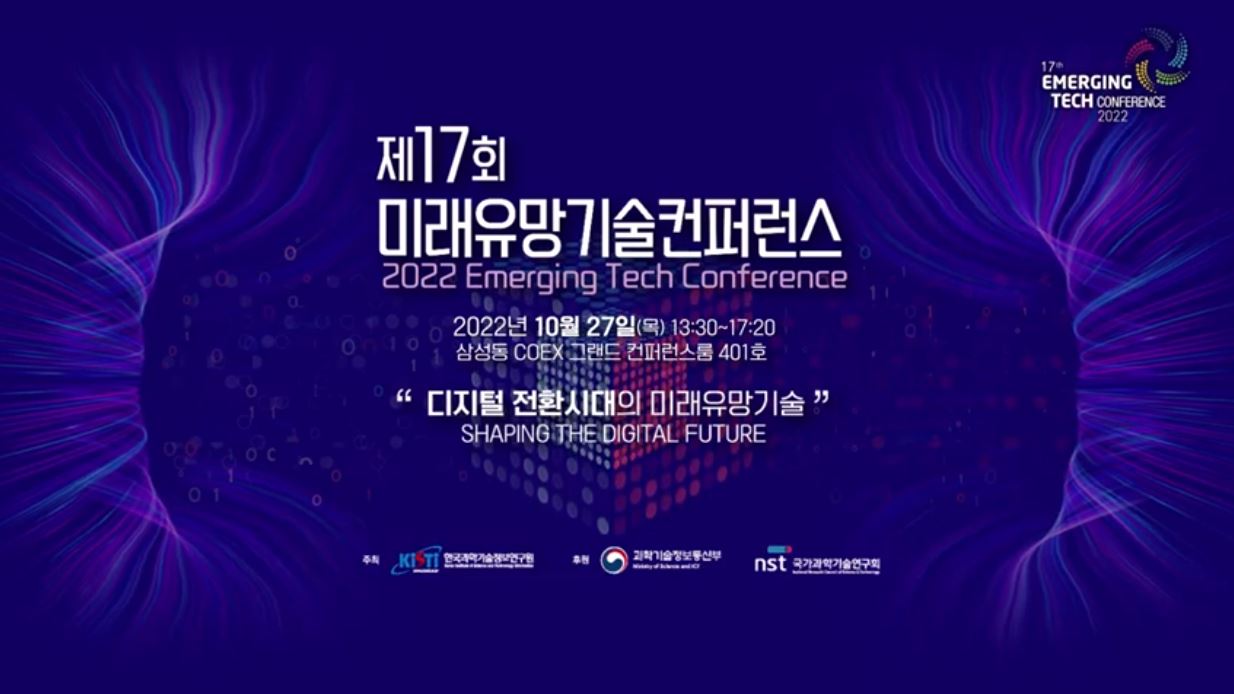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빅데이터가 ‘21세기 원유’로 각광받고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능력을 갖춘 데이터 과학자가 미래 유망직종으로 뜨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유망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키워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데이터 연금술사 : Road to Data Scientists’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5회 과총 데이터 사이언스 포럼은 그 방안을 찾고 앞으로의 전망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데이터 과학, 이공계만의 전유물 아냐”
박성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전 원장은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빅데이터 사용 및 활용 능력’은 56위다. 이는 터키, 브라질, 페루, 멕시코 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데이터 활용능력을 갖춘 전문가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박 전 원장에 따르면 2018년 1월 기준 105개 대학에서 학사 프로그램을, 144개 대학에서 석사 프로그램을, 59개 대학에서 박사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영국과 독일,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데이터 과학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데이터 과학 교육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는 28개 대학교에서 이를 실시 중이다.
박 전 원장은 “데이터 과학은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찾아내고 필요한 정보를 창출해 이를 실무에 활용하는 것을 연구하는 융합과학이다.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뿐 아니라 그것을 꿰뚫어보는 인문학적 이해력과 통찰력이 필요하다”라며 “그렇기에 데이터 과학은 이공계 전공자만의 전유물은 아니다”라고 소개했다.
때문에 그 커리큘럼도 대학마다 상이하다는 것이 박 전 원장의 분석이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컴퓨터공학, 전산과학, 통계학, 경영학 등이 혼합된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과학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실무 적용이다. 박 전 원장은 “다른 학문에 비해 산학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며 “기업들과 제휴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데이터 과학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데이터 기반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핵심 학문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데이터 과학자가 한국경제 성장을 끌어올리는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업 현장에서의 데이터 과학자
그렇다면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데이터 과학자의 역할은 어떨까. 데이터 분석 컨설팅 기업인 BEGAS(Best Expert Group in AnalyticS)의 김도현 대표는 “현재 스마트 홈, 스마트 헬스, 스마트 금융, 스마트 카 등 스마트 기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자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김 대표는 “산업에서 제품의 기획과 설계, 생산(제조와 공정), 유통과 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해 최소비용과 최소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스마트 팩토리가 앞으로 대세를 이룰 것”이라 전망하며 “데이터 과학자들의 능력이 더 많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데이터 과학자를 양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다.
김 대표는 “데이터 과학자는 데이터 속에서 의미있는 정보를 발굴하고 이를 비즈니스적인 가치로 연결시키는 사람”이라 정의하며 “기술 분석뿐 아니라 사업역량도 갖춰야 한다. 이는 슈퍼맨이 되길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팀을 통한 분업이다.
김옥기 (주)엔토아 데이터서비스 센터장은 “인간 슈퍼맨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데이터 라이브러리언(librarian), 데이터 저널리스트(journalist), 데이터 애널리스트(analyst), 데이터 엔지니어(engineer), 데이터 아키비스트(archivist) 등을 모아서 팀으로 데이터 과학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 김순강 객원기자
- pureriver@hanmail.net
- 저작권자 2018-10-04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