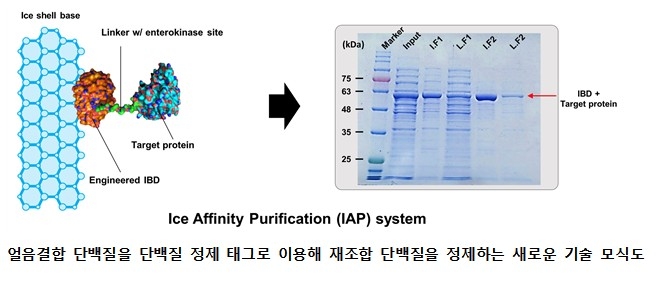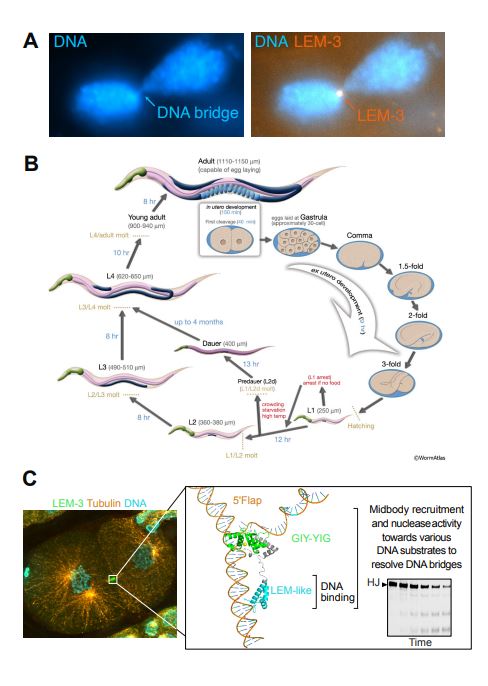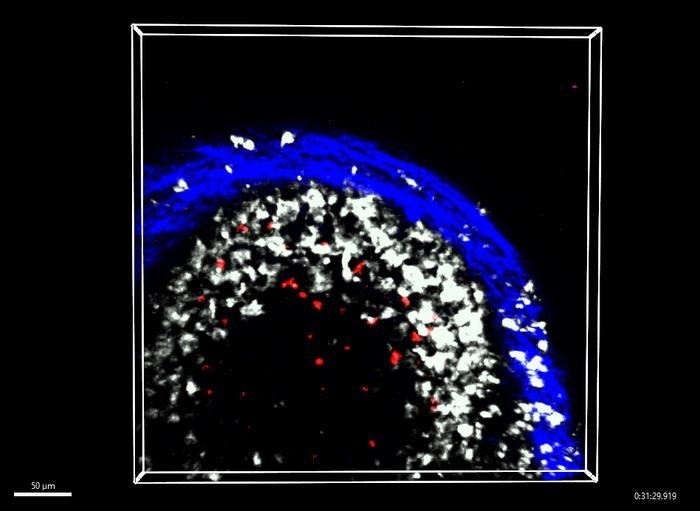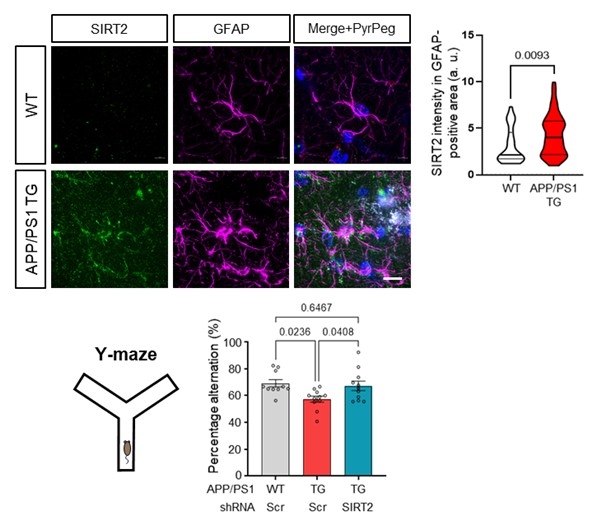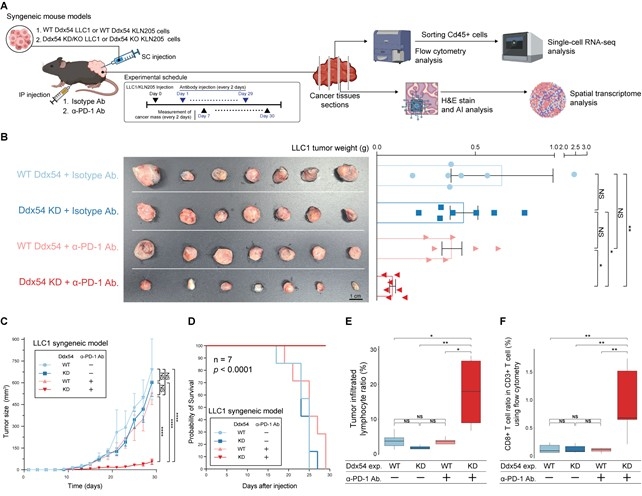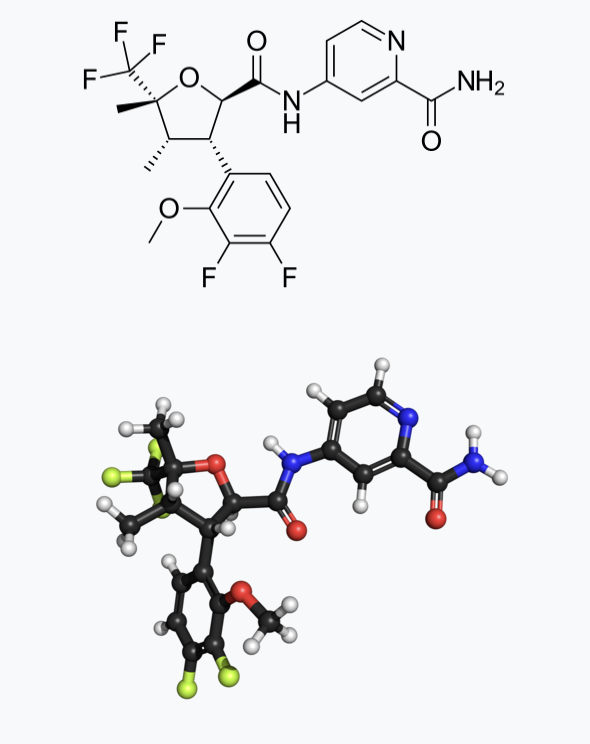지난 1일 스웨덴 카롤린스카의대 노벨위원회는미국 텍사스주립대 면역학과의 제임스 P. 앨리슨(James P. Allison) 교수, 일본 쿄토대 의과대 혼조 다스쿠(本庶佑) 교수를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 2명의 면역학자가 음성적 면역조절(negative immune regulation)을 억제하는 방식의 암치료법을 개발해 암치료 분야에 일대 혁명을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수상자를 배출한 미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졌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앨리슨 교수가 소속된 텍사스주립대 MD 암연구센터에서도 지난 주 금요일 록스타 밴드를 동원한 가운데 연구원 최초의 생리‧의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다른 과학자들도 유사한 연구 진행
이 자리에서 앨리슨 교수는 “내 연구는 ‘CTLA-4’란 단백질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단백질이 암세포와 싸우는 T세포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이해하는데 모든 것을 집중했다”며 “조만간 이 단백질을 활용한 치료법을 통해 암 환자를 완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앨리슨 교수의 연구 성과는 종래의 암 치료법과는 다른 혁명적인 시도였다. ‘댈러스 모닝 뉴스’는 7일 연구업적을 다룬 논평 기사에서 “아직은 연구가 기초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투자를 확대할 경우 ‘암 정복’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모든 과학자들이 그의 노벨상 수상에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주말 예일대 기관지인 ‘예일 데일리뉴스’는 “유사한 분야에서 연구를 해오던 많은 예일대 과학자들이 앨리슨 교수와 혼조 교수의 수상을 축하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욕을 당한 것 같은 기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수상자 선정에 사유가 된 T세포는 마약탐지견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T세포는 암세포를 찾아내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세포를 공격한다. 또한 항체를 만들고 있는 B세포에 자신이 공격하고 있는 암세포 항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준다.
앨리슨 교수는 이 과정에서 ‘CTLA-4’란 단백질이 T세포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앨리슨 교수는 ‘CTLA-4’에 제동을 거는 ‘Anti-CTLA-4’ 단클론항체를 만들어 활성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T세포의 암 살상력을 증강시킬 수 있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국적제약사 BMS는 지난 2010년 면역 항암제 ‘여보이(Yervoy)’를 개발했다. 미 식품의약국(FDA)는 2011년 ‘여보이’ 시판을 허가했다.
예일 대학 암센터에서 암 면역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마리오 스츠놀(Mario Sznol) 교수는 앨리슨 교수와 혼조 교수의 업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많은 과학자들이 이번 수상자들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연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수상자보다 먼저 ‘PD-L1’ 발견하기도
스츠놀 교수는 “다른 과학자들이 이번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앨리슨 교수와 호조 교수보다 먼저 ‘면역관문억제요법(checkpoint blockade therapy)’을 시도해왔지만 운이 없어 T세포 활동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노벨상은 못 받았지만 최근의 연구 성과가 있기까지 단백질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과학자들이 여러 명 있다”고 덧붙였다.
예일의대 리에핑 첸(Lieping Chen) 교수가 대표적인 경우다. 스츠놀 교수는 “첸 교수야말로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과 T세포를 이해하는데 큰 기여를 한 인물”이라며 이번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명단에 첸 박사가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강한 아쉬움을 표명했다.
첸 교수는 암과 싸우는 T세포 활동에 영향을 주는 단백질 ‘PD-L1’을 발견한 인물이다.
그는 1999년 국제 학술지‘네이처 메디슨(Nature Medicine)’을 통해 항암치료를 위해 ‘PD-L1’ 단백질을 체크해야 한다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지금 추가 연구를 통해 암치료법을 발견하고 있는 중이다.
많은 학자들은 “첸 교수의 연구는 ‘CTLA-4’ 단백질을 발견한 앨리슨 교수, ‘PD-1’ 단백질을 발견한 혼조 교수가 이들 단백질 활동을 억제하며 치료법을 개발하는 과정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명단이 발표된 직후 첸 교수는 “30초 정도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평상적인 상태로 되돌아왔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895년 알프레드 노벨은 유언장을 통해 “생리‧의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사람에게 상을 수여하라”는 말을 남겼다. 이후 6년이 지난 1901년부터 2018년까지 117년 동안 216명의 과학자들에게 노벨 생리‧의학상이 수여됐다.
그러나 1915, 1916, 1917, 1918, 1921, 1925, 1940, 1941, 1942년에는 수상자가 없었다. 알프레드 노벨이 유언을 통해 “업적에 상응할 만한 인물이 없을 때는 다음 해로 수상자 선정을 다음 해로 유보할 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과학자들이 연구를 멈춰야만 했던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 기간 중에는 생리‧의학상 선정을 미뤄야 했다.
21세기에 걸맞는 투명한 선정과정 요구
지난 117년 동안 단독 수상건수는 39건, 2명의 공동 수상건수는 34건, 3명의 공동 수상건수는 37건이다. 3명이 넘는 과학자가 공동 수상을 하지 못한 이유 역시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3명 이상 상금을 나누지 않도록 유언장을 작성했다.
지금까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과학자의 수는 216명이다. 수상자의 절반가량은 미국인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막대한 예산을 생물학 분야에 투입한 미국의 국력이 지금까지 생리‧의학상 수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상이다.
수상자의 평균 나이는 지난 2017년까지 58세였다. 그러나 2018년 수상자가 모두 70대인만큼 수치가 다소 올라갔을 것으로 보인다. 많지는 않지만 여성 수상자가 많은 분야가 생리‧의학상이다. 12명의 여성이 이 상을 수상했는데 2015년 중국의 투유유 박사가 이 상을 수상해 세계적인 화제가 됐다.
아시아 출신 수상자는 6명으로, 1987년에 일본의 토네가와 스스무, 2012년 일본의 야마나카 신야, 2015년에 일본의 오무라 사토시와 중국의 투유유, 2016년에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그리고 2018년에 혼조 타스쿠로 이어지면서 일본이 상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최근 노벨상 선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알프레드 노벨이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와는 달리 21세기 과학 환경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폐쇄적인 수상자 선정 과정, 남성 중심의 수상 풍토, 개인적 연구 성과를 중시하는 선정 기준, 그리고 국가적 영향력에 따른 수상자 편중 등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노벨상 시즌때마다 연례행사처럼 이어지고 있다.
어느 상이건 시상 때마다 논란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공정하다고 인정을 받아온 노벨과학상인 만큼 서둘러 21세기에 걸맞는 투명한 선정 기준과 과정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강봉 객원기자
- aacc409@naver.com
- 저작권자 2018-10-08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