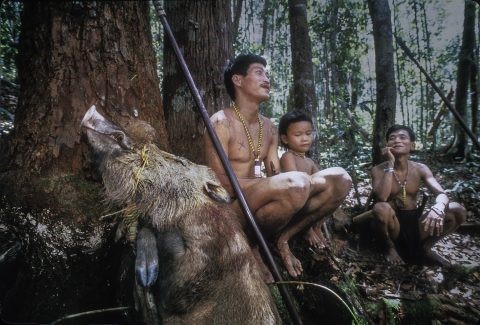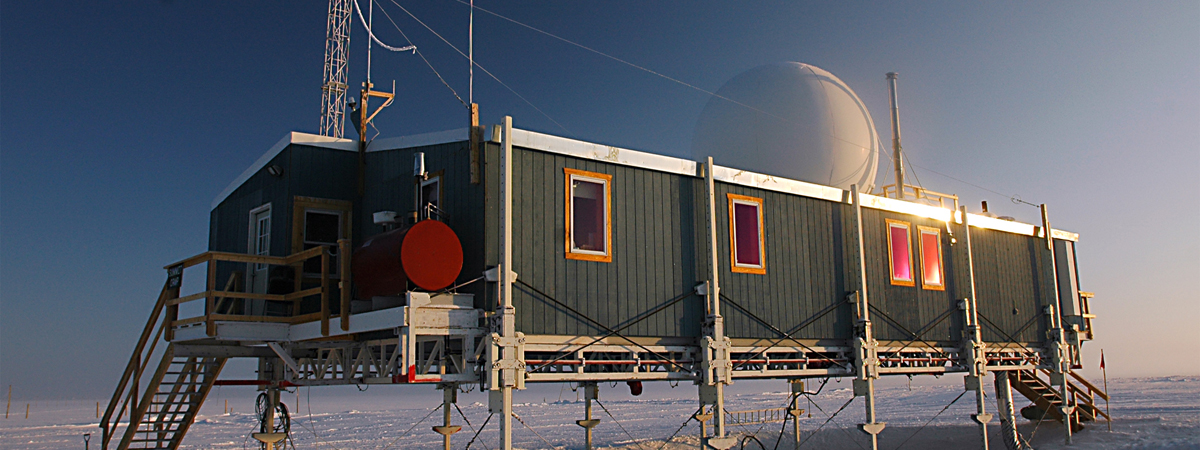지난 2015년 우리나라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이 병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나머지 병원을 통해 병이 대량으로 퍼지는 유례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같이 언제 있을지 모를 지구촌의 재앙적 감염병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 15가지 유망 기술에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미국 존스홉킨스 건강안전센터 연구원들은 최근 ‘지구촌의 재앙적 생물학적 위험에 대처하는 기술들’(Technologies to Address Global Catastrophic Biological Risks)이란 새 보고서를 펴냈다. 15가지의 새 기술과 그 응용법은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들이다.
이번 연구는 지구촌의 재앙적 생물학적 위험(GCBRs)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평가한 최초의 연구 보고서다.

“전통적 대처방법은 느리고 제한적”
‘지구촌의 재앙적 생물학적 위험’이란 이 센터가 이전에 정의한 특별한 위험의 범주를 말한다. 국내외 정부 조직과 민간부문의 집단적 통제 능력을 뛰어넘어 예기치 않게(sudden), 통상의 규모를 넘어서는(extraordinary), 광범위한(widespread) 감염성 재해를 일컫는다.
저자들은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이 세계 여러 곳에 있으나 전통적인 대처 방법은 너무 느리거나 범위가 제한돼 가장 좋은 환경에서조차도 생물학적 사건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것을 막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유형의 대응은 오늘날의 응급상황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속도와 정확성, 확장성 및 도달 범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과 기술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의 프로젝트팀은 광범위한 문헌 검토와 50명 이상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15가지의 본보기 기술을 선별했다. 그리고 공중보건을 위한 대비 및 대응과 관련해 이를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눴다.
다섯 가지 범주에 속한 각 기술들은 다음과 같다.
- 질병 탐지, 감시, 상황 인식 : 유비쿼터스 유전체 시퀀싱 및 센싱 기술, 환경 탐색을 위한 드론 네트워크, 농경 관련 병원체 발견을 위한 원격감지 기술
- 감염병 진단 : 미세유체(Microfluidic) 장치, 휴대용 질량분석기, 무세포(Cell-Free) 진단
- 분산된 의료대응제 제조 : 화학 및 생물학 제제 3D 프린팅, 의료대응제 제조를 위한 합성생물학
- 의료대응제 분배와 조제 및 투약 : 백신 투여용 미세배열(microarray) 패치, 자가 확산 백신, 백신용 삼키는 박테리아, 자가-증폭 mRNA 백신, 드론을 이용한 원격지 배달
- 의료 수요 급등 대비력 : 로봇과 원격 의료, 휴대용 간편 산소호흡기
프로젝트팀은 이 리스트가 필요한 것을 총망라한 것은 아니며, 특정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하일마이어 카테키즘 활용해 평가과정 표준화
연구팀은 세계 정상의 연구관리기관인 미국 국방고등연구기획청(DARPA)의 수정판 하일마이어 사전문답서(Heilmeier Catechism)를 활용해 각 기술의 평가와 자금 결정 지침 과정을 표준화했다.
이 과정은 연구팀이 각 기술의 개발부터 현장 활용까지의 준비성과, 이 기술이 GCBR를 낮출 수 있는 잠재적 영향력 그리고 기술을 낮게 혹은 높은 수준으로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재정 투자량을 정밀하게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연구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고서에 나와 있다.
프로젝트팀은 존스홉킨스 건강안전센터의 시니어 과학자인 크리스털 왓슨(Crystal Watson) 박사와 시니어 분석가인 매튜 왓슨(Matthew Watson) 연구원, 시니어 과학자인 타라 커크 셀(Tara Kirk Sell) 박사가 함께 이끌었고, 센터 원장인 톰 잉글스비(Tom Inglesby) 박사를 비롯한 여러 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기술 개발, 공중보건, 정책입안자 컨소시엄 필요”
이들의 연구는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전염병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이 필요한 분야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저자들은 “전염병 통제와 공중보건을 목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고 활용하는 일은 이런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수익성 높은 시장이 없기 때문에 종종 혁신에서 뒤처진다”며 “이런 공백들이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술 개발자와 공중보건 종사자, 정책입안자들이 전염병과 GCBR을 둘러싼 긴급한 문제를 이해하고 함께 기술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 김병희 객원기자
- hanbit7@gmail.com
- 저작권자 2018-10-10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