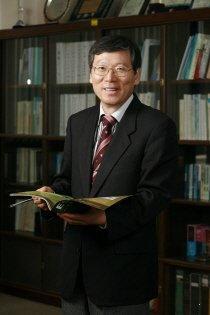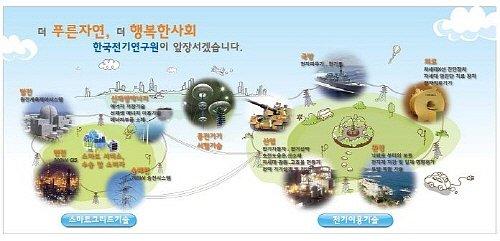오래 전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라는 광고 문안으로 세간의 이목을 끈 적이 있다. 그렇다면 전기(電氣)는 무엇이라고 표현해 볼까 ?
어쩌면 전기는 사랑, 공기와 같다. 우리가 평소에는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진짜로 없어진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기가 사랑과 같이 소중한 이유와 전기와 공기와의 유사점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우리 전기연구원 전시관 입구에는 2010년 초 리모델링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전시관명과 전기를 친근하게 느끼게 할 수 있는 표어가 게시되어 있다. 전시관명은 전기를 최초로 발견한 그리스의 과학자인 “탈레스”가 선정되었으며, 표어는 “전기는 사랑입니다”가 채택되었다. 그런 사랑과 같은 전기로 좀 더 풍요로운 우리들의 삶과 좀 더 활력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정조 때의 문장가인 유한준(兪漢雋, 1732~1811)이 지인에게 준 화첩(畵帖)의 발문(跋文)를 예로 들어본다.
“지즉위진애 애즉위진간 간즉축지 이비도축야(知則爲眞愛 愛則爲眞看 看則畜之而非徒畜也)”라는 문장이 나온다. 즉, “그림을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그림을 볼 수 있게 되고, 볼 줄 알게 되면 그림을 모으게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서문에도 인용되어 더욱 유명해진 글귀이기도 하다.
전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림’이라는 말 대신 ‘전기(電氣)’를 이 문장에 대신 넣어보면 “전기를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전기를 참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전기를 참으로 볼 수 있게 되면 아끼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문장이 된다.
“전기를 알면 사랑하게 되고...”
2008년 기준으로 지구상의 전 인류가 쓴 총 전기량은 20,181TWh(1테라와트시=1조와트시)에 달하고 있고 이 전기 사용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차 에너지 대비 전기에너지는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1차 에너지의 손실률이 무려 32%에 달하는 반면에 전기에너지의 손실률은 약 17%로서 1차 에너지 손실률의 약 절반 정도로 효율이 높다.
또한, 제어가 용이하고 사용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청정에너지로서 손색이 없다. 이런 소중한 전기에너지이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기처럼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
“사랑하게 되면 전기를 참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공기와 전기의 다른 점은 공기는 사실상 무한하지만, 전기는 현재의 기술로는 유한하다는 것이다. 공기와 같이 무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드는 노력(재생에너지 개발 등)이 진행 중이나 기술한계, 경제성 문제 등으로 아직까지는 대규모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출력 형태가 대부분 간헐적이며, 현재의 공급 기술로는 이러한 간헐적인 출력을 일정 양 이상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으로는 현재 원자력이나 화석연료 등을 사용하여 만드는 전기의 원가가 단위사용량(kWh, 킬로와트시) 기준 100원 미만이나 재생에너지인 경우 기준 원가는 200원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현재로서는 기존 발전방식에 비해 경쟁력이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현재의 발전 방식을 계속 유지한다면 결국 전기에너지도 어느 순간에는 고갈될 것이다. 그래서 전기에너지는 유한일 수밖에 없다.
“전기를 참으로 보게 되면 아끼지 않을 수 없다.”
전기가 유한한 존재라면 그 유한함을 극복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무한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결국 아껴 쓰고 효율을 높여서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는 방법뿐이다.
이 세 가지 방안 즉, 아껴 쓰고 효율을 높이고 무한한 대체에너지(신재생에너지 등)를 개발하는 것이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기본 방향이다. 이 세 가지 방안 중 효율을 높이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전문가의 몫이라면 에너지를 아껴 쓰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의 전기에너지 사용 증가율은 연평균 2~3%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향후 전기에너지 사용 증가율도 연평균 2.5% 내외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매년 3% 정도의 에너지를 아껴 쓴다면 더 이상 에너지 생산량을 증가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껴 쓰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 후손 대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전기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현재, 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더 스마트한 모습(스마트그리드)으로 변모를 계속하고 있다. 그것이 제대로 성공한다면 우리는 전기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무한대로 사용 가능하게 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전기에너지를 구현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굳이 전기에너지의 지속가능성, 에너지 독립을 크게 거론하지 않더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자 유한한 전기에너지를 우리는 마땅히 사랑하고 아껴야 하지 않겠는가?
어쩌면 전기는 사랑, 공기와 같다. 우리가 평소에는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진짜로 없어진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기가 사랑과 같이 소중한 이유와 전기와 공기와의 유사점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우리 전기연구원 전시관 입구에는 2010년 초 리모델링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전시관명과 전기를 친근하게 느끼게 할 수 있는 표어가 게시되어 있다. 전시관명은 전기를 최초로 발견한 그리스의 과학자인 “탈레스”가 선정되었으며, 표어는 “전기는 사랑입니다”가 채택되었다. 그런 사랑과 같은 전기로 좀 더 풍요로운 우리들의 삶과 좀 더 활력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정조 때의 문장가인 유한준(兪漢雋, 1732~1811)이 지인에게 준 화첩(畵帖)의 발문(跋文)를 예로 들어본다.
“지즉위진애 애즉위진간 간즉축지 이비도축야(知則爲眞愛 愛則爲眞看 看則畜之而非徒畜也)”라는 문장이 나온다. 즉, “그림을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그림을 볼 수 있게 되고, 볼 줄 알게 되면 그림을 모으게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서문에도 인용되어 더욱 유명해진 글귀이기도 하다.
전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림’이라는 말 대신 ‘전기(電氣)’를 이 문장에 대신 넣어보면 “전기를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전기를 참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전기를 참으로 볼 수 있게 되면 아끼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문장이 된다.
“전기를 알면 사랑하게 되고...”
2008년 기준으로 지구상의 전 인류가 쓴 총 전기량은 20,181TWh(1테라와트시=1조와트시)에 달하고 있고 이 전기 사용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차 에너지 대비 전기에너지는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1차 에너지의 손실률이 무려 32%에 달하는 반면에 전기에너지의 손실률은 약 17%로서 1차 에너지 손실률의 약 절반 정도로 효율이 높다.
또한, 제어가 용이하고 사용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청정에너지로서 손색이 없다. 이런 소중한 전기에너지이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기처럼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
“사랑하게 되면 전기를 참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공기와 전기의 다른 점은 공기는 사실상 무한하지만, 전기는 현재의 기술로는 유한하다는 것이다. 공기와 같이 무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드는 노력(재생에너지 개발 등)이 진행 중이나 기술한계, 경제성 문제 등으로 아직까지는 대규모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출력 형태가 대부분 간헐적이며, 현재의 공급 기술로는 이러한 간헐적인 출력을 일정 양 이상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으로는 현재 원자력이나 화석연료 등을 사용하여 만드는 전기의 원가가 단위사용량(kWh, 킬로와트시) 기준 100원 미만이나 재생에너지인 경우 기준 원가는 200원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현재로서는 기존 발전방식에 비해 경쟁력이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현재의 발전 방식을 계속 유지한다면 결국 전기에너지도 어느 순간에는 고갈될 것이다. 그래서 전기에너지는 유한일 수밖에 없다.
“전기를 참으로 보게 되면 아끼지 않을 수 없다.”
전기가 유한한 존재라면 그 유한함을 극복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무한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결국 아껴 쓰고 효율을 높여서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는 방법뿐이다.
이 세 가지 방안 즉, 아껴 쓰고 효율을 높이고 무한한 대체에너지(신재생에너지 등)를 개발하는 것이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기본 방향이다. 이 세 가지 방안 중 효율을 높이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전문가의 몫이라면 에너지를 아껴 쓰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의 전기에너지 사용 증가율은 연평균 2~3%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향후 전기에너지 사용 증가율도 연평균 2.5% 내외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매년 3% 정도의 에너지를 아껴 쓴다면 더 이상 에너지 생산량을 증가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껴 쓰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 후손 대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전기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현재, 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더 스마트한 모습(스마트그리드)으로 변모를 계속하고 있다. 그것이 제대로 성공한다면 우리는 전기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무한대로 사용 가능하게 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전기에너지를 구현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굳이 전기에너지의 지속가능성, 에너지 독립을 크게 거론하지 않더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자 유한한 전기에너지를 우리는 마땅히 사랑하고 아껴야 하지 않겠는가?
- 김호용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 저작권자 2013-05-07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