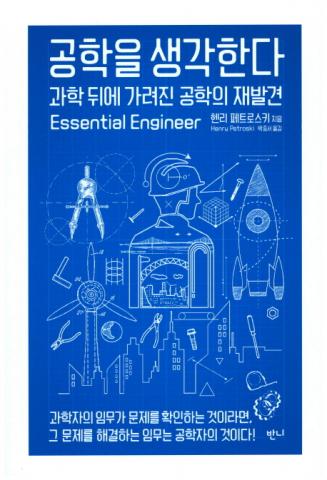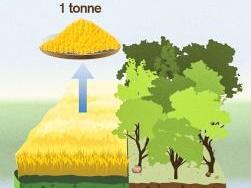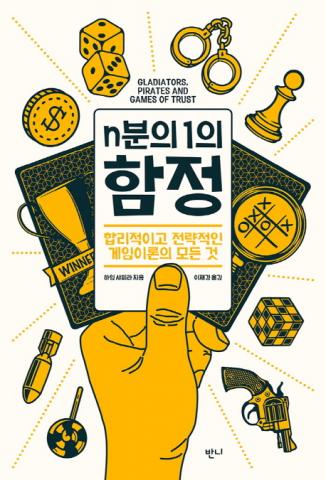과학기술(S&T)은 같이 붙여서 이야기하는데 어째서 ‘공학’은 같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연구개발(R&D)를 이야기하면서 어째서 ‘공학’이라는 단어는 들어가지 않을까? 노벨상 수상자는 어째서 공학자는 빼고 과학자 사이에 편중되어있을까?
단어를 둘러싼 용쟁호투에서는 ‘과학’이 ‘공학’을 압도한 것 같다. 그렇지만, 재미있는 것은 공과대학이든 순수과학 분야이든 우리는 ‘이공계’ 학생이라고 부른다. 이공계 대학에 다니면서 오래 동안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서야 “과학과 공학의 차이를 이제 알 것 같다”는 젊은 교수도 있다.
어느 대학교수는 세계적인 국내 대기업 임원에게 물었다. 어떤 이공계 인재가 필요합니까? 임원의 대답은 이랬다.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이해하는 학생이 필요합니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이 단어를 대할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빠지지 않는 질문은 과연 어떤 인재를 길러낼 것인가에 모아진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공계 학생들이 갖춰야 할 능력으로 ‘시스템 공학’을 아는 인재가 필요하다는 말이 가장 정확한 답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요인을 감안하지 않으면 공학이 아니다
시스템 공학이란, 단순히 과학이나 연구개발이나 기술적인 문제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매우 복잡한 구성을 거쳐야 도달하기 때문이다. 시스템 공학에서 반드시 포함되는 부분이 ‘사회적인 요인’이다.
그리고 ‘사회적 요인’이라는 단어에는 다른 분야와의 상관관계, 이해상충의 해소방안, 경제성, 환경 등 거의 모든 분야가 들어간다. 이런 이해상충을 가장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윤리적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최선이어야 한다는 기본 명제를 충족할 수 있다.
‘공학을 생각한다’(The Essential Engineer)라는 책을 읽고 나면,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려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요약한 단어가 ‘시스템공학’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과학과 공학의 차이를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면, 과학은 왜를 묻는 것이고 ‘공학’은 ‘어떻게’를 실현하는 일이다.
저자인 헨리 페트로스키(Henry Petroski)에 따르면 과학과 공학은 서로 주도권 다툼을 벌여왔다. 미국에서 과학자가 공학자를 월등하게 압도했던 계기로,물리학자들이 발견한 원리를 바탕으로 원자폭탄을 탄생시킨 일이 꼽힌다.
물리학자들은 핵분열이라는 물리학 원리가 얼마나 가공할 무기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2차 대전 중에 미국은 독일이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폭탄을 먼저 개발하면 세계가 히틀러의 광기에 함몰될 것을 우려해서 맨하탄 프로젝트를 가동시켜서 원자폭탄을 제조하는데 성공했다.
이 분위기가 역전된 것으로 저자는 1957년 소련이 미국에 앞서 위성을 발사시킨 ‘스푸트니크 쇼크’를 꼽았다. 스푸트니크 쇼크 이후 미국 정부는 연구와 개발에 더 큰 관심을 쏟으며 재원을 분배하기 시작했다. 미국 항공우주국이 설립됐으며,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세워졌다.
소련을 기술적으로 따라 가기 위한 노력이다. 아폴로 계획이 성공을 거두면서 미국에서는 드디어 공학자들이 과학자들과 대등한 위치에 올랐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1964년에 국립공학아카데미가, 1970년에 의사협회가 창설돼 과학자들이 중심이 된 국립과학아카데미와 대등한 지위를 차지했다. 1980년대에는 국립과학위원회의 중요한 통계보고서의 과학지표(Science Indications)가 과학및공학지표(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ions)로 바뀐 것도 공학의 중요성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증거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렇다면 과연 둘 사이를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전통적으로 과학에서 출발해서 공학으로 발전한다는 ‘직선형 모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과학적 발견과 탐구가 이뤄진 다음에 공학이 발전하는 직선형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어떤 경우는 공학이 먼저 발전한 다음에, 그 영향으로 과학이 뒤이어 발전하는 순환용 모델도 얼마든지 발견된다. 망원경이 나온 뒤 천문학이 발전한 것은 수많은 사례중 하나이다.
긴장 속에서 경쟁하는 과학과 공학
과학과 공학의 긴장관계와 주도권 싸움은 이해를 하겠는데, 과연 저자가 강조하는 공학의 참 모습은 무엇일까? 우선 명칭에서 찾을 수 있다. 과학은 복수(sciences)로 쓸 수 있지만, 공학(engineering)은 언제나 단수로 쓴다.
과학은 서로 분리돼 존재하지만, 공학은 발명(inventing) 설계(designing) 제작(making) 건설(building)과 마찬가지로 항상 계속되는 과정이며 전체가 하나를 이뤄야 함을 암시한다고 저자는 해석했다.
공학은 넓게 보면 순수과학, 응용과학, 공학의 하나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분야와 동시에 시스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학과 크게 다르다.
공학은 경제이론, 재정과 함께 생각해야 하며, 사회관계, 산업관계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공학이 순수과학과 맺고 있는 깊은 관계만큼이나, 공학은 사회적 문제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공학과 사회적 문제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사례 중의 하나로 저자는 바이오연료를 들었다. 2008년 원유가격이 대폭 오르자 미국은 바이오연료 연구에 재정을 쏟아 부었다. 이미 미국은 2005년에 옥수수 추출 에탄올을 휘발유에 섞도록 의무화했다.
옥수수 가격은 1년 새 4배나 뛰고, 세계은행은 2002년 이래 식량가격 상승의 75%는 바이오 연료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을 정도였다. 바이오연료가 연료펌프의 금속부품을 손상시킨다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는 공공정책이 공학을 무시해서 추진됐을 때의 폐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옥수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과도하게 비료를 뿌리면 토양의 질소화가 나타나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결국 공학은 시스템을 생각하지 않으면 공학이 아닌 것이다. 세계적인 대기업에서 필요한 이공계 인재는 ‘시스템 공학을 아는 인재’여야 한다는 답변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가.
- 심재율 객원기자
- kosinova@hanmail.net
- 저작권자 2017-06-22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