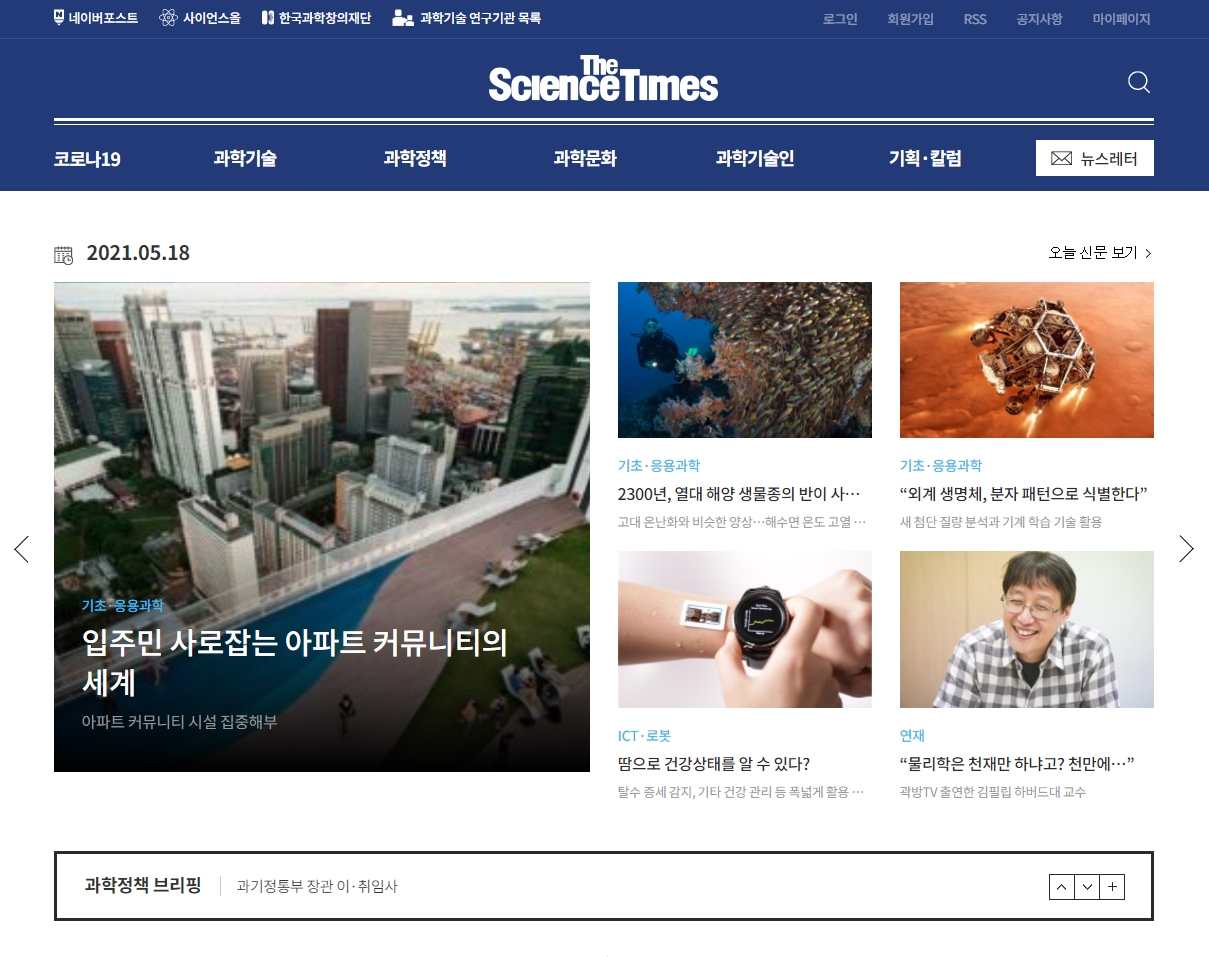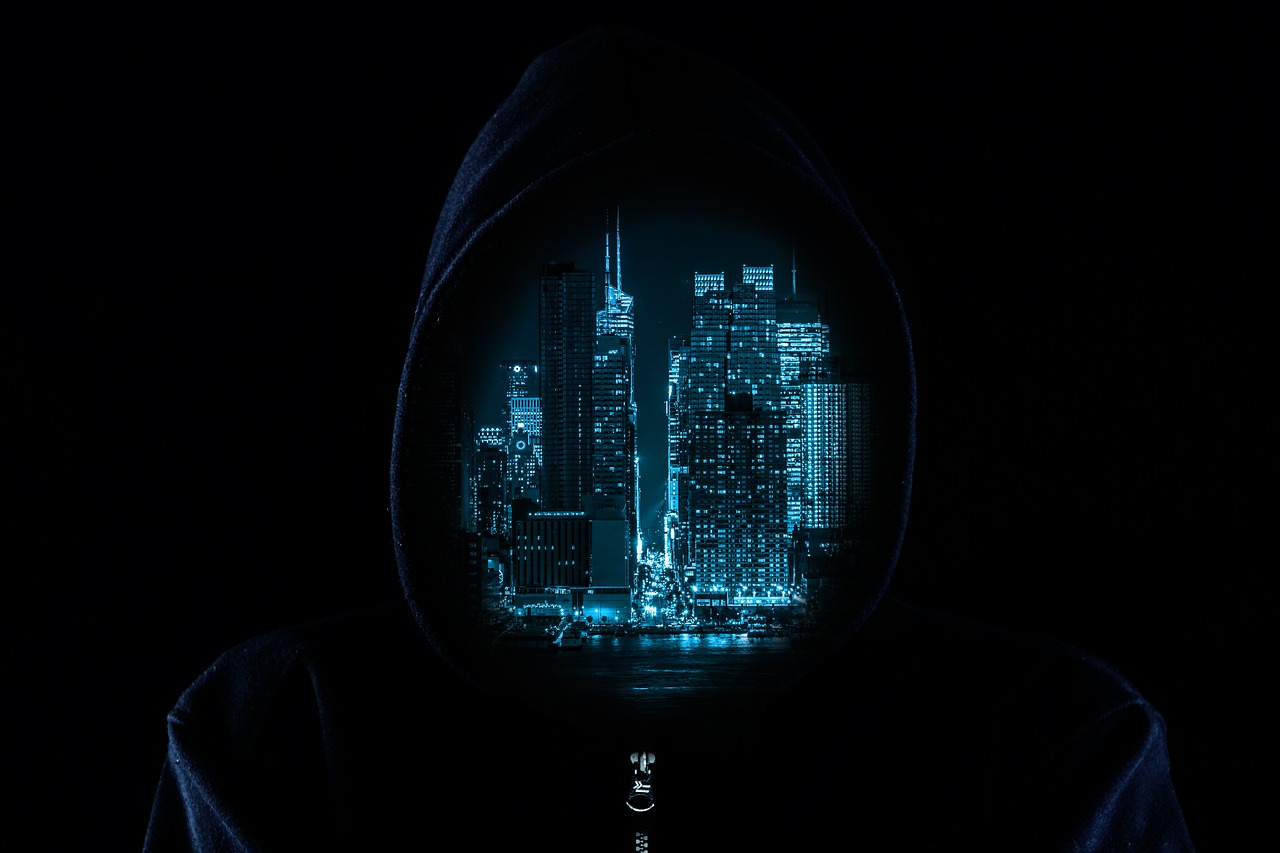나카무라 슈지(Nakamura Shuji) 미국 UC 샌타바버라 교수는 세계 최초로 고휘도 청색 발광다이오드(LED)를 개발에 성공하며 인류 조명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그는 LED에서 가장 구현하기 힘든 ‘고휘도 청색’을 개발하면서 일약 세계적인 과학자로 이름을 알렸다.
개발을 통해 그가 당시 재직 중이던 일본 니치아 화학공업은 LED 패키지 분야 매출액 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 또한 지난 2014년 노벨 물리학 상을 거머쥐는 영광을 누렸다.

하지만 나카무라 슈지 교수는 이러한 성과에 대한 별다른 보상 없이 회사를 떠나야 했다. 일본 기업의 과학자 직무발명 보상 시스템이 미흡했기 때문.
최근 업계에서는 나카무라 교수의 사례를 들며 과학자의 직무발명 보상 제도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벨상 거머쥔 과학자가 직접 받아낸 직무발명 보상금
발명자의 지적재산권과 합당한 직무발명 보상권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국가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과학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요 기술로는 자율 주행 자동차, 3D 프린팅, AR/VR, 바이오 헬스케어, 사물인터넷, 스마트 팩토리,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 손꼽힌다.
최근 사회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 가치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이 중 지식재산권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에서의 직무 발명권 보호 시스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개발은 대규모 연구시설과 자본을 갖춘 법인이 주도하고, 여기에 소속된 직원들의 직무발명이 지적재산권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나카무라 슈지 교수가 자신이 10년간 몸을 담았던 니치아화학공업을 떠난 이유는 합리적이지 않은 직무발명 보상금 시스템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니치아화학은 그의 발명으로 인해 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우뚝 서며 1조 원이 넘는 매출액을 올렸다. 반면 나카무라 교수에게 돌아온 보상은 1000만 엔(약 1억 873만 원)의 연봉뿐이었다. 직무발명 보상금으로는 불과 2만 엔(약 21만 원)이 주어졌다.
그는 세계 최고의 발명품을 발명하고도 발명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 없이 퇴직하고 말았다. 나카무라 교수는 미국 대학으로 떠난 후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정 소송을 감행했다.
일본 도쿄지방 재판소는 그의 신청을 받아들여 니치아화학공업이 나카무라 슈지 교수에게 200억 엔(약 2174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종 양측은 8억 5000만 엔(약 92억 4239만 원)에 합의를 해 사건은 종결됐다. 나카무라 교수와 니치아화학의 법적 분쟁은 전 세계 파란을 불러왔다. 그의 법적 투쟁은 열악한 직무발명 보상권 시스템에 경종을 울리는 대사건이었다.
국내 직무발명 보상 제도 보완해야
대부분의 기업들은 직원이 직무발명을 하면 회사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직무발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무발명제도’란 직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 및 소유하고 직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직무발명은 우수 특허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원천으로 쓰이며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홍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실장은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산업이 고도화되고 기술이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대규모 연구시설과 자본을 갖춘 법인이 새로운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라며 “전 세계가 지식재산권을 독점 베타권으로 인식하면서 국가경쟁력의 초석으로 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직무발명은 특정한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발명한 직원이 특허권을 갖고 회사는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기업과 종업원 양측이 특허권으로 인한 분쟁이 없으려면 회사는 직원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 받아 회사 명의로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카무라 교수와 같이 발명자가 직무발명에 대해 크게 보상받은 사례는 매우 특수한 사례로 손꼽힌다. 우리나라 또한 과거에는 직무발명 보상이 매우 미흡했기 때문.
하지만 최근 들어 국내 제약 및 주류회사 등에서는 큰 액수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발명제안 보상, 출원 유보 보상, 출원 보상, 등록 보상, 자사 실시 보상, 타사 실시 보상, 처분 보상 등 다양한 형태의 직무발명 보상 제도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직무발명 보상 제도가 발명자들의 활발한 연구 활동을 촉진시키는 데에는 여전히 몇 가지 걸림돌이 존재한다.
김승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개정된 국내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들었다. 그는 “직무발명 보상금과 관련하여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이 모호하게 되어 있다”라며 “원활한 직무발명을 위해서는 직무발명 보상금 구분의 모호성과 보상금의 비과세 축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김은영 객원기자
- teashotcool@gmail.com
- 저작권자 2019-05-29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