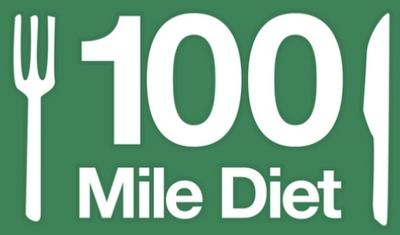장거리를 여행하면 우리 몸은 피로를 느끼며, 지치게 된다. 먹거리 역시 마찬가지다.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기다 보면 대부분 처음에 가지고 있던 신선함을 잃으면서, 품질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처럼 먹거리의 신선도를 운송거리로 설명하는 새로운 개념을 ‘푸드마일리지(Food Mileage)’라고 부른다. 원산지로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에너지와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식품의 신선도를 가늠해 보는 잣대로 활용되고 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푸드마일리지
푸드마일리지는 1990년 영국의 안드레아 팩슨(Andrea Paxon)이라는 학자가 처음 구상한 개념이다. 이후 영국의 환경운동가인 팀 랭(Tim Lang)이 먹거리와 환경 문제를 연관시켜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명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푸드마일리지의 개념에 대해 “가능한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식품을 소비하는 것이 식품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의미”라고 정의하며 “이 외에도 푸드마일리지에는 운송에 따른 비용 및 환경 문제 등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푸드마일리지를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식품의 운송량과 식품이 이동한 거리를 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표기한다면 ‘식품운송량(t)×거리(km)’로서, ‘톤킬로미터(t·km)’를 단위로 한다.
예를 들어 10톤 정도의 식품을 20km 정도 운송했을 경우, 푸드마일리지의 값은 200t·km이 되고, 100km를 이동했다면 1000t·km이 된다.
따라서 푸드마일리지는 숫자가 낮을수록 좋다.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식품의 운송 거리가 짧을수록, 유통 단계가 간단할수록 푸드마일리지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숫자가 낮을수록 우리가 섭취하는 먹거리가 신선하고, 안전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입농산물의 경우는 푸드마일리지가 높다. 이는 먼 거리에 위치한 원산지에서 우리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거리는 물론,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걱정스런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푸드마일리지는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2년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일 인당 푸드마일리지가 7085t·km로서, 2001년의 5172t·km 보다 3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조사대상국인 일본, 영국, 프랑스 중 가장 높은 수치로서, 739t·km를 기록한 프랑스의 열 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일본, 영국, 프랑스는 모두 2003년보다 푸드마일리지가 줄어들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푸드마일리지가 불과 10년 사이에 대폭 증가한 이유로는 원거리에 위치한 미국의 곡물 수입량이 2001년의 480만 톤에서, 2010년에는 884만 톤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이 꼽힌다.
또한 농축수산물의 수입 자유화 및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먼 거리에서 수입되는 식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점도 푸드마일리지가 증가한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로컬푸드는 푸드마일리지를 줄이는 해법
푸드마일리지를 줄여 건강한 식탁을 꾸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것이다. 식품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치한다면 푸드마일리지와 유해물질 걱정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농사를 직접 지으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대신에 모든 먹거리들의 이동거리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로컬푸드(Local Food)’ 운동이 제시되고 있다.
로컬 푸드란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는 지역 농산물을 의미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리를 단축시켜 신선도를 제고하고 포장과 운송에 따르는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또한 중간유통을 줄인다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도시 소비자들이 지불한 대가가 생산자에게 바로 돌아가도록 한다는 의도까지 담겨 있다. 이런 경우 푸드마일리지는 단순한 물리적 거리가 아닌, 좀 더 거시적 차원의 사회경제적 거리가 되는 셈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로컬푸드 정책이 활성화되어 있고, 성공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로컬푸드 정책으로는 미국 북미의 ‘100마일 다이어트 운동’과 일본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 등을 들 수 있다. 100마일 다이어트 운동이란 자신의 주거지로부터 100마일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비하자는 운동이다.
우리나라는 전북 완주군이 지난 2008년에 처음으로 로컬푸드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도입 초기에는 여러 가지 정책적 혼선이 있었으나, 7년이 지난 지금 완주군의 로컬푸드 매장은 주민들의 홍을 얻어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 김준래 객원기자
- stimes@naver.com
- 저작권자 2015-07-07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