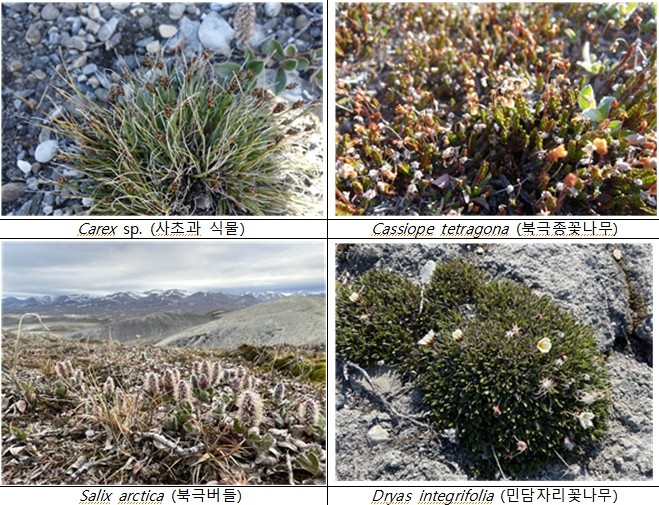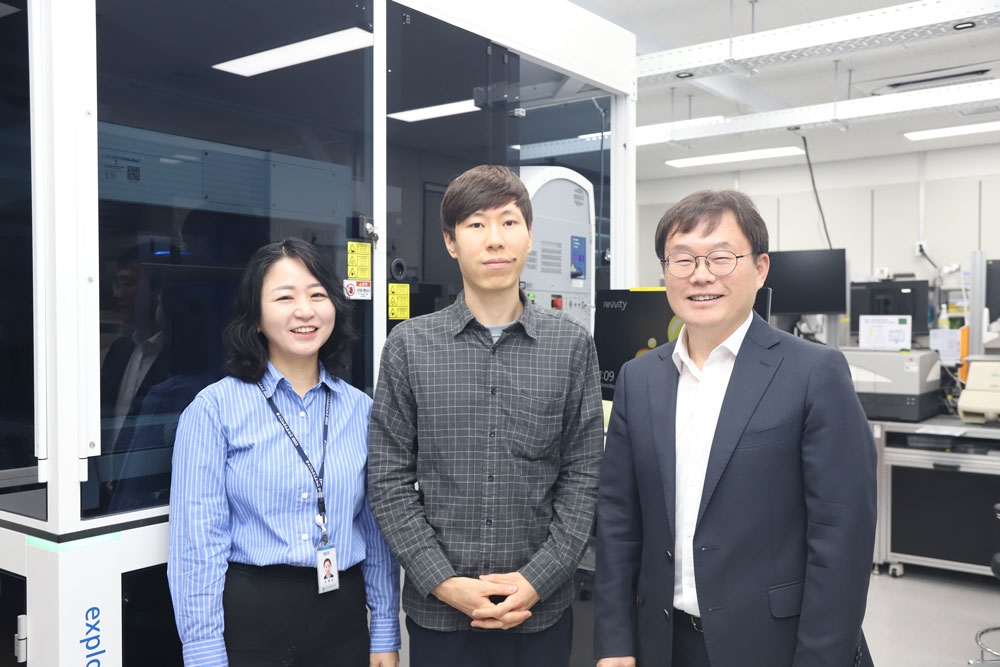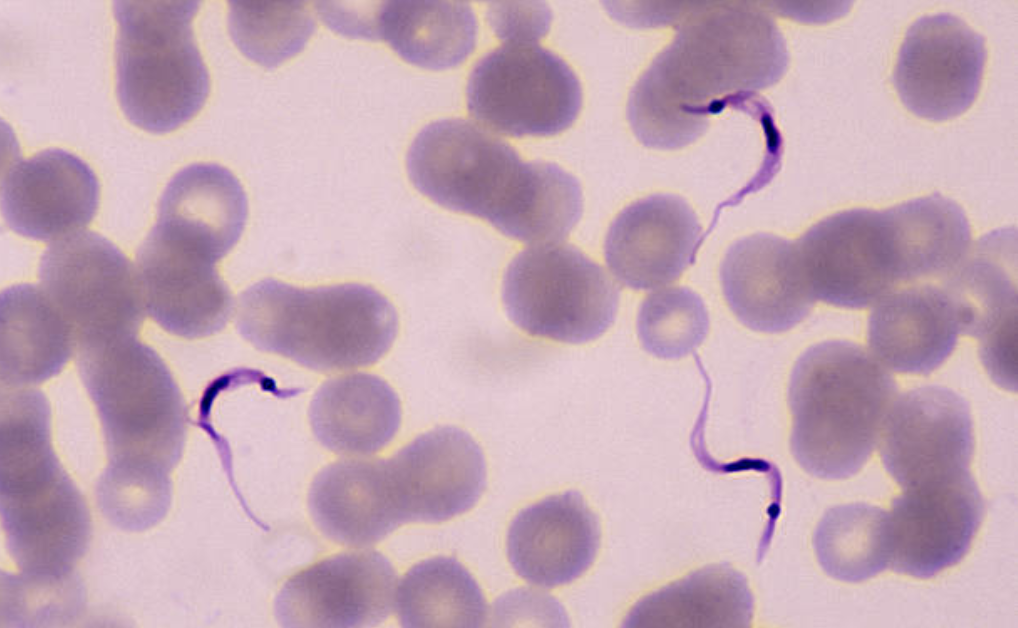화산 폭발은 흔히 지구를 냉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화산재가 대기를 뒤덮어 햇빛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24일자 발표 논문에 따르면 화산 폭발은 수천㎞나 떨어져 있는 빙상(ice sheets)이 녹는데 일조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컬럼비아대 라몬트-도어티 지구관측소 연구진은 빙하 속 얼음 표본과 빙하가 녹은 물을 분석한 결과, 지금부터 1만2000~1만3000년 전 빙하기 마지막 무렵에 발생한 고대 화산 폭발이 북부 유럽을 뒤덮고 있던 대륙빙하가 대량으로 신속하게 녹는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논문 제1저자로 위 연구소에서 박사후 과정 연구원으로 일할 때 이 연구를 수행한 프란체스코 무스키띠엘로(Francesco Muschitiello) 박사는 “1000년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일반적으로 화산 폭발이 일어난 뒤 1년 정도 안에 빙상 융해가 가속화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얼음 위에 떨어진 화산재가 태양열 흡수하고 반사량은 적어
폭발한 화산들은 빙상 위나 그 근처에 있는 화산들이 아니고 멀리는 빙상에서 수천마일이나 떨어져 있었다. 화산이 폭발하면 하늘로 거대한 화산재들이 솟아오르고 이 화산재들은 멀리까지 날아가 얼음 판 위에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빙상 표면이 어두운 색으로 변해 태양열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된다.
무스키띠엘로 박사는 “화산재가 많이 쌓여 얼음 표면이 더 어둡게 되면 태양빛을 대기 중에 반사하는 반사율이 낮아져 얼음이 더 빨리 녹게 된다”며, “이것이 기본적인 과학적 원리”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아무도 고대 기후 분야에서 화산과 빙상 융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견은 빙하가 해마다 쌓여진 빙하 연층(年層){[glacial varves]의 횡단면 관찰을 통해서 확인됐다. 이 빙하 연층에 관한 자료는 대부분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수집됐다. 빙하 연층은 빙상 밑의 녹은 물이 많은 잔해 더미를 빙상 가장자리 근처의 호수로 운반할 때 형성되는 층상 퇴적물이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빙하 연층의 각 층들은 그 해의 상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층이 두꺼우면 더욱 많은 물이 퇴적물을 운반했기 때문에 얼음이 그만큼 더 많이 녹았다는 것을 가리킨다.
화산 폭발 활발한 시기엔 빙하 연층 두꺼워
연구팀은 여러 빙하 연층을 그린란드 빙상에서 채취한 표본들과 비교해 봤다. 그린란드 빙상 층은 고대 대기 조건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 이 층들을 황산염으로 테스트한 결과 어느 시기에 화산 폭발이 있었고, 화산재의 양은 얼마나 많았는지가 밝혀졌다.
연구팀은 이 얼음 층들을 같은 시기의 빙하 연층들과 비교해 화산 폭발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에는 빙하 연층이 두껍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화산 폭발이 북부 유럽의 빙상을 더 많이 녹게 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무스키띠엘로 박사팀은 마지막 빙하기가 오늘날의 따뜻한 기후로 옮겨가던 1만3200~1만2000년 전의 기간을 연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아이슬란드의 에이야프얄라외쿨 화산 폭발과 유사한 고위도 북부유럽지역에서의 화산 폭발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아이슬란드의 화산 폭발은 고대 화산 폭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였으나 거대한 화산재 구름이 유럽 전역을 뒤덮어 항공기 운항이 일주일 가까이 중단됐었다.

“화산재, 최소 20㎝~1m 높이의 빙상 녹여”
그러면 그 같은 고대 화산 분출로 빙하가 얼마나 많이 녹을 수 있었을까?
논문 공저자로 영국 리버풀대 빙하학자인 제임스 리(James Lea) 박사는 “당시의 여러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수량을 말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수 천 가지의 모델 시뮬레이션을 통해 빙하가 녹아내리는 양은 각각의 분출이 일어난 계절과 당시의 눈이 쌓인 상태, 빙상의 높이 등에 달려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리 박사는 “이런 요인 가운데 한 가지라도 달라지면 융해의 양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실험 모델에 따르면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화산재 퇴적은 빙상의 가장 높은 부분에서 20㎝~1m 높이의 얼음을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스키띠엘로 박사는 과거 조건의 불확실성 때문에 모델이 나타내는 결과는 어느 정도의 가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연구팀이 매우 광범위한 잠재 조건들을 시뮬레이션했기 때문에 빙상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들은 자신들의 측정 범위 안에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폭발은 빙하 융해 부추기고, 융해는 다시 폭발 일으켜
이번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스위스 쉐러(Scherrer) 연구소의 고기후과학자 미카엘 지글(Michael Sigl) 박사는 화산재 입자가 화산 분출의 냉각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가설은 흥미롭다고 말했다. 그러나 “빙상이 빨리 녹아드는 시기와 화산 분출 시기가 우연히 일치된다면 자동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와 일치하는 다른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글 박사는 화산 폭발로 인한 오존 붕괴와 남반구에서의 빙하 해빙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럼에도 그는 이번 연구가 대기 중 화산재 방출 효과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나타내 준다고 말했다.
무스키띠엘로 박사는 “예비 연구결과에 따르면 오늘날의 빙상들이 화산 폭발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연구결과들은 또 미래 예측을 위해 사용하는 기후 모델들에 구멍이 있다고 지적한다. 즉 현재의 기후 모델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대기로부터 쌓이는 입자 퇴적물의 변화에 대한 빙상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
또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이전 연구에서 빙상과 빙하가 녹으면 지각의 하중이 가벼워져 마그마를솟아오르게 함으로써 빙하지역의 화산 분출 주기가 증가할 것이라고 시사한 점이다. 화산 활동과 빙상 융해 사이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폭발이 융해를 부추기고 더 많은 빙하의 융해는 다시 화산 폭발을 촉발하는 이른 바 ‘양성 피드백 순환’(positive feedback loop)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무스키띠엘로 박사는 이번 연구가 “급속한 기후 변화가 예상되는 현재 여기에 작용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김병희 객원기자
- kna@live.co.kr
- 저작권자 2017-10-25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