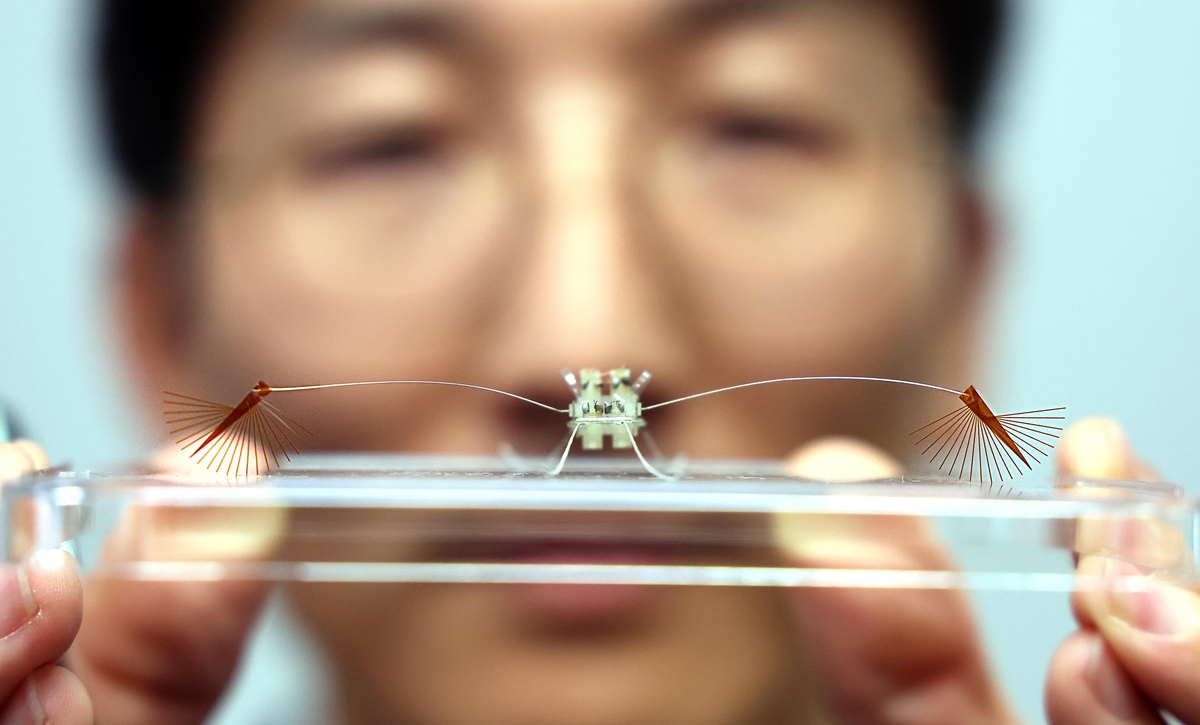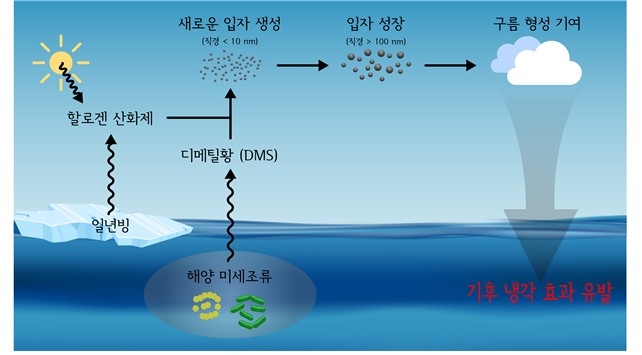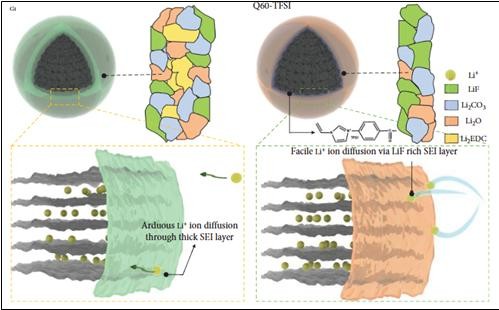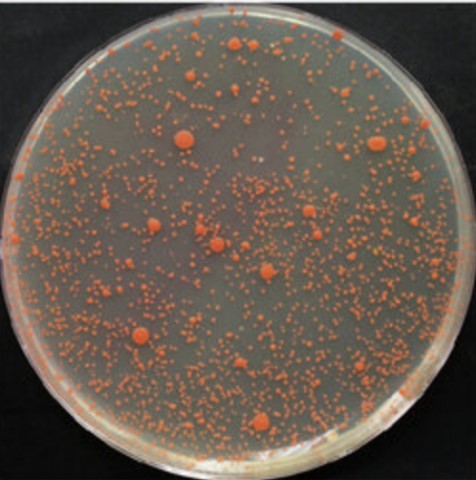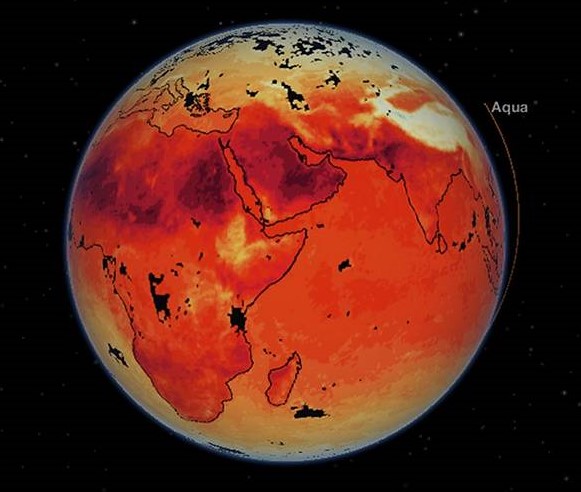바다 속 ‘숨참기 챔피언’들의 놀라운 능력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인류무형문화유산 ‘해녀’의 능력이 또 한 번 입증됐다.
인간이 물속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라는 오랜 의문에 대한 답을 바꿔놓은 이들이 바로 평균 나이 70세의 제주 해녀들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바다에서 작업하는 동안 무려 55.9%의 시간을 물속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개나 바다사자 같은 바다표범과 맞먹는 수준이며, 심지어 반수생 포유류인 비버보다도 높은 놀라운 수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일반적인 잠수 포유류와는 전혀 다른 생리적 반응을 보인다는 점이다. 해양 포유류 연구에서 오랫동안 필수 조건으로 여겨졌던 '잠수 반응'이 인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바다표범이나 고래 같은 잠수 동물과는 반대로 해녀들은 물속에서 심박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뇌로의 혈류량이 늘어나는 독특한 패턴을 보였다.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 대학교 해양포유류 연구소의 J. 크리스 맥나이트(J. Chris McKnight) 박사와 유타대학교 인류학과의 멜리사 일라르도(Melissa Ilardo) 박사 연구팀은 제주 해녀 7명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Current Biology)에 발표했다.
오랜 전통이 키워낸 바다의 전문가들
연구에 참여한 해녀들은 모두 3대째 해녀 집안 출신으로, 나이는 62세부터 80세까지였다. 제주해녀문화는 17세기부터 기록에 나타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해녀들이 물질을 통해 얻은 소득이 가정 경제의 주축을 담당해 왔다. 이들은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뉘어 물질 실력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바다의 여신인 용왕할머니에게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잠수굿 등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왔다.
연구팀은 이들의 일상적인 성게 채취 작업을 관찰하며 총 1,786회의 잠수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 중 959회의 뇌 측정 데이터와 854회의 근육 측정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했다.
분석 결과 해녀들의 일일 잠수 활동 시간은 124분에서 636분까지 다양했으며, 평균 255분에 달했다. 이는 북극곰이 바다에서 보내는 시간보다도 길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바다에 있는 동안 물속에서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다. 해녀들은 평균 55.9%의 시간을 수중에서 보냈는데, 이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측정된 가장 높은 수치다.
맥나이트 박사는 "해녀들이 보여준 수중 체류 시간 비율은 젊은 남성 바자우족 다이버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반수생 포유류인 유라시아 비버(Castor fibre)를 넘어서며 바다수달과 뉴질랜드 바다사자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잠수 반응' 없이도 가능한 극한 잠수
연구팀이 주목한 것은 해녀들의 독특한 생리적 반응이었다.
일반적으로 바다표범, 고래 등 전문 잠수 동물들은 물속에 들어가면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말초 혈관이 수축하며, 근육으로 가는 혈액량이 감소하는 '잠수 반응(dive response)'을 보인다. 이는 제한된 산소를 뇌와 심장 같은 핵심 장기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생존 메커니즘이다.
하지만 해녀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잠수 중 심박수는 분당 101회로 수면 휴식 시간(분당 100회)보다 오히려 높았고, 잠수 전 심박수(분당 84회)보다는 훨씬 높았다(p<0.001). 근육으로 가는 혈액량 변화도 개인차는 있었지만 일관된 감소 패턴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뇌 혈류량은 잠수 중에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체내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으로 인한 혈관 확장과 혈류량 증가 효과로 해석된다. 뇌의 산소포화도는 잠수 시작과 끝 사이에 미미한 감소만을 보였으며(p=0.03), 이 역시 개인차가 컸다.
일라르도 박사는 "해녀들의 잠수 방식은 짧고 반복적이며 표면 휴식 시간도 짧아서 심각한 산소 부족 상태를 만들지 않는다"며 "이런 방식이 운동과 유사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극곰보다 더? 70세에도 오래 바다에 머무는 비결
해녀들의 잠수 패턴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이들은 평균 0.7m 깊이에서 평균 11초 동안 머물며, 수면에서의 회복 시간은 평균 8.9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해녀는 최대 4.75m 깊이까지 잠수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비교적 얕은 깊이에서 짧은 시간 동안 반복 잠수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장시간 깊이 잠수하기보다 짧고 빈번한 잠수를 통해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략인 것으로 분석됐다.
해녀들의 일일 잠수 활동은 그 지속성 면에서도 놀라웠다.
성게 채취를 위한 하루 작업 시간이 124분에서 636분까지 개인차가 컸지만, 평균 255분으로 4시간 이상 바다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앞서 언급한 대로 55.9%를 실제 수중에서 보내므로 하루 평균 2시간 20분 가량을 물속에 잠수해 있는 셈이다. 이는 북극곰이 바다에서 보내는 일일 시간보다도 길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해녀들이 연중 90일 정도만 물질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하는 날에는 이처럼 집중적인 수중 활동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해녀의 나이를 고려하면 매우 놀라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평균 70세인 현재 해녀들이 젊었을 때는 지금보다 더 오래 잠수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녀들은 여름철에는 하루 67시간, 겨울철에는 45시간씩 물질을 하며, 1960년대 당시에는 남편의 한 달 월급을 하루 만에 벌 정도로 뛰어난 경제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맥나이트 박사는 "현재 해녀 세대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잠수 능력과 생리학을 이해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평균 나이 70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수중 체류 능력은 더욱 경이롭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또한 해녀들이 바다 속 암초와 해산물 서식처에 대한 정확한 인지적 지도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 효율적인 채취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인간 잠수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팀은 해녀들이 보인 독특한 생리적 반응의 원인을 여러 각도로 분석했다.
첫째, 짧고 반복적인 잠수 방식으로 인해 심각한 산소 부족이 발생하지 않아 전형적인 잠수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운동과 유사한 대사 상태로 인해 교감신경계 활성화가 부교감신경계 활성화보다 우세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가설이다.
또한 해녀들이 사용하는 물안경으로 인해 얼굴의 대부분이 찬 바닷물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삼차신경 자극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삼차신경 자극은 잠수 반응을 촉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연구에 참여한 고든 헤이스티(Gordon Hastie) 박사는 "이 연구는 전문적인 잠수 포유류에서 관찰되는 뚜렷한 잠수 반응이 모든 경우에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의 오랜 잠수 문화와 관련된 유전적 적응에 대한 이전 연구들과도 연결된다. 과거 연구에서는 이 지역 잠수 민족들이 향상된 잠수 능력과 관련된 유전적 적응을 보인다는 증거가 발견된 바 있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해녀들의 특별한 생리적 반응은 이러한 유전적 배경과 수십 년간의 훈련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된다.
※ 관련 자료 바로가기: https://doi.org/10.1016/j.cub.2025.06.066
- 김현정 리포터
- vegastar0707@gmail.com
- 저작권자 2025-08-28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