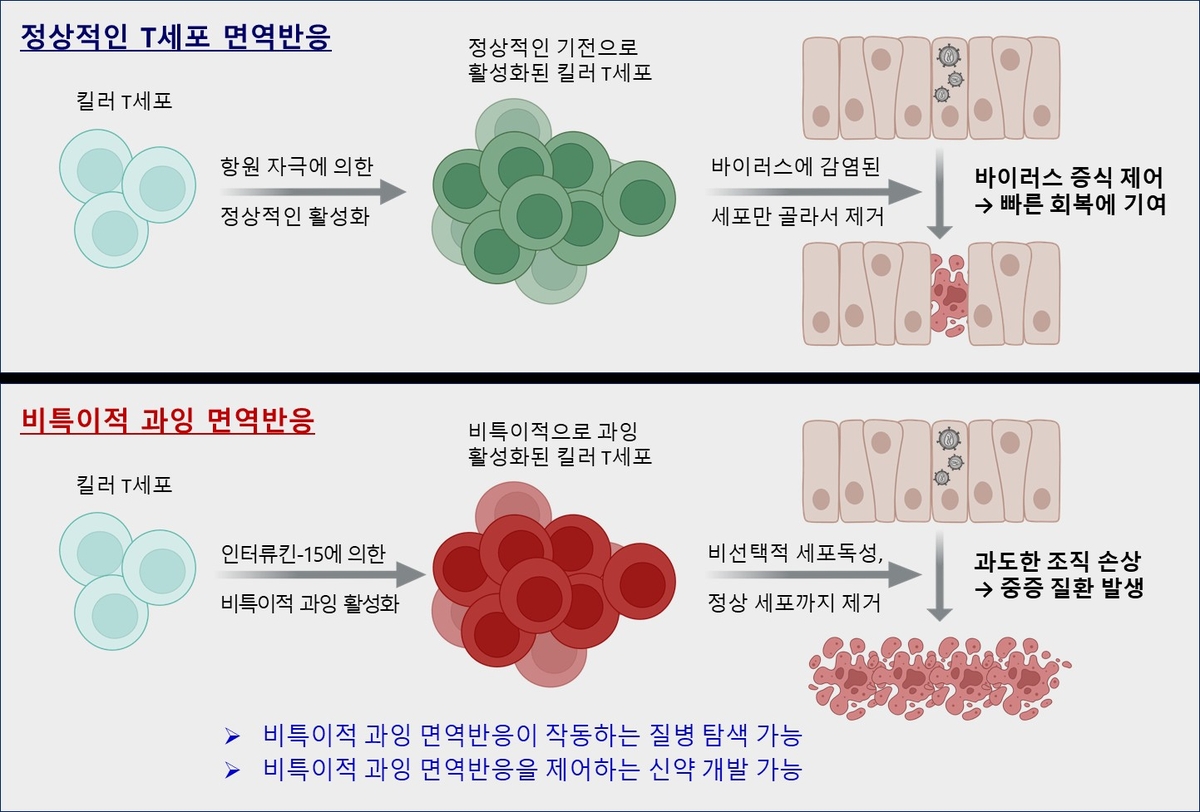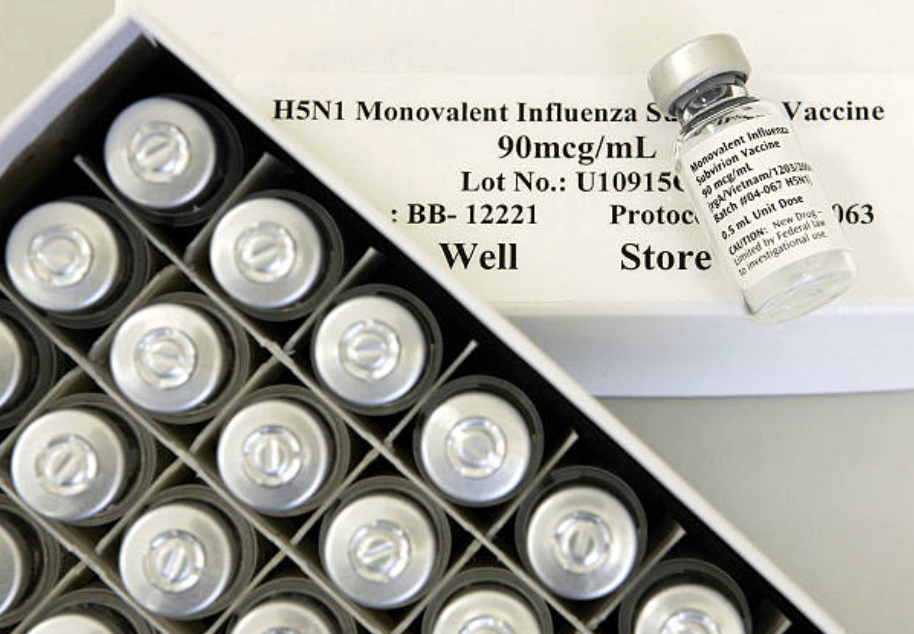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좀비딸’을 살릴 수 있을까?
영화 ‘좀비딸’이 2025년 여름 박스오피스를 강타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이 영화는 아버지 정환(조정석 역)이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딸 수아(최유리 역)를 지키기 위한 고군분투를 그리고 있다. 맹수 전문 사육사인 정환은 좀비 감염자를 색출하는 사회 분위기를 피해 수아와 함께 아머니가 사는 바닷가 마을로 피신한다. 그곳에서 수아가 사람 말을 알아듣고 좋아하던 춤에 반응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좀비딸’을 훈련시키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감염된 딸이 인간성을 유지하고, 아버지의 훈련으로 길들여진다는 이 영화의 독특한 설정은 기존 좀비 장르의 관습을 뒤엎는다.
이전의 '좀비물'에는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의식을 잃고 공격성이 극대화되며, 인간의 살점을 탐식하려는 본능적 충동에 지배당한다. 특히 뇌의 전두엽과 해마 등 고차원적 사고와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이 손상되어 인지능력과 감정조절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이 영화는 좀비를 ‘사자(死者)’가 아닌 ‘산자’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던진다. 감염 후에도 선택적 기억과 정서적 유대가 보존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치료 가능한 환자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 영화적 상상력일까 아니면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
들끓는 부성애, “아빠는 포기 안해”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는 부성애다. 정환은 사회가 감염자 격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딸을 포기하지 못하며, 호랑이 조련 기술까지 동원해 수아를 지키고 회복시키려고 안간힘을 쓴다. 이러한 극단적 부성애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자녀 유대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강력한 유대감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에 의해 조절되는데, 지금까지 이 호르몬은 출산과 수유 과정에서 분비되는 '모성 호르몬'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도 어머니 못지않게 강력한 옥시토신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남성의 뇌에서도 아기와의 상호작용 시 옥시토신 수용체가 활성화되며, 이를 통해 부성 본능과 보호 행동이 발현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루스 펠드만(Ruth Feldman) 바르일란대학교 교수 연구팀이 2012년 정신신경내분비학회지(Psychoneuroendocrinology)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혈장 옥시토신 수치는 각 시점에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부성애가 모성애와 동일한 생물학적 기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버지의 옥시토신 수치가 특정한 양육 행동 패턴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옥시토신은 '애정적 양육 행동'—즉 '엄마말' 발성, 긍정적 감정 표현, 애정적 터치—와 관련이 있었던 반면, 아버지의 옥시토신은 '자극적 양육 행동'—즉 고유수용성 접촉, 촉각 자극, 물체 제시—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펠드만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차이를 '모성적 전형적 양육 행동'과 '부성적 전형적 양육 행동'으로 구분했다. 아버지들의 자극적이고 탐색적인 양육 방식은 진화적으로 자녀의 인지적, 신체적 발달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아버지의 자극적 양육 방식은 영화 속 정환이 호랑이 조련 기술을 활용해 딸을 '훈련'시키려는 행동과 유사성을 보인다. 정환의 독특한 접근법은 부성적 양육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몸이 기억하는 "You're still my No.1"
영화의 주요 플롯은 좀비가 된 수아가 여전히 아버지와 할머니를 알아보고, 춤과 같은 일부 기억을 유지한다는 설정이다. 수아가 가수 보아의 ‘넘버 원’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은 최근 신경과학에서 발견된 ‘기억’에 대한 연구로 접근해 볼 수 있다.
기억은 뇌의 신경세포들이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뇌의 해마와 전두엽, 측두엽 등은 기억 형성과 저장의 핵심 영역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최근 다른 신체의 세포들도 기억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니콜라이 쿠쿠쉬킨(Nikolay V. Kukushkin) 뉴욕대학교 교수 연구팀은 뇌뿐만 아니라 신장이나 신경조직 같은 신체의 다른 부분 세포들도 기억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2024년 11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세포들이 화학적 신호 패턴에 노출될 때 뇌세포와 동일한 '기억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뇌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에서도 일부 기억과 반응이 유지될 수 있는 생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세포들이 신경세포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 '집중-분산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한 번에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보다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 학습할 때 기억 유전자를 더 강하고 오랫동안 활성화시켜 기억이 더 잘 형성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즉, 춤 동작이나 운동 기능 같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몸에 밴 기억은 뇌세포뿐만 아니라 근육과 신경조직의 다른 세포들에도 저장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뇌의 고차원적 인지 기능이 손상되어도 이러한 신체적 기억은 여전히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화 속 수아가 "You're still my No.1"로 시작하는 노래가 시작되자 손을 뻗어 춤을 추는 행동이 신체 전반에 분산된 세포기억 시스템 때문일 수 있다.
평소에 좋아하는 춤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몸에 밴 기억으로 뇌세포뿐만 아니라 근육과 신경조직의 다른 세포들에도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뇌의 고차원적 인지 기능이 손상되어도 이러한 신체적 기억은 여전히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아빠 무는 거 아니야, 알겠지?”, “으어어어”
이처럼 아버지의 훈련과 보살핌 덕분에 수아는 이 세상에 마지막 남은 좀비가 됐다. 여전히 수아는 좀비이지만 행동영역에서는 이전 좀비와는 완전히 다르다. 정환이 사회적 압박과 위험 속에서도 딸을 포기하지 않고 훈련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좀비딸' 수아의 변화된 모습은 옥시토신의 복합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셸리 테일러(Shelley Taylor) UCLA 교수가 2000년 사이콜로지컬 리뷰(Psychological Review)에 발표한 '보살피고 협력하는(tend and befriend) 이론'은 기존의 스트레스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싸우거나 도망치는(fight-or-flight)' 반응이 주요한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테일러 교수는 특히 여성과 부모에게서 나타나는 다른 패턴을 발견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녀를 보살피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응의 핵심에는 옥시토신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옥시토신은 혈압을 낮추고 불안과 공포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위기 상황에서 공격이나 도피보다는 보호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또한 옥시토신이 내인성 오피오이드 펩타이드와 함께 작용하여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옥시토신의 작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주변 환경이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친화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반대로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오히려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영화에서 정환이 감염된 딸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적대시당하면서도 더욱 강하게 딸을 보호하려는 모습과 영화의 결말로 이어지는 이야기의 과학적 근거가 된다.
이처럼 영화 ‘좀비딸’은 아버지의 사랑이 생존의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부모의 사랑은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강력한 생물학적 시스템으로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작동한다. 좀비 바이러스는 영화적 허구이지만, 그 속에 피어나는 가족애는 우리가 가진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인간적인 특성이다.
- 김현정 리포터
- vegastar0707@gmail.com
- 저작권자 2025-08-19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