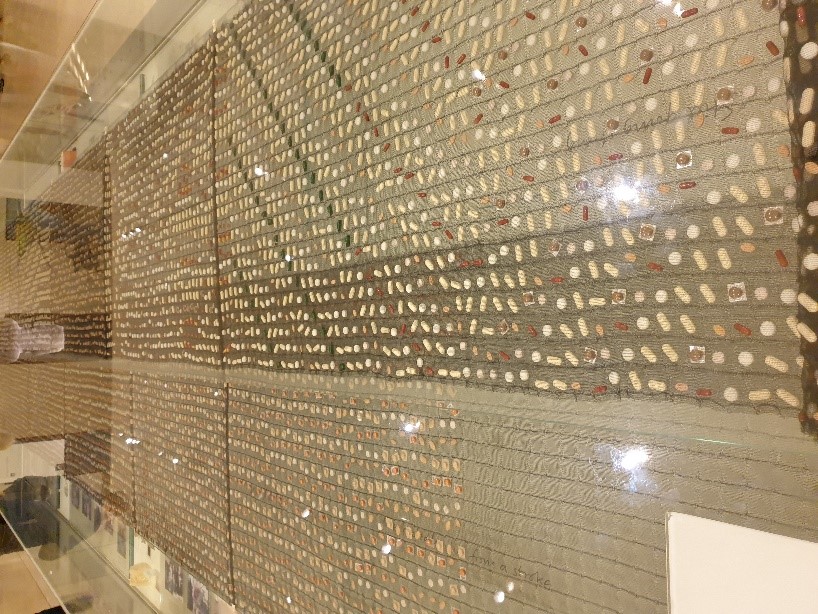지난 6월 16일에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주도한 임상시험에서 덱사메타손(dexamethasone)이 중증 코로나19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여주었다는 예비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WHO는 즉각 ‘과학적으로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대단한 뉴스를 전해준 영국 정부와 옥스퍼드대 관련자들에게 축하를 보낼 정도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뉴스가 사실이라면 약값도 저렴한 데다가 실전에 바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외로 의료계 현장의 분위기는 미지근하다. 덱사메타손은 의사라면 누구나 처방해본 약물이고, 웬만한 병원의 약장에 비치되어 있을 정도로 흔한 약물이기 때문이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쓸 수 있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약물이다.
덱사메타손을 포함하는 스테로이드 약물들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원인도 모르고 치료방법도 없는 병에 걸린 환자가 위중한 상태라면 한 번쯤 써볼 수 있는 약물이었다. 의의로 잘 듣는 병도 많았다. 그러니 산소를 공급해야 하거나 인공호흡기로 숨을 쉬는 중증 코로나19 환자에게도 분명 써볼 수도 있었을 테다. 아니나 다를까, 써보았고 효과가 있어 일단 환자 목숨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예비’ 연구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덱사메타손이 코로나19의 특효약이라 생각할 의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언론이 마치 새로운 특효약이 발견된 것처럼 무분별하게 보도하기 시작한다면 의료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환자나 보호자들이 덱사메타손을 왜 쓰지 않느냐고 물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의사들에게 덱사메타손이나 스테로이드 약물은 언제나 ‘양날의 검’과도 같은 약이다. 언제나 약효보다 부작용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하는 약이다. 어쩌면 의학역사상 스테로이드만큼 극적으로 등장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을 보여주어 정작 그 발견자를 괴롭힌 약물이 드물 정도다.
1928년 미국 미네소타주 로체이터에 있는 메이요 클리닉의 필립 헨치(Philip Showalter Hench, 1896~1965)는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다. 어느 날, 헨치는 환자로부터 특이한 이야기를 듣는다. 의사이자 류머티즘성 관절염을 앓는 65세의 남자는 자신이 간염에 걸려 황달이 생기자 관절염 증상이 아주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에 대해 헨치는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비슷한 사례들을 접하자 헨치는 생각을 바꾼다. 혹시 황달 때 몸속에서 생기는 어떤 물질이 류머티즘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것은 아닐까? 헨치는 그 물질을 일단 ‘X-물질’이라고 부르고는 황달을 이용한 류머티즘성 관절염 치료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먼저 헨치는 황달 때 몸속에서 증가하는 담즙을 X-물질의 제1 후보로 세웠다. 헨치는 류머티즘성 관절염 환자들에게 담즙을 투여해보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다음으로는 간 추출물도 써보고 심지어는 황달 환자의 피까지 수혈해보았다. 모두 허사였다. 아무 효과가 없었다. X-물질은 그 속에 들어 있지 않았다.
아무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 무모한(?) 실험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으니까.
첫째, 황달뿐 아니라 임신 중에도 류머티즘성 관절염이 좋아진다. 둘째, 황달이나 임신 중에는 건초열, 천식, 중증무력증 같은 병들도 좋아진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헨치는 임신이나 황달이나 모두 인체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니 어쩌면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내려 우리 몸이 내뿜는 호르몬’이면서 불필요하게 강한 자가 면역 반응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 무렵 메이요 클리닉의 연구실에는 부신피질 호르몬을 연구하는 켄달(Edward Calvin Kendall, 1886~1972)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대략 30여 종에 이르는 이 호르몬을 ‘코르틴(cortin)’으로 불렀다. 코르틴은 부신 피질(cortex)에서 얻은 물질이란 뜻이다. 켄달은 복합 성분인 코르틴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연구했다.
때마침 그는 헨치의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었고 1948년에 켄달이 만든 ‘E-합성물’을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 이 약을 먹은 환자는 사실상 치료 불가능한 상태였던 29세 여인이었다. 약을 먹은 지 나흘째 되는 날에 그녀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X-물질이 바로 부신피질 호르몬이라는 것에 확신을 얻은 헨치는 추가로 13명의 환자들에게도 약효를 시험했다.
모두 지긋지긋한 류머티즘성 관절염에서 회복되었다. 켄달이 합성하고 헨치가 치료에 쓴 이 물질은 ‘코르티손(cortisone)’이라고 명명했고, 약효를 1949년 봄에 발표했다.
그 결과 1950년 헨치와 켄달은 ‘부신 피질 호르몬 발견’의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다. 역사상 업적에 대해 가장 빨리 수여된 노벨 생리학-의학상이었다.
하지만 기적의 약물로 환영받은 코르티손은 이듬해부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치료받은 환자들의 얼굴이 달덩이처럼 붓고, 위궤양, 피부 조직 흐물거림, 피하 출혈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헨치는 자신이 발견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환자들 때문에 낙담하고 괴로워했다.
하지만 부작용을 줄이는 처방법이 발견되었다. 아울러 코르티손에 대한 개량 작업이 이루어져 개성이 강한 후손들이 세상에 나왔다. 강하고도 부작용이 적어진 프레드니솔론과 프레드니손, 작용이 오래가는 메틸프레드니솔론, 기립성 저혈압에 쓸 수 있는 프루드로코르티손, 그 변형품으로 관절 주사로 많이 쓰는 트리암시놀론,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 환자에게 쓰는 흡입용 베클로메타손과 부데소니드, 그리고 가장 강력하지만 부작용은 더 적은 덱사메타손과 베타메타손 등 모두 부신피질 호르몬의 후손들이다.
그렇다면 스테로이드(steroid)는 무엇인가? 특정한 화학구조를 가진 물질이다. 우리 몸속에서는 부신피질호르몬, 성호르몬, 담즙산, 콜레스테롤 등이 해당되고 자연에도 수백 종의 스테로이드가 존재한다.
헨치가 쓴 코르티손은 부신피질에서 만든 스테로이드다.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억제하는 소염작용이 뛰어났다. 관절염 환자들의 증상이 호전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나온 것이 NSAIDs(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즉, ‘스테로이드가 아닌 소염제’이다.
흔히 아는 아스피린, 나프록센, 이부프로펜, 케토프로펜, 디클로페낙 등이 모두 스테로이드가 아니지만 스테로이드처럼 염증을 없애는 약들이다. 흔히 ‘소염(해열)진통제’라고 부른다.
하지만 아세트아미노펜은 NSAIDs 가 아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소염작용은 약하고 해열진통효과가 크다. 광고에 많이 나오는 해열진통제들은 대부분 아세트아미노펜이 든 약들이 많다.
- 박지욱 신경과 전문의
- yosoolpiri@gmail.com
- 저작권자 2020-06-30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