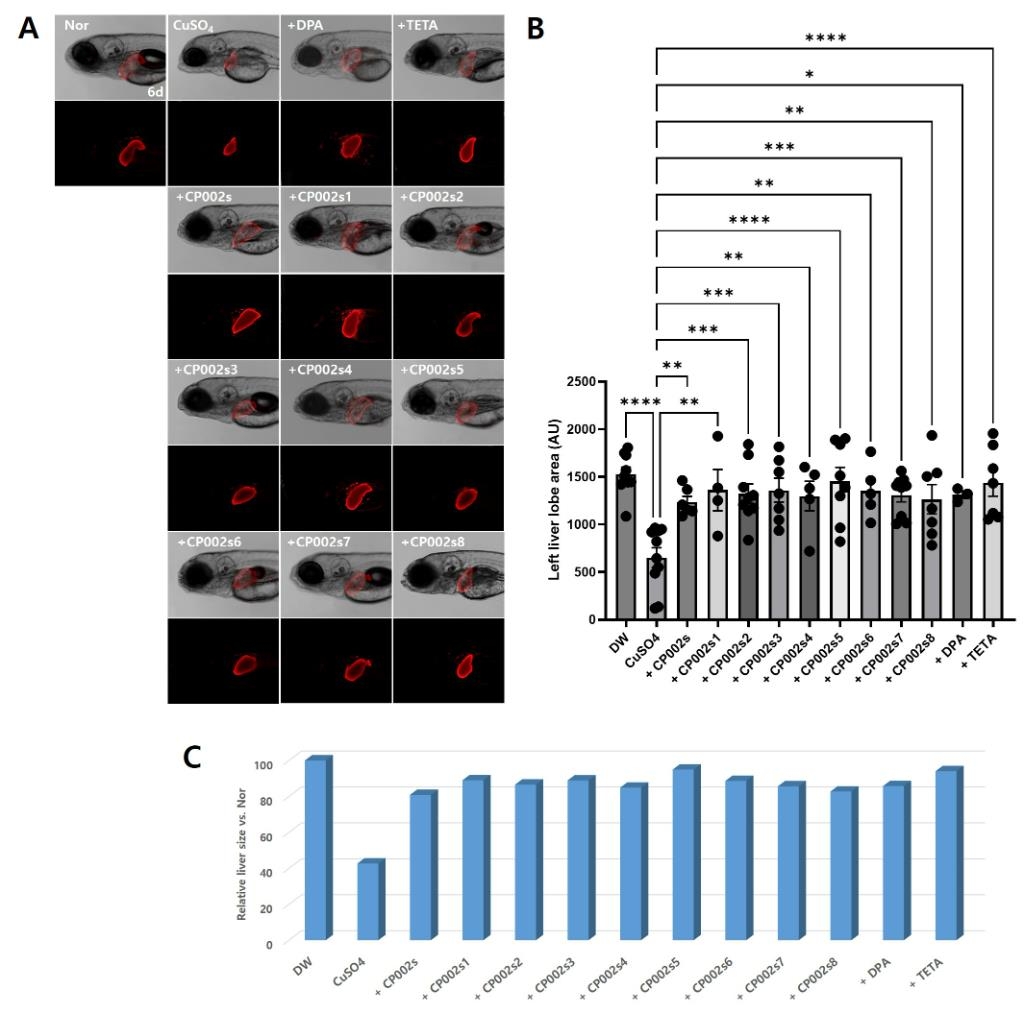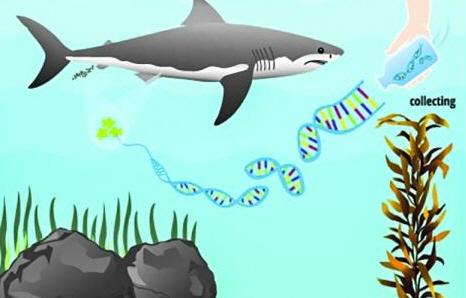지난 2015년 12월 12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 컨소시엄이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연구팀이 고안한 계산방식에 따르면 바다에는 26만8940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떠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고래인 대왕고래(흰수염고래) 1400마리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집계는 북태평양 등 일부 해역을 중심으로 한 기초 자료를 전체 해역에 적용한 것으로 과학자들 스스로 데이터를 더 구체화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그리고 자료를 보충하기 위해 태평양 전역을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실태를 조사해왔다. 이 일을 해온 사람 가운데 찰스 무어(Charles Moore) 선장이 있다. 1997년 첫 번째 쓰레기 섬(garbage patch) 탐사에 참여한 바 있는 인물이다.

“남태평양에 플라스틱 쓰레기 집중돼”
16일 ‘BBC'에 따르면 찰스 무어 선장은 지난 수년 동안 100만 km가 넘는 남태평양 해역을 누비면서 거대한 뗏목처럼 바다를 떠도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추적해왔다. 그리고 최근 귀국해 심각한 해양오염 상황을 공개했다.
무어 선장은 “남태평양 해역을 떠도는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25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다”고 말했다. 한반도 면적이 22만 평방킬로미터, 남한이 10만 평방킬로미터인 점을 감안하면 한반도의 11,4배, 남한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남태평양의 쓰레기 탐사를 기피해왔다. 남반구 환류에 따라 해양을 떠돌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찰스 무어 선장은 지난 수 년 간에 걸쳐 끈질기게 쓰레기 섬을 추적해왔다.
해양학자인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의 에릭 반 세빌레(Erik van Sebille) 박사는 “무어 선장과 그의 동료들의 탐사 결과가 그동안 해양 플라스틱을 놓고 벌어진 논란을 잠재우기에 충분할 만큼 데이터의 갭을 채워주었다”고 말했다.
탐사 팀이 조사한 해역은 열대와 온대 사이의 위치하는 곳으로 남태평양 해류가 흐르고 있다. 유속은 가장자리일수록 커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런 만큼 이 해역에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이 떠도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이번 탐사 결과로 남태평양 환류가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몰고 다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어 선장은 “다른 해역과 비교해 남태평양에 떠돌고 있는 쓰레기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무어 선장은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기구 AMR(Algalita Marine Research)의 창립자다. 지난 30여 년 간 그는 과학자들에게 자신의 배인 ‘알귀타(Alguita)’를 제공하는 등 해양을 떠도는 플라스틱 쓰레기 연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왔다.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 급속히 파괴”
그의 선박 뒤에는 플라스틱을 거르는 장치가 설치돼 있다. 항해 도장 이 장치에 플라스틱이 걸리면 그 플라스틱 성분을 분석해 이 미세한 성분이 해양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기초 자료를 제공해왔다.
무어 박사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태평양뿐만 아니라 대서양, 남·북극해, 지중해 등에도 떠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양의 쓰레기가 떠돌고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현재 무어 선장 연구팀은 현재 쓰레기 섬 추적과 함께 플라스틱 쓰레기가 물고기 등 해양생물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병행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연구에서 특히 심해에 살고 있는 발광어 깃비늘치(Lanternfish)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깃비늘치는 오징어, 황제펭귄 등 주요 해양생물의 먹이가 되는 중요한 물고기다. 무어 선장은 “깃비늘치가 플라스틱 성분을 섭취하면서 나머지 해양생물들 역시 플라스틱 성분에 오염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미 해군의 해양생물학자 크리스티나 보거(Christiana Boerger) 박사는 “플라스틱 오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남태평양 지역을 더 자세히 탐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해양생물 오염 실태를 최초로 증언한 인물이다.
일부 물고기 뱃속에서 먹이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전체 해양 생물 오염으로 발전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쓰레기 배출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바다를 떠도는 플라스틱 대부분은 육지에서 나온 것이다.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내려온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거대한 뗏목과 같은 모습을 형성하면서 바다 속으로 이동을 시작한다. 그러나 남태평양 쓰레기들은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무어 박사는 “많은 쓰레기들이 대규모 어업 종사자, 혹은 어민들에 의해 버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버린 크고작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남태평양 해류를 타고 거대한 뗏목을 형성하면서 흘러 다니고 있다는 설명이다.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늘어나면서 해양생물의 오염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중이다. 위트레흐트 대학 세빌레 박사는 가장 큰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 해안이라고 말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이면서 오염 문제로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사는 “향후 연구가 대륙붕을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심 200m까지의 완만한 경사를 갖고 있는 이 해역은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으로 해양 생물 생존은 물론 미래 어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또한 육지로부터 유출된 플라스틱 쓰레기가 대량 떠돌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최근 거북이, 바닷새 등을 대상으로 수행한 오염실태 연구 결과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각국 정부가 플라스틱 오염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
- 이강봉 객원기자
- aacc409@naver.com
- 저작권자 2017-07-17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