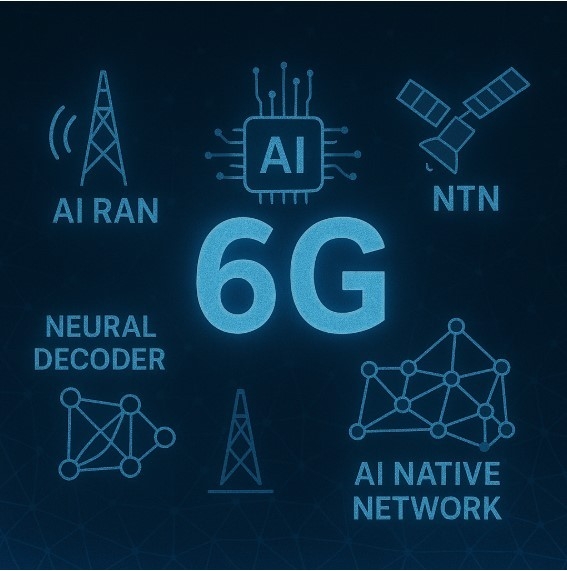경기콘텐츠진흥원은 ‘2023 문화기술 콘퍼런스’를 14, 15일 양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AI가 확장한 문화기술의 세계’를 주제로 AI를 활용한 문화기술의 미래와 산업 전망, 글로벌 문화기술 페스티벌 및 지역활성화 사례, 생성AI 기업의 전문세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14일 개막식과 함께 진행된 기조세션에서는 ‘인공지능의 미래’의 저자 제리 카플란(Jerry Kaplan) 스탠퍼드대학교 교수, ‘특이점의 신화’를 저술한 장 가브리엘 가나시아(Jean-Gabriel Ganascia) 소르본대학교 교수가 참석해 생성AI가 문화기술 산업에 가져온 변화를 통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국내외 AI전문가와 세계적 문화기술 전문기관이 생성AI 전문세션과 생성AI 교육 워크숍을 함께 진행해 이 혁신 기술이 가져올 문화기술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은 새로운 예술형태를 창조해 왔다
생성AI가 등장한 이후 ‘인공지능은 예술가가 될 수 있을까’는 이슈가 줄곧 따라왔다. 일부 서비스 영역에서는 효과적인 솔루션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발전에 가속도가 붙기도 했지만, 문화예술 창작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결과물을 두고 논란이 거셌다. 여전히 AI와 예술의 관계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이지만, 분명한 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기조발제를 한 두 석학은 생성AI는 대단히 지능적인 문화기술 도구이지만, 이것이 문화예술의 위기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기술과 도구가 새로운 예술 형태를 만들었고, 새로운 직업군을 생성해온 것처럼 생성AI는 문화예술 전반을 확장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기? 이제는 기회를 말하다
제리 카플란 교수는 현재를 ‘경제 조정기간’이라고 표현했다. 생성AI가 저비용·고효율의 산업구조를 만들면서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게 되겠지만, 또 다른 직업군과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생겨나면서 수요가 급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기술과 문화예술의 관계가 그랬듯이 이러한 사양(斜陽)과 부상(浮上)이 끊임없이 조정되면서 새로운 기술은 결국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진기술과 애니메이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카메라의 발명은 훨씬 짧은 시간에 더 정교하게 피사체를 모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다보니 효율성 측면에서 화가에 대한 수요가 줄었고, 이 시기에도 새로운 도구에 대한 날선 경계와 예술 분야의 위기론이 있었다. 또 사진기사는 ‘예술가’가 아닌 카메라 버튼을 누르는 ‘기술자’에 포함됐다. 하지만 머지않아 사진을 찍는 기술이 기계적 작동이 아니라 창의적 작업이라는 인식이 생겨났고 지금까지도 사진은 예술의 한 장르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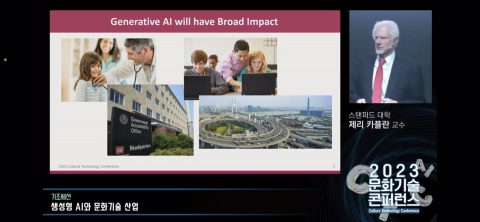
이어 제리 교수는 “애니메이션 창작자가 펜과 종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덜 창의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들은 단지 다른 매개체를 사용해서 작업하는 다른 직업군일 뿐”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애니메이션이 예술작품으로 평가 받고 문화산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르가 된 것처럼 앞으로 문화산업 전반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물론 제리 교수 역시 생성AI가 사회 전반에 순전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확실하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적어도 문화산업에 동반될 몇 가지 문제를 제시하며 경계할 것을 권했다. 먼저 콘텐츠 생성이 쉽기 때문에 저품질 콘텐츠가 넘쳐날 것이며, 생성AI를 훈련시켜 특정 작가를 유사하게 흉내 내거나 복제하는 일, 개인정보 이슈 등은 문화산업 자체의 위기를 가져오는 행위라는 것이다.
끝으로 제리 교수는 생성AI가 인간의 정신적 작업을 감소시킨다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인간의 정신만큼 탄력적인 것은 없다.”면서 이 혁신 기술을 잘 활용하고 다뤄서 작품을 만드는 사람을 숙련된 예술가로 여기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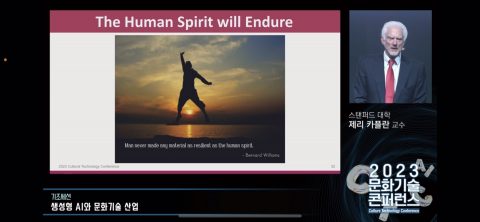
생성AI, 새로운 ‘아우라’를 만들어낼 것
장 가브리엘 가나시아 교수는 ‘생성AI는 예술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변화시키나?’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가나시아 교수는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자와 창작자들이 ‘생각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어왔다고 말했다. 물론 당시에는 생성AI 같은 정교함은 불가능했지만 지금의 생성AI와 유사한 아이디어를 가졌고, 실제로 1950년대 중반에 존 맥커시는 스스로 생각·학습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발표한 사례를 제시했다. 따라서 넓게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기계와 기술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창작해 왔다는 것이다.
가나시아 교수는 이제 생성AI가 인간의 미학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또 생성AI 시대의 결과물과 예술작품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디지털과 생성AI가 재온톨로지화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미 시작된 변화의 시류 속에서 미학도 혁신의 단계를 거치며 가치와 존재가 재정의 되는 중이라는 의미다.
가나시아 교수는 “발터 벤야민이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에서 논했던 ‘아우라’를 우리도 지금 다시 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지 않아서 무엇이 예술인가, 무엇이 아름다움인가에 대한 재정의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예술은 “디지털 아우라”라는 개념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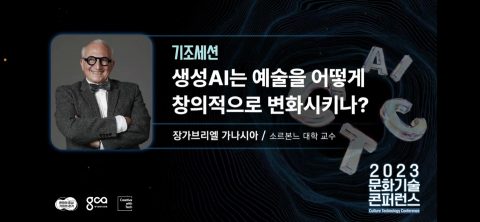
- 김현정 리포터
- vegastar0707@gmail.com
- 저작권자 2023-09-15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