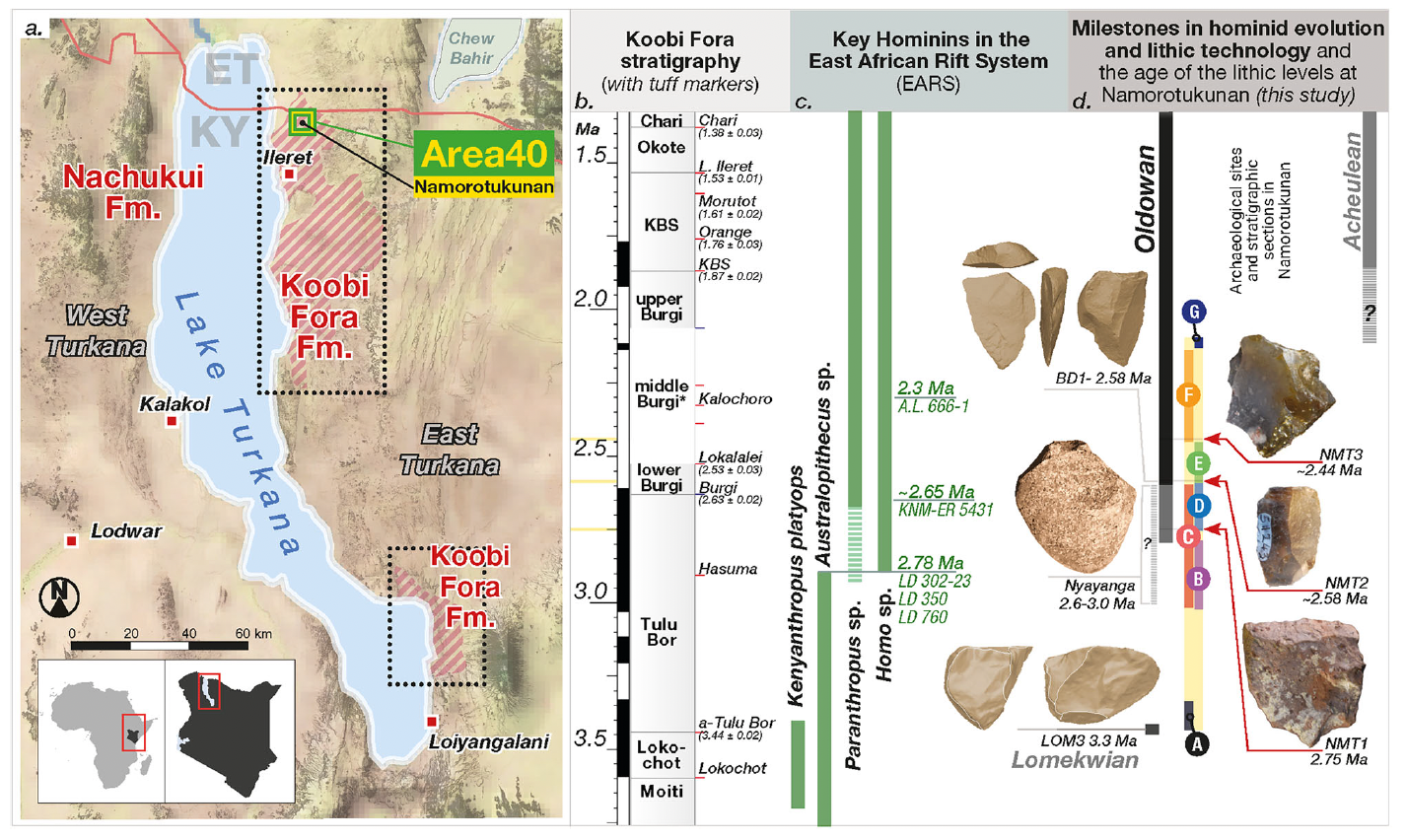이스터섬으로 알려진 라파누이의 거대한 석상 모아이(moai)는 오랫동안 강력한 중앙 권력과 위계적 사회를 상징해 왔다. 이렇게 압도적인 기념비를 세운 사회라면 당연히 강력한 중앙 권력이 있었을 것이며, 모아이 석상은 그 권력이 조직한 대규모 노동의 결과라는 가정이 통용돼 온 이유다.
그런데 최근 이 통념에 의문을 던지며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 PLOS One에 발표됏다. 미국 빙엄턴대학교 인류학과와 애리조나대학교 인류학과, 라파누이 현지 공동체 연구자들은 라파누이의 모아이 채석장 ‘라노 라라쿠(Rano Raraku)’를 초고해상도 3차원 모델로 분석한 결과, 모아이 생산이 중앙 통제 방식이 아닌 여러 자율적 집단이 동시에 참여한 분산형 체계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숲도, 바퀴도, 금속 도구도 없던 섬에서 만들어져 ‘인류 최대의 미스터리’로도 불려온 모아이 석상은 이번 연구를 통해 권력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 조직 방식의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재해석되고 있다.
하나의 채석장이었지만, 하나의 조직은 아니었다?
연구팀이 주목한 라노 라라쿠는 라파누이 모아이의 95% 이상이 나온, 섬 최대이자 사실상 유일한 응회암 채석장이다. 19세기 말부터 여러 탐사와 지도 제작이 이어졌지만, 각 연구가 다루는 구역과 기준이 제각각이라 전체적인 공간 구조와 작업 맥락을 한 번에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이곳은 오랫동안 ‘섬 전체를 통제한 중앙 작업장’으로 간주돼 왔다. 그러나 드론으로 촬영한 1만 1천여 장의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제작한 3차원 모델은 전혀 다른 구조를 드러냈다.
연구팀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DJI 매빅 3 엔터프라이즈 드론으로 라노 라라쿠 일대를 30~50m 저고도로 촘촘히 촬영했다. 총 1만 1,686장의 고해상도 사진을 80% 중복과 지형 추종 비행으로 확보해 하나의 거대한 3D 메시에 통합했다. 이 과정에서 인디헤나 공동체인 ‘Comunidad Indígena Ma’u Henua’가 직접 프로젝트를 요청하고 허가권자로 참여해, 과학적 연구와 현지 문화유산 관리가 긴밀히 연결된 사례를 만들었다.
리포 교수는 “라노 라라쿠는 가파른 사면과 겹겹이 쌓인 작업 흔적이 뒤엉킨, 말 그대로 3차원 퍼즐 같은 장소”라며 “평면 지도만으로는 어느 절벽에서 어느 공방이 어디까지 파고 들었는지, 어느 시점에 어떤 조각이 겹쳐졌는지 가늠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3D 모델 덕분에 특정 모아이와 주변 지형을 원하는 각도에서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426개의 조각 흔적, 30개의 공방… ‘작은 손’들의 거대 공사
3D 모델을 바탕으로 연구진은 모아이 생산과 관련된 특징들을 하나하나 식별해 데이터베이스화했다. 그 결과, 완성품과 미완성품, 바닥에서 막 떠오르는 ‘프리폼(preform)’까지 다양한 단계의 모아이 조각 흔적 426개, 독립된 블록을 떼어내기 위해 파 들어간 도랑(trench) 341개, 실제로 모아이가 떼어져 나간 직사각형 공극 133개, 그리고 밧줄을 걸거나 기둥을 세웠을 것으로 보이는 구멍과 볼라드 등 운반 관련 구조물들이 새로 정리됐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이 방대한 흔적들이 30개의 뚜렷한 작업 구역(quarrying focus)으로 묶인다는 점이다. 각각의 구역은 아직 채석되지 않은 암반이나 자연 지형으로 다른 구역들과 분명히 나뉘어 있었고, 안쪽에는 비슷한 방식으로 파인 도랑과 여러 단계의 모아이 운반 흔적이 반복되어 나타났다.
헌트 교수는 “지도 위에 30개의 공방은 각 구역마다 좁고 길게 뻗어 있어 동시에 연속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인원은 많아야 조각가 4~6명, 주변에서 도구와 밧줄을 관리하고 식량을 대는 사람들을 포함해도 수십 명 규모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 정도 규모라면 섬 전체를 동원한 대규모 노역이라기보다, 친족 단위의 작업장에 더 가깝다”고 덧붙였다.
모아이 운반 실험에서도 최대 수십 명이 석상을 ‘걷는 것처럼’ 세워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어 ‘큰 석상 = 대규모 동원력 = 강력한 중앙 권력’이라는 단순 도식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리포 교수는 “모아이 석상은 거대 국가의 강력한 권력의 산물이 아니라 여러 씨족이 자기 구역에서 작업하면서도 서로 비슷한 형태의 석상을 만들어내는 느슨하지만 단단한 문화적 공유의 흔적”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집권 없이도 가능한 ‘수평적 거대 프로젝트’
3D 모델은 공방의 개수만이 아니라 작업 방식의 다양성도 함께 드러냈다. 이를 근거로 연구진은 라노 라라쿠에서 쓰인 조각 절차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다.
얼굴부터 섬세하게 파내고 나중에 몸을 따라가는 ‘얼굴 우선(face‑outline)’ 방식, 먼저 사각형 블록을 도려내고 그 안에서 몸과 얼굴을 정리하는 ‘블록(block)’ 방식, 수직 절벽에 옆으로 파고드는 ‘측면(lateral)’ 방식이 그것이다. 각각의 방식은 지형 조건과 작업 전통에 맞춰 선택된 것으로 보이며, 전체 채석장을 통틀어 어느 하나의 표준 공정이 강제된 흔적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모아이 형태가 제각각인 것은 아니다. 연구진은 일부 ‘여성형 모아이’처럼 독특한 예를 보여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얼굴과 몸 비례, 자세가 상당히 표준화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트 교수는 이를 두고 “공방마다 손맛은 달랐지만, 모두가 ‘모아이처럼 보이는 모아이’를 만들고자 했다는 점에서 강한 문화적 규범과 정보 공유가 작동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많은 고고학 사례에서 거대 건축과 기념비는 흔히 위계적 국가와 결부돼 왔으나, 라파누이의 경우 정교하게 조직된 수평적 네트워크와 경쟁하는 여러 집단의 에너지가 모여 중앙집권 없이도 거대 사업이 가능했다는 사례를 보여줬다. 리포 교수는 복잡한 협력과 대규모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꼭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만은 아니라면서 “라파누이는 수평적 네트워크와 문화적 전통만으로도 얼마나 큰 일을 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 김현정 리포터
- vegastar0707@gmail.com
- 저작권자 2025-12-18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