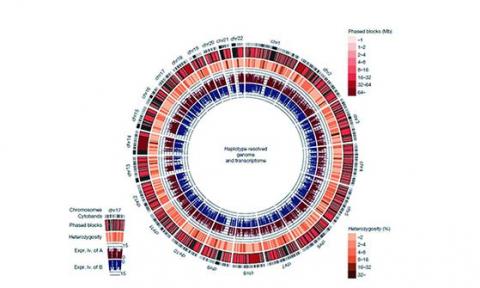“포스트휴먼을 넘어 ‘반인간으로의 전회(nonhuman turn)’의 시대에 인간다움과 사물다움, 기계다움은 무엇일까?
지난 23일 ‘포스트디지털 시대의 문화콘텐츠 산업’이라는 주제로 열린 ‘다다오픈세미나’에서 김현주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던진 질문이다. 김 교수는 “견고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이들의 정의와 경계는 무색해지고 진부해진다”며 인간다움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이야기했다.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
포스트휴먼은 인간이라는 종의 다음에 나타나는 새로이 진화된 인간을 말한다. 즉 과학과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기계와 융합된 인간이 포스트휴먼이다. 여기서 김 교수가 주목한 것은 인간과 기계의 탈경계 담론에 대한 예술적 해석이다.
그녀는 탈경계의 첫 단계가 ‘몸의 탈물질화와 확장, 변이’라고 말했다. 즉 육체라는 경계를 벗어나 여러 기술과 결합해 확장하고 변이된 모습을 미술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는 원격으로 꽃에 물을 주는 미술작품을 소개하면서 “다른 공간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멀리서 로봇이 물을 주도록 조정함으로써 몸이 할 수 있는 일의 개념을 확장하고, 이것이 곧 몸의 확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예로 Paul sermon의 ‘Telematic Dreaming’을 인공위성 네트워크로 가져온 지구 반대편 사람의 이미지와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소통하는 작품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녀는 “침대라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서 가상의 이미지와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탈물질화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정보기술과 생명공학의 발달로 기술이 인간 몸속에 삽입되거나 생활에 밀착되어 포스트휴먼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행위예술가로 꼽을 수 있는 스텔락 호주 커틴대 교수가 “로봇과 몸이 결합된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확장될 수 있는 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피부를 영혼과 자아를 위한 경계이며 동시에 세계가 시작되는 경계로 보고 그것을 늘리고 뚫고 조작하는 기술을 사용해 그 경계를 허물뿐 아니라 피부가 더 이상 경계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도록 한 스텔락 교수의 작품들은 신체의 구조 변화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적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몸의 경계를 허물고 확장하는 방법이 개조부터 삽입, 성형, 그리고 유전자조작까지 더 확대되고 있는데, 왼쪽 팔에 인공 귀를 이식한 스텔락 교수의 작품이 그 대표적 사례다. 스텔락 교수는 연골을 배양해 만든 ‘제3의 귀’를 자신의 왼팔에 삽입했다. 이에 대해 스텔락 교수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몸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자신의 예술적 아이디어의 원천이고 이것이 바로 과학과 예술의 본격적인 융합이라고 했다.
포스트휴먼 시대를 넘는 실험적 예술
김현주 교수는 몸의 경계를 허물고 확장성을 보여주는 자신의 작품들도 소개했다. 기술사회 속의 백색 소음 속에서 반응하는 인간이 점점 사이보그로 변해가는 과정을 담은 영상작품을 보여주면서 진정한 인간다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또 거대한 몸의 이미지가 투영된 영상들 사이로 작은 기계, 로봇이 돌아다니는 작품을 보여주면서 “몸이라는 것이 한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채널과 네트워크를 통해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것을 계기로 김 교수는 로봇 기술을 예술에 접목시킨 ‘로보틱스 아트(Robotics Art)’ 개념을 도입한 ‘트윗봇(TweetBot) v1.0 System’이라는 작품을 선보이게 됐다. 그 배경은 손으로 터치할 수 없는 디지털미디어에 로보틱스 아트 개념을 넣어서 훨씬 더 물질적이고 신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음으로써 디지털과 기계의 융합을 시도한 것이다.
트위터에 외롭다고 올린 글들을 영상으로 만들고, 그 사이를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는 이 작품을 통해 그녀는 “디지털 세계에서 순간적으로 사라져 가는 인간의 감정이 로봇과 수없이 많은 메모를 통해 기억되면서 사람들과 기계의 관계성을 나타내려 했다”고 이야기했다.
그 다음 도전은 ‘로보틱스 아트’를 넘어 로봇과 공연예술의 융합을 보여주는 ‘로봇을 이겨라’라는 실험극이다. 그녀는 “미래는 기술의 발전으로 로봇이 포스트 액터로 등장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했다”며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감정이 없는 로봇이 연기까지 리얼하게 해낸다면 로봇의 확장성은 어디까지일지가 궁금해진다”고 말했다.
요즘 김 교수는 ‘시적 기계-쉬어가기’라는 전시회를 열고 있다. 기계문명의 심화로 인해 인간은 기계로부터 소외되고, 고도화된 기계를 다루는 인간은 기계를 사물화하여 소외한다는 내용이다. 그녀는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 로봇 등 오늘날의 현란한 기술적 수사들을 내려놓고 고요히 돌아가 사물과 나에 대한 명상과 휴식의 상황을 만들고 싶었다”고 전시 의도를 밝혔다.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연구자인 김현주 교수는 다양한 디지털 영상과 실험적인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연구, 창작해 왔다. 그는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이루어낸 미학적, 사회 문화적 변화들에 관심을 갖고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비물질성과 인간이 테크놀로지와 상호작용함으로써 변화된 일상과 포스트 휴먼적인 현상들을 융합적이고 혼성적 매체로 풀어내고자 노력해 왔다. 그녀의 전시회는 오는 12월 5일까지 미디어극장 아이공에서 열린다.
- 김순강 객원기자
- pureriver@hanmail.net
- 저작권자 2017-11-24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