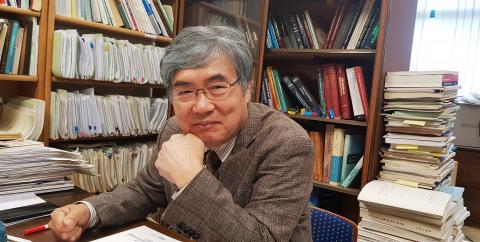취임식은 검소하면서도 진지하고 따듯한 분위기 가운데 열렸다. 카이스트 역사상 처음으로 동문이 총장에 오른데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신성철 카이스트 16대 총장 취임식이 15일 카이스트 대강당에서 열렸다. 신 총장은 경기고-서울대 응용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1977년 카이스트 대학원 고체물리학과를 졸업했다.
카이스트 총 동문회장인 고정식 전 특허청장은 축사 도중 두 번이나 신 총장을 돌아보며 감격을 표시했다. 축가를 준비한 사람도 11명으로 구성된 교수합창단이었다. 이중 절반 이상은 나이가 지긋한 원로교수였다. 선배 교수들은 신 총장이 가장 좋아하는 ‘선구자’를 골랐다.
인류문명에 기여하는 카이스트 제시
권숙일 한림원 원장은 물리학계의 후배인 신 총장이 학문적으로 얼마나 탁월한 성과를 낸 사람인지를 길게 설명하면서 ‘존경하는 후배’임을 밝혔다.
신성철 총장의 취임사는 열정과 비전으로 가득했다. 40년 전 그가 카이스트를 다닐 때의 꿈은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었다. 이제 신 총장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크게 발돋움한 카이스트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학생들에게 “인류사회와 문명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비전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 총장은 5가지 혁신을 제시했는데 그 방향은 그가 인용한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의 말에 잘 나타난다.
‘현재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이 현재를 만들어간다.’
총장 취임사는 이상민 의원의 표현대로 “특강”에 가까웠다. 1971년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아직도 매우 낮아 북한과 겨우 비슷해졌을 때, 정부는 카이스트를 설립했다.
가발수출로 만족하고 있을 때, 기술없이는 더 이상 발전이 어렵다는 과학자들의 건의를 박정희 대통령이 받아들여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방법으로 이공계 인재들을 불러 모아 만든 첫 번째 대학원 중심 대학이 바로 카이스트이다.
최고의 인재를 끌어모은 방안은 카이스트에 입학하면 군대를 면제해준다는 조건이었다. 이 절대적인 조건을 무기삼아 카이스트는 단번에 대한민국의 이공계를 대표하는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발돋움했다.
신 총장은 취임사에서 과감하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그것은 ‘글로벌 가치창출 세계선도대학’(Global Value-Creative World-Leading University)이다. 세계적인 학문적 가치, 기술적 가치, 경제적 가치 창출을 통해서 인류문명사회구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는 방법론으로 신 총장은 ‘5가지 혁신’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교육혁신’이다. 융합능력과 협업능력에 윤리의식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해 학사과정에 기초과학(물리,수학,화학,생물)과 기초공학을 집중 교육시킬 것을 제시했다.
기초공학에 포함되는 학문은 컴퓨터 코딩, 통계, 자동제어, 엔지니어링 디자인 등이다. 통섭적 인문사회과목을 공통필수로 정해서 좌뇌나 우뇌 뿐 아니라 전뇌(全腦)교육을 제시했다. 신 총장이 꼽은 인문사회과목은 비교역사학, 동서양철학, 예술사 등이다.
협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팀기반 학습이나 그룹연구를 활성화하고 카이스트 글로벌 리더십센터의 설치도 제시했다. 학사과정에 무학과 교육시스템 트랙을 도입해서 기존의 학과중심교육과 투트랙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연구혁신’의 핵심은 융복합 연구의 정착이다. ‘융복합 연구 매트릭스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공을 초월한 융복합 연구그룹을 집중육성하겠다고 신 총장은 밝혔다. 교수와 학생이 연구에 참여하는 매트릭스 연구조직을 만들고 세계적 명성의 플래그십 연구그룹을 10개 정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가 은퇴하면 문을 닫는 연구단절의 고리를 끊기 위해 도입하는 ‘협업연구실제도’는 연령대별로 세부전공교수를 구성하는 방안이다.
연구-개발-사업 고리 만들어야
세 번째는 기술사업화 혁신이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개발(R&D)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연구개발사업(R&DB Research, Development, Business)을 이루는 것이 목표이다.
국제화 혁신은 네 번째 목표로서 신 총장은 “교육 연구실적에 비해 세계대학평가에서 저평가되는 주요원인으로 국제화지표가 낮은 것”을 꼽았다. 영어소통이 원활한 글로벌 캠퍼스 구축, 외국인 교수 채용비율의 확대(9%에서 15%로) 외국인 학생 비율 5%에서 10% 확대 등이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미래전략혁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신 총장은 “설립 60주년을 바라보면서 신 총장은 기관 비전과 혁신적 전략을 담은 ‘비전 2031 장기플랜’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 총장은 "5가지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변화(Change)하고, 소통(Communication)하며, 돌보는(Care) '3C 리더십' 으로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리더가 되겠다"고 말했다.
신 총장은 교직원에게 한 당부에서 출연연구소, 지역사회, 부설기관(고등과학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및 GIST, DGIST, UNIST 등 다른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했다.
카이스트 총장은 권위적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정부나 정권의 입김이 많이 작용해서 선발됐다는 인상을 줬다. 카이스트가 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기자 노벨상 수상자인 러플린 총장에 이어 미국적인 서남표 총장 그리고 역시 미국적인 강성모 총장 등 외국인 총장 시대가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에는 동문총장이 처음 탄생했으니 동문들의 감회가 남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카이스트는 11,700명의 박사를 포함해서 58,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 심재율 객원기자
- kosinova@hanmail.net
- 저작권자 2017-03-16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