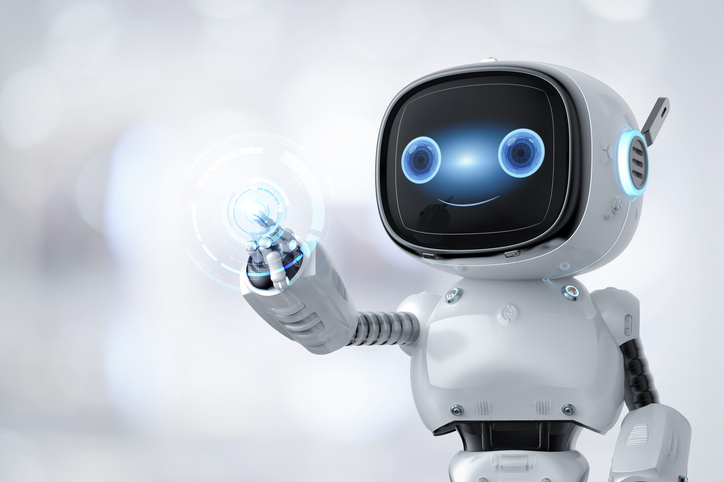하루에도 수십 번,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린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과 같은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하 SNS). 하나의 메시지를 다 읽기도 전에 다른 메시지가 도착한다. 끊임없이 던져지는 일방적인 메시지들에 정신이 없다.
누군가와 끊임없이 소통한다는 것은 뿌듯함을 주는가? 당신의 인간관계에서 스마트폰 혹은 SNS가 차지하는 정도는 얼마나 되는가?
지하철 옆자리에 앉아 SNS로 대화하다
![]() 2009년에 개봉했던 영화 ‘김씨표류기’에서 정려원이 맡았던 ‘여자 김씨’는 얼굴에 있는 화상흉터와 정신적인 소외감으로 인해 집 밖으로는 전혀 나가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격리돼 살아가는 인물이다. 대신 여자 김씨는 인터넷 속 가상의 세계에서 사회생활을 구축한다. 김씨는 타인의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에서 맘에 드는 사진을 골라 자신의 미니홈피를 꾸며 마치 자신의 삶인 듯 가장하고 친구를 만든다. 영화 속 인물은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하지만, SNS는 개인이 보여주고 싶은 것으로만 이루어진 철저히 구성된 공간이다.
2009년에 개봉했던 영화 ‘김씨표류기’에서 정려원이 맡았던 ‘여자 김씨’는 얼굴에 있는 화상흉터와 정신적인 소외감으로 인해 집 밖으로는 전혀 나가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격리돼 살아가는 인물이다. 대신 여자 김씨는 인터넷 속 가상의 세계에서 사회생활을 구축한다. 김씨는 타인의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에서 맘에 드는 사진을 골라 자신의 미니홈피를 꾸며 마치 자신의 삶인 듯 가장하고 친구를 만든다. 영화 속 인물은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하지만, SNS는 개인이 보여주고 싶은 것으로만 이루어진 철저히 구성된 공간이다.
SNS의 초기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미니홈피는 스마트폰, 태블릿 PC등의 보급과 함께 형태는 간략하면서도 더 확산적인 전달방식으로 진화했다. 트위터의 메시지 전달은 미니홈피보다 더 일방향적이고 공개적이다. 또한 스스로 한 건의 단문을 남기지 않더라도 타인의 메시지를 팔로잉, 리트윗하면서 내 트위터 공간을 채워갈 수 있다.
![]() 카카오톡도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순간 단문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늘어나는 말풍선 형태의 창도 사실 하나하나 툭툭 끊어져 있는 개별 메시지인 것이다.
카카오톡도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순간 단문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늘어나는 말풍선 형태의 창도 사실 하나하나 툭툭 끊어져 있는 개별 메시지인 것이다.
SNS는 기본적으로 만남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나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린 단문이나 사진을 보고 반응한다. 팔로워와 팔로잉의 인물들을 실제로 거리에서 스쳐지나가도 서로 모를 수 있다. 지하철 옆자리에 앉아서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트위터를 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팔로워와 리트윗은 ‘나’라는 사람이 아닌 ‘내 글을 지지해주는 피상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하지만 진짜 당신을 믿고 따라주는 사람 냄새나는 친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트위터로 만난 사람들이 인스턴트 음식과 같이 느껴지지는 않는가?
이제는 개인 네트워크 서비스로
2010년 11월 15일 서비스를 시작한 패스(path)는 50명 이하의 사람들 간에 사진, 비디오, 메시지를 공유하는 소규모 집단으로 구성된 SNS 애플리케이션이다. 패스의 창시자인 데이브 모린(Dave Morin)은 일찍이 페이스북의 플랫폼 매니저였다. 그는 어떤 대화나 메시지,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홍보성과 공공성을 띄고 있어 사생활 노출에 위험이 있는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의 문제점에 주목했다.
패스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을 위해 개발된, 특정 정보를 친한 사람들하고만 공유하는 그룹형 서비스이다.
![]()
50명이라는 숫자는 옥스퍼드대의 진화심리학자인 로빈 던바(Robin Dunbar) 교수가 제시한 던바의 법칙에서 비롯됐다. ‘던바의 법칙’은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숫자가 최대 150명이라고 설명한다. 패스는 던바의 수를 반영하여, 5명은 가장 가까운 친구들로, 20명을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는 친구들로 생각했고, 나아가 언제, 어떠한 포스트를 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개인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의 수를 최대 50인으로 한정했다.
패스는 오프라인에서의 지인들을 SNS로도 연결시켜준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그룹형태로 특별한 일에 대해 대화를 하거나 사진을 올릴 수 있고, 모임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패스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나오고 있다. 하나는 기존의 SNS인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반해 새롭게 등장한 안티 소셜 네트워크, 즉 ‘개인화된 네트워크 서비스(personal network service)’로서 다소 사적이고 개인적인 공간을 추구한다는 견해다. 이는 패스가 여타 SNS와는 차별화됐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패스가 트위터와 같은 ‘간략하고 일방적인 소통방식’과 페이스북과 같은 ‘사적인 친교목적의 개인블로그’를 결합한 형태라는 의견이다. 결국은 기존의 SNS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패스는 친구들 간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아닌’ 또 다른 앱을 사용해야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패스를 활용하는 유저의 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그 밖에 GroupMe, Frenzy, Rally UP, Shizzlr, Beluga, Disco 등도 패스와 비슷한 소규모 그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NS, 소통과 단절 조절하는 능력 요구
결국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개인화된 네트워크 서비스 모두 손안의 조작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과의 만남이다.
SNS가 오히려 직접적인 인간관계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너무 침해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드러나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삶에 미치는 SNS의 영향력을 배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해 개인의 인간관계에 있어 소통과 단절을 조절하는 능력이 더 요구될 것이다.
누군가와 끊임없이 소통한다는 것은 뿌듯함을 주는가? 당신의 인간관계에서 스마트폰 혹은 SNS가 차지하는 정도는 얼마나 되는가?
지하철 옆자리에 앉아 SNS로 대화하다
SNS의 초기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미니홈피는 스마트폰, 태블릿 PC등의 보급과 함께 형태는 간략하면서도 더 확산적인 전달방식으로 진화했다. 트위터의 메시지 전달은 미니홈피보다 더 일방향적이고 공개적이다. 또한 스스로 한 건의 단문을 남기지 않더라도 타인의 메시지를 팔로잉, 리트윗하면서 내 트위터 공간을 채워갈 수 있다.
SNS는 기본적으로 만남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나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린 단문이나 사진을 보고 반응한다. 팔로워와 팔로잉의 인물들을 실제로 거리에서 스쳐지나가도 서로 모를 수 있다. 지하철 옆자리에 앉아서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트위터를 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팔로워와 리트윗은 ‘나’라는 사람이 아닌 ‘내 글을 지지해주는 피상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하지만 진짜 당신을 믿고 따라주는 사람 냄새나는 친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트위터로 만난 사람들이 인스턴트 음식과 같이 느껴지지는 않는가?
이제는 개인 네트워크 서비스로
2010년 11월 15일 서비스를 시작한 패스(path)는 50명 이하의 사람들 간에 사진, 비디오, 메시지를 공유하는 소규모 집단으로 구성된 SNS 애플리케이션이다. 패스의 창시자인 데이브 모린(Dave Morin)은 일찍이 페이스북의 플랫폼 매니저였다. 그는 어떤 대화나 메시지,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홍보성과 공공성을 띄고 있어 사생활 노출에 위험이 있는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의 문제점에 주목했다.
패스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을 위해 개발된, 특정 정보를 친한 사람들하고만 공유하는 그룹형 서비스이다.
50명이라는 숫자는 옥스퍼드대의 진화심리학자인 로빈 던바(Robin Dunbar) 교수가 제시한 던바의 법칙에서 비롯됐다. ‘던바의 법칙’은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숫자가 최대 150명이라고 설명한다. 패스는 던바의 수를 반영하여, 5명은 가장 가까운 친구들로, 20명을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는 친구들로 생각했고, 나아가 언제, 어떠한 포스트를 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개인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의 수를 최대 50인으로 한정했다.
패스는 오프라인에서의 지인들을 SNS로도 연결시켜준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그룹형태로 특별한 일에 대해 대화를 하거나 사진을 올릴 수 있고, 모임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패스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나오고 있다. 하나는 기존의 SNS인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반해 새롭게 등장한 안티 소셜 네트워크, 즉 ‘개인화된 네트워크 서비스(personal network service)’로서 다소 사적이고 개인적인 공간을 추구한다는 견해다. 이는 패스가 여타 SNS와는 차별화됐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패스가 트위터와 같은 ‘간략하고 일방적인 소통방식’과 페이스북과 같은 ‘사적인 친교목적의 개인블로그’를 결합한 형태라는 의견이다. 결국은 기존의 SNS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패스는 친구들 간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아닌’ 또 다른 앱을 사용해야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패스를 활용하는 유저의 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그 밖에 GroupMe, Frenzy, Rally UP, Shizzlr, Beluga, Disco 등도 패스와 비슷한 소규모 그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NS, 소통과 단절 조절하는 능력 요구
결국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개인화된 네트워크 서비스 모두 손안의 조작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과의 만남이다.
SNS가 오히려 직접적인 인간관계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너무 침해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드러나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삶에 미치는 SNS의 영향력을 배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해 개인의 인간관계에 있어 소통과 단절을 조절하는 능력이 더 요구될 것이다.
- 조서영 객원기자
- livelygreen@naver.com
- 저작권자 2011-05-18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