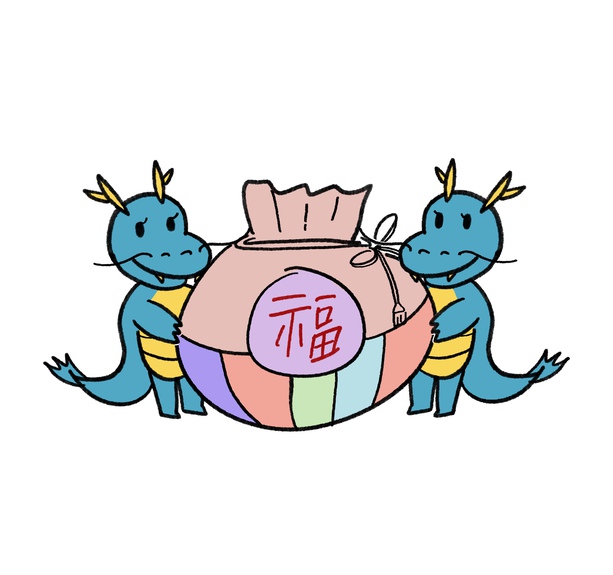지금으로부터 약 6,600만 년 전, 지구로 접근한 소행성은 멕시코 유카탄 반도를 강타했다. ‘칙술루브(Chicxulub) 충돌구’를 만든 이 사건으로 공룡 대부분이 멸종하고, 지구 식물과 동물 70% 이상이 사라졌다. 백악기와 신생대 제3기인 팔레오세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을 ‘K-Pg(백악기-팔레오세) 멸종’이라 부른다.
최근 남아메리카 열대우림 탄생에 관한 해석이 제기됐다. 파나미 스미소니언 열대연구소 고생물학자인 카를로스 자라밀로 박사 연구진은 “백악기 남아메리카 숲은 칙술루브 충돌로 지금의 열대우림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칙술루브 충돌 지점에서 남쪽으로 약 1,500km 떨어진 곳에서 콜롬비아 K-Pg 경계에 걸친 꽃가루 화석 5만개와 잎 화석 6,000개를 분석했다. 그리고 혜성 충돌 전후인 백악기 후기 마스트리히트세(Maastrichtian, 7,450만~6,640만 년 전)와 팔레오세(Paleocene Epoch, 6,500만~5,500만 년 전) 식물상을 비교 해석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 2일자에 게재됐다.
충돌 전후 캐노피 구성하는 식물상 변화
칙술루브 충돌 전후의 남아메리카는 두시기 모두 덥고 습한 기후였다. 하지만 식물상과 숲 형태는 차이를 보였다. 당시 화분과 나뭇잎 화석기록에 따르면 백악기 말에 속씨식물이 서식했지만, 숲을 구성하는 주요 식물은 겉씨식물과 양치류였다.

특히, 침엽수가 많아 빛을 이용할 수 있는 캐노피(Canopy, 숲 나뭇가지들이 지붕 모양으로 우거진 상태) 밀도가 낮았다. 화석기록에 따르면 카우리 소나무(학명 Agathis australis), 남양삼나무과(Araucariaceae) 계통의 침엽수가 주요 수종을 이뤘다.
하지만 K-Pg 멸종 이후 숲을 대표하던 침엽수는 사라지고 꽃 피는 속씨식물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잎 넓은 상록활엽수와 관목, 초본 식물 등이 크게 번식하고, 그늘이 생기면서 여러 형태의 음지 및 반음지 식물이 자리 잡았다. 연구진은 현대 열대우림처럼 다양한 식물이 계층화된 분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숲의 구성원은 바뀌었지만, 다양성을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자라밀로 박사는 “충격 후 1,000만 년 동안은 회복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멸종의 여파를 짐작할 만하다.
공룡‧침엽수 멸종, 토양 비옥화 등…현대 열대우림 탄생 요인
침엽수가 주를 이뤘던 숲이 어떻게 단 한 번의 소행성 충돌로 현재의 열대우림으로 바뀌게 됐을까. 연구진은 꽃가루와 잎의 증거를 바탕으로 세 가지 가설로 설명했다.

우선 공룡 멸종이 원인이라는 점이다. 백악기 말에는 대부분 초식성이었던 공룡이 숲을 밟거나 나뭇잎과 가지 등을 섭취하면서 식물의 서식지를 교란, 캐노피 밀도를 낮췄다. 캐노피 밀도가 낮으니 식물 간 햇빛에 관한 부족함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캐노피 밀도를 방해하던 공룡이 사라지면서 식물들 사이에는 ‘빛 경쟁’이 시작됐고, 다양한 빛 환경에 생존하는 식물이 출현했다는 해석이다.
또 토양 영양분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가설이다. 칙술루브(Chicxulub) 충격으로 발생한 화산재는 토양에 인(P)을 제공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인은 식물 성장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풍부한 토양 비옥도를 제공해 식물의 번식력을 높였다. 또 이 과정에서 질소를 고정하는 콩과식물의 번식을 견인하고 콩과식물 증가는 질소순환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연구진은 K-Pg 경계의 고토양(Paleosol, 과거에 만들어져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토양) 분석과 동위원소 측정을 통해 알아냈다.
마지막 가설은 선택적 식물의 소멸과 관련이 있다. 백악기 말 주요 수종으로 추정되는 침엽수인 남양삼나무과 계통은 다양하지 않았지만, 당시 캐노피 환경을 구성하는 주요 수종이었다. 하지만 서식 범위가 좁아 멸종 충격에 취약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반면 배수체 빈도가 높은 속씨식물 계통은 멸종에 강한 저항성을 띠었고, 결국 K-Pg 멸종은 개화 식물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연구진은 이런 여러 가설이 현재 열대우림 구성에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 연구자인 모니카 카르발류 박사는 “열대우림 생태계는 급격한 교란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 오랜 시간 생태계들이 교체되는 과정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 정승환 객원기자
- biology_sh@daum.net
- 저작권자 2021-04-15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