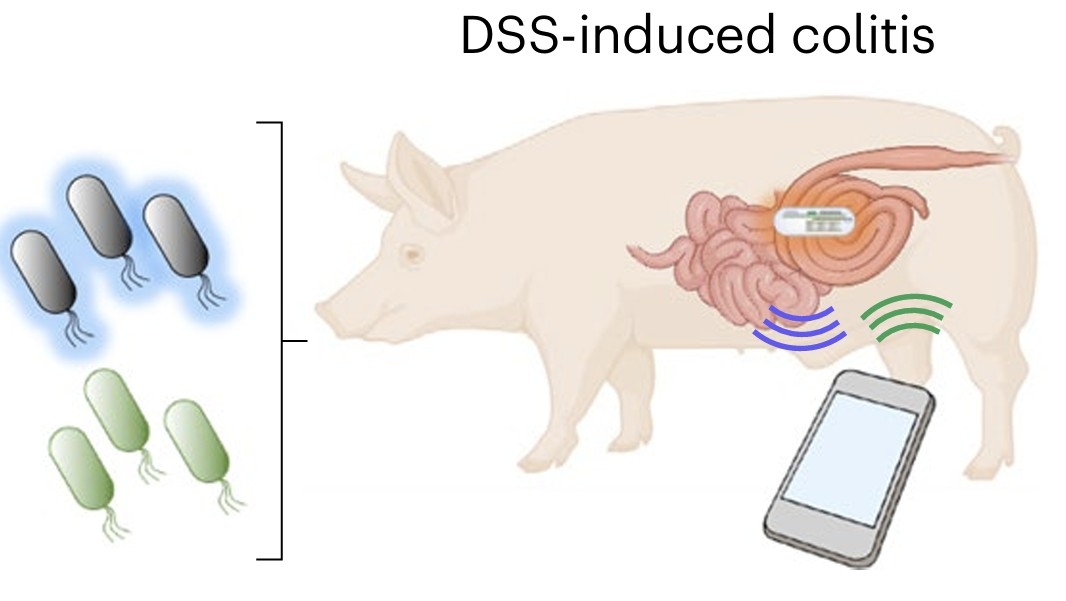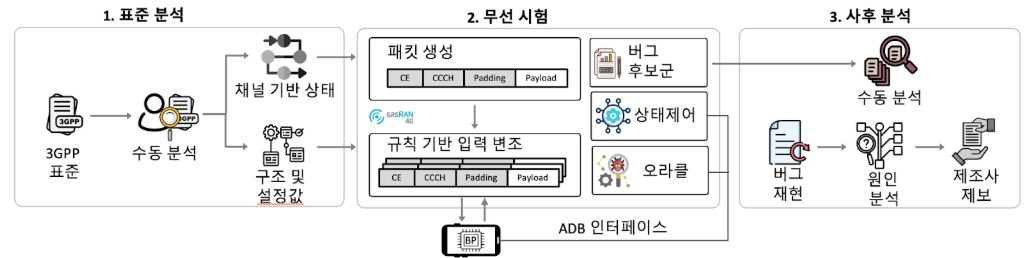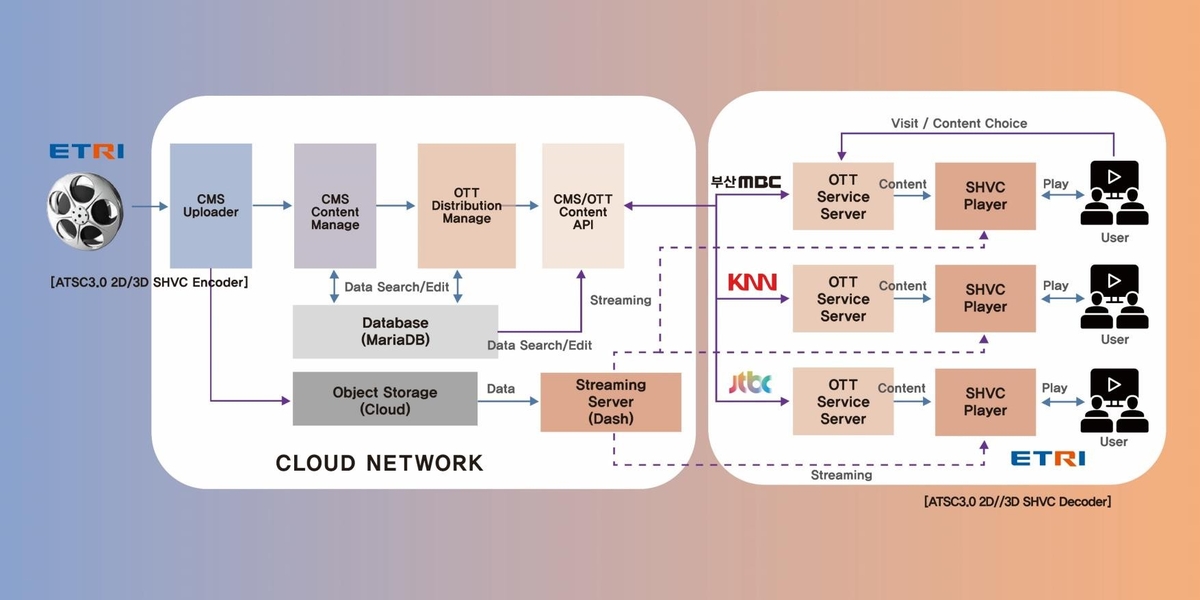성격 요소(personality traits)는 연인이나 대인관계, 직업, 건강과 수명과 같은 삶의 여러 부분에 관여하는 것으로 연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은 학업 성취가 더 좋고, 일의 성과나 건강, 대인관계, 수명의 질이 더 좋은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성격 요소는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성장하는 과정에서나 어른이 된 이후에라도 지속해서 변화가 가능하다는 연구들 역시 꾸준히 보고되어 왔다. 이때, 말하는 변화는 속도가 더딘 것이지만, 감정 변화가 적어진다거나 자신감이나 사교성과 같은 부분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이 가능하고, 그런 경우 자연히 이후 삶의 여러 부분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성격 요소에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미칠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
최근 ‘미국 국립과학원회보’에 실린 연구에 의하면, 이 같은 성격 변화를 유도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1,500여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 사용하게 한 결과, 대조군과 비교해 실험군에서 참여자 스스로에게서,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성격의 변화가 있었다. 이는 임상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앱을 통해 성격 변화를 돕는 첫 증거라고 연구진은 밝히고 있다.
연구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피치(PEACH)가 사용되었는데, 사람들이 성격 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고 이를 유지하도록 미세한 개입(microintervention)을 하도록 고안된 앱이었다. 치료 내용은 최신 심리요법식 접근을 기반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이 같은 개입과 치료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스스로 목표로 하는 상과 현재 자신과의 차이를 잘 인지하도록 도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개입이 긍정적인 피드백 회로를 만들고 유지해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변화를 위한 힘과 의지를 갖도록 돕고, 장기적인 통찰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자신감과 기대감, 동기부여 등을 적절히 깨닫게 돕는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을 외부 개입 없이 스스로가 돌아보고 스스로 개입할 힘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앱의 치료 내용이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해 개입을 극대화하고 성격 요소 변화를 효과적으로 돕도록 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에 참여한 건강한 성인 1,500여 명은 모두 10주의 치료 기간을 거쳤는데, 그중 랜덤으로 고른 ⅓ 정도의 ‘한 달 대기자’ 군은 참여 이후 치료 시작까지 한 달간 기다리는 시간을 두고, 이 치료 없이 대기하는 기간을 평가한 것을 ‘대조군(control)’로 사용하고, 나머지 참여자 ⅔를 앱을 통해 치료한 이후 평가한 것을 ‘실험군’으로 해 비교하는 방식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26.7퍼센트가 신경질을 줄이는 것을 원했고, 26.1퍼센트는 성실성을 높이는 것을, 24.6퍼센트는 더 외향적으로 변하는 것을 원한다고 답했다. 더불어, 7.4퍼센트의 참여자는 개방성을 높이는 것을, 6.4퍼센트는 우호성을 줄이는 것을, 4.1퍼센트는 우호성을 높이는 것을, 2.6퍼센트는 성실성을 낮추는 것을, 1.9퍼센트는 개방성을 낮추는 것을, 0.2퍼센트는 외향성을 줄이는 것을 원했다.
먼저, 연구진은 ‘대조군’에 해당하는, 참가자들 일부가 치료 전에 한 달간 대기하는 동안 유의미한 성격 요소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앱으로 치료를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원하는 방향으로 유의미한 성격 요소의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외향성을 높이거나, 신경질을 줄이거나, 성실성을 높이거나, 우호성을 높이거나 낮추려던 참여자들은 현저하게 변화를 볼 수 있었지만, 성실성, 외향성을 낮추거나 개방성을 높이거나 낮추려던 참여자들에게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목표로 하는 성격 요소와 방향에 따라 앱의 개입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친구나 가족과 같은 주변인들이 참여자들의 변화를 느끼는지를 묻고 이를 평가에 포함했는데, 참여자 자신들보다 주변인들이 느끼는 변화는 조금 낮은 경향을 보였지만, 변화를 포착하는 경향성에서는 참여자들에게서 본 패턴과 비슷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연구진은 이같이 변화한 성격 요소가 지속해서 유지되는지를 알기 위해, 앱 사용 후 3개월 후에 한 차례 더 평가했는데, 스스로 느끼는 변화와 주변인이 보고한 변화 모두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디지털 앱의 개입이 건강한 성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격 요소를 변화시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성격 요소가 안정적인 편으로 변화시키기가 어렵다고 믿어오던 기존의 시각에 도전을 던지는 것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한다. 나아가, 정책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 같은 변화가 개인들과 사회에 불러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경제적이고 사용이 쉬운 이 같은 도구를 더 널리 사용할 방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 한소정 객원기자
- sojungapril8@gmail.com
- 저작권자 2021-03-02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