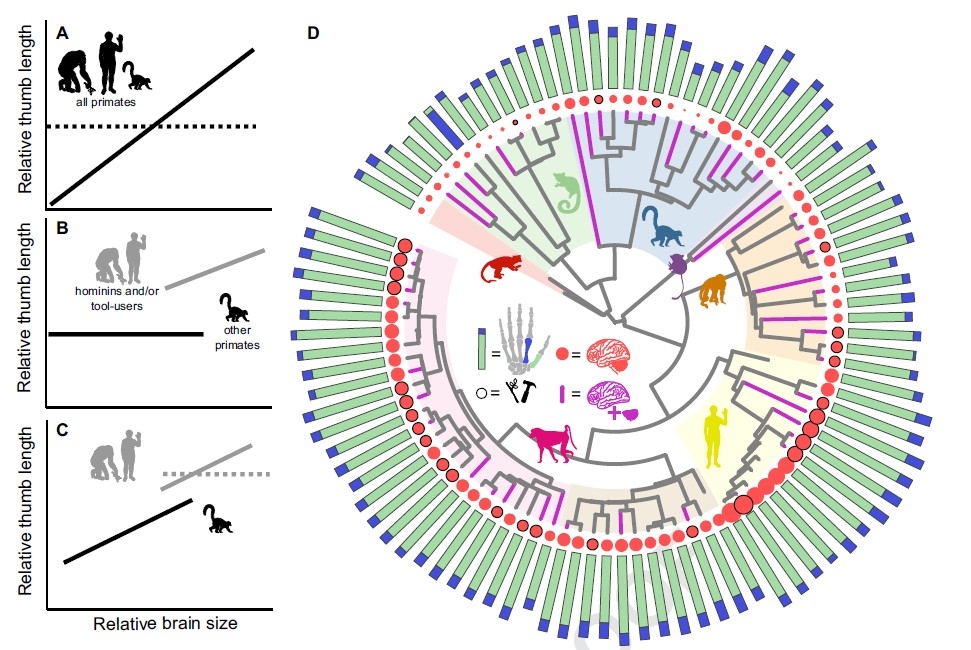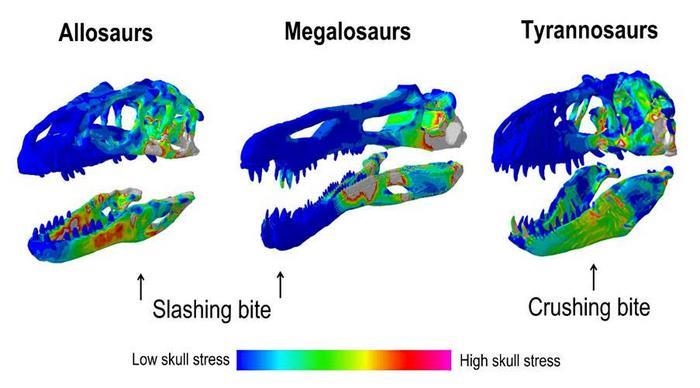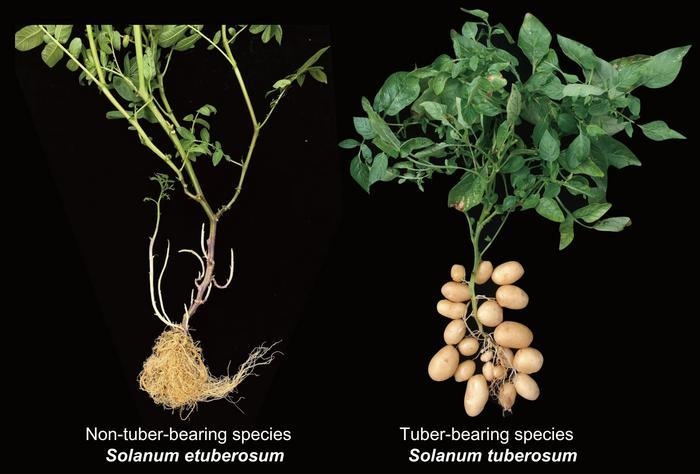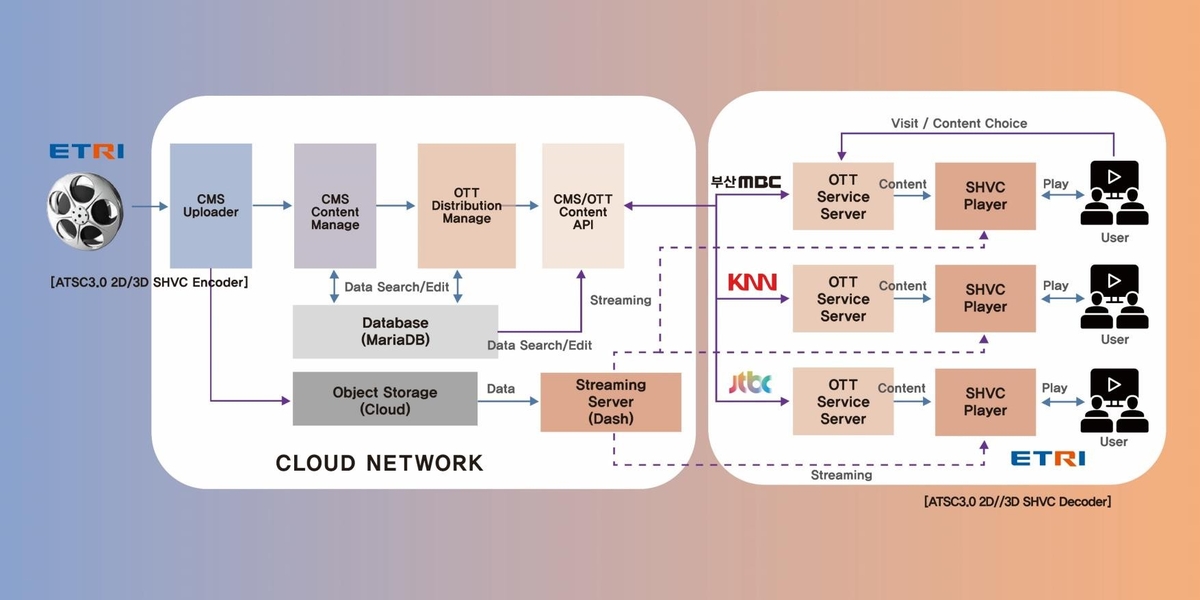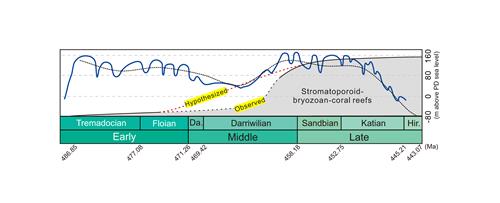북미에 서식하는 찌르레기(cowbirds)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매우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새끼를 키운다.
다른 종(種) 들의 둥지에 알을 낳은 후 마음씨 좋은 다른 새들이 자신의 새끼를 돌보도록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새들의 알들과 섞여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게 마련이다.
당하는 쪽에서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진화 과정에서 끊임없이 대처법을 발전시켜왔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새끼의 삶과 죽음이 걸려 있는 기생 새와 착한 새들 사이에 이 치열한 신경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비슷한 알 낳아 남의 둥지에서 번식
그동안 과학자들은 새가 알의 겉모습을 보고 자신의 알과 다른 알을 구분하고 있으며, 자신의 알과 남의 알의 겉모습이 비슷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남의 알을 키우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것은 이 식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런 추정이 최근 과학자들에 의해 실제로 확인되고 있다.
6일 ‘사이언스’ 지에 따르면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 대학의 진화학자인 대니얼 핸리(Daniel Hanley) 교수 연구팀은 찌르레기가 어떤 식으로 알을 낳고 있으며, 남의 둥지에서 어느 정도 안전하게 번식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관찰하는데 성공했다.
찌르레기는 자신의 알이 남의 둥지 안에서 다른 새에 의해 키워질 수 있도록 다른 새와 비슷한 색상과 문양의 알을 낳고 있었다.
핸리 교수 연구팀이 찌르레기의 희생자로 지목한 것은 흉내지빠귀(chalk-browed mockingbird)다. 다른 새의 소리를 흉내 내는 데도 익숙하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
이 새는 연한 청록색에 점이 있는 알을 낳는다. 반면 북미산 찌르레기는 순수한 흰색서부터 갈색 등 다양한 색상에 점박이 문양이 있는 알을 낳는다.
핸리 교수 연구팀은 이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3D 프린터로 찌르레기 알의 색상과 문양이 다른 알서부터 유사한 알에 이르기까지 70종의 알을 만들었다. 그중 절반은 점 문양이 있는 알들이었다.
그리고 85차례에 걸쳐 (어미가 없을 때) 이 알들을 흉내지빠귀 둥지 속에 가져다 놓은 후 이 알들이 어떤 운명에 처하는지 관찰했다.
그 결과 흉내지빠귀는 점박이 문양이 없는 갈색의 가짜 알 들, 그리고 흉내지빠귀의 알과 전혀 다른 색상과 문양을 지닌 알들을 열이면 아홉 제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점박이 문양이 있는 갈색 알의 경우 제거율이 60%에 머물렀다.
착한 새 쪽에서도 정교한 식별법 적용
전체적으로 흉내지빠귀는 푸른 색 계통 알에 관대했다. 자신의 알보다 훨씬 더 진했는데도 불구하고 푸른색이면 자신의 둥지에 받아들이고 있었다. 점박이 문양이 있는 알에 대해서는 더욱 관대했다. 90% 이상의 알을 보호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통해 흉내지빠귀가 푸른색의 점박이 문양이 있는 알을 자신의 알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은 최근 생물학 저널 영국 ‘왕립학회 자연과학 회보 B(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에 게재됐다. 제목은 ‘Higher-level pattern features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to birds when recognizing and rejecting parasitic eggs’이다.
한편 영국 링컨대학 쉬나 카터(Sheena Cotter) 교수는 핸리 교수와 달리 남의 알을 정확하게 식별해 남의 새끼를 키우지 않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진화학자 메리 캐스웰 스토다드(Mary Caswell Stoddard) 교수 연구팀은 그동안 아프리카 잠비아 숲에서 번성하고 있는 프리니아(Prinia subflava) 사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고하고 있다.
교수는 프리니아가 다른 새의 알을 거부한 122건의 사례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고성능 컴퓨터를 통해 거부당한 알들의 색상과 문양, 형태, 크기 등의 특징을 찾아낸 후 그동안 몰랐던 패턴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프리니아는 알을 식별할 때 형태(shapes)와 얼룩 반점의 위치를 정교하게 확인하고 있었다. 연구팀은 특히 알 표면에 나타난 얼룩 반점의 위치를 자신의 알과 비교해 진위를 확인하는 일은 매우 뛰어난 식별력을 갖추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프리니아는 다른 새가 지니고 있지 않은 이런 탁월한 능력 때문에 흉내지빠귀와 같은 다른 새들처럼 남의 알을 거의 키우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새들 역시 프리니아의 알들 속에 자신의 알을 끼워 넣기가 매우 힘들고, 부화를 위탁하는 경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관련 논문은 ‘왕립학회 자연과학 회보 B’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Higher-level pattern features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to birds when recognizing and rejecting parasitic eggs’이다.
동시에 발표된 이 논문들은 찌르레기와 같은 이런 기생 새들이 자신의 알 부화와 새끼 부양을 남에게 떠맡기는 문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더욱 영리하게 진화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스토다드 교수는 “자신의 알을 남의 둥지에서 키우려는 많은 기생 새들이 그동안 그 방식을 진화시켜온 만큼 그 반대편에서는 방어적으로 정교한 식별 방법을 진화시켜왔다”며, “새들 간의 신경전이 상상한 것보다 더 복잡하고 뛰어나다”고 말했다.
- 이강봉 객원기자
- aacc409@naver.com
- 저작권자 2019-03-07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