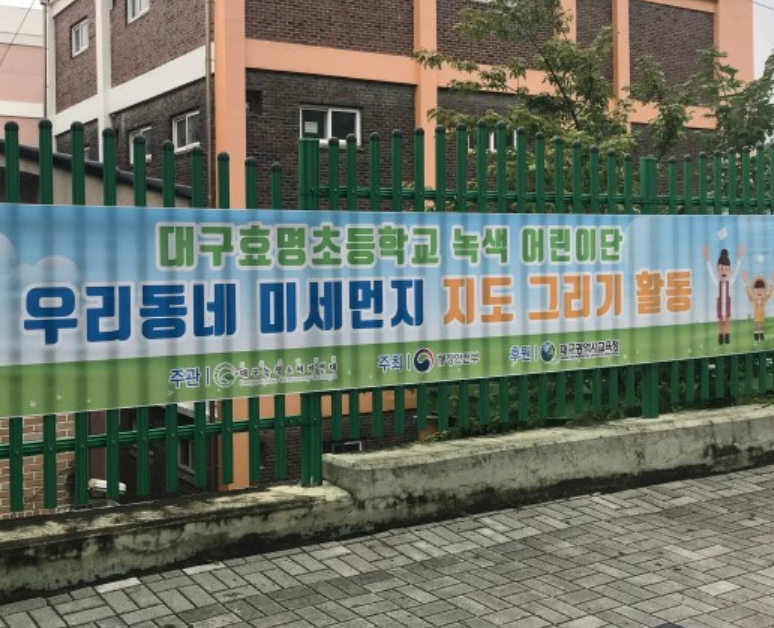야간에 작업을 하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자가 발광 키트를 활용하여 가시성이 향상된 의복을 개발한다든지 망막질환 진단을 위해 거치대 없이 비전문가도 촬영이 가능한 보급형 안저카메라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생활 속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연구들이 모두 리빙랩(Living Lab)이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증 방법론으로 도입된 리빙랩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직접 나서서 현장을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용자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위에 야간작업자 안전의복도 연구자와 사회적 경제조직,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함께 참여해 개발한 사례다.
최근 고령화, 지진, 미세먼지, 거대 해조류 등 우리 주변에 많은 생활문제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참여가 확대된 R&D인 리빙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 주도는 물론 지자체, 풀뿌리 민간 조직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리빙랩 활동의 성찰과 과제는?
지난 28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는 세종국책연구단지 대강당에서 ‘한국 리빙랩 활동의 성찰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7차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을 열었다. 특별히 이날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정덕영 고령친화R&BD센터장이 한국시니어리빙랩의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은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령친화 사업 인프라를 강화하고 고령친화 산업기술의 고도화하며 고령친화 산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고령친화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정 센터장은 “체험관 내에 IOT융합 고령친화제품을 체험해 보고 실제 사용자들인 어르신들의 평가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는 실증실과 고령자 신체기능향상을 위한 운동기기를 통해 각 건강지수와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실을 마련해 놓았다”며 “여기서 모아진 의견과 정보들이 고령친화기업의 제품 개발에 사용됨으로써 고령자들의 생활 속 문제해결을 돕는 시니어리빙랩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시니어리빙랩에서는 고령자 문화 및 콘텐츠 향유 실증실도 운영하고 있다. 모바일과 스마트기기의 발전과 맞물려 시니어의 문화콘텐츠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고령자를 위한 직접적인 콘텐츠 개발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곳을 통해 시니어의 인지적, 신체적 특성을 모으고 그것이 문화콘텐츠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정 센터장은 “리빙랩의 유형에는 기초, 원천기술을 최종 사용자의 니즈와 연계하여 진화시켜 나가는 ‘사업화 프로젝트 리빙랩’과 플랫폼 개념의 리빙랩이 있는데, 한국시니어리빙랩은 리빙랩 플랫폼에 해당한다”며 “프로젝트형 리빙랩이 진화해서 인프라로 발전하면서 형성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고령사회에 진입했음에도 우리는 고령자를 위한 특화된 연구기관이나 시설이 미비한 상태”라며 정 센터장은 “시니어 대상 연구개발자와 생산자, 소비자가 집결하는 일종의 플랫폼이 있어야 고령소비자인 시니어의 생활 밀착형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니어리빙랩이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시니어리빙랩 운영 사례 소개
이를 위해 한국시니어리빙랩에서는 200여 명의 액티브 시니어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욕창 예방 국부 압력조절 스마트 전동침대’의 사용성 평가, ‘고령자 배회방지시스템’의 사용성 평가 등을 통해 시니어 소비자 중심의 제품 개선과 고령친화사업의 성공을 이끌어냈다.
정 센터장은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고령자들이나 도서벽지, 쪽방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건강과 편리, 정서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그동안은 사용자의 정보 수집을 위해 손목에 차거나 피부에 붙이거나 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었다”며 “이것은 대부분의 고령자들의 IOT기술에 익숙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착용에 대한 심적 물리적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소비자인 고령자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 센터장은 “시니어리빙랩을 통해 고령자들의 특징을 파악한 결과 ‘IOT 기반 비침습․무접촉 건강모니터링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성과 사례를 소개했다.
결론적으로 정덕영 센터장은 “이제는 연구실 중심의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서 벗어나 리빙랩 중심의 제품 개발 프로세스로 바뀌어야 한다”며 “연구개발에 시니어가 제품개발의 주체로서, 직업 참여하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시니어를 단순히 사용성 평가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성 평가 작성에서 실행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전국의 리빙랩들이 활동성과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리빙랩 주체들 간의 연계협력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KNoLL)’가 조직되었다. 이를 처음부터 진행해 온 성지은 STEPI 연구위원은 “리빙랩 운영과 관련된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보다 조직적으로 리빙랩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효율성을 더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순강 객원기자
- pureriver@hanmail.net
- 저작권자 2018-03-29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