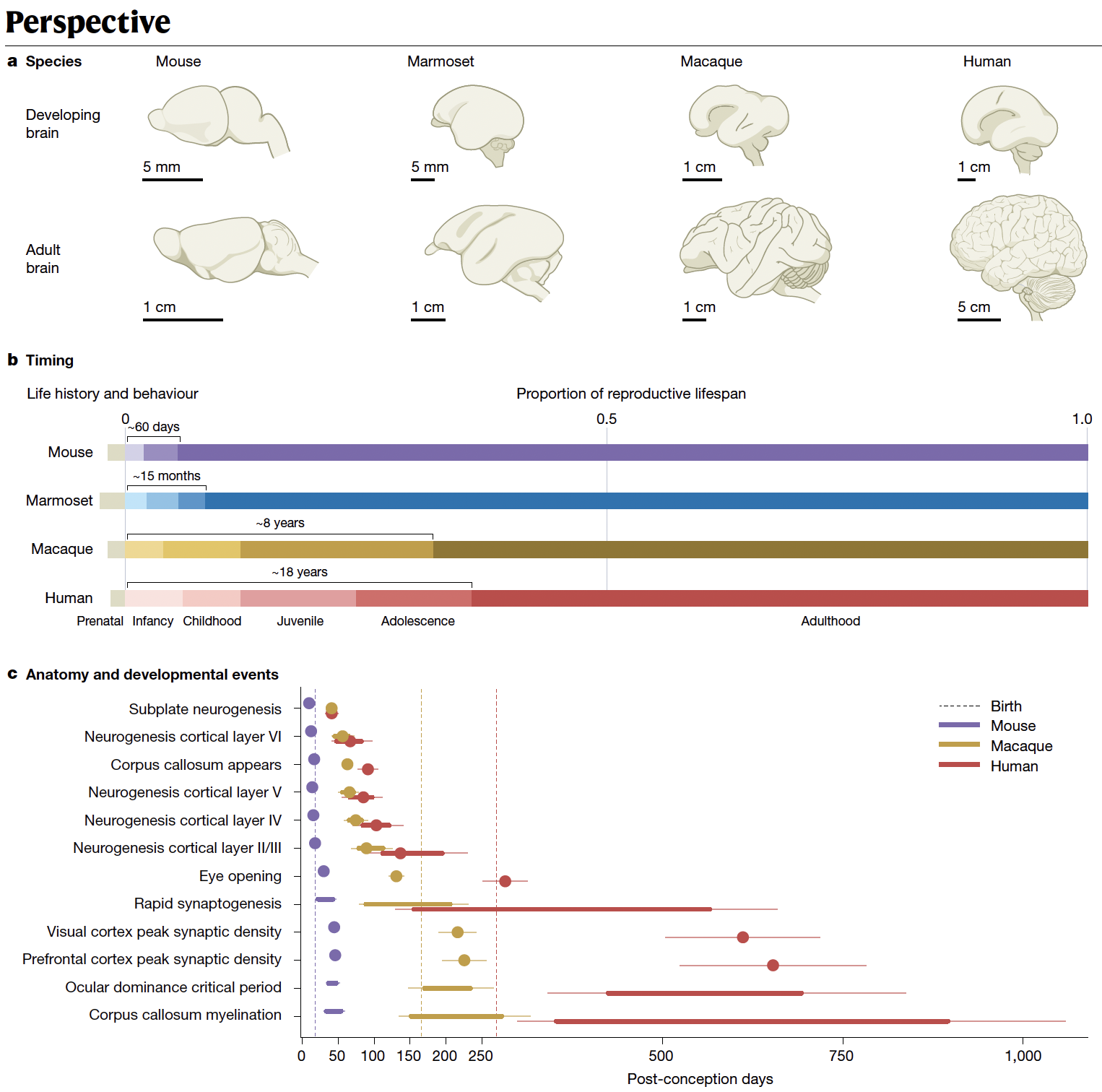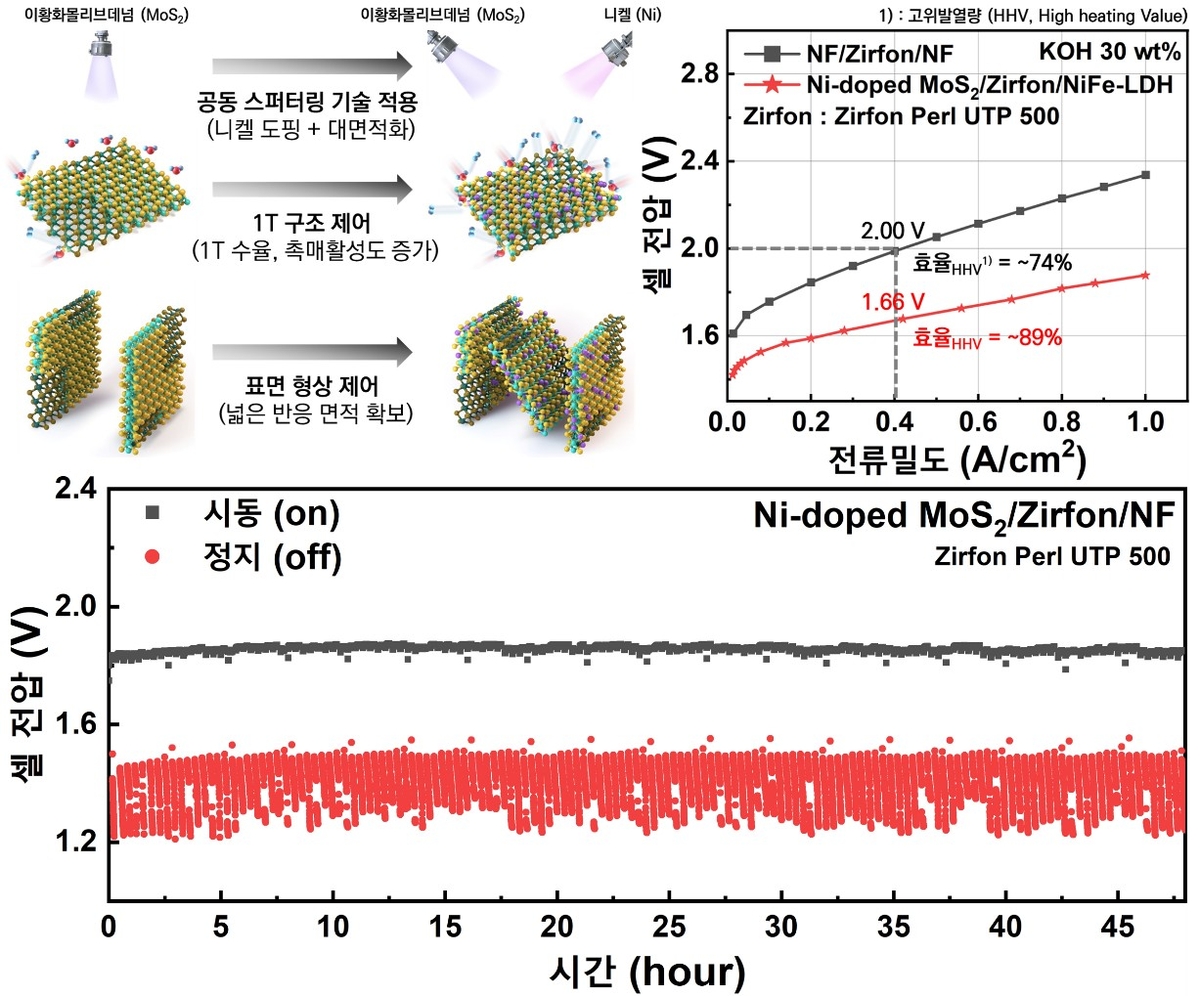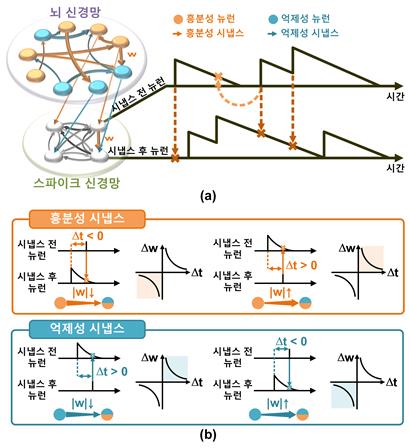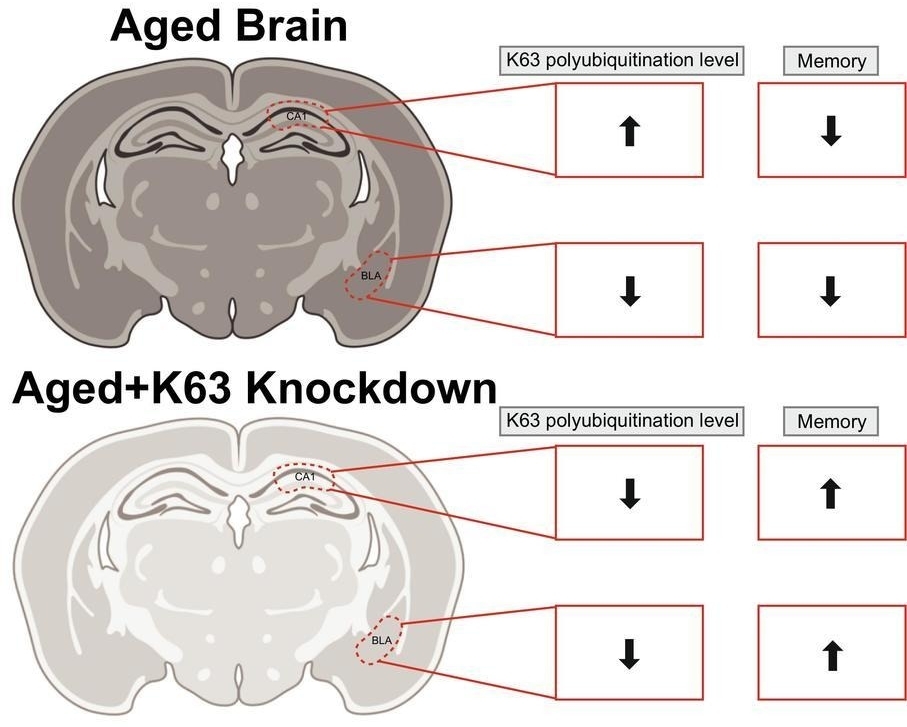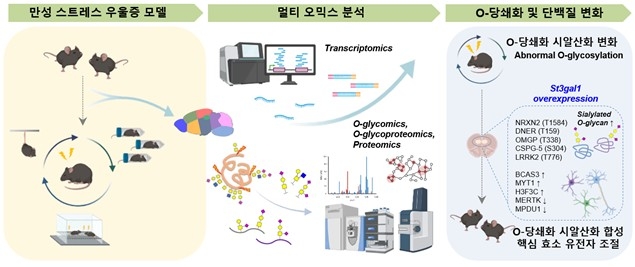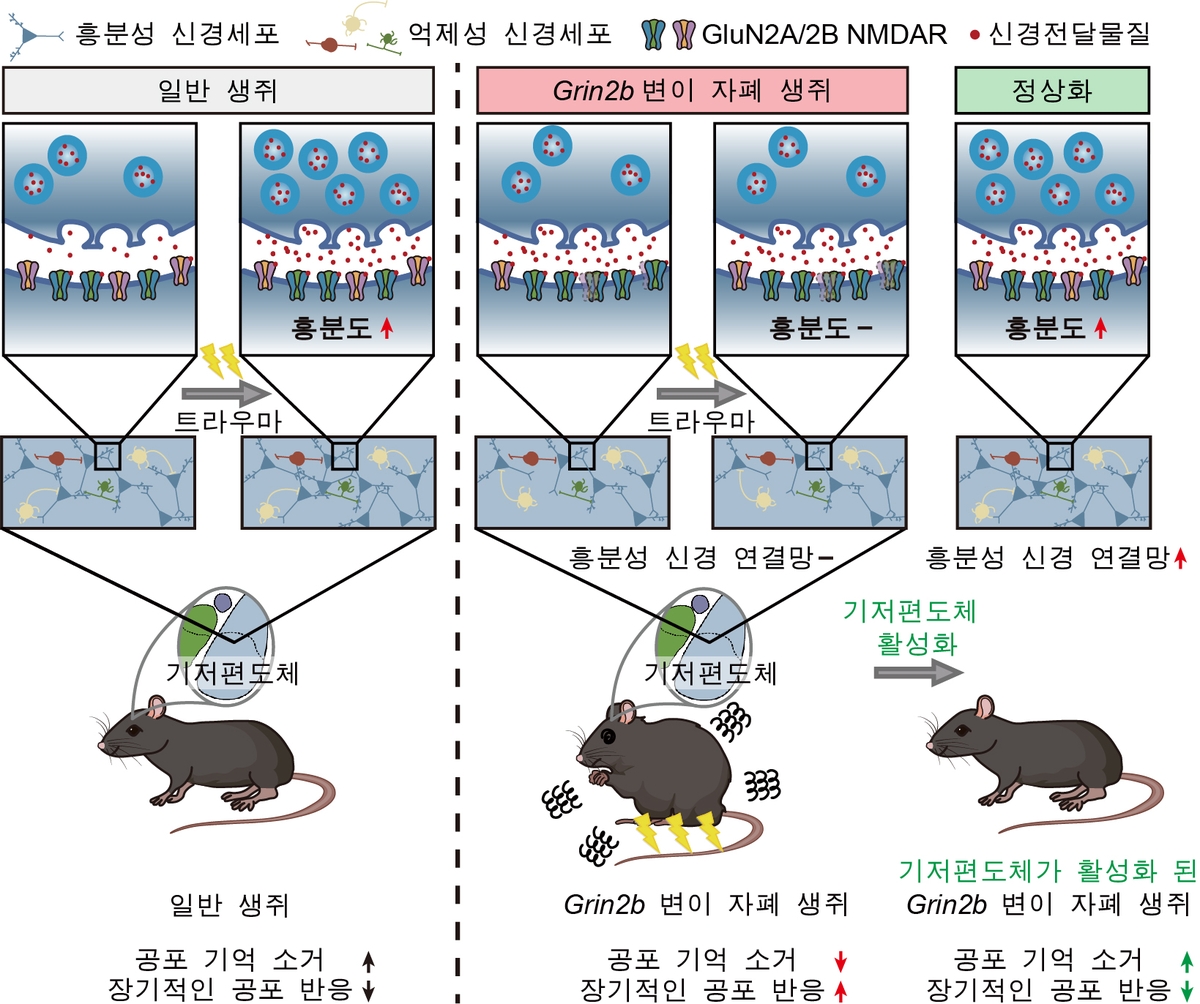지난 2003년 미국 에모리대학의 신경과학자 헬렌 메이버그(Helen Mayberg) 교수는 심각할 정도의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험적인 실험을 시작했다. 그 실험은 ‘구역 25(area 25)’라 불리는 부위에 전극을 심는 일이 포함돼 있었다.
희망에 찬 보고서는 미국 세인트폴에 있는 세인트 주드 메디컬(St. Jude Medical)을 움직였다. 그리고 ‘BROADEN’이란 명칭이 붙은 200명의 임상시험을 지원토록 했다. 그리고 지난 달 의학 전문지 ‘랜싯 정신의학’에 그 시험이 실패했다는 소식이 실렸다.
2012년 임상시험이 중단됐다는 것. 보고서는 많은 경우 실험 참가자 뇌 속에 심은 전극이 정상적인 활동을 멈추면서 뇌 속에 전극을 심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사라졌으며, 이로 인해 임상 시험을 중단해야 했다고 밝혔다.

임상시험 중단 후 재개방안 모색
그러나 마지막 실험 참가자 90명 중 44명의 환자들은 자신의 뇌 속에 전극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 참가자들이 뇌 속의 전극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임상의들은 종전대로 이들을 돌봐야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뇌심부자극술(DBS, deep brain stimulation) 임상시험을 재개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뇌 & 행동과학 협회에 따르면 44명의 환자들은 세인트 주드 메디컬 임상의들과 함께 지난 주 베서스다에 있는 국립보건원(NIH)에서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 참석자들은 뇌심부자극술을 완성하기 위해 더 지속적인 임상시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들이 임상 시험 재개를 원하는 것은 그동안의 임상 시험이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특히 전극에 신호가 발생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임상 시험에서는 모든 전극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100%의 성공률을 기록했다. 그 중 77명의 시험 참가자들은 그동안 실시한 뇌심부자극술에 의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우울증자기평가척도에 따르면 이들은 약 40%의 차도를 보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완치를 보인 환자 수는 19명이다. 이런 시험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임상 시험을 지속할 경우 17%의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속적인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임상 시험을 지원해온 미국의 제약회사인 애벗 래버러토리스 (Abbott Laboratories)는 시험 참가자 뇌 속에 심은 전극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로 필요한 수술 등 새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이 끊긴 상황이다. 임상 시험을 주도하고 있는 메이버그 교수는 자신이 이 환자들을 돌보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등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공률 아직 미미해, 신뢰성 높여야
지난 주 NIH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임상 시험과 관련 다양한 문제들이 협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가한 신경과학자, 윤리학자 등은 그동안 미국 행정부가 추진해온 뇌지도 프로젝트 ‘BRAIN 이니셔티브’에 투입된 자금 중 일부를 DBS에 투입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워싱톤 대학의 생명윤리학자 사라 괴링(Sara Goering) 교수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시험 결과를 제약회사 등 기업에 넘기는 방안이다. 그럴 경우 제약사들은 뇌심부자극술과 관련된 의약품 시험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지나치게 높은 실패 가능성이다. 지난 2012년 임상 시험이 중단된 이후 연구자들은 오랜 기간 시험이 재개되기를 기다려왔다. 그러나 실패 가능성을 더 줄이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시험 재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증상이 심각한 중증 우울증 환자들이 뇌심부자극술을 원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실패율이 높을 경우 사회적으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메이버그 교수는 지금 적용하고 있는 전극 미세조정 기술을 통해 성공률을 80%까지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BROADEN’ 임상시험 연구진은 메어버그 연구팀의 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중이다. 대신 자체적으로 개발한 컴퓨터단층촬영법(CT), MRI 스캔 등에 의한 전극 배치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두 연구진 간의 협력이 요구된다.
더 심각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임상 시험 목표가 잘못 설정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에리어 25’ 가설이다. 전극으로 뇌 속의 이 부위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성공적으로 항우울성 반응(antidepressant response)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을 말한다.
메어버그 교수는 “이 가설에 따라 매우 단순한 전극 구조로 매우 복잡한 구조의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생각이 임상 시험이 끝나기도 전에 지나친 기대를 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신경과학자 존 크라카우어(John Krakauer)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뇌심부자극술을 업그레이드해 성공률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 전기치료의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뇌심부자극술은 그동안 심각한 저항성 우울증을 경험하는 환자 치료를 위해 임상적인 방법으로 시도가 이루어져왔다. 특히 전극(심부자극기)의 효능을 지지하는 많은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연구에 따라 성공률이 들쑥날쑥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NIH 미팅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기록한 보고서가 나올 계획이다. 보고서 안에는 윤리적인 고찰과 함께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전극 효과, 참가자들에 대한 세부적인 기록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이강봉 객원기자
- aacc409@naver.com
- 저작권자 2017-11-01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