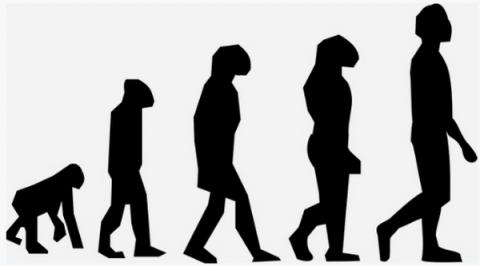진화의 사전적 의미는 생명의 기원 이후부터 생물이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현상이다. 수백 수천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매우 느리고 점진적인 과정인 만큼, 수많은 시간이 흘러야 생물체는 조금씩 변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모든 생물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같은 종(種)의 생물체라 하더라도 환경 및 지역에 따라 매우 짧은 시간에 급진적인 진화가 이뤄지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과학기술 전문 매체인 사이언데일리(sciencedaily)는 미국의 과학자들이 도시와 도시 근교에 사는 도토리 개미(acorn ant)들의 거주 환경을 조사한 결과 온도 적응력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고 보도하면서, 불과 100여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같은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링크)
100여년 만에 높은 온도에 적응하는 개미로 진화
미 케이스웨스턴리저브 대학의 사라 다이아몬드(Sarah Diamond)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곤충의 진화를 연구하기 위해 도토리 개미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런 이름이 붙여진 까닭은 개미들이 도토리 같은 작은 공간에 집을 마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도토리 개미는 다른 개미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소규모 군집을 이룬다는 점 외에는 특별할 것이 없다. 그럼에도 조사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다이아몬드 교수는 “북미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류인 만큼, 어떤 특정 지역을 선정하더라도 도토리 개미가 존재하기 때문에 진화 정도를 비교하기가 수월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우선 대학이 위치해 있는 클리브랜드시의 시내에서 채집한 도토리 개미들과 시 근교에서 채집한 개미들이 해당 지역에서 머물기 시작한 시점과 주위 환경 등을 조사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두 개미 집단이 해당 지역에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100년 전으로서, 이들의 여왕개미 수명이 5년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진화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대략 20세대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위 환경과 관련해서는 주로 온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조사가 이뤄졌다. 도시 지역의 경우 아스팔트와 시멘트가 많고 차량과 건물, 집에서 나오는 열기 때문에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더 더운 특징을 보였다. 반면에 도시 근교에 사는 개미들은 도시 내에서 살고 있는 개미보다 낮은 온도에서 적응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다이아몬드 교수는 “놀랍게도 도시 지역에서 사는 개미의 경우 낮은 온도에 대한 적응력은 상실한 대신에 높은 온도에서 버티는 능력은 향상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말하며 “불과 20세대, 즉 100년 정도의 시간 만에 온도가 높은 도시 환경에 적응한 신종 도시형 개미로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현재 진행 중인 지구 온난화의 추세를 감안해도 이 신종 도시형 개미들이 충분히 적응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다수의 동식물이 지구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적응하지 못한 채 도태되겠지만, 신종 도시형 개미 같은 진화된 개미는 충분히 살아남아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는 것이 연구진의 생각이다.
도심지에서 신종 곤충의 등장 확률 높아져
비교적 짧은 시간에 도시 환경에 맞춰 진화한 곤충은 비단 클리블랜드시의 개미뿐만이 아니다. 미 LA에서는 곤충 사전에도 등재되지 않은 30여종의 신종 파리가 발견되어 학계에 충격을 준 바 있다.
LA에 위치한 국립자연사박물관(NHM)의 곤충학자인 에밀리 하톱(Emily Hartop) 박사는 가정집이나 하수구 등에 설치되어 있는 곤충포획장치를 통해 채집된 파리들을 조사하다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신종 파리들이라는 점을 깨닫고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톱 박사는 “일반적으로 신종 곤충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접한다면 아마존의 열대 우림이나 아프리카의 정글 등에서 채집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라고 전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금 전 지나갔던 도심 주변에 신종 파리들이 대거 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일은 연구진이 수집한 1만 여종의 파리들 중, 신종이 30여종에 달한다는 사실과 조사 기간이 불과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하톱 박사의 언급에 대해 NHM의 곤충학 부분 큐레이터인 브라이언 브라운(Brian Brown) 박사는 “언뜻 보기에는 말이 안되는 상황 같지만, 이는 도심 생물의 다양성을 연구 하는 바이오스캔(BioSCAN) 프로젝트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브라운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도시는 분명 생물들이 서식하기에는 좋은 환경이 아니다. 인간 위주의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식물이 서식하기에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리 같은 경우는 워낙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불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적응하는 신종 파리나 바퀴벌레 등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오스캔 프로젝트는 바로 이런 신종 생물체의 등장을 포착하여 그 정체를 밝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브라운 박사는 “LA 같은 대도시는 사람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난방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사람들이 먹다 남은 음식물쓰레기가 끊임없이 제공되는 등 파리가 서식하기에는 최적의 공간”이라고 밝히며 “따라서 이런 곳에서 신종 파리들이 등장했다는 소식은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등장 주기가 일반적인 진화 속도보다 훨씬 빠른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 김준래 객원기자
- stimes@naver.com
- 저작권자 2017-03-27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