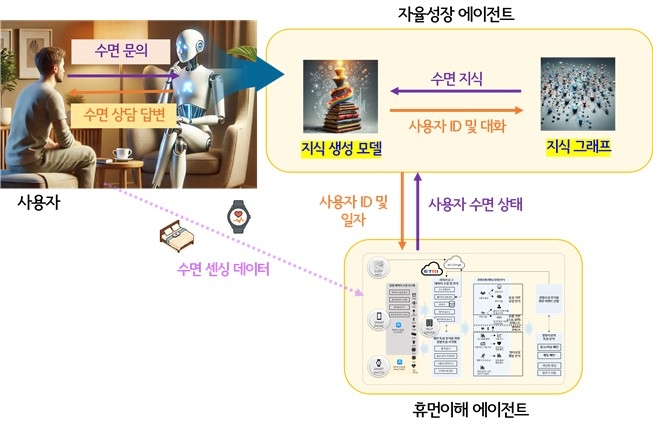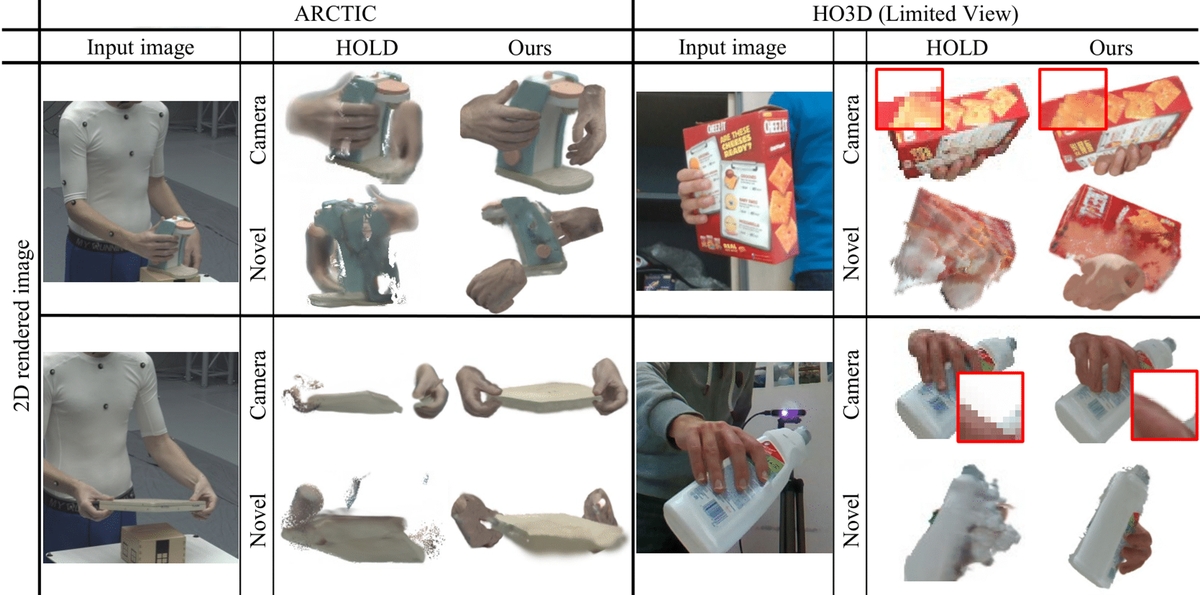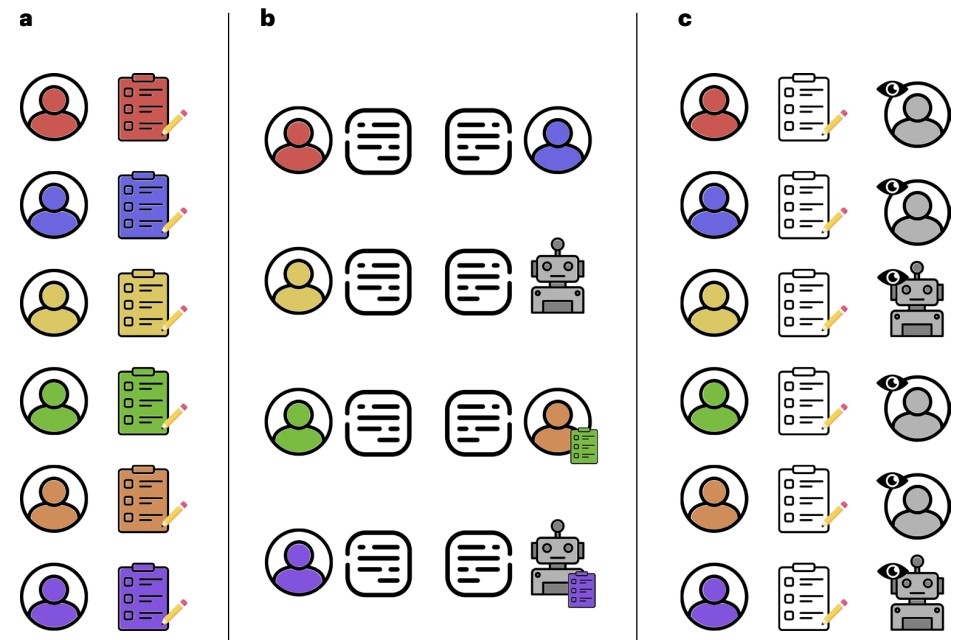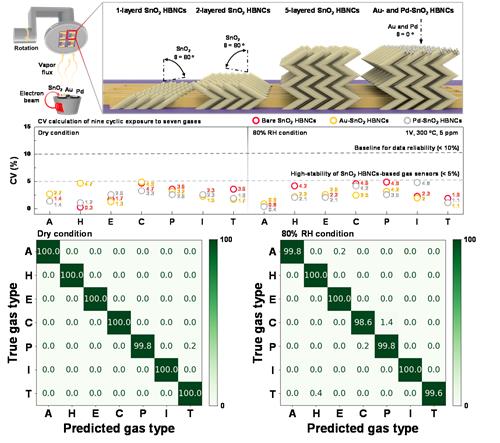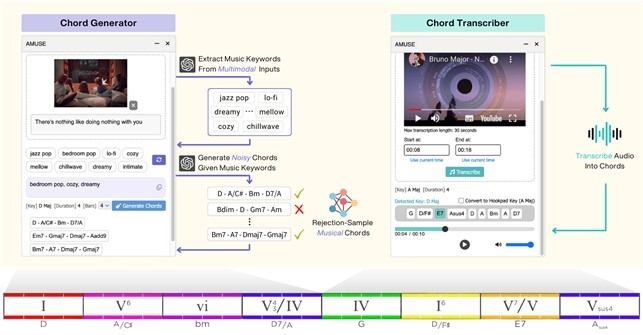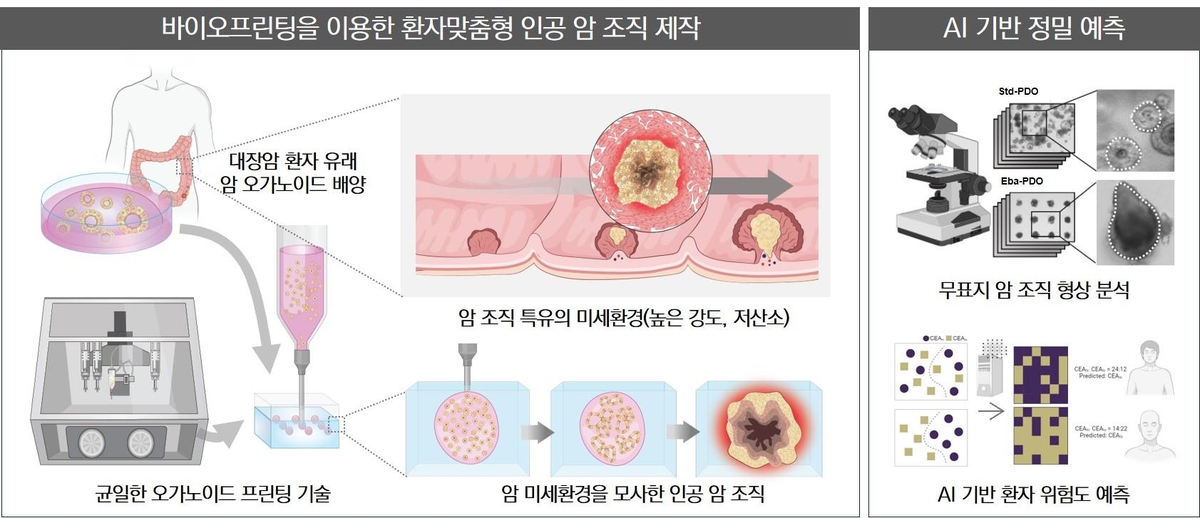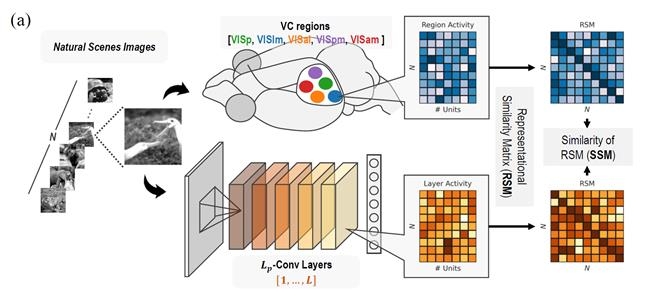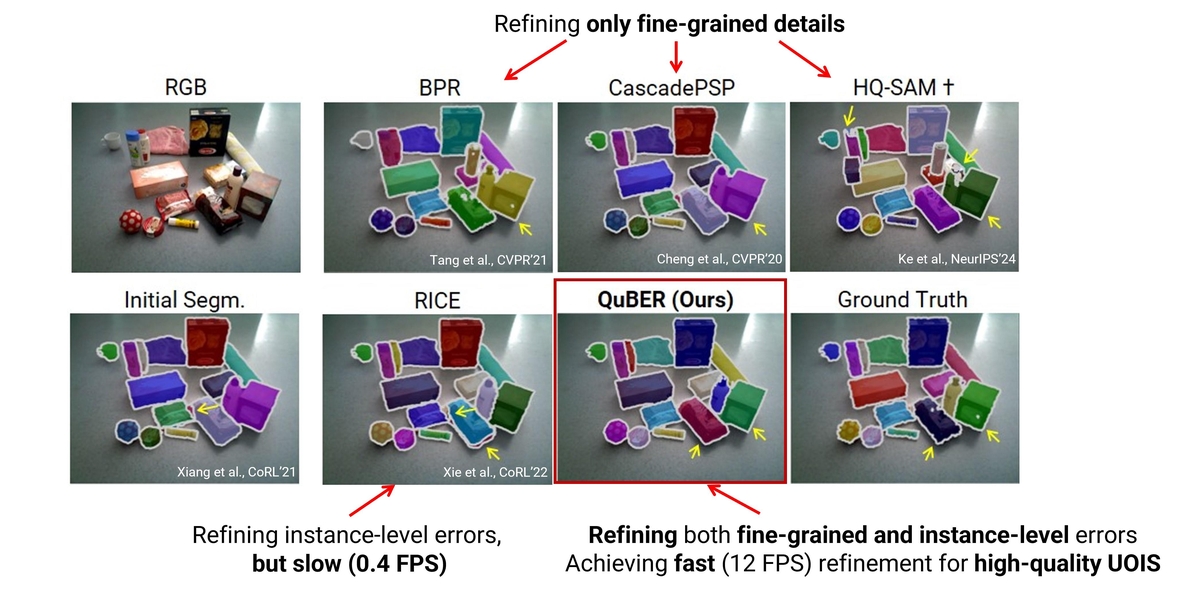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상상해 본 적 있는가. 목적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원하는 곳까지 운전해주는 자율주행차는 이제 꿈이 아니다.
영화 '빽튜더 퓨처'(Back To The Future 2)에서 선보인 하늘을 나는 스케이드보드 '호버 보드(Hoverboard)'도 이미 세상에 나왔다.
미래의 교통수단을 상상하는 것은 큰 즐거움 중 하나 이다. 첨단 과학 기술의 발달로 상상 속의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들이 실현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자율의지나 판단이 반영되지 않는 미래 교통 수단의 경우 대중화에 앞서 해결되어야 할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미래형 교통수단의 문제점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율주행차가 사고율이 더 적다는 데에는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다. 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기에 사고 위험에 대한 책임 소재 및 다양한 부분에서의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에서는 자율주행차 개발 및 확산에 있어 선행해야 할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향후 어떤 정책과 철학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를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과장은 자율주행차와 운전자 간 통제권 전환의 시점이나 도로 교통 측면에서의 기술적 연계성의 범위를 결정하는 부분을 주요 이슈로 제기했다.
사생활 보호가 먼저이냐, 공공정보가 먼저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정의경 과장은 "주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신호와 데이타를 주고 받아야 하는데 이때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테러나 해커의 공격에도 대비해야 한다. 정의경 과장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커나 테러 조직에 의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법적, 윤리적 문제'를 꼽았다.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판단을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에 맡겼을 경우 인공지능의 자율적 판단을 믿을 수 있는가 부터 사고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등 여러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원섭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체계를 요구했다. 정의경 과장도 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 및 자율주행 보험, 운전자와 보행자 중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는가 등의 법적 윤리적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술적 산업적 사회적 문화적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 고찰해야
자율주행차 연구 및 개발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정원섭 책임연구원은 "정부 차원에서 개발되는 자율주행차는 '공공재'이기도 하다"며 공공재로써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했다.
정원섭 책임연구원은 "우리의 공적 자금이 도로에서 달리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수익과 비용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자율주행차의 체험을 일반화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원섭 책임연구원은 사용화 초기에 드는 고비용에 대한 부담과 수혜를 설명하며 경제적 측면에서 손익관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자동차 개발 단계별 이해관계자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구했다.
또 "법률, 기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중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자율주행차 등 미래 첨단 교통 수단 개발에 대해서는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끊임없이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행 프로그래밍이 인간에 의해 짜여지는 것을 고려해볼 때 인간의 선입견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정 책임연구원은 "윤리적 다원성과 이질성 반영 방안 설정 및 법률의 영역과 윤리의 영역 재설정이 필요하다"며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정원섭 책임연구원은 "자율자동차와 관련된 개발자 소프트웨어를 위한 최소한의 윤리적 강령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사회가 복잡해지면 메뉴얼이 생기고 메뉴얼에 따르면서 개인의 책임이 최소화 되고 회피되고 있다"며 "우리의 윤리적 인식을 반영하는 제도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각국은 자율주행차 연구 및 개발과 더불어 정책수립 방향, 현행 규정의 적용 등 제도 관련 가이드 라인을 꾸준히 사회적 논의 과제로 삼아 발전시켜 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실정에 맞는 기준 및 결함 검사 제도, 책임 제도에 대한 가이드 라인 제정과 메가 트랜드에 맞는 인문,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 김은영 객원기자
- teashotcool@gmail.com
- 저작권자 2016-12-08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