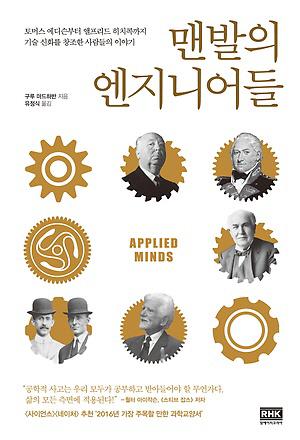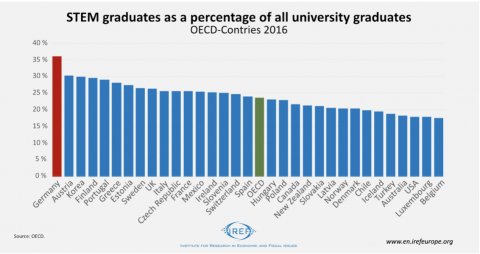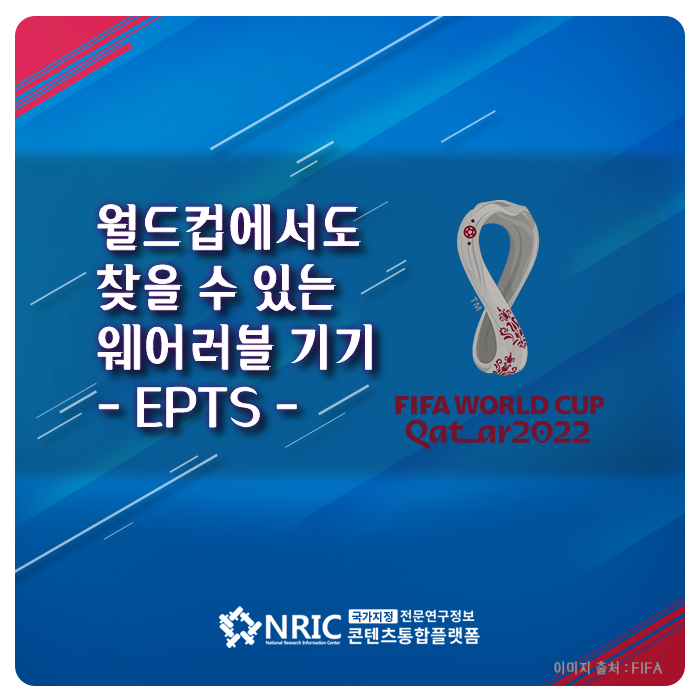요즘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과학적인 발견’의 본질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자. 모든 발견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큰 장치가 없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것들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그 발견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 과학자의 상상력이나 탐구력이라고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비싸고 정확하고 매우 정교한 기계장치가 없다면 현대 과학은 설 자리가 없다.
그렇다면 과학적인 발견을 가능하게 한 기계장치를 만들거나 설계한 사람, ‘공학자’에겐 어째서 과학자에게 돌아가는 영예가 주어지지 않을까? ‘맨발의 엔지니어들’을 읽다보면 그런 질문이 떠오른다.
'공학 없는 과학' 점점 어려워져
하긴 용어부터도 그렇다. ‘과학과 기술’이라고 하지, ‘과학과 공학’이란 말은 잘 쓰지 않는다. 서양에서도 과학이 기술 보다 훨씬 우위라는 ‘잘못된’ (적어도 이 책에서는) 편견의 결과가 아닐까.
이 책은 공학이란 무엇인지, 공학자들이 어떻게 인류에게 이바지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토머스 에디슨의 전화기, 조리 라우러의 바코드, 현금자동인출기, 디지털 카메라, 액정디스플레이, 일회용 기저귀 등 인류문명을 바꾼 혁신적인 성과를 공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다큐멘터리 처럼 설명해준다.
예를 들면 이렇다. 한 젊은이는 20대 여성이 7층에서 뛰어내렸지만, 송판 지붕을 뚫고 바닥에 떨어지느라 목숨을 건진 기사를 쓰게 됐다. 자기 자신은 비행기 충돌사고에서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상대 비행기 조종사는 사망하는 극한 체험도 한다. 이 같은 경험은 그로 하여금 자동차 충돌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를 고안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점점 더 통제불능으로 치닫는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의 교통정체를 해결한 것도 공학자들의 노력 덕분이다. 이미 수 십 개의 다리가 있는 스톡홀름은 다리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IBM 엔지니어의 컨설팅을 받는다.
엔지니어들은 교통흐름을 감지하는 센서를 달고 43만개의 무선응답기를 사용하고 85만장의 사진을 수집했다. 병목지점과 교차점을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시스템 모델을 세웠다. 그리고 ‘새로운 다리와 도로를 건설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했다. 대신 피크타임대의 다리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통근자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엉뚱해 보이는 이 제도가 2006년 시행된 이래 교통혼잡도는 20~25% 줄고 통근자들이 정차해 있는 시간은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줄었다. 공학의 힘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이다.
케네디 대통령이 “1960년대가 끝나기 전에”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고 선언한 대로 아폴로 11호가 1969년 달에 착륙했다. 사람들은 이것을 로켓과학의 성과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책의 저자인 구루 마드하반(Guru Madhavan)이 보기에 제한된 시간 안에 목표를 달성한 달착륙이야 말로 공학의 성과이다.
과학자와 공학자 사이의 은근한 경쟁심은 공학사상가 헨리 페트로스키(Henry Petroski)의 말에서 잘 나타난다. “과학은 공학의 도구다. 끌이나 정이 조각품을 창조했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과학이 로켓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과학의 핵심은 ‘발견’이고 공학의 정수는 ‘창조’라는 말로 은근히 과학자들의 심기를 긁는다.
요즘처럼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단순한 공학만 가지고 안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진다. 정치와 사회의 복잡한 구조를 뚫는 또 다른 형태의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
복잡한 사회 문제 풀려면 공학적 접근법 필요
‘맨발의 엔지니어들’은 휴대폰에 GPS기능을 넣고 이를 미국의 119시스템인 911와 결합하도록 하는데 성공한 데이비드 쿤(David Koon)의 이야기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1993년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18세된 제니퍼 쿤은 오전 10시30분쯤 도심 한 가운데 쇼핑몰 주차장에서 납치돼 2시간동안 폭행과 강간을 당하고 결국 총에 맞아 사망했다.
제니퍼는 몇 차례 휴대전화로 911에 전화를 걸었지만, 911은 그녀가 납치된 위치를 알 수 없었기에 구조가 불가능했다.
바슈롬에서 오래동안 산업공학자로 일한 데이비드 쿤은 딸이 쇼핑몰에서 당한 비극을 믿을 수 없었다. 사건 주변 건물의 CCTV를 샅샅이 조사해서 잘 못 된 점을 발견하고, 911과 GPS를 연결하는 제도개선에 온 힘을 쏟았다. 법안을 만들고 주지사를 설득하고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공학적 접근방법이 필요했다.
결국 쿤은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 ‘911강화법’을 발의하고 주지사의 거부권을 뛰어넘어 911강화법이 실행되도록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 그는 동료 의원들에게 지능형 추적 시스템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기술기업들과 통신시스템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한편으로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3방향 의사소통을 벌였다.
시스템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익숙한 공학자 다운 접근법이다. 사회문제에 관심 많은 공학자들이 배워야 할 새로운 형태의 공학이라고 할까.
- 심재율 객원기자
- kosinova@hanmail.net
- 저작권자 2016-06-30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