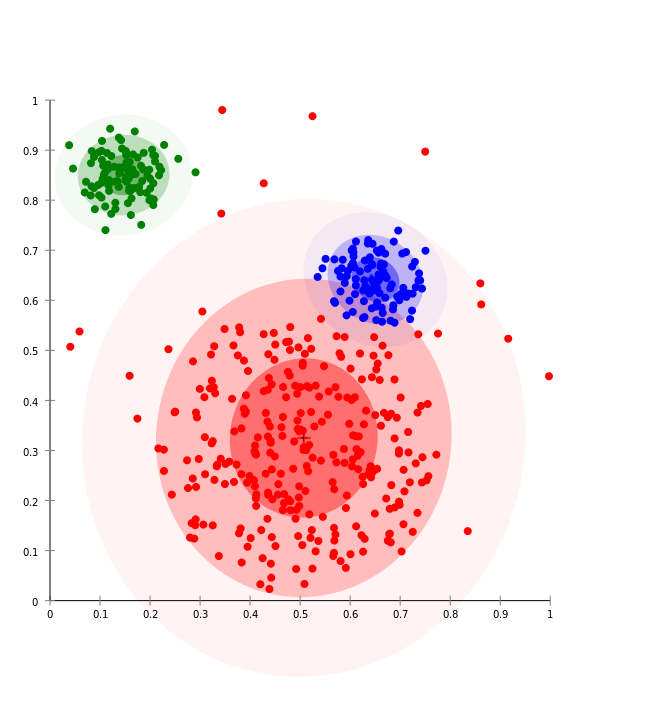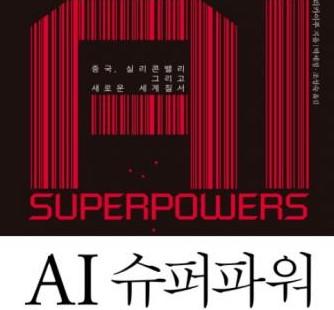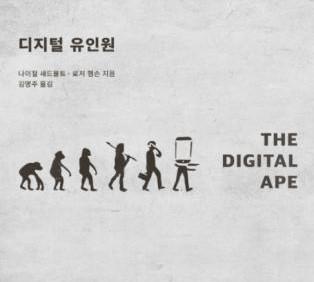이세돌 9단과 알파고와의 대결은 처음 생각했던 것 보다 엄청나게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세돌 9단은 1대 3으로 밀리고 있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이세돌 9단이 컴퓨터를 이긴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13일 벌어진 4국은 그 전 3번의 대국 보다 훨씬 더 반향이 컸다. 3번의 패배를 딛고 한 번 이긴 것이 아니다. 알파고의 4번째 패배는 알파고의 약점을 너무 강렬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한 판만 지고도 전체적으로 인간의 상대가 되기에는 아직 미약하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알파고와 이세돌 9단 사이의 대국이 ‘경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만약 ~이었다면 어땠을까’는 가정을 하게 만든다.
첫 번째, 만약 7번기로 대회가 진행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점이다. 4국을 기점으로 급격히 상황이 변했기에 7국까지 갔다면 최종 승부는 장담하기 어려웠을지 모른다.
두 번째, 이세돌 9단에게 알파고를 파악할 시간을 미리 줬다면 어땠을까? 프로야구나 농구에서 시범경기를 치르듯, 본격적인 대국 이전에 시범대국을 했으면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다.
이세돌 9단의 한번의 승리는 3번의 패배 보다 더 의미가 깊다.
우선 인공지능이 결정적인 오류를 보여줬다는 점이다. 알파고는 중반에 이세돌 9단의 묘수가 나와서 전세가 역전될 상황이 되자, 당황한 나머지 너무나 이상한 수를 잇따라 뒀다. 바둑 초보자라도 두지 않을 만큼 하수(下手)의 모습을 보여줬다.
마치 일생을 1등만 하면서 살아오다가 중년이 돼서 약간의 일탈을 하거나, 3,4등으로 떨어지자 이것을 못 견뎌 급속히 무너지면서 회복하지 못하는 모범생을 닮았다고나 할까. 알파고 역시 실패하는 법, 지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 같다. 기계의 약점, 인공지능의 치명적인 약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엄청난 사건이었다.
허사비스 딥마인드 CEO도 4국 대국 종료 후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도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허사비스는 “알파고는 초반에 스스로 우세한 형세라는 추정값을 냈지만, 이세돌 9단의 묘수와 여러 복잡한 형세에 실수가 나왔다”고 인정했다.
허사비스는 “영국으로 돌아가 기보를 면밀히 분석해서, 여러 통계 수치를 통해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 파악해 알파고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국이 끝난뒤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는 두 손으로 이세돌 9단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는 공손한 인사를 통해서 아낌없는 경의를 표시했다.
이번 대국은 우리나라 과학계에 매우 중요한 과제를 던졌다. 알파고는 현재로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만든 프로그램이다. 수 백 명인지 수 천 명인지 모를 세계 최고의 프로그래머에 구글이라는 막강한 금력(金力)이 합쳐져 개발한 알파고 프로그램이 단 한 사람 이세돌 9단에게 여지없이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다.
이것은 반대로 보면 한국에는 엄청난 기회와 발전의 여지를 보여준 신호이기도 하다. 체스가 1997년에 컴퓨터 프로그램인 ‘디퍼 블루’에 한 방에 무너진 것 과는 달리, 바둑은 광활한 19×19 짜리 거미줄 안에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대륙이 호령하고 있음이 증명됐다.
그런데 바둑의 그 오묘한 미개지가 인공지능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점을,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가들은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인류의 거의 모든 생활에 깊숙이 침투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산업의 미래는 누가 더 우수한 프로그래머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세돌 9단의 승리는 과학적인 지식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도와줄 창의력과 직관을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가 한국에 있음을 보여줬다. 이세돌 같은 인재를 보유한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분야에 적극 진출해도 승산이 있음이 증명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산업계가 할 일이 무엇인지 보여줬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과 바둑을 결합한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바둑 고수가 있는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컴퓨터 대회를 개최하면 세계적인 관심을 끌 것이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발전에 바둑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이다. 우리나라가 IT 분야에서 하드웨어는 세계 수준인데, 소프트웨어는 뒤진 국가라는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다.
- 심재율 객원기자
- kosinova@hanmail.net
- 저작권자 2016-03-14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