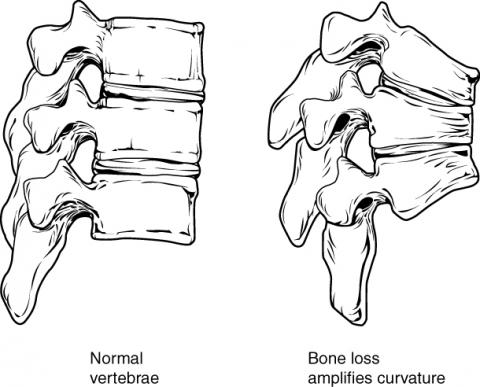1970년대 이후 페미니스트들은 섹스(Sex)라는 말 대신 젠더(Gender)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한국말로는 두 단어 모두 성(性)을 뜻하지만, 원어인 영어에서는 묘한 차이가 있다. 섹스는 생물학적 성차를 나타내는 반면, 젠더는 사회적인 성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통상 성차에 대한 본질적인 규정을 근거로 해서 성차별은 정당화되어 왔다. 예를 들어 여성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냉정하고 논리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작업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이 있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여자인 것과 감정적인 것에는 어떠한 본질적인 관계가 없다.
결국 '여성은 감정적이다'라는 규정은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구성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젠더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섹스는 신체의 해부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자웅의 구별을 말한다.
오랜 시간에 걸쳐 알게 모르게 자리잡은 성차별을 없애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 젠더혁신(gendered innovation) 바람이 불고 있다. 유럽연합(EU)와 미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젠더를 남녀차별적인 섹스보다 대등한 남녀간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즉, 평등에 있어서도 모든 '사회적인' 동등함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런 젠더혁신은 의학분야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젠더혁신은 성-젠더 분석을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만들고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이 용어는 2005년 론다 슈빙어(Londa Schiebinger) 박사가 만들어낸 용어로, 젠다 슈빙어 박사는 특히 과학, 의학, 기술, 환경 분야에서의 젠더 혁신을 강조하였다. (관련링크)
과학기술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고 연구 기관에서의 다양성 증진에 따라 지식 창출과 기술 활용에서도 젠더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산업분야에서도 젠더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젠더혁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1997년부터 2000년 사이 미국에서 의약품 10종이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인해 회수된 사례가 있다. 회수된 의약품 10종 중 8종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젠더에 대한 편견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러한 편견이 과학기술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해하는'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연구 초반부터 성-젠더 분석을 통해 연구의 편견(bias)을 제거하여 과학, 의학, 공학 분야에서 연구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바로 젠더혁신이다.
'젠더혁신' 프로젝트의 시작
젠더혁신 프로젝트의 시작은 2009년 7월 스탠포드 대학교(Stanford University)였다. 론다 슈빙어 박사를 주축으로 젠더혁신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2011년 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젠더를 통한 혁신'이라는 전문가 집단을 통해 연구혁신 분야에 젠더 요소를 접목시키기 위한 2년 단위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2010년 젠더 혁신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genSET(Gender in Science) 프로젝트의 보고서 개발에 참여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유럽 과학 분야에서 젠더 평등을 신장시키고 양질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대화를 나누고 행동 계획을 세우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이다.
2011년 3월 젠더, 과학 및 기술에 대한 UN의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다음해 1월 미국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여기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후, 젠더 혁신 프로젝트 보고서 및 웹사이트 개발은 스탠포드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3년 7월 9일 젠더 혁신 프로젝트는 유럽회의에서 발표되었으며, 여기에서 젠더 혁신이 어떻게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 보고서도 함께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연구 정책의 우선 순위 중 하나로 젠더 요소를 연구혁신 분야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관련링크)
목표는 실용적인 성-젠더 분석 방법 제공
젠더 혁신 프로젝트의 목적은 과학기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성-젠더 분석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젠더 혁신 프로젝트가 국제협력을 통해 개발되는 이유는 바로 과학기술이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는 의료, 환경 등 20여개의 분야에서 젠더 개념, 즉 여성이 빠짐으로써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밝히고 있다. 보다 중요하게 젠더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무엇을 혁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젠더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기술의 가치와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새로운 혁신과 창의성에 기반한 미래 생태계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다. 말하자면 지식의 생산과 응용, 여기서 나온 성과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남녀의 통합적인 시각을 반영한다면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여성만을 위한 젠더 혁신이 아니라, 남녀 모두를 위한 젠더혁신인 것이다.
한국에서도 젠더 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태 젠더서밋'(Asia-Pacific Gender Summit)이 열린다. 오는 8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리며, 주최 및 주관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과 한국연구재단(NRF),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다. 한국에서 열릴 제6차 젠더서밋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젠더혁신관련 이해당사자들을 연결하고 남녀가 조화롭게 활동하는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관련링크)
- 이슬기 객원기자
- justice0527@hanmail.net
- 저작권자 2015-05-06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